목차
Ⅰ. 들어가며 . . .
Ⅱ. 벽화에 나타난 주요 복식의 특징
1. 저고리
2. 바지
3. 치마
4. 두루마기
Ⅲ. 복식의 신분별 차이(재현사진 참고)
1. 왕과 왕비
2. 귀족 남녀
3. 장수의 모습
4. 평민의 모습
5. 시녀
Ⅳ. 성별에 따른 옷의 구별
1. 남자의 옷
2. 여자의 옷
3. 집안과 평양 지역의 복식 차이
Ⅴ. 머리모양
1. 여자의 모리모양
2. 남자의 머리모양
Ⅵ. 모자와 신발
Ⅶ. 장신구
Ⅷ. 마치며 . . .
Ⅱ. 벽화에 나타난 주요 복식의 특징
1. 저고리
2. 바지
3. 치마
4. 두루마기
Ⅲ. 복식의 신분별 차이(재현사진 참고)
1. 왕과 왕비
2. 귀족 남녀
3. 장수의 모습
4. 평민의 모습
5. 시녀
Ⅳ. 성별에 따른 옷의 구별
1. 남자의 옷
2. 여자의 옷
3. 집안과 평양 지역의 복식 차이
Ⅴ. 머리모양
1. 여자의 모리모양
2. 남자의 머리모양
Ⅵ. 모자와 신발
Ⅶ. 장신구
Ⅷ. 마치며 . . .
본문내용
우관이라고 한다. 절풍의 좌우에 깃을 한 개씩 꽂거나 정수리 부분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꽂은 경우가 일반적이며, 투구 위에 새 깃을 꽂은 예도 보인다. 고구려에서는 신분이나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모자에 꽂는 깃의 수가 달라지며, 나아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깃을 꽂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자에 새 깃을 꽂아 장식하는 풍습은 고구려 외에 신라와 백제에도 있었으며, 내륙 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데, 이런 풍습은 새를 신의 사자, 죽은 자의 인도자로 여기는 신앙에서 유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책 : 책은 문관이나 무관의 의례용 모자로 주로 사용되었다. 앞부분이 모자 테 보다 한 단 높고, 앞부분보다 더 높은 뒷부분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책과 뒤 운두가 뾰족하게 솟은 책의 두 종류가 있다. 뒤 운두가 솟은 책은 주로 무사들이 썼다. 책에 쓰인 천이나 천의 색깔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다.
5) 라관 : 라관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인물만이 쓰던 모자로 뒤 운두가 솟은 책 모양의 내관과 발이 성긴 \'라\'라는 비단으로 짠 외관으로 이루어졌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왕은 백색, 대신은 청색, 그 다음은 붉은색 비단으로 짠 라관을 썼다고 한다. 고분벽화에서 무덤 주인은 흔히 라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진다.
6) 패랭이 : 패랭이는 반구형 덮개와 햇빛 가림용의 넓은 채양으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모자로 오늘날의 밀짚모자와 기본형태가 같다. 감신총 벽화와 안악2호분 등의 벽화에서 사냥하는 사람이 쓰고 있다.
2. 신발
벽화에서 보이는 신발은 형태상 화(靴)와 리(履)로 나뉘어 진다. 화는 목이 높은 신으로 현대의 장화와 유사한데, 앞부리가 뾰족하고 목이 길어 종아리 정도이거나 무릎 밑까지 오는 것도 있다. 쌍영총 주인공 부부가 평상에 정좌한 앞에 부부의 화가 놓여 있고, 매산리 사신총에도 주인과 세 부인이 모두 평상에 정좌한 앞에 부부의 화가 놓여 있다. 쌍영총의 수렵도 중 기마 인물과 무용도 중에 포를 입은 여자 무용인이 화를 신었고, 안악3호분의 행렬도 중에 군사가 무릎길이의 화를 신었다. 리는 목이 없는 신으로 남자 고무신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못신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발바닥에 송곳과 같이 끝이 날카로운 소막대를 촘촘히 박은 특수화이다. 못신류는 전쟁에서 보병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병이 자신의 신발에 덧신던 것이다. 삼실총 벽화에서 이 신을 신은 갑주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무덤 속에서 실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구려 귀족들은 노란 가죽신을 즐겨 신었다고 한다. 무용총벽화에서는 사냥중인 기마 인물들이 목이 긴 가죽신을 신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쌍영총 및 약수리 고분벽화에서는 무덤 주인부부로 보이는 인물들이 목이 긴 가죽신을 벗고 평상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Ⅶ. 장신구
벽화에 나타나는 인물이 착용한 장신구들로는 귀고리, 목걸이, 팔찌 등이 있다. 귀고리는 안악3호분 주인 남자의 귓불에 찍힌 홍색 점으로 추측되고, 쌍영총 여인의 목선에 보이는 가는 선은 목걸이를 표현한 것이다. 팔찌는 집안12호분 여인이 착용하였는데 이 팔찌는 긴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손을 치켜든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통구사신총 역사들 중 한 명이 귀고리를 했고, 두 명이 팔찌를 했다. 삼실총의 천장을 떠받들고 있는 역사 네 명이 팔찌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양쪽에 다 하였고 세 명은 우측 팔에 팔찌를 한 모습이 보인다.
반면,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장신구류에는 귀고리와 팔찌 외에 반지와 머리장식품, 비녀가 있다. 특히, 고구려 장신구류 출토품 중 그 대부분이 귀고리인데, 주로 금과 금동제품으로 된 것이다. 반지는 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Ⅷ. 마치며 . . .
지금까지 고분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의 복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복식에 대해서 기존에 아는 바도 거의 없고, 또한 관련 용어들이 생소해서 정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우리 복식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고분벽화 유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 문헌 >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 풀빛출판사, 1999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이경자, 「우리옷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임영미, 「한국의 복식문화(1)」 도서출판 경춘사, 1996
4) 책 : 책은 문관이나 무관의 의례용 모자로 주로 사용되었다. 앞부분이 모자 테 보다 한 단 높고, 앞부분보다 더 높은 뒷부분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책과 뒤 운두가 뾰족하게 솟은 책의 두 종류가 있다. 뒤 운두가 솟은 책은 주로 무사들이 썼다. 책에 쓰인 천이나 천의 색깔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냈다.
5) 라관 : 라관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인물만이 쓰던 모자로 뒤 운두가 솟은 책 모양의 내관과 발이 성긴 \'라\'라는 비단으로 짠 외관으로 이루어졌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왕은 백색, 대신은 청색, 그 다음은 붉은색 비단으로 짠 라관을 썼다고 한다. 고분벽화에서 무덤 주인은 흔히 라관을 쓴 모습으로 그려진다.
6) 패랭이 : 패랭이는 반구형 덮개와 햇빛 가림용의 넓은 채양으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모자로 오늘날의 밀짚모자와 기본형태가 같다. 감신총 벽화와 안악2호분 등의 벽화에서 사냥하는 사람이 쓰고 있다.
2. 신발
벽화에서 보이는 신발은 형태상 화(靴)와 리(履)로 나뉘어 진다. 화는 목이 높은 신으로 현대의 장화와 유사한데, 앞부리가 뾰족하고 목이 길어 종아리 정도이거나 무릎 밑까지 오는 것도 있다. 쌍영총 주인공 부부가 평상에 정좌한 앞에 부부의 화가 놓여 있고, 매산리 사신총에도 주인과 세 부인이 모두 평상에 정좌한 앞에 부부의 화가 놓여 있다. 쌍영총의 수렵도 중 기마 인물과 무용도 중에 포를 입은 여자 무용인이 화를 신었고, 안악3호분의 행렬도 중에 군사가 무릎길이의 화를 신었다. 리는 목이 없는 신으로 남자 고무신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못신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발바닥에 송곳과 같이 끝이 날카로운 소막대를 촘촘히 박은 특수화이다. 못신류는 전쟁에서 보병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기병이 자신의 신발에 덧신던 것이다. 삼실총 벽화에서 이 신을 신은 갑주 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무덤 속에서 실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고구려 귀족들은 노란 가죽신을 즐겨 신었다고 한다. 무용총벽화에서는 사냥중인 기마 인물들이 목이 긴 가죽신을 신은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쌍영총 및 약수리 고분벽화에서는 무덤 주인부부로 보이는 인물들이 목이 긴 가죽신을 벗고 평상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Ⅶ. 장신구
벽화에 나타나는 인물이 착용한 장신구들로는 귀고리, 목걸이, 팔찌 등이 있다. 귀고리는 안악3호분 주인 남자의 귓불에 찍힌 홍색 점으로 추측되고, 쌍영총 여인의 목선에 보이는 가는 선은 목걸이를 표현한 것이다. 팔찌는 집안12호분 여인이 착용하였는데 이 팔찌는 긴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나, 손을 치켜든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드러나게 되었다. 통구사신총 역사들 중 한 명이 귀고리를 했고, 두 명이 팔찌를 했다. 삼실총의 천장을 떠받들고 있는 역사 네 명이 팔찌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양쪽에 다 하였고 세 명은 우측 팔에 팔찌를 한 모습이 보인다.
반면,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장신구류에는 귀고리와 팔찌 외에 반지와 머리장식품, 비녀가 있다. 특히, 고구려 장신구류 출토품 중 그 대부분이 귀고리인데, 주로 금과 금동제품으로 된 것이다. 반지는 은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Ⅷ. 마치며 . . .
지금까지 고분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의 복식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복식에 대해서 기존에 아는 바도 거의 없고, 또한 관련 용어들이 생소해서 정리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우리 복식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꼭 한번, 고분벽화 유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보고서를 마친다.
< 참고 문헌 >
전호태,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이야기」 풀빛출판사, 1999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이경자, 「우리옷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임영미, 「한국의 복식문화(1)」 도서출판 경춘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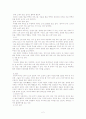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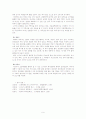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