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역사의 라이벌 4단정론에 대해
이황
1.1. 1.1. 1.1. 산수의 즐거움
1.1. 1.1. 1.1. 도학과 이기설
1.1.1. 1.1.1. 1.1.1. 사단이발칠정기발설(四端理發七情氣發說)
1.1.1. 1.1.1. 1.1.1.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에 대한 논변1. 1. 1. 기대승
1.1. 1.1. 1.1. 시대상
1.1. 1.1. 1.1. 퇴계와의 관계
1.1. 1.1. 1.1. 곧음으로 보낸 일생
이황
1.1. 1.1. 1.1. 산수의 즐거움
1.1. 1.1. 1.1. 도학과 이기설
1.1.1. 1.1.1. 1.1.1. 사단이발칠정기발설(四端理發七情氣發說)
1.1.1. 1.1.1. 1.1.1.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에 대한 논변1. 1. 1. 기대승
1.1. 1.1. 1.1. 시대상
1.1. 1.1. 1.1. 퇴계와의 관계
1.1. 1.1. 1.1. 곧음으로 보낸 일생
본문내용
일파 대윤(大尹)을 몰아내어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1498년(연산군 4) 이후 약 50년간 관료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어 나타난 대옥사(大獄事)는 을사사화로서 마지막이 되었으나,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한 사림세력에 의해 붕당(朋黨)이 형성되었다.
후로 윤원형 .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 을사사화의 공으로 보익공신(保翼功臣) 3등,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서원군(瑞原君)에 봉해졌다. 1546년(명종 1),형 원로(元老)와 권세(權勢)를 다투어 유배하게 하고, 이듬해 양재역(良才驛) 벽서사건을 계기로 대윤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 1548년 이조판서, 1551년 우의정, 1558년 다시 우의정을 거쳐서, 1560년(명종 15) 서원부원군(瑞原府院君)에 봉해지고, 1563년 영의정에 올랐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삭직되고 강음(江陰)에 귀양가서 죽었다.
등 일파와 이량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 명종 후반에 그는 국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척신인 심통원(沈通源) 역시 그의 세력 급성장에 도움을 주었다.1562년 이조참판에 오르면서 그의 세력은 더욱 커졌으며, 이후 예조판서공조판서 등을 거쳐 1563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기대승(奇大升)허엽(許曄)윤근수(尹根壽) 등의 사림들과 가까웠던 조카 심의겸(沈義謙)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심강(沈鋼)과 심의겸 부자의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되었으며, 이어 강계로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지나치게 재산을 축적하여 그의 집 앞은 시장과 같았다는 것이나, 윤원형 심통원과 더불어 삼흉(三凶)으로 지칭된 것에서 보이듯 부정적이었다.
(李樑) 등의 방해로 벼슬길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늘 김인후와 이항에게 찾아가 서로 묻고 배웠다.기대승은 천하가 다 아는 고집불통으로 남을 이기기를 즐겨하며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라서 환영을 받지 못해 항상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존경하고 배워야 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았고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가령 그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초야에 은거한 박순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요동정벌 때 이성계(李成桂)의 휘하에서 종군하였으며, 1392년 조선의 개국과 함께 상장군이 되었다. 태조가 왕자들을 죽이고 등극한 태종을 미워하여 함주(咸州: 咸興)에 머무르는 동안 귀환을 요청하러 온 사자를 모조리 죽이자, 그는 사신으로 자청, 함주에 가서 돌아가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태조의 측근에게 살해되었다. 태종은 그의 공을 기려 관직 토지를 내리고 자손들을 등용하고, 자결한 부인 임씨(任氏)에게는 묘지를 내렸다. 고향에 충신열녀의 두 정문(旌門)이 섰다.
(朴淳)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박순이 의리를 분석함에 있어 명쾌한 변론과 그 선명한 판단은 내가 따르지 못하는 바이다.”그는 의리의 강구를 평생의 본분으로 삼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비가 분명하였고 호도(糊塗)란 있을 수 없었다. 이량이 횡포를 부릴 때에도 그는 사류의 영수가 되어 상소했다. 그는 경연에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항상 옳음에 두었고, 현명한 임금은 시비를 식별하여 올바른 대신을 등용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얼마 후 을사사화를 일으킨 윤원형이 실각하자 그는 사화로 인하여 귀양갔던 노수신(盧守愼)백인걸(白仁傑)유희춘(柳希春) 등을 사면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제일 먼저 고하였다. 이로써 그들을 사면되고 관직에 등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산군 4년에 시작했던 네 번째의 사화는 종지부를 찍고 선비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것이다.명종이 승하한 다음 그는 시비의 분별에 힘을 주어 역설하였다.“천하의 일은 시비가 있는 것이며, 시비가 분명치 못하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으며 나라의 정사는 전도되는 것이다.”말하자면 그의 학문은 시비의 분별에 있었던 것이다. 기대승은 기묘사화에서 죽어간 조광조를 무척 숭배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죽기 일년 전 이언적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어 그의 학문을 높이 추모하기도 하였다. 일찍 부모를 잃은 고봉은 일정한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운바 없으나 그 스스로 분발하고 노력하여 널리 고금(古今)에 통하고 전고(典故)에 익숙하여 경연에서 임금에게 학문을 이야기함에 있어선 그 뜻이 자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족히 감동시켰던 것이다.후에 율곡이 성혼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학문 경향은 이이와 1572년부터 6년간에 걸쳐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한 왕복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신에서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비판하였다. 이이는 그의 학문을 평가하여 의리상 분명한 것은 내가 훌륭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외손인 윤선거(尹宣擧)는 그가 학문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成渾)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봉을 높이 칭찬하였다.“이퇴계는 기대승과 더불어 사칠(四七)의 설을 논하였는데 무려 1만여 언(言)이다. 그의 논설은 분명하고 곧아서 그 힘이 대[竹]를 쪼개는 것과 같다. 이퇴계는 그 변(辨)이 매우 상세하나 의리가 밝지 못하다.”율곡은 이처럼 고봉을 극구 칭찬하였으며, 고봉의 설을 지지하여 이퇴계를 공격하였으니 고봉의 진면목을 옳게 인식하여 평한 것이라 하겠다. 한반도에 성리학이 전래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명종선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셋을 들 수 있는 것이다.첫째는 이언적과 조한보의 논변이며, 둘째는 이퇴계와 기대승의 사칠논변이며, 셋째는 이율곡과 성혼의 논변이라 할 수 있겠다. 이중에서도 성리학의 이론을 더욱 궁구(窮究)한 한국 최대의 성리학자 퇴계와 고봉의 논변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다음으로 이이와 성혼의 논변을 들 수 있다. 이에 있어서 기대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이이였다. 그는 기대승을 논변을 내세워 이황이 틀렸고 기대승이 옳다고 하였고, 마침내 이황의 설을 지지하려던 성혼이 그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기대승은 이황이이와 함께 성리학이 한창 성하던 무렵에 그 가장 심오한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었다.
후로 윤원형 . 중종의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동생. 을사사화의 공으로 보익공신(保翼功臣) 3등, 이어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서원군(瑞原君)에 봉해졌다. 1546년(명종 1),형 원로(元老)와 권세(權勢)를 다투어 유배하게 하고, 이듬해 양재역(良才驛) 벽서사건을 계기로 대윤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 1548년 이조판서, 1551년 우의정, 1558년 다시 우의정을 거쳐서, 1560년(명종 15) 서원부원군(瑞原府院君)에 봉해지고, 1563년 영의정에 올랐다. 1565년 문정왕후가 죽자 삭직되고 강음(江陰)에 귀양가서 죽었다.
등 일파와 이량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숙. 명종 후반에 그는 국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며, 척신인 심통원(沈通源) 역시 그의 세력 급성장에 도움을 주었다.1562년 이조참판에 오르면서 그의 세력은 더욱 커졌으며, 이후 예조판서공조판서 등을 거쳐 1563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 기대승(奇大升)허엽(許曄)윤근수(尹根壽) 등의 사림들과 가까웠던 조카 심의겸(沈義謙)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심강(沈鋼)과 심의겸 부자의 탄핵을 받고 삭탈관직되었으며, 이어 강계로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에 대한 당시의 평가는 지나치게 재산을 축적하여 그의 집 앞은 시장과 같았다는 것이나, 윤원형 심통원과 더불어 삼흉(三凶)으로 지칭된 것에서 보이듯 부정적이었다.
(李樑) 등의 방해로 벼슬길이 더욱 늦어지게 되었다. 벼슬길에 오른 후에도 늘 김인후와 이항에게 찾아가 서로 묻고 배웠다.기대승은 천하가 다 아는 고집불통으로 남을 이기기를 즐겨하며 굽힐 줄 모르는 성품이라서 환영을 받지 못해 항상 외로움과 고독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존경하고 배워야 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았고 존경을 아끼지 않았다. 가령 그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초야에 은거한 박순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요동정벌 때 이성계(李成桂)의 휘하에서 종군하였으며, 1392년 조선의 개국과 함께 상장군이 되었다. 태조가 왕자들을 죽이고 등극한 태종을 미워하여 함주(咸州: 咸興)에 머무르는 동안 귀환을 요청하러 온 사자를 모조리 죽이자, 그는 사신으로 자청, 함주에 가서 돌아가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태조의 측근에게 살해되었다. 태종은 그의 공을 기려 관직 토지를 내리고 자손들을 등용하고, 자결한 부인 임씨(任氏)에게는 묘지를 내렸다. 고향에 충신열녀의 두 정문(旌門)이 섰다.
(朴淳)을 다음과 같이 평했다.“박순이 의리를 분석함에 있어 명쾌한 변론과 그 선명한 판단은 내가 따르지 못하는 바이다.”그는 의리의 강구를 평생의 본분으로 삼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비가 분명하였고 호도(糊塗)란 있을 수 없었다. 이량이 횡포를 부릴 때에도 그는 사류의 영수가 되어 상소했다. 그는 경연에 나아가 국가의 안위를 항상 옳음에 두었고, 현명한 임금은 시비를 식별하여 올바른 대신을 등용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얼마 후 을사사화를 일으킨 윤원형이 실각하자 그는 사화로 인하여 귀양갔던 노수신(盧守愼)백인걸(白仁傑)유희춘(柳希春) 등을 사면하여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제일 먼저 고하였다. 이로써 그들을 사면되고 관직에 등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산군 4년에 시작했던 네 번째의 사화는 종지부를 찍고 선비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것이다.명종이 승하한 다음 그는 시비의 분별에 힘을 주어 역설하였다.“천하의 일은 시비가 있는 것이며, 시비가 분명치 못하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으며 나라의 정사는 전도되는 것이다.”말하자면 그의 학문은 시비의 분별에 있었던 것이다. 기대승은 기묘사화에서 죽어간 조광조를 무척 숭배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죽기 일년 전 이언적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어 그의 학문을 높이 추모하기도 하였다. 일찍 부모를 잃은 고봉은 일정한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운바 없으나 그 스스로 분발하고 노력하여 널리 고금(古今)에 통하고 전고(典故)에 익숙하여 경연에서 임금에게 학문을 이야기함에 있어선 그 뜻이 자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임금을 족히 감동시켰던 것이다.후에 율곡이 성혼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학문 경향은 이이와 1572년부터 6년간에 걸쳐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한 왕복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신에서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비판하였다. 이이는 그의 학문을 평가하여 의리상 분명한 것은 내가 훌륭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외손인 윤선거(尹宣擧)는 그가 학문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成渾)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고봉을 높이 칭찬하였다.“이퇴계는 기대승과 더불어 사칠(四七)의 설을 논하였는데 무려 1만여 언(言)이다. 그의 논설은 분명하고 곧아서 그 힘이 대[竹]를 쪼개는 것과 같다. 이퇴계는 그 변(辨)이 매우 상세하나 의리가 밝지 못하다.”율곡은 이처럼 고봉을 극구 칭찬하였으며, 고봉의 설을 지지하여 이퇴계를 공격하였으니 고봉의 진면목을 옳게 인식하여 평한 것이라 하겠다. 한반도에 성리학이 전래된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명종선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셋을 들 수 있는 것이다.첫째는 이언적과 조한보의 논변이며, 둘째는 이퇴계와 기대승의 사칠논변이며, 셋째는 이율곡과 성혼의 논변이라 할 수 있겠다. 이중에서도 성리학의 이론을 더욱 궁구(窮究)한 한국 최대의 성리학자 퇴계와 고봉의 논변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다음으로 이이와 성혼의 논변을 들 수 있다. 이에 있어서 기대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 이이였다. 그는 기대승을 논변을 내세워 이황이 틀렸고 기대승이 옳다고 하였고, 마침내 이황의 설을 지지하려던 성혼이 그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기대승은 이황이이와 함께 성리학이 한창 성하던 무렵에 그 가장 심오한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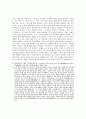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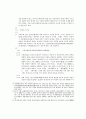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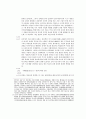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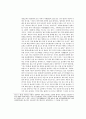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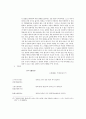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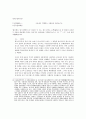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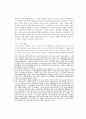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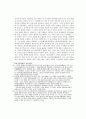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