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보 20호 - 불국사 다보탑
2. 국보 21호 - 불국사 삼층석탑
3.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4. 국보 23호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5. 국보 24호 석굴암석굴
6. 국보 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7. 국보64호 법주사 석연지
8. 국보 52호 해인사 대장경판전
9. 국보 제 27호 - 불국사 금동 아미타여래 좌상
10. 국보 5호 법주사 사자 석등
11. 국보13호 무위사 극락전
12. 국보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13. 국보 48호 월정사 8각 9층석탑
14. 국보 제 78호 -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5. 국보 제 84호 - 서산마애 삼존불상
16. 국보 제 86호 - 경천사 10층 석탑
17. 국보 제 49호 - 수덕사 대웅전
18. 국보 제 62호 - 금산사 미륵전
19. 국보 제 2호 - 원각사지 10층 석탑
20. 국보 제 11호 - 미륵사지 석탑
2. 국보 21호 - 불국사 삼층석탑
3.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4. 국보 23호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5. 국보 24호 석굴암석굴
6. 국보 35호 화엄사사사자삼층석탑
7. 국보64호 법주사 석연지
8. 국보 52호 해인사 대장경판전
9. 국보 제 27호 - 불국사 금동 아미타여래 좌상
10. 국보 5호 법주사 사자 석등
11. 국보13호 무위사 극락전
12. 국보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13. 국보 48호 월정사 8각 9층석탑
14. 국보 제 78호 - 금동미륵보살반가상
15. 국보 제 84호 - 서산마애 삼존불상
16. 국보 제 86호 - 경천사 10층 석탑
17. 국보 제 49호 - 수덕사 대웅전
18. 국보 제 62호 - 금산사 미륵전
19. 국보 제 2호 - 원각사지 10층 석탑
20. 국보 제 11호 - 미륵사지 석탑
본문내용
되었으나 파손이 심하여 경복궁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었다가 1959~1960년에 재건되었고, 다시 1995년 해체된 후 문화재연구소·한국자원연구소·원자력연구소의 공동작업으로 완벽 보존처리되었다.
석탑의 형식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다각(多角) 석탑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 신라의 형식을 이은 평면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었다. 기단의 평면은 \'亞\'형으로 3단이고, 탑신부는 1∼3층이 기단과 같은 평면이나, 4층부터는 직사각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체감(遞減)되었다. 각 층마다 옥신(屋身) 밑에는 난간을 돌리고, 옥개(屋蓋) 밑에는 다포집 형식의 두공 형태를 모각(模刻)하였으며, 상면에는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 모양과 기왓골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의 조각은 기단과 탑신에도 새겨져 있는데, 기단에는 부처·보살·인물·화초·용 등이, 옥신에는 13불회(佛會) 외에도 부처·보살·천부(天部)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그 수법이 장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미한 풍취가 넘친다. 이러한 형태의 석탑은 조선 전기에도 나타나지만 유례 없는 희귀한 일품이다.
초층 옥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 \"至正八年戊子三月日(지정팔년무자삼월일)\"이란 기록에서 그 건립 연대가 1348년(충목왕 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17. 국보 제 49호 - 수덕사 대웅전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柱心包)집이다. 가구수법(架構手法)이 부석사 무량수전과 흡사하며 세부양식 역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그 구조·장식·양식·규모·형태 등에서 발견되었다.
외관은 각 부재(部材)가 크고 굵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측면은 특히 아름답다. 약간 배흘림기둥을 연결하는 경쾌한 인방(引枋), 고주(高柱)와 평주(平柱)를 잇는 퇴보, 고주간을 맞잡는 대들보 등의 직선재(直線材)와 이들을 지탱하는 다분히 장식적인 포대공(包臺工), 그리고 곡률(曲率)이 큰 우미량(牛眉樑)들이 이루는 조화와 이들이 흰 벽을 구획한 세련된 구도는 한국 고건축(古建築)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이다. 건물의 건립연대(1308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다른 건물의 건립연대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18. 국보 제 62호 - 금산사 미륵전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62호로 지정되었다. 1·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다포(多包)집이다. 겉모양이 3층으로 된 한국의 유일한 법당으로 내부는 통층(通層)이다.
기단(基壇)은 양쪽에 자연석을 초석으로 앉힌 돌계단이 있다. 두리기둥은 우주(隅柱:모서리 기둥)가 매우 굵고 기둥머리에 창방(昌枋)을 끼고 그 위에 평방(平枋)을 올렸으며, 머리끝 부분과 기둥 사이에 공간포(空間包)를 놓았다. 가구(架構) 방식은 1층은 고주(高柱) 4개와 20개의 기둥을 주위에 세워 고주와 이 기둥들을 커다란 퇴보로 연결하였다. 2층은 이 퇴보 위에 가장자리 기둥을 세워 그 안쪽 고주를 퇴보로 연결하였다. 3층은 몇 토막의 나무를 이어서 만든 고주를 그대로 우주를 삼아 그 위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이 특수한 가구 방식은 목조 탑파(塔婆)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 심주(心柱) 각층 기둥이 연결되는 방식을 본떠서 한 개의 심주 대신에 네 개의 고주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二出目)으로 외부 첨차(遮)는 우설(牛舌), 내부 첨차는 운궁(雲宮)으로 되었다. 1층과 2층의 퇴보는 그 끝이 길쭉하게 뻗어나와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고, 그 아래에 운공(雲空)이 있다. 규모가 웅대하고 상부의 줄어든 비율이 크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
19. 국보 제 2호 - 원각사지 10층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약 12m이다. 이 탑보다 약 120년 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경천사(敬天寺) 십층석탑(국보 86)을 모방하여 만든 탑이다. \'아(亞)\' 자형의 3층 기단, 이와 같은 평면의 3층 탑신, 네모꼴로 된 4층 이상의 탑신이 경천사 십층석탑과 기본적으로 같다.
탑신부는 층층이 아름다운 기와집을 모각하여 기둥·난간·공포(包), 지붕의 기와골까지 섬세한 수법이다. 옥신(屋身)에는 수많은 부처 ·보살상 ·천인(天人) 등과 구름·용·사자·모란·연꽃·인물·새·선인(仙人) 등이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세련된 석탑이다.
1466년(세조 12) 현재의 탑골공원 자리에 창건된 원각사와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앞서 건조되었다는 설도 있다. 맨 위 3층은 오랫동안 무너져 내려져 있던 것을 1947년에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20. 국보 제 11호 -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4.24m. 사각형의 다층석탑(多層石塔)이었으나, 서남 부분은 무너지고 북동쪽 6층까지만 남아 있다. 초층 탑신은 사면이 3칸씩이며, 그 중앙칸은 내부와 통하도록 사방에 문이 있고, 탑 안의 중앙에는 네모난 커다란 찰주(擦柱)가 놓여 있다. 각 면에는 엔타시스 수법을 쓴 모난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평방(平枋)·창방(昌枋)을 짰으며, 다시 두공양식(枓樣式)을 모방한 3단의 받침으로 옥개(屋蓋)를 받쳤다. 2층부터 탑신이 얕아지고 옥개석은 초층과 같은 수법으로 표현하였다.
이 석탑은 각 부분이 작은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구(架構) 수법도 목조건물을 모방하기 위해 석탑 이전에 목탑(木塔)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기이며, 한국 석탑양식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양식상으로 볼 때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원래 7층석탑으로 추정한다면 20m 안팎의 거대한 탑이었을 것이다. 건립연대는 백제 말기의 무왕 때인 600∼64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일제강점기 때, 붕괴가 우려된다고 콘크리트를 발라놓아 훼손이 심하다.
석탑의 형식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다각(多角) 석탑의 유형을 따르지 않고 신라의 형식을 이은 평면직사각형의 형태를 갖추었다. 기단의 평면은 \'亞\'형으로 3단이고, 탑신부는 1∼3층이 기단과 같은 평면이나, 4층부터는 직사각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체감(遞減)되었다. 각 층마다 옥신(屋身) 밑에는 난간을 돌리고, 옥개(屋蓋) 밑에는 다포집 형식의 두공 형태를 모각(模刻)하였으며, 상면에는 팔작지붕 형태의 지붕 모양과 기왓골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부의 조각은 기단과 탑신에도 새겨져 있는데, 기단에는 부처·보살·인물·화초·용 등이, 옥신에는 13불회(佛會) 외에도 부처·보살·천부(天部) 등을 빈틈없이 조각하였다. 그 수법이 장려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미한 풍취가 넘친다. 이러한 형태의 석탑은 조선 전기에도 나타나지만 유례 없는 희귀한 일품이다.
초층 옥신의 이맛돌에 새겨진 조탑명(造塔銘) \"至正八年戊子三月日(지정팔년무자삼월일)\"이란 기록에서 그 건립 연대가 1348년(충목왕 4)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17. 국보 제 49호 - 수덕사 대웅전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柱心包)집이다. 가구수법(架構手法)이 부석사 무량수전과 흡사하며 세부양식 역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그 구조·장식·양식·규모·형태 등에서 발견되었다.
외관은 각 부재(部材)가 크고 굵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측면은 특히 아름답다. 약간 배흘림기둥을 연결하는 경쾌한 인방(引枋), 고주(高柱)와 평주(平柱)를 잇는 퇴보, 고주간을 맞잡는 대들보 등의 직선재(直線材)와 이들을 지탱하는 다분히 장식적인 포대공(包臺工), 그리고 곡률(曲率)이 큰 우미량(牛眉樑)들이 이루는 조화와 이들이 흰 벽을 구획한 세련된 구도는 한국 고건축(古建築)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을 보이는 목조건축이다. 건물의 건립연대(1308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다른 건물의 건립연대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18. 국보 제 62호 - 금산사 미륵전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62호로 지정되었다. 1·2층은 정면 5칸, 측면 4칸, 3층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다포(多包)집이다. 겉모양이 3층으로 된 한국의 유일한 법당으로 내부는 통층(通層)이다.
기단(基壇)은 양쪽에 자연석을 초석으로 앉힌 돌계단이 있다. 두리기둥은 우주(隅柱:모서리 기둥)가 매우 굵고 기둥머리에 창방(昌枋)을 끼고 그 위에 평방(平枋)을 올렸으며, 머리끝 부분과 기둥 사이에 공간포(空間包)를 놓았다. 가구(架構) 방식은 1층은 고주(高柱) 4개와 20개의 기둥을 주위에 세워 고주와 이 기둥들을 커다란 퇴보로 연결하였다. 2층은 이 퇴보 위에 가장자리 기둥을 세워 그 안쪽 고주를 퇴보로 연결하였다. 3층은 몇 토막의 나무를 이어서 만든 고주를 그대로 우주를 삼아 그 위에 팔작지붕을 올렸다. 이 특수한 가구 방식은 목조 탑파(塔婆)의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 심주(心柱) 각층 기둥이 연결되는 방식을 본떠서 한 개의 심주 대신에 네 개의 고주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포는 내외 2출목(二出目)으로 외부 첨차(遮)는 우설(牛舌), 내부 첨차는 운궁(雲宮)으로 되었다. 1층과 2층의 퇴보는 그 끝이 길쭉하게 뻗어나와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고, 그 아래에 운공(雲空)이 있다. 규모가 웅대하고 상부의 줄어든 비율이 크기 때문에 안정감을 준다.
19. 국보 제 2호 - 원각사지 10층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2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약 12m이다. 이 탑보다 약 120년 전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경천사(敬天寺) 십층석탑(국보 86)을 모방하여 만든 탑이다. \'아(亞)\' 자형의 3층 기단, 이와 같은 평면의 3층 탑신, 네모꼴로 된 4층 이상의 탑신이 경천사 십층석탑과 기본적으로 같다.
탑신부는 층층이 아름다운 기와집을 모각하여 기둥·난간·공포(包), 지붕의 기와골까지 섬세한 수법이다. 옥신(屋身)에는 수많은 부처 ·보살상 ·천인(天人) 등과 구름·용·사자·모란·연꽃·인물·새·선인(仙人) 등이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조각솜씨를 보여주는 세련된 석탑이다.
1466년(세조 12) 현재의 탑골공원 자리에 창건된 원각사와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보다 앞서 건조되었다는 설도 있다. 맨 위 3층은 오랫동안 무너져 내려져 있던 것을 1947년에 원상태로 복구하였다.
20. 국보 제 11호 - 미륵사지 석탑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1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4.24m. 사각형의 다층석탑(多層石塔)이었으나, 서남 부분은 무너지고 북동쪽 6층까지만 남아 있다. 초층 탑신은 사면이 3칸씩이며, 그 중앙칸은 내부와 통하도록 사방에 문이 있고, 탑 안의 중앙에는 네모난 커다란 찰주(擦柱)가 놓여 있다. 각 면에는 엔타시스 수법을 쓴 모난 기둥을 세웠고, 그 위에 평방(平枋)·창방(昌枋)을 짰으며, 다시 두공양식(枓樣式)을 모방한 3단의 받침으로 옥개(屋蓋)를 받쳤다. 2층부터 탑신이 얕아지고 옥개석은 초층과 같은 수법으로 표현하였다.
이 석탑은 각 부분이 작은 석재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구(架構) 수법도 목조건물을 모방하기 위해 석탑 이전에 목탑(木塔)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기이며, 한국 석탑양식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양식상으로 볼 때 현존하는 석탑 중에서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원래 7층석탑으로 추정한다면 20m 안팎의 거대한 탑이었을 것이다. 건립연대는 백제 말기의 무왕 때인 600∼640년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일제강점기 때, 붕괴가 우려된다고 콘크리트를 발라놓아 훼손이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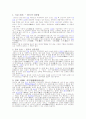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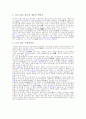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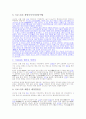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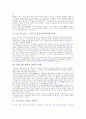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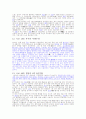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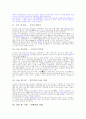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