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례
Ⅰ. 머리말
Ⅱ. 4세기 전후 加耶와 新羅의 초기적 상황
Ⅲ. 4세기 후반 百濟의 남해안 진출
Ⅳ. 400년 전후 加耶와 新羅의 갈등
Ⅴ. 맺음말
Ⅰ. 머리말
Ⅱ. 4세기 전후 加耶와 新羅의 초기적 상황
Ⅲ. 4세기 후반 百濟의 남해안 진출
Ⅳ. 400년 전후 加耶와 新羅의 갈등
Ⅴ. 맺음말
본문내용
南征의 결과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큰 세력은 낙동강 하류유역의 任那加羅가 급격히 약화되어 그 勢力圈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그 내부에서 일정 기간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남해안지역에서는 3세기 이전부터 유력한 세력인 安羅가 계속 존속하였다. 고고학적 연구대상에 의하면 5세기 전반 김해지역에 대형묘가 축조되지 않는 반면에 동래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고분이 등장하고 있는 점, 일시적으로 新羅토기의 요소가 보이면서도 주목되는 것이 함안식 토기가 안정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할 때 5세기 전반 낙동강 하류유역에서는 新羅와 安羅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고고학적인 연구성과도 참고된다(申敬澈, 삼국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1995).
그 세력은 南征軍이 지원한 新羅와 加耶지역에서 任那加羅에 버금가는 세력이었던 安羅로서, 그들이 낙동강 하류유역에 진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5세기 전반 낙동강 하류유역에는 당시 安羅의 대표적인 토기인 함안식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교역 주도세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5세기 전반 新羅는 양산에 파견된 朴堤上을 통하여 낙동강 하류유역에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訥祗王의 자립사건 등 新羅 국내정세의 불안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로써 倭는 이전에 교역을 전개한 任那加羅 대신에 安羅와 교역을 전개하는 것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4세기의 加耶와 新羅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시기 加耶와 新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이 없고 다만 廣開土王陵碑에 서기 400년 高句麗가 新羅를 구원한 소위 ‘廣開土王南征’의 과정에서 新羅를 공격하다가 퇴각하는 倭가 任那加羅로 들어간 점과 이에 安羅가 대응한 점에서, 그 이전인 4세기 加耶와 新羅의 대립적인 배경이 南征의 연속선상에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주지하듯이 4세기의 한국 고대사회는 발전과정상에서 일정지역을 통합하여 고대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이면서 각 국가 사이에 대립 경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4세기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한 전제를 3세기 후반 국제사회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중국정사에 보이는 東夷傳 기록에 의하면 3세기 중엽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魏志東夷傳>과 3세기 후반의 상황을 전하는 <晉書東夷傳>의 비교를 통한 것이다. 3세기 중엽까지 중국이 3국으로 분립되어져 曹魏가 물자확보를 위해 樂浪郡 및 帶方郡을 통해 동방지역의 물자를 확보하려 함에 대응하여 弁辰韓 사회에는 각기 12國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安邪國 狗邪國 斯盧國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交易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중국이 통일됨에 따라 동이족사회와 적극적인 교역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弁辰韓 사회가 중국 본토에까지 나아가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교역의 체계화가 진행됨과 아울러 소국은 읍락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해 나갔다. 또한 3개의 交易圈 내부에서 소국간의 갈등도 있었으며, 交易圈 간의 갈등 대립도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3세기 후반 弁辰韓 소국의 정치력 성장과 함께 야기된 交易圈 간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三國史記 初期記錄의 婆娑王代의 소국분쟁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初期記錄의 史料的 價値를 긍적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紀年을 인하 수정해야 하는데, 이 기사는 서기 2세기 초가 아니라, 3周甲이나 기년이 인하된 3세기 말엽의 사실로서 이해되었다. 3세기 말엽에는 狗邪國을 중심으로 하는 交易圈과 斯盧國을 중심으로 하는 交易圈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斯盧國 중심의 交易圈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에 狗邪國이 개입하였다. 이에 斯盧國은 狗邪國의 交易圈 확대 의도를 저지하고 交易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初期記錄에 보이는 소국정복활동이다.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 전개된 소국정복을 통하여 斯盧國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 辰韓을 하나의 勢力圈으로 묶어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狗邪國도 하나의 세력권으로 통합해 나갔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廣開土王陵碑에 廣開土王이 위기에 빠진 新羅를 구원한 소위 ‘南征’ 기사에서 주 공격대상이었던 任那加羅가 바로 狗邪國을 주축으로 한 낙동강 하류유역의 勢力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고대국가의 발전이 4세기 초 樂浪郡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라 3세기 후반의 국제적 정세변화와 내부적인 발전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본고의 중심 부분으로서 加耶와 新羅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日本書紀 神功紀의 기록과 廣開土王陵碑의 庚子年條 기록의 분석이었다. 신빙성 문제로 논란이 많은 神功紀의 기록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료 [4] 百濟와 倭의 교섭 개시기록뿐이었으며, 나머지 기록들은 6세기의 사실을 부회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廣開土王陵碑의 庚子年條 기록에 보이는 ‘安羅人戍兵’은 ‘安’자의 용법을 검토해 볼 때 ‘新羅人을 안치시켜 수병케 했다’는 문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대로 ‘安羅의 국경수비병’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4세기 후반 百濟와 倭의 교섭상에 매개가 된 것은 卓淳國이었다. 이는 加耶와 倭의 입장에서 보면 3세기 말 이후 두절된 중국과의 교섭이 百濟를 통해 재개된 것이며, 한편으로 百濟는 교역에 의한 물자확보를 통해 당시 위협하고 있었던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新羅는 소위 남해안교섭체계의 성립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高句麗와 연계하는 한편, 남해안교섭체계의 전개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倭는 加耶의 협조를 얻어 신라를 공격하였고, 고구려도 남부지역에서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세력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新羅 구원이라는 南征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南征으로 인하여 任那加羅는 쇠퇴하고 加耶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차례
Ⅰ. 머리말
Ⅱ. 4세기 전후 加耶와 新羅의 초기적 상황
Ⅲ. 4세기 후반 百濟의 남해안 진출
Ⅳ. 400년 전후 加耶와 新羅의 갈등
Ⅴ. 맺음말
그 세력은 南征軍이 지원한 新羅와 加耶지역에서 任那加羅에 버금가는 세력이었던 安羅로서, 그들이 낙동강 하류유역에 진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5세기 전반 낙동강 하류유역에는 당시 安羅의 대표적인 토기인 함안식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교역 주도세력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다. 5세기 전반 新羅는 양산에 파견된 朴堤上을 통하여 낙동강 하류유역에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訥祗王의 자립사건 등 新羅 국내정세의 불안으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로써 倭는 이전에 교역을 전개한 任那加羅 대신에 安羅와 교역을 전개하는 것으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4세기의 加耶와 新羅의 관계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 시기 加耶와 新羅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이 없고 다만 廣開土王陵碑에 서기 400년 高句麗가 新羅를 구원한 소위 ‘廣開土王南征’의 과정에서 新羅를 공격하다가 퇴각하는 倭가 任那加羅로 들어간 점과 이에 安羅가 대응한 점에서, 그 이전인 4세기 加耶와 新羅의 대립적인 배경이 南征의 연속선상에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였다.
주지하듯이 4세기의 한국 고대사회는 발전과정상에서 일정지역을 통합하여 고대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이면서 각 국가 사이에 대립 경쟁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4세기에 해당하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한 전제를 3세기 후반 국제사회의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중국정사에 보이는 東夷傳 기록에 의하면 3세기 중엽까지의 상황을 전하는 <魏志東夷傳>과 3세기 후반의 상황을 전하는 <晉書東夷傳>의 비교를 통한 것이다. 3세기 중엽까지 중국이 3국으로 분립되어져 曹魏가 물자확보를 위해 樂浪郡 및 帶方郡을 통해 동방지역의 물자를 확보하려 함에 대응하여 弁辰韓 사회에는 각기 12國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安邪國 狗邪國 斯盧國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交易圈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러나 3세기 후반 중국이 통일됨에 따라 동이족사회와 적극적인 교역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오히려 弁辰韓 사회가 중국 본토에까지 나아가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교역의 체계화가 진행됨과 아울러 소국은 읍락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해 나갔다. 또한 3개의 交易圈 내부에서 소국간의 갈등도 있었으며, 交易圈 간의 갈등 대립도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3세기 후반 弁辰韓 소국의 정치력 성장과 함께 야기된 交易圈 간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은 三國史記 初期記錄의 婆娑王代의 소국분쟁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初期記錄의 史料的 價値를 긍적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紀年을 인하 수정해야 하는데, 이 기사는 서기 2세기 초가 아니라, 3周甲이나 기년이 인하된 3세기 말엽의 사실로서 이해되었다. 3세기 말엽에는 狗邪國을 중심으로 하는 交易圈과 斯盧國을 중심으로 하는 交易圈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 斯盧國 중심의 交易圈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에 狗邪國이 개입하였다. 이에 斯盧國은 狗邪國의 交易圈 확대 의도를 저지하고 交易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初期記錄에 보이는 소국정복활동이다. 3세기 말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 전개된 소국정복을 통하여 斯盧國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나가 辰韓을 하나의 勢力圈으로 묶어 성장하게 되었다. 한편 狗邪國도 하나의 세력권으로 통합해 나갔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廣開土王陵碑에 廣開土王이 위기에 빠진 新羅를 구원한 소위 ‘南征’ 기사에서 주 공격대상이었던 任那加羅가 바로 狗邪國을 주축으로 한 낙동강 하류유역의 勢力圈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고대국가의 발전이 4세기 초 樂浪郡의 소멸로 인한 것이 아니라 3세기 후반의 국제적 정세변화와 내부적인 발전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본고의 중심 부분으로서 加耶와 新羅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日本書紀 神功紀의 기록과 廣開土王陵碑의 庚子年條 기록의 분석이었다. 신빙성 문제로 논란이 많은 神功紀의 기록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료 [4] 百濟와 倭의 교섭 개시기록뿐이었으며, 나머지 기록들은 6세기의 사실을 부회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廣開土王陵碑의 庚子年條 기록에 보이는 ‘安羅人戍兵’은 ‘安’자의 용법을 검토해 볼 때 ‘新羅人을 안치시켜 수병케 했다’는 문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대로 ‘安羅의 국경수비병’으로 해석하는 편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4세기 후반 百濟와 倭의 교섭상에 매개가 된 것은 卓淳國이었다. 이는 加耶와 倭의 입장에서 보면 3세기 말 이후 두절된 중국과의 교섭이 百濟를 통해 재개된 것이며, 한편으로 百濟는 교역에 의한 물자확보를 통해 당시 위협하고 있었던 고구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新羅는 소위 남해안교섭체계의 성립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高句麗와 연계하는 한편, 남해안교섭체계의 전개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倭는 加耶의 협조를 얻어 신라를 공격하였고, 고구려도 남부지역에서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세력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新羅 구원이라는 南征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 南征으로 인하여 任那加羅는 쇠퇴하고 加耶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차례
Ⅰ. 머리말
Ⅱ. 4세기 전후 加耶와 新羅의 초기적 상황
Ⅲ. 4세기 후반 百濟의 남해안 진출
Ⅳ. 400년 전후 加耶와 新羅의 갈등
Ⅴ.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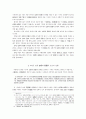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