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속제도에 나타나는 남녀차별
경국대전속에 나타난 상속법
재산상속의 특징
남녀차별의 시작
권벌가의 경제 기반-농지 소유
상속 제도의 변화
경국대전속에 나타난 상속법
재산상속의 특징
남녀차별의 시작
권벌가의 경제 기반-농지 소유
상속 제도의 변화
본문내용
5
532
1,122
919
18
2,059
표 2 권상충 형제의 상속 재산(1621년)
*표시한 것에는 도망자 한 명씩이 포함됨
2) 1682년 분재기
① 남녀 균분 상속 원칙의 해체가 두드러짐
-> 이천기를 제외한 4명의 사위들에게는 농지가 일절 분재되지 않음. 노비도 세 적자들이 21명씩 분재받은 데에 비해 사위들은 13명의 노비를 분재받고 있음.
*이천기에게만 농지가 상속된 것은 그가 대대로 빈궁한 집 출신으로 유우(유우: 방랑하다가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것)의 신분이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
② 별급이라는 형태로 시작한 남자에 대한 우대가 여기에서는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부모의 의사는 적은 가산을 여덟 명의 자식들에게 나눠 물려주면 제사도 지낼 수 없게 되므로 노비와 토지를 세 명의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것이며 사위들도 이에 동의 하였으나 외손자들의 생활이 곤궁한 것은 불쌍하므로 노비만은 사위에게도 분재하기로 했다.\'고 1682년 분재기의 서문에 적혀 있다.
노비
농지(두락)
남자종
여자종
계
논
밭
불명
계
봉사(奉祀)
3
3
6
23
22
4
49
사위 정시영
5
8
13
0
0
0
0
목
10
11
21
109
103.6
0
212.6
사위 이천기
6
7
13
40
46
3
89
국
10
11
21
98
113.6
0
211.6
사위 이명익
6
7
13
0
0
0
0
홍
10
11
21
95.5
92.1
4
191.6
사위 이진우
5
8
13
0
0
0
0
사위 이만엽
7
6
13
0
0
0
0
서자 점
1
0
1
12.5
9
0
21.5
서자 겸
1
0
1
12.5
9
0
21.5
외조카 정질
0
0
0
10
4
0
14
외가 제사
0
0
0
15
0
0
15
계
64
72
136
415.5
399.3
11
825.8
표 3 권목 형제의 상속 재산(1)-1682년 분재기
*5년 뒤에 또다른 분재기가 작성되는데 이 분재기에서는 남녀 균분 상속의 방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으며 수급액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위들도 적자 못지않게 노비와 농지를 분재받고 있음->필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나 종래의 관행과는 큭 다른 분재 방식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비
농지(두락)
남자종
여자종
불명
계
논
밭
불명
계
봉사(奉祀)
5
2
0
7
14
21
0
35
사위 정시영
6
9
0
15
28
32
15
75
목
7
10
0
17
41
53.6
0
94.6
사위 이천기
7
7
1
15
42
44
0
86
국
9
8
0
17
42.5
39.6
0
85.1
사위 이명익
7
8
0
15
44
29.5
0
73.5
홍
7
8
2
17
39
41.6
5
85.6
사위 이진우
7
8
0
15
39
30
0
69
사위 이만엽
5
10
0
15
40
27.5
4
71.5
서자 점
1
0
0
1
12.5
11
0
23.5
서자 겸
1
0
0
1
18
9
0
27
오조카 정질
0
0
0
0
10
2
0
12
질녀 두웅
0
1
0
1
0
0
0
0
계
62
71
3
136
373
340.8
24
737.8
표 4 권목 형제의 상속 재산(2)-1687년 문재기
*표 3과 4두 분재기의 존재는 17세기 후반 안동 지방에서 남녀 균분 상속제의 해체가 시작되던 과도기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18세기 이후의 권벌 가문 분재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다른 양반 가문의 18세기 분재기를 보면 남자 우대, 장남 우대(->남자 간에서는 균등하게 분재하면서 봉사조를 비대화)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재기 작성 : 분재기 작성은 남녀 균분 상속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532
1,122
919
18
2,059
표 2 권상충 형제의 상속 재산(1621년)
*표시한 것에는 도망자 한 명씩이 포함됨
2) 1682년 분재기
① 남녀 균분 상속 원칙의 해체가 두드러짐
-> 이천기를 제외한 4명의 사위들에게는 농지가 일절 분재되지 않음. 노비도 세 적자들이 21명씩 분재받은 데에 비해 사위들은 13명의 노비를 분재받고 있음.
*이천기에게만 농지가 상속된 것은 그가 대대로 빈궁한 집 출신으로 유우(유우: 방랑하다가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것)의 신분이라는 특별한 이유 때문
② 별급이라는 형태로 시작한 남자에 대한 우대가 여기에서는 더욱 명확한 형태로 나타남.
-> \'기본적으로 부모의 의사는 적은 가산을 여덟 명의 자식들에게 나눠 물려주면 제사도 지낼 수 없게 되므로 노비와 토지를 세 명의 아들에게만 물려준다는 것이며 사위들도 이에 동의 하였으나 외손자들의 생활이 곤궁한 것은 불쌍하므로 노비만은 사위에게도 분재하기로 했다.\'고 1682년 분재기의 서문에 적혀 있다.
노비
농지(두락)
남자종
여자종
계
논
밭
불명
계
봉사(奉祀)
3
3
6
23
22
4
49
사위 정시영
5
8
13
0
0
0
0
목
10
11
21
109
103.6
0
212.6
사위 이천기
6
7
13
40
46
3
89
국
10
11
21
98
113.6
0
211.6
사위 이명익
6
7
13
0
0
0
0
홍
10
11
21
95.5
92.1
4
191.6
사위 이진우
5
8
13
0
0
0
0
사위 이만엽
7
6
13
0
0
0
0
서자 점
1
0
1
12.5
9
0
21.5
서자 겸
1
0
1
12.5
9
0
21.5
외조카 정질
0
0
0
10
4
0
14
외가 제사
0
0
0
15
0
0
15
계
64
72
136
415.5
399.3
11
825.8
표 3 권목 형제의 상속 재산(1)-1682년 분재기
*5년 뒤에 또다른 분재기가 작성되는데 이 분재기에서는 남녀 균분 상속의 방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으며 수급액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위들도 적자 못지않게 노비와 농지를 분재받고 있음->필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나 종래의 관행과는 큭 다른 분재 방식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비
농지(두락)
남자종
여자종
불명
계
논
밭
불명
계
봉사(奉祀)
5
2
0
7
14
21
0
35
사위 정시영
6
9
0
15
28
32
15
75
목
7
10
0
17
41
53.6
0
94.6
사위 이천기
7
7
1
15
42
44
0
86
국
9
8
0
17
42.5
39.6
0
85.1
사위 이명익
7
8
0
15
44
29.5
0
73.5
홍
7
8
2
17
39
41.6
5
85.6
사위 이진우
7
8
0
15
39
30
0
69
사위 이만엽
5
10
0
15
40
27.5
4
71.5
서자 점
1
0
0
1
12.5
11
0
23.5
서자 겸
1
0
0
1
18
9
0
27
오조카 정질
0
0
0
0
10
2
0
12
질녀 두웅
0
1
0
1
0
0
0
0
계
62
71
3
136
373
340.8
24
737.8
표 4 권목 형제의 상속 재산(2)-1687년 문재기
*표 3과 4두 분재기의 존재는 17세기 후반 안동 지방에서 남녀 균분 상속제의 해체가 시작되던 과도기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다.
*18세기 이후의 권벌 가문 분재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다른 양반 가문의 18세기 분재기를 보면 남자 우대, 장남 우대(->남자 간에서는 균등하게 분재하면서 봉사조를 비대화)라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분재기 작성 : 분재기 작성은 남녀 균분 상속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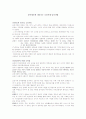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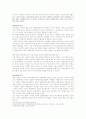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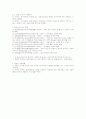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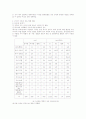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