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5세기 중기국어의 자음 음소체계에 관한 연구
Ⅰ. 緖論
Ⅱ. 本論
1. 門題의 提起
2. ‘ㅿ, ㅸ’ 考
3. ‘ㅇ’ 考
4.‘ㆆ考
5. 硬音考
Ⅲ. 結論
Ⅰ. 緖論
Ⅱ. 本論
1. 門題의 提起
2. ‘ㅿ, ㅸ’ 考
3. ‘ㅇ’ 考
4.‘ㆆ考
5. 硬音考
Ⅲ. 結論
본문내용
淸音化된 것을 代音 표기한 일종의 상징적 글자에 불과하며, 고유어 표기에서의 各字竝書字는「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가 간행된 1465년경까지는‘ㅅ∼’계 合用 書字인‘ㅺ, ㅼ, ㅽ’과 함께 硬音 音素體系자의 쌍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6)‘ㅅ∼’계 合用 書字 중‘ㅾ’은 17세기 말 문헌인「 解新語」에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5세기 中期 國語의 字音 音素體系字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ㅅ\'계 合用 書字는 語源論的으로 볼 때 2음절이었을 蓋然性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15세기 中期國語에서는 硬音의 音素體系로 보아야 한다.
8) ‘ㅂ∼’계 合用 書字가‘ㅳ, ㅄ, ㅶ’과‘ㅄ∼’系 合用 書字‘ㅴ, ㅵ’은 語源論的으로 15세기 중기 이전에는 2음절, 또는 3음절이었던 것이 후에 語頭複子音群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오늘날‘ㅂ∼’系나‘ㅄ∼’系 語頭子音의 낱말들이 統辭的 합성어를 이룰 때, ‘ㅂ’보유어로 남은 것으로 보아, 이들 자음은[pt, ps, pts]와 [pk\', pt\']의 複子音으로 후기 中世 國語 硬音의 子音 音素體系字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9) 위의 語頭複子音들은 硬音化, 有氣音化, ㅂ設落의 세 類型으로 변천·발달하였다.
10) 이와 같은 언어 사실로 보아 15세기 中期國語의 子音 音素體系는 다음과 같이 23體系로 定立됨이 옳다고 본다.
序列(調音點位置)
系列(調音方法)
兩脣音
齒槽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聲門音
破裂音
無氣音
連音
硬音
有氣音
激音
破擦音
無氣音
連音
硬音
有氣音
激音
摩擦音
無聲音
有聲音
硬音
流音
有氣音
鼻音 有氣音
五音
脣音
舌音
齒音
牙音
喉音
6)‘ㅅ∼’계 合用 書字 중‘ㅾ’은 17세기 말 문헌인「 解新語」에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15세기 中期 國語의 字音 音素體系字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ㅅ\'계 合用 書字는 語源論的으로 볼 때 2음절이었을 蓋然性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15세기 中期國語에서는 硬音의 音素體系로 보아야 한다.
8) ‘ㅂ∼’계 合用 書字가‘ㅳ, ㅄ, ㅶ’과‘ㅄ∼’系 合用 書字‘ㅴ, ㅵ’은 語源論的으로 15세기 중기 이전에는 2음절, 또는 3음절이었던 것이 후에 語頭複子音群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오늘날‘ㅂ∼’系나‘ㅄ∼’系 語頭子音의 낱말들이 統辭的 합성어를 이룰 때, ‘ㅂ’보유어로 남은 것으로 보아, 이들 자음은[pt, ps, pts]와 [pk\', pt\']의 複子音으로 후기 中世 國語 硬音의 子音 音素體系字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9) 위의 語頭複子音들은 硬音化, 有氣音化, ㅂ設落의 세 類型으로 변천·발달하였다.
10) 이와 같은 언어 사실로 보아 15세기 中期國語의 子音 音素體系는 다음과 같이 23體系로 定立됨이 옳다고 본다.
序列(調音點位置)
系列(調音方法)
兩脣音
齒槽音
硬口蓋音
軟口蓋音
聲門音
破裂音
無氣音
連音
硬音
有氣音
激音
破擦音
無氣音
連音
硬音
有氣音
激音
摩擦音
無聲音
有聲音
硬音
流音
有氣音
鼻音 有氣音
五音
脣音
舌音
齒音
牙音
喉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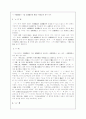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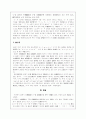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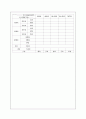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