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승희는 구두다
서울, 1970년대 겨울
김승희的 삶에 대하여
5․18 광주
소월․윤심덕․데미안
공옥진
문단이여, 혁명하라
서울, 1970년대 겨울
김승희的 삶에 대하여
5․18 광주
소월․윤심덕․데미안
공옥진
문단이여, 혁명하라
본문내용
왜들 그리 ‘몸’에 획일적으로 집착하는지 정말 문제라고 역설한다. 몸의 집단주의, 이 거품을 걷어야 한다. 이는 곧 문단의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우린 지금 ‘소비 제국주의’에 너무 함몰하고 있어 큰 문제! 우리 자신이 텍스트가 되어 이미지를 만나야 하리. 누가 이런 말을 한 것도 같다. 그래, 롤랑 바르트.
바르트─인용하고 싶지 않지만─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일종의 시각적 불확실성의 ‘시초’라고 진술한 대목이 떠오른다. 글쓰기를 깨달음이라고도 했던가. 일본 여행에서 왜색 이미지를 독특한 감각으로 그린 지리부도(=안내서) 겸 에세이집 《기호의 제국》(민음사, 1997)은 바르트다운 감각이 절묘히 텍스트화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자신의 사고로 일본을 ‘해체’시켜 철저히 실험한다. 남는 건 앙상한 기호다. 바르트는 확실히 우리 체질과 맞닿는다. 그의 시각 또한 독창적이라서 땡긴다. 그는 왜색을 보면서 자유인으로서 철저히 즐긴다. 1991년에 나온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은 어떤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달콤한 언어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 육감적 분위기와 숱한 기호의 압축미가 돋보인다. 그러고 보면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와 쟈크 라캉, 미셸 푸코 등과 함께 바르트 역시 참 프랑스적(!)인 것 같다. 기껏해봤자 내가 아는 프랑스란 ‘앙시앙 레짐’과 까뮈·싸르트르, 또한 가스통 바슐라르 정도. 무지한 내 나이 스무살 여린 시절이었지.
바르트도 그랬다지. 결핵으로 아플 당시 5년여를 요양하는 중에 싸르트르와 칼 맑스에 취해 있지 않았던가. 다만 나는 맑스에 취약했다. 경직된 사고 또한 싫었다. 나의 이런 다층적 문화 애호주의란 기껏 해야 딜레탕트로서의 표피 감각일 뿐. 하지만 그는 우리의 시적 이미지를 관통하는 대단한 매력을 풍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프랑스적인 사고’(나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저 사유 체계가 나를 가끔 현혹시킨다)가 당분간 우리의 사유 체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는 물론 바로 그 앞에 과학 철학(인식론)적 사유로 철저히 무장한 바슐라르를 친다. 그가 한편으로 촛불을 통해 시적 이미지(→문학적 상상력)를 분석해낸 건 참으로 현란할 지경이다. 곽광수가 지은 《가스통 바슐라르》(민음사, 1995)를 보라. 오히려 해설·비평이 좀 난해하지만, 대상을 잘 대변했다는 생각도 든다. 시인·사상가인 바슐라르의 사유 체계가 프랑스 지식인들의 중심사고가 된 건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한때 30대 쯤에 겁없이 나는 바슐라르의 상상력과 바르트의 사물에의 성적 충동의식을 비교하면 어떨까, 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다. 아서라, 그저 불나비의 굴광성屈光性phototropisme이나 동경하면서 타오르자, 타오르자, 타오르자! 그녀는 관념적이라고 스스로 책망하는, 적어도 내가 만난 김승희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생명이란 반드시 파괴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다. 이때 머리는 투명해지는 법이다. 김창열의 작품 <물방울> 씨리이즈에도 공감하며 우리는 즐거워했다. 비현실적 신비주의는 좀 문제(나의 말)가 되나, 정밀한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는 미세한 ‘먼지 의식’(그녀의 말)에 한껏 젖은 적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시를 쓴다는 건 ‘인습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느냐’다. 그러므로 그녀는 객관성(또는 객관적)으로부터 사유할 줄 안다. 어, ‘객관적’이라고 써버렸네. 사실 나는 요즘 이 용어에 매우 반해 있다.
완전한 객관성─, 이것이 난해하고 두렵다. 해체란 곧 완전한 객관화가 아닌가. 내가 비로소 알게 된 시인 김승희는 너무나도 객관성을 지향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남은 것을 다 폭로하려고 몸짓한다. 승희 씨, 소설보단 시를 더 사랑해주기를. 누가 뭐래도 우리 시인으로서 ‘영적 자부심Spiritual Pride’을 갖자구. 미국 땅에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고풍스러운 감각도 듣기에 좋더군. 나는 헤어지기 위해 주특기인 악수를 그녀에게 정중히 청한다. 그녀의 손가락 합이 나의 손끝에 살짝 잡힌다. 금방 슬쩍 뺀다. 그녀는 8월 중순께 다시 버클리로 간다. 플라톤을 전공한 철학 교수(동덕여대) 남편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그녀는 ‘죽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오래 전에 체험한 외삼촌의 죽음은 한동안 그녀의 내면을 짓눌렀다.) 그녀의 경우, 결혼이란 삶의 색다른 변형이고 도전이었다. 종교는 불교적, 특정 종교는 없고, 무릎 밑에 지금 16세인 중3 딸과 11살(초등학생 4학년) 사내를 데리고 함께 산다.
그리고 부끄러운 뿌리 의식. 미국에 가서야 한국땅을 비로소 그리워하게 되었다. 처녀 시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알았을 때의 싱그러운 충격에 아직도 가슴 설레는 김승희는 우리의 좋은 시인임에 분명하다. 나는 그녀 시의 주조를 이루는 죽음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요구했다. 즉답하면서 교통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그녀의 말. ‘파란 신호등으로 죽음을 볼 것인가, 붉은 신호등으로 죽음을 볼 것인가.’ 아리송한, 우리 모두의 화두다. 나는 이 물음 앞에 ‘LIFE’란 단어를 그녀에게 던진다. 이중에서 L과 I를 제외하면 ‘IF’가 남는데. 삶(인생)이란 온통 ‘if’? 나도 어느 귀한 자리에서 얻어들은 얘기다.
김승희는 앞으로 기인 에세이 <101세의 팡세>를 쓰려고 한다. 33세의 팡세, 그 두 자리를 넘어 세 자리의 팡세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 광기라는 것, 그녀는 ‘문학은 신토불이’임을 특별히 강조한다. 실로 주체가 상실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어로 쓰인 우리 문학이 경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녀는 걱정한다.
문단이여, 혁명하라
시단이여, 혁명하라. 우리 모두(각자) 테러리스트가 되자.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또는 오래 전 <터미네이터>의 슈왈츠제네거처럼, 온몸으로 노래하는 제니스 조플린처럼, 객석에서 바라보는 음音의 파괴자·반항아 베네싸 메이처럼. 조각하는 사랑하는 내 친구 승진이처럼. 그리고 솔직한 여성 김승희처럼─. 불결한 언어와 난무하는 각종 폭력을 향해. 나는 나의 수상한 속 근육질부터 혈혈, 파먹는다.
바르트─인용하고 싶지 않지만─가 ‘텍스트와 이미지’를 일종의 시각적 불확실성의 ‘시초’라고 진술한 대목이 떠오른다. 글쓰기를 깨달음이라고도 했던가. 일본 여행에서 왜색 이미지를 독특한 감각으로 그린 지리부도(=안내서) 겸 에세이집 《기호의 제국》(민음사, 1997)은 바르트다운 감각이 절묘히 텍스트화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자신의 사고로 일본을 ‘해체’시켜 철저히 실험한다. 남는 건 앙상한 기호다. 바르트는 확실히 우리 체질과 맞닿는다. 그의 시각 또한 독창적이라서 땡긴다. 그는 왜색을 보면서 자유인으로서 철저히 즐긴다. 1991년에 나온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은 어떤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달콤한 언어를 대상으로 쓴 글이라 육감적 분위기와 숱한 기호의 압축미가 돋보인다. 그러고 보면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와 쟈크 라캉, 미셸 푸코 등과 함께 바르트 역시 참 프랑스적(!)인 것 같다. 기껏해봤자 내가 아는 프랑스란 ‘앙시앙 레짐’과 까뮈·싸르트르, 또한 가스통 바슐라르 정도. 무지한 내 나이 스무살 여린 시절이었지.
바르트도 그랬다지. 결핵으로 아플 당시 5년여를 요양하는 중에 싸르트르와 칼 맑스에 취해 있지 않았던가. 다만 나는 맑스에 취약했다. 경직된 사고 또한 싫었다. 나의 이런 다층적 문화 애호주의란 기껏 해야 딜레탕트로서의 표피 감각일 뿐. 하지만 그는 우리의 시적 이미지를 관통하는 대단한 매력을 풍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프랑스적인 사고’(나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저 사유 체계가 나를 가끔 현혹시킨다)가 당분간 우리의 사유 체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나는 물론 바로 그 앞에 과학 철학(인식론)적 사유로 철저히 무장한 바슐라르를 친다. 그가 한편으로 촛불을 통해 시적 이미지(→문학적 상상력)를 분석해낸 건 참으로 현란할 지경이다. 곽광수가 지은 《가스통 바슐라르》(민음사, 1995)를 보라. 오히려 해설·비평이 좀 난해하지만, 대상을 잘 대변했다는 생각도 든다. 시인·사상가인 바슐라르의 사유 체계가 프랑스 지식인들의 중심사고가 된 건 부인할 수 없으리라. 한때 30대 쯤에 겁없이 나는 바슐라르의 상상력과 바르트의 사물에의 성적 충동의식을 비교하면 어떨까, 라고 상상한 적이 있었다. 아서라, 그저 불나비의 굴광성屈光性phototropisme이나 동경하면서 타오르자, 타오르자, 타오르자! 그녀는 관념적이라고 스스로 책망하는, 적어도 내가 만난 김승희는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생명이란 반드시 파괴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일찍부터 알았다. 이때 머리는 투명해지는 법이다. 김창열의 작품 <물방울> 씨리이즈에도 공감하며 우리는 즐거워했다. 비현실적 신비주의는 좀 문제(나의 말)가 되나, 정밀한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는 미세한 ‘먼지 의식’(그녀의 말)에 한껏 젖은 적이 있었다. 따지고 보면 시를 쓴다는 건 ‘인습의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느냐’다. 그러므로 그녀는 객관성(또는 객관적)으로부터 사유할 줄 안다. 어, ‘객관적’이라고 써버렸네. 사실 나는 요즘 이 용어에 매우 반해 있다.
완전한 객관성─, 이것이 난해하고 두렵다. 해체란 곧 완전한 객관화가 아닌가. 내가 비로소 알게 된 시인 김승희는 너무나도 객관성을 지향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남은 것을 다 폭로하려고 몸짓한다. 승희 씨, 소설보단 시를 더 사랑해주기를. 누가 뭐래도 우리 시인으로서 ‘영적 자부심Spiritual Pride’을 갖자구. 미국 땅에서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고풍스러운 감각도 듣기에 좋더군. 나는 헤어지기 위해 주특기인 악수를 그녀에게 정중히 청한다. 그녀의 손가락 합이 나의 손끝에 살짝 잡힌다. 금방 슬쩍 뺀다. 그녀는 8월 중순께 다시 버클리로 간다. 플라톤을 전공한 철학 교수(동덕여대) 남편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그녀는 ‘죽음’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오래 전에 체험한 외삼촌의 죽음은 한동안 그녀의 내면을 짓눌렀다.) 그녀의 경우, 결혼이란 삶의 색다른 변형이고 도전이었다. 종교는 불교적, 특정 종교는 없고, 무릎 밑에 지금 16세인 중3 딸과 11살(초등학생 4학년) 사내를 데리고 함께 산다.
그리고 부끄러운 뿌리 의식. 미국에 가서야 한국땅을 비로소 그리워하게 되었다. 처녀 시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알았을 때의 싱그러운 충격에 아직도 가슴 설레는 김승희는 우리의 좋은 시인임에 분명하다. 나는 그녀 시의 주조를 이루는 죽음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요구했다. 즉답하면서 교통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그녀의 말. ‘파란 신호등으로 죽음을 볼 것인가, 붉은 신호등으로 죽음을 볼 것인가.’ 아리송한, 우리 모두의 화두다. 나는 이 물음 앞에 ‘LIFE’란 단어를 그녀에게 던진다. 이중에서 L과 I를 제외하면 ‘IF’가 남는데. 삶(인생)이란 온통 ‘if’? 나도 어느 귀한 자리에서 얻어들은 얘기다.
김승희는 앞으로 기인 에세이 <101세의 팡세>를 쓰려고 한다. 33세의 팡세, 그 두 자리를 넘어 세 자리의 팡세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은 너무 정상적인 것이 광기라는 것, 그녀는 ‘문학은 신토불이’임을 특별히 강조한다. 실로 주체가 상실된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어로 쓰인 우리 문학이 경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그녀는 걱정한다.
문단이여, 혁명하라
시단이여, 혁명하라. 우리 모두(각자) 테러리스트가 되자. <다이하드>의 브루스 윌리스, 또는 오래 전 <터미네이터>의 슈왈츠제네거처럼, 온몸으로 노래하는 제니스 조플린처럼, 객석에서 바라보는 음音의 파괴자·반항아 베네싸 메이처럼. 조각하는 사랑하는 내 친구 승진이처럼. 그리고 솔직한 여성 김승희처럼─. 불결한 언어와 난무하는 각종 폭력을 향해. 나는 나의 수상한 속 근육질부터 혈혈, 파먹는다.
추천자료
 문명의 충돌을읽고 ... 문명의충돌
문명의 충돌을읽고 ... 문명의충돌 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감상문 (쉰들러 리스트의 배경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곁들여서 작성)
쉰들러 리스트에 대한 감상문 (쉰들러 리스트의 배경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곁들여서 작성) [인문과학] 남북관계
[인문과학] 남북관계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 진출
현대자동차의 중국시장 진출 바울은 왜 바나바와 다툼을 했을까?
바울은 왜 바나바와 다툼을 했을까? 한국 무역의 현주소
한국 무역의 현주소 유럽중심주의의 허와 실
유럽중심주의의 허와 실 미술작가 천경자
미술작가 천경자 현대자동차의 중국진출 마케팅 성공전략
현대자동차의 중국진출 마케팅 성공전략 한국 정치 현황과 실태를 통한 현대 정치의 발전 방향 (A Study of Future`s Progressive Pol...
한국 정치 현황과 실태를 통한 현대 정치의 발전 방향 (A Study of Future`s Progressive Pol... 한중고령화와 그 패러다임 변화 (한국, 중국)
한중고령화와 그 패러다임 변화 (한국, 중국) 최승희에 대한 연구
최승희에 대한 연구 TV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 (미국 텔레비전 산업)
TV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통 (미국 텔레비전 산업)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근대 초 비서구 문명권의 발전과 유럽 팽창의 ‘상대화’ - 군사혁명...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근대 초 비서구 문명권의 발전과 유럽 팽창의 ‘상대화’ - 군사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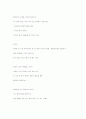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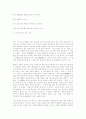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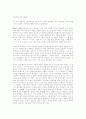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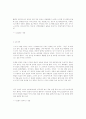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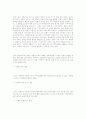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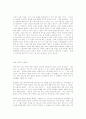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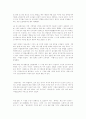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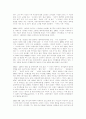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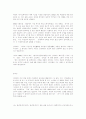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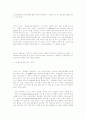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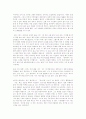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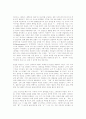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