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본문내용
, 신주(信州)의 강기주(康起珠) 등 유력한 호족들이 그들의 딸을 태조에게 바쳐 세력보전을 꾀하였는데, 특히 서경의 김행파는 두 딸을 태조에게, 청주의 김긍률(金兢律)은 두 딸을 혜종(2대)과 정종(3대)에게 바쳐 중복된 외척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태조는 또한 지방호족을 회유하여 그들에게 중앙관직의 위계(位階)와 똑같은 명칭의 향직위(鄕職位)를 주고, 중앙정부를 축소한 듯한 조직을 갖게 하여 지방자치를 맡게 하는 한편, 기인(其人)이라 하여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선상(選上)케 하여 그 세력을 견제하였다. 고려시대의 호족 세력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성종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갔다.
황제
(皇帝)
제국(帝國)의 세습군주의 존호(尊號). 왕이 본래는 부족장적(部族長的) 성격을 띠며 근대에 와서도 한 민족국가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 황제는 여러 이민족(異民族)을 포괄하는 보편적 국가의 수장(首長)을 의미한다. 유럽에서 황제의 개념은 고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 원수(元首)의 칭호로 사용된 임페라토르(imperator), 카이사르(caesar)라는 어원이 나타내듯이, 고대 로마제국의 원수정치(元首政治)와의 관련에서 생겼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大移動)에 이어 중세사회의 형성과 함께 카롤링거왕조, 신성(神聖) 로마제국이라는 형태로 서방에서의 로마제국의 부흥이 실현되고 있을 때, 황제는 교회의 종교적 수장인 로마 교황과 대립한 상태에서 속권(俗權)의 최고 담당자를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453년 비잔틴제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멸망될 때까지, 동방에서는 고대 로마 황제의 전통이 직접 존속되었으나 서방의 가톨릭 세계에서는 황제가 다른 모든 군주권력보다 차원이 높은, 보편적 권위로서 교회에 대해서도 보호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과의 사이에 유명한 성직서임권투쟁(聖職敍任權鬪爭)이 야기되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발전한 신권적(神權的) 군주의 세계지배의 이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서 헬레니즘으로 이어져 구약성서의 제국사상(帝國思想)과 함께 중세에 영향을 끼쳤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황제는 점차 국민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고대 로마의 전통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러시아의 차르, 프랑스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 독일 황제 등의 칭호는 빅토리아 여왕 이래 인도에 대한 영국왕의 제호(帝號)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요구를 위해 자주 이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의 천자(天子)의 존호(尊號)로서 사용되었는데,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로부터 시작된다. 시황제는 BC 221년, 그때까지 전국 7웅(戰國七雄)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던 중국 전토를 통일하여 종래의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郡縣制)라는, 중국 전토를 하나의 정치단위로서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창시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統一帝國)을 건설하였다. 그는 승상(丞相)인 왕관(王?) 등에게 명하여 새 제국 통치에 어울리는 자신의 존호를 짓도록 하였다. 고대에 천황˙지황(地皇)˙태황(泰皇)의 3황(皇)이 있어 그 중에서 태황이 가장 귀하므로 그것을 존호로 해야 한다는 왕관의 주청을 물리치고 황제를 존호로 쓰기로 하였다. 이 존호에는 그 공(功)과 덕(德)이 고대의 3황 5제(三皇五帝)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시황제가 황제를 칭하기 이전 은대(殷代)˙주대(周代)에는 제후(諸侯)의 위에 있어 중국 전토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명호(名號)는 왕 또는 천자라고 하였다. 제(帝)는 또한 상제(上帝)라고도 하여 재천(在天)의 최고지상신(最高至上神)의 이름이었으며, 황(皇)은 대개 조상이나 상제 등의 미칭(美稱)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제(帝)와 황(皇)을 합쳐 황제라는 지상 최고 주권자의 존호가 성립되었다. 시황제에 와서 황제라는 존호가 성립된 데에는 역사적인 내력이 있다. 재묘(在廟)의 왕을 제(帝)라 부른 예는 이미 은말(殷末)에 있었다. 왕에 황의 미칭을 붙여 부른 예도 주대(周代)부터 있었다. 또한, 황제라는 명호에 관해서도 서주(西周) 말기 선왕(宣王) 무렵의 호칭으로서 황천(皇天)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 황제라는 말이 보이며, 이 무렵의 것으로 여겨지는 《상서(尙書)》 <여형편(呂刑篇)>에는 고대 5제(帝)의 한 사람인 제곡(帝?)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황제라는 말을 쓴 예가 있다. 진(秦)나라 이전의 문헌에서도 황제˙제요(帝堯)˙제순(帝舜) 등 전설상의 옛 제왕을 제(帝)라 부른 것은 이미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전국(戰國) 중기인 BC 288년에는 당시 위세를 떨치던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과 제(齊)나라 민왕(?王)이 서로 약속하고 한동안 서제(西帝)와 동제(東帝)라고 부른 일도 있다. 한편으로는 인왕(人王)에 대하여 제라는 말을 점차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시대에 들어와 제후(諸侯)가 모두 왕을 칭하게 되자, 이 제후를 통일한 절대권력자에게는 다른 명호가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서 생긴 것이 황제라는 존호이다. 시황제는 황제라는 존호를 정하는 동시에, 짐(朕)이라 자칭(自稱)하고 신민(臣民)은 폐하(陛下)라 존칭하였으며, 명(命)을 제(制)라 하고 영(令)을 조(詔)라 하는 등의 황제용어를 정했으며, 거마(車馬)˙의복˙궁전˙인새(印璽)에도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지위에 권위를 부여하고, 시법(諡法)을 폐하여 자신을 시황제라 하는 등 만세(萬世)에 걸쳐 그 지위를 전하려고 하였다. 진(秦)나라는 3세(世)로 멸망하였으나, 그 후 한(漢)의 고조(高祖)가 BC 202년 제후와 장상(將相)의 옹립으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 그 후로부터 역대 왕조의 천자는 황제를 정식존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 황제의 권력에는 시대에 따라 성쇠(盛衰)가 있었고, 또한 그 권력이 귀족이나 호족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한대(漢代)와 거의 같은 형태의 황제는 당대(唐代)에까지 존속하였다. 당말(唐末)˙오대(五代)의 혼란을 거쳐 송제국(宋帝國)이 성립되자, 송(宋)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을 기반으로 한 절대군주제를 채택하여, 황제라는 이름은 같았으나 새로운 정치형태가 탄생하였다.
황제
(皇帝)
제국(帝國)의 세습군주의 존호(尊號). 왕이 본래는 부족장적(部族長的) 성격을 띠며 근대에 와서도 한 민족국가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대해, 황제는 여러 이민족(異民族)을 포괄하는 보편적 국가의 수장(首長)을 의미한다. 유럽에서 황제의 개념은 고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 원수(元首)의 칭호로 사용된 임페라토르(imperator), 카이사르(caesar)라는 어원이 나타내듯이, 고대 로마제국의 원수정치(元首政治)와의 관련에서 생겼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大移動)에 이어 중세사회의 형성과 함께 카롤링거왕조, 신성(神聖) 로마제국이라는 형태로 서방에서의 로마제국의 부흥이 실현되고 있을 때, 황제는 교회의 종교적 수장인 로마 교황과 대립한 상태에서 속권(俗權)의 최고 담당자를 가리키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453년 비잔틴제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멸망될 때까지, 동방에서는 고대 로마 황제의 전통이 직접 존속되었으나 서방의 가톨릭 세계에서는 황제가 다른 모든 군주권력보다 차원이 높은, 보편적 권위로서 교회에 대해서도 보호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과의 사이에 유명한 성직서임권투쟁(聖職敍任權鬪爭)이 야기되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발전한 신권적(神權的) 군주의 세계지배의 이념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에서 헬레니즘으로 이어져 구약성서의 제국사상(帝國思想)과 함께 중세에 영향을 끼쳤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황제는 점차 국민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고대 로마의 전통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러시아의 차르, 프랑스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 독일 황제 등의 칭호는 빅토리아 여왕 이래 인도에 대한 영국왕의 제호(帝號)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적 요구를 위해 자주 이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역대 왕조의 천자(天子)의 존호(尊號)로서 사용되었는데,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로부터 시작된다. 시황제는 BC 221년, 그때까지 전국 7웅(戰國七雄)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던 중국 전토를 통일하여 종래의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郡縣制)라는, 중국 전토를 하나의 정치단위로서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창시함으로써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統一帝國)을 건설하였다. 그는 승상(丞相)인 왕관(王?) 등에게 명하여 새 제국 통치에 어울리는 자신의 존호를 짓도록 하였다. 고대에 천황˙지황(地皇)˙태황(泰皇)의 3황(皇)이 있어 그 중에서 태황이 가장 귀하므로 그것을 존호로 해야 한다는 왕관의 주청을 물리치고 황제를 존호로 쓰기로 하였다. 이 존호에는 그 공(功)과 덕(德)이 고대의 3황 5제(三皇五帝)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시황제가 황제를 칭하기 이전 은대(殷代)˙주대(周代)에는 제후(諸侯)의 위에 있어 중국 전토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명호(名號)는 왕 또는 천자라고 하였다. 제(帝)는 또한 상제(上帝)라고도 하여 재천(在天)의 최고지상신(最高至上神)의 이름이었으며, 황(皇)은 대개 조상이나 상제 등의 미칭(美稱)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제(帝)와 황(皇)을 합쳐 황제라는 지상 최고 주권자의 존호가 성립되었다. 시황제에 와서 황제라는 존호가 성립된 데에는 역사적인 내력이 있다. 재묘(在廟)의 왕을 제(帝)라 부른 예는 이미 은말(殷末)에 있었다. 왕에 황의 미칭을 붙여 부른 예도 주대(周代)부터 있었다. 또한, 황제라는 명호에 관해서도 서주(西周) 말기 선왕(宣王) 무렵의 호칭으로서 황천(皇天)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 황제라는 말이 보이며, 이 무렵의 것으로 여겨지는 《상서(尙書)》 <여형편(呂刑篇)>에는 고대 5제(帝)의 한 사람인 제곡(帝?) 등을 의미하는 말로서 황제라는 말을 쓴 예가 있다. 진(秦)나라 이전의 문헌에서도 황제˙제요(帝堯)˙제순(帝舜) 등 전설상의 옛 제왕을 제(帝)라 부른 것은 이미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전국(戰國) 중기인 BC 288년에는 당시 위세를 떨치던 진(秦)나라 소양왕(昭襄王)과 제(齊)나라 민왕(?王)이 서로 약속하고 한동안 서제(西帝)와 동제(東帝)라고 부른 일도 있다. 한편으로는 인왕(人王)에 대하여 제라는 말을 점차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전국시대에 들어와 제후(諸侯)가 모두 왕을 칭하게 되자, 이 제후를 통일한 절대권력자에게는 다른 명호가 필요하게 되어, 여기에서 생긴 것이 황제라는 존호이다. 시황제는 황제라는 존호를 정하는 동시에, 짐(朕)이라 자칭(自稱)하고 신민(臣民)은 폐하(陛下)라 존칭하였으며, 명(命)을 제(制)라 하고 영(令)을 조(詔)라 하는 등의 황제용어를 정했으며, 거마(車馬)˙의복˙궁전˙인새(印璽)에도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지위에 권위를 부여하고, 시법(諡法)을 폐하여 자신을 시황제라 하는 등 만세(萬世)에 걸쳐 그 지위를 전하려고 하였다. 진(秦)나라는 3세(世)로 멸망하였으나, 그 후 한(漢)의 고조(高祖)가 BC 202년 제후와 장상(將相)의 옹립으로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 그 후로부터 역대 왕조의 천자는 황제를 정식존호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 황제의 권력에는 시대에 따라 성쇠(盛衰)가 있었고, 또한 그 권력이 귀족이나 호족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한대(漢代)와 거의 같은 형태의 황제는 당대(唐代)에까지 존속하였다. 당말(唐末)˙오대(五代)의 혼란을 거쳐 송제국(宋帝國)이 성립되자, 송(宋)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을 기반으로 한 절대군주제를 채택하여, 황제라는 이름은 같았으나 새로운 정치형태가 탄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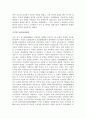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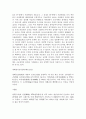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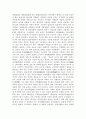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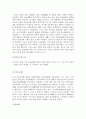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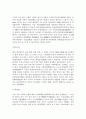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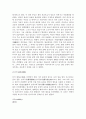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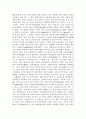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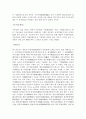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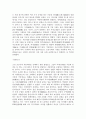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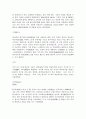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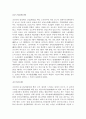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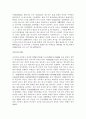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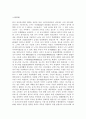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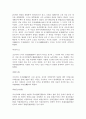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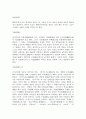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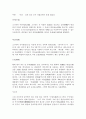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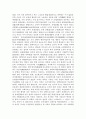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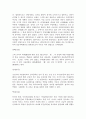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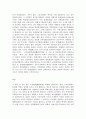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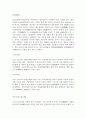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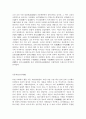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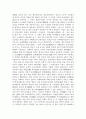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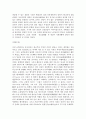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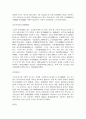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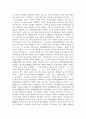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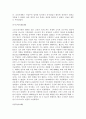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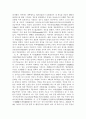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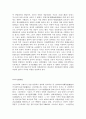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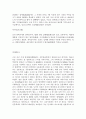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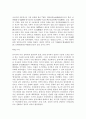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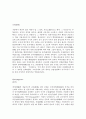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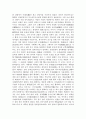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