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임진왜란의 배경 경과 결과
2.이순신과 임진왜란
1)세계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건조
2)해전의 대승첩(부산해전)
3)한산도 생활
4)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의 몸
5)명랑해전의 대승리
6)충무공의 최후(노량해전)
3. 아직도 그치지 않는 이순신 죽음의 논란
4. 아직 끝나지 않은 임진왜란
2.이순신과 임진왜란
1)세계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의 건조
2)해전의 대승첩(부산해전)
3)한산도 생활
4)억울한 누명을 쓴 죄인의 몸
5)명랑해전의 대승리
6)충무공의 최후(노량해전)
3. 아직도 그치지 않는 이순신 죽음의 논란
4. 아직 끝나지 않은 임진왜란
본문내용
이미 찾았고 큰 원수마저 갚았거늘 무엇 때문에 오히려 평소의 맹세를 실천해야 하셨던고?라고 썼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아끼던 부하인 유형은 행장에서 평소에 속마음을 토로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대장이 전공을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대개는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이 물러나는 그날 죽음으로써 유감될 수 있는 일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 물고 뜯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순신 자살론을 본격 제기한 것은 숙종때 사람 이민서가 쓴 김덕령 장군 전기다. 이 글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 장군이 반역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이순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김덕령)장군이 죽고부터 여러 장수들이 모두 저마다 스스로 제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것이니 저 (의병장) 곽재우는 마침내 군사를 해산하고 산 속에 숨어 화를 면했고 이순신도 바야흐로 전쟁중에 갑옷을 벗고 앞장서 나섬으로써(免先登) 스스로 탄환을 맞아 죽었으며….
그러나 진린의 제문은 글의 성격상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용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라는 구절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민서의 글도 이순신이 과연 당시 갑옷을 입지 않았는지, 조선 해군 장수가 전투시 갑옷을 입는 것이 관행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거가 박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장 교수는 사약을 받아도 궁궐쪽을 향해 배례를 한 후 죽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후원자인 유성룡의 파면과 고문받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순국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 박사는 자살론과 달리 은둔설을 주장한다.이분의 행장에 따르면 이순신은 1598년 11월 19일 노량 바다에서 죽었고 고향인 충남 아산으로 옮겨져 다음해 2월 11일 죽은지 80일만에 장례를 치른다. 그후 15년이 지난 1614년에 600㎙ 떨어진 곳에 이장한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은 나흘후인 11월 23일 선조에게 보고되는데 이 때는 전쟁이 끝난 후이며 장례비도 국가에서 대주었으므로 장례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80일이나 지나 치른 것도 이상하고 15년 후에 이장한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때 비로소 이순신이 죽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다시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분은 어쩌면 자신의 기록을 통해 이순신이 실제로는 일흔살까지 살았음이 밝혀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는 순국설이 정설이지만 국가전란속에서도 그치지 않았던 당쟁속에서의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4. 아직 끝나지 않은 임진왜란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한일합방이 발생하기 20여년 전부터 일본인들은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일합방을 제2의 임진왜란으로 성격규정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1892년 일본의 육군 보병대위 柴山尙則은 文祿征韓水師始末 朝鮮李舜臣傳을, 이듬해에는 松本愛重이 豊太閣征韓秘錄을 야심차게 펴냈다. 그들은 임진왜란의 실패 원인을 조선 수군에 돌렸고 수군 지휘자인 이순신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진왜란의 쓰라린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국을 삼키려고 지식을 축적해갔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吉)을 통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보다 큰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795년(정조)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됐고, 1967년(박정희 대통령) 아산 현충사 성역화사업이 이뤄졌다. 물론 1908년 단재 신채호나, 31년 춘원 이광수는 반일사상이나 민족의 우월성 고취를 목적으로 이순신을 연구했다가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고, 70년대 노산 이은상이나, 80년대에 구해 조성도의 연구도 계승되지 않고 그들의 운명과 함께 거의 사라져버렸다.
반면 일본은 줄기차게 이순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방향은 계속 이순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일본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일본 국민의 우수성을 과시함으로써 세계제패의 꿈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일본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물러 전쟁을 지휘했던 나고야성(名古屋城)을 복원했다. 일본인들의 이순신 연구방향을 통해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한 성격을 교정해야 할 듯싶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개인적으로 무모하게 조선을 정벌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가 사용한 조선정벌이라는 용어는 국가 차원의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이순신 연구목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본의 최고 작가 小田實(1932~)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民岩太閤記에서 대체로 침략이란 방위나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다. … 그런데 한번 왜곡은 영원한 왜곡으로 이어진다.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출병이고, 분로쿠(文祿)의 역(役)이었지 침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정신구조는 더 먼 과거에도 마찬가지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임진왜란이순신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서는 매년 간행되고 있다. 石原道博 內藤鐫輔 岡野昌子 吉岡新一 高橋盛孝 德問康快 矢澤康祐 嶋岡晨 佐藤和夫 藤居信雄 貫井正之 片野次雄 北島卍次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학회―朝鮮學報 朝鮮史硏究會 史學雜誌 學硏 등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순신 전문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 전문가가 더 많듯이….
일본인들은 10년 전부터 조선을 정탐하여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임진왜란 이후, 줄곧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내세웠다. 한일합방이 있기 20년 전부터, 태평양전쟁이 있기 30년 전에도 대대적으로, 최근 3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제3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순신 자살론을 본격 제기한 것은 숙종때 사람 이민서가 쓴 김덕령 장군 전기다. 이 글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 장군이 반역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당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이순신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김덕령)장군이 죽고부터 여러 장수들이 모두 저마다 스스로 제 몸을 보전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것이니 저 (의병장) 곽재우는 마침내 군사를 해산하고 산 속에 숨어 화를 면했고 이순신도 바야흐로 전쟁중에 갑옷을 벗고 앞장서 나섬으로써(免先登) 스스로 탄환을 맞아 죽었으며….
그러나 진린의 제문은 글의 성격상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과 용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오직 한 번 죽는 것만 남았노라라는 구절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민서의 글도 이순신이 과연 당시 갑옷을 입지 않았는지, 조선 해군 장수가 전투시 갑옷을 입는 것이 관행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거가 박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장 교수는 사약을 받아도 궁궐쪽을 향해 배례를 한 후 죽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후원자인 유성룡의 파면과 고문받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순국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 박사는 자살론과 달리 은둔설을 주장한다.이분의 행장에 따르면 이순신은 1598년 11월 19일 노량 바다에서 죽었고 고향인 충남 아산으로 옮겨져 다음해 2월 11일 죽은지 80일만에 장례를 치른다. 그후 15년이 지난 1614년에 600㎙ 떨어진 곳에 이장한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은 나흘후인 11월 23일 선조에게 보고되는데 이 때는 전쟁이 끝난 후이며 장례비도 국가에서 대주었으므로 장례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80일이나 지나 치른 것도 이상하고 15년 후에 이장한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때 비로소 이순신이 죽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다시 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분은 어쩌면 자신의 기록을 통해 이순신이 실제로는 일흔살까지 살았음이 밝혀지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아직까지는 순국설이 정설이지만 국가전란속에서도 그치지 않았던 당쟁속에서의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4. 아직 끝나지 않은 임진왜란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한일합방이 발생하기 20여년 전부터 일본인들은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일합방을 제2의 임진왜란으로 성격규정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1892년 일본의 육군 보병대위 柴山尙則은 文祿征韓水師始末 朝鮮李舜臣傳을, 이듬해에는 松本愛重이 豊太閣征韓秘錄을 야심차게 펴냈다. 그들은 임진왜란의 실패 원인을 조선 수군에 돌렸고 수군 지휘자인 이순신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진왜란의 쓰라린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한국을 삼키려고 지식을 축적해갔던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吉)을 통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보다 큰 꿈을 실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795년(정조)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됐고, 1967년(박정희 대통령) 아산 현충사 성역화사업이 이뤄졌다. 물론 1908년 단재 신채호나, 31년 춘원 이광수는 반일사상이나 민족의 우월성 고취를 목적으로 이순신을 연구했다가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고, 70년대 노산 이은상이나, 80년대에 구해 조성도의 연구도 계승되지 않고 그들의 운명과 함께 거의 사라져버렸다.
반면 일본은 줄기차게 이순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방향은 계속 이순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일본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일본 국민의 우수성을 과시함으로써 세계제패의 꿈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일본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물러 전쟁을 지휘했던 나고야성(名古屋城)을 복원했다. 일본인들의 이순신 연구방향을 통해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한 성격을 교정해야 할 듯싶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개인적으로 무모하게 조선을 정벌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가 사용한 조선정벌이라는 용어는 국가 차원의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이순신 연구목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본의 최고 작가 小田實(1932~)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民岩太閤記에서 대체로 침략이란 방위나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다. … 그런데 한번 왜곡은 영원한 왜곡으로 이어진다.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출병이고, 분로쿠(文祿)의 역(役)이었지 침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정신구조는 더 먼 과거에도 마찬가지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임진왜란이순신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서는 매년 간행되고 있다. 石原道博 內藤鐫輔 岡野昌子 吉岡新一 高橋盛孝 德問康快 矢澤康祐 嶋岡晨 佐藤和夫 藤居信雄 貫井正之 片野次雄 北島卍次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나, 학회―朝鮮學報 朝鮮史硏究會 史學雜誌 學硏 등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이순신 전문가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 전문가가 더 많듯이….
일본인들은 10년 전부터 조선을 정탐하여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임진왜란 이후, 줄곧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내세웠다. 한일합방이 있기 20년 전부터, 태평양전쟁이 있기 30년 전에도 대대적으로, 최근 30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3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제3의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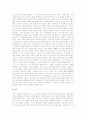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