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상의 개념
2. 불상의 기원
3. 불상의 유형
4. 불상의 형식
2. 불상의 기원
3. 불상의 유형
4. 불상의 형식
본문내용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州)의 주도(主都) 보팔의 북동 약 35km 지점에 있는 불교유적
등의 부조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약기인(藥器印)
병을 없애준다는 의미로 손에 약사발을 들고 있다.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
선정인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아미타불의 수인. 묘관찰지인(妙觀察智印)이라고도 한다.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에 오른손을 포개어 배꼽 부근에 놓고 각각 둘째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 끝이 엄지손가락에 닿게 한 모양이다.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중생들은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설법해야만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9품에 따라 아미타불의 수인도 각각 다르다.
상생인(上生印)은 아미타정인과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생인(中生印)은 두 손을 가슴 앞에까지 올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자세이고, 하생인(下生印)은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위에까지 올리고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만 다를 뿐, 손가락 모양은 상, 중, 하생인이 똑같이 되어있다. 다만 엄지와 맞대고 있는 손가락에 따라 상(上), 중(中), 하품(下品)으로 구분된다. 즉,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서로 맞대고 있을 때에는 상품이고, 엄지가 셋째 손가락과 맞대고 있을 때에는 중품, 그리고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 닿아 있을 때에는 하품이 되는 것이다. 이중에서 상품상생 인은 좌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입상에서는 상품하생 인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와는 반대로 손 모양으로 똑같지만 서로 맞대고 있는 손가락에 따라 상, 중, 하생 인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하용하고 있다.
·천지인(天地印)
한 손은 위로 하고 다른 한 손은 아래로 향한 모습으로 주로 탄생불이 취하는 수인. 즉, 부처가 태어나자 마자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쳤던 데에서 유래한 손 모양이다.
⑫지물
불상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건으로 계인(契印)이라고도 한다. 불, 보살의 본원(本願)과 성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주(寶珠):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구슬.
·불자(拂子): 마음의 티끌이나 번뇌를 털어 내는 데에 사용하는 불구(佛具).
·금강저(金剛杵): 창과 같은 형태의 무기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
·정병(淨甁): 깨끗한 물이나 감로수(甘露水)를 담는 병.
·경책(警策): 좌선할 때 졸음이나 잡념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넓적한 막대기.
·염주(念珠): 염불하는 수를 세는데 사용하는 불구.
·석장(錫杖): 둥근 고리가 달린 지팡이.
⑬자세
불상은 자세에 따라 입상, 좌상, 와상(臥像)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좌상은 결가부좌, 반가부좌, 유희좌, 윤왕좌, 의좌, 교각좌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결가부좌(結跏趺坐)
부처가 좌선할 때 취하는 편안한 자세. 금강좌(金剛坐), 선정좌(禪定坐), 여래좌(如來坐)라고도 한다. 여래가 주로 취하는 자세로 길상좌(吉祥坐)와 항마좌(降摩坐)의 두 형식이 있는데 전자는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좌선할 때 취한 자세로서 그 기원이 좀 더 오래된 srjt이다.
길상좌는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은 다음 오른발을 밖에서 왼쪽 다리 위에 얹고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은 것이다.
·반가부좌(半跏趺坐)
보살상이 많이 취하는 자세. 반가좌(半跏坐) 또는 보살좌(普薩坐)라고도 한다. 결가부좌에서 한쪽의 다리를 푼 자세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으로 결가부좌한 위쪽의 다리를 젊적다리 밑으로 넣고 오른쪽 또는 왼쪽의 한 발만을 다리 위에 얹은 것이다.
·유희좌(遊戱坐)
한쪽다리는 결가부좌하여 대좌 위에 얹고 다른 다리는 아래로 늘어뜨린 자세. 다리의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오른쪽 다리를 내린 것은 우서상(右舒相)이라고 하는 반면에 왼쪽 다리를 내린 경우는 좌서상(左舒相)이라고 한다.
·윤왕좌(輪王坐)
한쪽 다리는 결가부좌하고 다른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세.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좌법으로 왼손은 왼쪽 다리 뒤로 바닥을 짚고 기대어 있는데 반하여 오른손은 무릎 위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불상의 상체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좌(倚坐)
일반적으로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의자나 대좌에 걸터앉아 있는 자세. 이 명칭은 오래된 예가 없어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교각좌(交脚坐)
의좌(倚坐)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양 다리를 교차시킨 자세. 인도에서는 천인(天人)과 속인(俗人)이 앉는 방법으로 그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간다라 보살상에 그 예가 많이 남아있다.
·열반상(涅槃像)
부처가 열반할 때의 모습으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뻗고 옆으로 누운 자세의 불상. 와상(臥像)이라고도 한다. 이 자세는 석가모니불만이 취할 수 있다.
⑭대좌(臺座)
·연화좌(蓮花座):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연꽃모양의 대좌.
·사자좌(獅子座): 여래상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대게 대좌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부처의 위엄과 위세를 뜻한다.
·상현좌(裳懸座):결가부좌한 불상이 입은 옷자락이 내려와 대좌를 덮고 있는 형식.
·암좌(岩座): 바위 형태를 표현한 대좌로 명왕
) 명왕 : 어둠을 깨뜨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밧줄과 칼을 들고 분노의 상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 불상 가운데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에 많이 사용.
·운좌(雲座): 구름의 형태를 띈다.
·조수좌(鳥獸座): 동물을 대좌로 사용한 형식으로 인도에서 유래된 것.
·생령좌(生靈座): 모든 생물을 대좌로 한 형식. 주로 입상에 많이 나타남.
참고 문헌
<불상의 탄생-다카다 오사무>
<불상-중앙일보사>
<한국의 불상-진홍섭>
<한국불교미술사-진홍섭>
<한국불교미술사-문명대>
참고사이트
등의 부조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약기인(藥器印)
병을 없애준다는 의미로 손에 약사발을 들고 있다.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
선정인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아미타불의 수인. 묘관찰지인(妙觀察智印)이라고도 한다. 손바닥을 위로 한 왼손에 오른손을 포개어 배꼽 부근에 놓고 각각 둘째 손가락을 구부려서 그 끝이 엄지손가락에 닿게 한 모양이다.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중생들은 성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 중, 하 3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9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설법해야만 구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9품에 따라 아미타불의 수인도 각각 다르다.
상생인(上生印)은 아미타정인과 같은 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생인(中生印)은 두 손을 가슴 앞에까지 올려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한 자세이고, 하생인(下生印)은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위에까지 올리고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만 다를 뿐, 손가락 모양은 상, 중, 하생인이 똑같이 되어있다. 다만 엄지와 맞대고 있는 손가락에 따라 상(上), 중(中), 하품(下品)으로 구분된다. 즉, 엄지와 둘째 손가락이 서로 맞대고 있을 때에는 상품이고, 엄지가 셋째 손가락과 맞대고 있을 때에는 중품, 그리고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 닿아 있을 때에는 하품이 되는 것이다. 이중에서 상품상생 인은 좌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입상에서는 상품하생 인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와는 반대로 손 모양으로 똑같지만 서로 맞대고 있는 손가락에 따라 상, 중, 하생 인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의 방법을 많이 하용하고 있다.
·천지인(天地印)
한 손은 위로 하고 다른 한 손은 아래로 향한 모습으로 주로 탄생불이 취하는 수인. 즉, 부처가 태어나자 마자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외쳤던 데에서 유래한 손 모양이다.
⑫지물
불상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건으로 계인(契印)이라고도 한다. 불, 보살의 본원(本願)과 성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상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보주(寶珠):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구슬.
·불자(拂子): 마음의 티끌이나 번뇌를 털어 내는 데에 사용하는 불구(佛具).
·금강저(金剛杵): 창과 같은 형태의 무기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
·정병(淨甁): 깨끗한 물이나 감로수(甘露水)를 담는 병.
·경책(警策): 좌선할 때 졸음이나 잡념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넓적한 막대기.
·염주(念珠): 염불하는 수를 세는데 사용하는 불구.
·석장(錫杖): 둥근 고리가 달린 지팡이.
⑬자세
불상은 자세에 따라 입상, 좌상, 와상(臥像)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좌상은 결가부좌, 반가부좌, 유희좌, 윤왕좌, 의좌, 교각좌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결가부좌(結跏趺坐)
부처가 좌선할 때 취하는 편안한 자세. 금강좌(金剛坐), 선정좌(禪定坐), 여래좌(如來坐)라고도 한다. 여래가 주로 취하는 자세로 길상좌(吉祥坐)와 항마좌(降摩坐)의 두 형식이 있는데 전자는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좌선할 때 취한 자세로서 그 기원이 좀 더 오래된 srjt이다.
길상좌는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은 다음 오른발을 밖에서 왼쪽 다리 위에 얹고 왼발을 오른쪽 다리 위에 얹은 것이다.
·반가부좌(半跏趺坐)
보살상이 많이 취하는 자세. 반가좌(半跏坐) 또는 보살좌(普薩坐)라고도 한다. 결가부좌에서 한쪽의 다리를 푼 자세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으로 결가부좌한 위쪽의 다리를 젊적다리 밑으로 넣고 오른쪽 또는 왼쪽의 한 발만을 다리 위에 얹은 것이다.
·유희좌(遊戱坐)
한쪽다리는 결가부좌하여 대좌 위에 얹고 다른 다리는 아래로 늘어뜨린 자세. 다리의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오른쪽 다리를 내린 것은 우서상(右舒相)이라고 하는 반면에 왼쪽 다리를 내린 경우는 좌서상(左舒相)이라고 한다.
·윤왕좌(輪王坐)
한쪽 다리는 결가부좌하고 다른 한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자세. 전륜성왕(轉輪聖王)의 좌법으로 왼손은 왼쪽 다리 뒤로 바닥을 짚고 기대어 있는데 반하여 오른손은 무릎 위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불상의 상체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좌(倚坐)
일반적으로 두 다리를 늘어뜨리고 의자나 대좌에 걸터앉아 있는 자세. 이 명칭은 오래된 예가 없어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다.
·교각좌(交脚坐)
의좌(倚坐)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양 다리를 교차시킨 자세. 인도에서는 천인(天人)과 속인(俗人)이 앉는 방법으로 그 기원이 오래되었으며 간다라 보살상에 그 예가 많이 남아있다.
·열반상(涅槃像)
부처가 열반할 때의 모습으로 두 다리를 가지런히 뻗고 옆으로 누운 자세의 불상. 와상(臥像)이라고도 한다. 이 자세는 석가모니불만이 취할 수 있다.
⑭대좌(臺座)
·연화좌(蓮花座):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연꽃모양의 대좌.
·사자좌(獅子座): 여래상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대게 대좌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부처의 위엄과 위세를 뜻한다.
·상현좌(裳懸座):결가부좌한 불상이 입은 옷자락이 내려와 대좌를 덮고 있는 형식.
·암좌(岩座): 바위 형태를 표현한 대좌로 명왕
) 명왕 : 어둠을 깨뜨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밧줄과 칼을 들고 분노의 상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 불상 가운데는 거의 볼 수가 없다.
에 많이 사용.
·운좌(雲座): 구름의 형태를 띈다.
·조수좌(鳥獸座): 동물을 대좌로 사용한 형식으로 인도에서 유래된 것.
·생령좌(生靈座): 모든 생물을 대좌로 한 형식. 주로 입상에 많이 나타남.
참고 문헌
<불상의 탄생-다카다 오사무>
<불상-중앙일보사>
<한국의 불상-진홍섭>
<한국불교미술사-진홍섭>
<한국불교미술사-문명대>
참고사이트
추천자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술에 있어 만다라의 상징과 치유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예술에 있어 만다라의 상징과 치유적 의미에 관한 연구 불국사 - 통일신라 문화의 꽃
불국사 - 통일신라 문화의 꽃 경주 문화 유산 답사기
경주 문화 유산 답사기 한국에 미륵신앙
한국에 미륵신앙  양산지역 서운암의 관광환경 및 사찰관광에 관한 고찰
양산지역 서운암의 관광환경 및 사찰관광에 관한 고찰 [당나라의 종교] 당나라의 종교
[당나라의 종교] 당나라의 종교 한국문화유산의이해 필기정리
한국문화유산의이해 필기정리 국보 제24호 석굴암
국보 제24호 석굴암 보로부드루 개괄
보로부드루 개괄  [고구려시대 회화미술][백제시대 회화미술][신라시대 회화미술][조선시대 회화미술][회화미술...
[고구려시대 회화미술][백제시대 회화미술][신라시대 회화미술][조선시대 회화미술][회화미술... [화엄사][화엄사상][동오층석탑][서오층석탑]화엄사의 위치, 화엄사의 연혁, 화엄사와 화엄사...
[화엄사][화엄사상][동오층석탑][서오층석탑]화엄사의 위치, 화엄사의 연혁, 화엄사와 화엄사... [법문, 백일법문, 대종경법문, 수필법문, 금강산법문, 대종경, 수필, 금강산, 퇴옹성철, 소태...
[법문, 백일법문, 대종경법문, 수필법문, 금강산법문, 대종경, 수필, 금강산, 퇴옹성철, 소태... 배불숭유정책
배불숭유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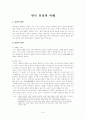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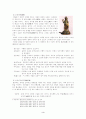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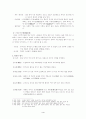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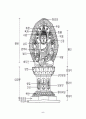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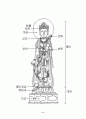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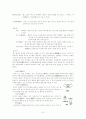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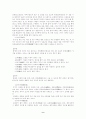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