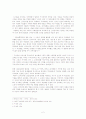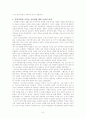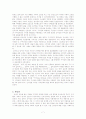목차
1. 머리말
2. 신여성의 개념
3. 신여성의 이상과 사회의 수용
4.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
5. 맺음말
2. 신여성의 개념
3. 신여성의 이상과 사회의 수용
4. 문학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
5. 맺음말
본문내용
930년대 신여성과 구여성의 갈등은 종종 잡지의 기사거리가 되었는데, 신여성은 구식가정의 불합리한 시집살이를, 구여성은 신여성의 헤픈 살림살이와 사치, 허영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신, 구여성간의 갈등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조장된 것이었다. 신교육을 받아 자의식에 눈뜬 신여성과 봉건적, 관습적 삶을 살아온 구여성의 갈등은 사실상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사회는 이들의 갈등을 주로 시집살이와 고부갈등에 국한시켜 논의하였다.
교육으로 얻어진 여성의 자의식이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남성은 이들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봉건시대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남편과 집안을 받드는 구여성의 미덕을 예찬하기 시작하였다. 연애는 신여성과 결혼은 구여성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이러한 말은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서로의 대립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을 유순히 따르고 그를 봉양하는 구여성에 대한 예찬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현진건의 「빈처」를 보면, 조혼을 한 남성이 ‘소위 신풍조의 영향으로 까닭 없이 구식 여자가 싫어지고...... 일찍이 장가든 것을 후회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아내를 깨워보니 의외의 따듯한 맛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곤하게 자는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라고 외친다.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아내를 예찬하는 이 장면은 이 시기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신여성’과 이에 대한 대립상으로 새롭게 제시된 ‘구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자기중심적 시선이 또렷이 읽힌다. 신여성은 연애의 대상, 구여성은 결혼의 대상이라는 이분법이 새로 생성돼 여성들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고, 신여성을 다시금 가부장제적 결혼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인다.
5. 맺음말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형성된 새로운 여성 집단을 신여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신여성이라는 집단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신여성은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사회세력이자 여성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남성 지식인이나 남성 직업인을 신남성이라 지칭한 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새로 등장한 여성 집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부장 사회의 기표라 할 수 있다. 사실 신여성에 대한 시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해갔다. 근대 초기, 봉건 사회를 청산할 긍정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신여성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점차 보수화되면서 타락하고 허영을 일삼는 존재로 비난받았다. 이와 더불어 신여성과 대비되는 세력으로 구여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구여성이란 관습적 삶을 유지해온 여성들로 조선왕조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던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을 마치 새로 등장한 집단이기나 한 것처럼 구여성이라 명명하고 이들을 신여성과 대비시키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신여성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었다. 이처럼 외부적인 모순에 의해 근대의 여성운동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여성억압의 근원과 그 해결에 대한 건설적인 목표 및 이상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식층 중심의 제한적 이고 비현실적인 운동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대의 여성운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교육으로 얻어진 여성의 자의식이 연애할 때는 좋지만 결혼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남성은 이들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봉건시대의 생활방식을 고수하며 남편과 집안을 받드는 구여성의 미덕을 예찬하기 시작하였다. 연애는 신여성과 결혼은 구여성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이러한 말은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서로의 대립을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을 유순히 따르고 그를 봉양하는 구여성에 대한 예찬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현진건의 「빈처」를 보면, 조혼을 한 남성이 ‘소위 신풍조의 영향으로 까닭 없이 구식 여자가 싫어지고...... 일찍이 장가든 것을 후회하였다가...... 집에 돌아와 아내를 깨워보니 의외의 따듯한 맛과 순결한 맛’을 발견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밤이 깊도록 다듬이를 하다가 그만 옷을 입은 채로 쓰러져 곤하게 자는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아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여!’ 라고 외친다.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아내를 예찬하는 이 장면은 이 시기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신여성’과 이에 대한 대립상으로 새롭게 제시된 ‘구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자기중심적 시선이 또렷이 읽힌다. 신여성은 연애의 대상, 구여성은 결혼의 대상이라는 이분법이 새로 생성돼 여성들 사이를 서로 분리시키고, 신여성을 다시금 가부장제적 결혼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여실히 보인다.
5. 맺음말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형성된 새로운 여성 집단을 신여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신여성이라는 집단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신여성은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의 사회세력이자 여성 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한 남성 지식인이나 남성 직업인을 신남성이라 지칭한 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말은 새로 등장한 여성 집단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부장 사회의 기표라 할 수 있다. 사실 신여성에 대한 시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해갔다. 근대 초기, 봉건 사회를 청산할 긍정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신여성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점차 보수화되면서 타락하고 허영을 일삼는 존재로 비난받았다. 이와 더불어 신여성과 대비되는 세력으로 구여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구여성이란 관습적 삶을 유지해온 여성들로 조선왕조부터 꾸준히 존재해 왔던 집단이다. 그러나 이들을 마치 새로 등장한 집단이기나 한 것처럼 구여성이라 명명하고 이들을 신여성과 대비시키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신여성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었다. 이처럼 외부적인 모순에 의해 근대의 여성운동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또한 내부적으로 여성억압의 근원과 그 해결에 대한 건설적인 목표 및 이상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지식층 중심의 제한적 이고 비현실적인 운동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여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근대의 여성운동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