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1. 조선의 건국
2.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Ⅱ. 조선 시대의 법전
1. 조선 최초의 법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 경제문감 (經濟文鑑)
3. 최초의 통일 법전 - 경제육전(經濟六典)
4. 조선 기본 통치 규범 - 경국대전(經國大典)
5. 속대전(續大典)
6. 대전통편(大典通編)
7. 조선 최후 통일 법전 - 대전회통(大典會通)
8. 육전조례 (六典條例)
1. 조선의 건국
2.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Ⅱ. 조선 시대의 법전
1. 조선 최초의 법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 경제문감 (經濟文鑑)
3. 최초의 통일 법전 - 경제육전(經濟六典)
4. 조선 기본 통치 규범 - 경국대전(經國大典)
5. 속대전(續大典)
6. 대전통편(大典通編)
7. 조선 최후 통일 법전 - 대전회통(大典會通)
8. 육전조례 (六典條例)
본문내용
위년)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한 뒤, 임술민란을 수습하고 국가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법전 편찬이 요청되었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과 그 이후 편찬된 여러 성문 법전의 중복된 입법 내용을 피하여 고종 초기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맞게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삼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조문 입법규정 내용을 비교 나열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보충적 입법규정 등을 새 전교(傳敎)의 규정으로서 보완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原)으로 표기하고, 《속대전》에 처음 보이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으며,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보이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고 있다.
《대전회통》도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봉건국가의 기본행정기관인 6조의 조직형식을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그 6전 체계 속에서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제반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문(條文)을 보면,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 등 31개 조문을, 호전(戶典)은 경비 등 29개 조문을, 예전(禮典)은 제과(諸科) 등 62개 조문을,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 등 53개 조문을, 형전(刑典)은 용률(用律) 등 37개 조문을, 공전(工典)은 교로(橋路) 등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26개 조문으로 엮어져 있다. 이와 같이 《대전회통》의 편제는 《경국대전》의 6전체계와 각 조문의 입법규정에 《속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보충규정으로서 새 전교(傳敎)의 순으로 그 항목을 차례대로 싣고 있어, 제도 전반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이전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직체계인 6전체계에 의거하여 편찬된 나머지 원칙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국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며 관청과 관료에 대한 직무 명령 또는 준칙이었다. 물론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인(私人)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민중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인 점에서 관료가 준행 해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 후기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광무 9)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과 그 밖의 민사법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적 법체계의 형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 시점이라 근대적 ·자주적인 법체계의 수립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8. 육전조례 (六典條例)
조선 후기 각 관청에서 맡은 사목(事目) 및 시행규례(施行規例)를 수록한 책으로 활자본이며 1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세로가 19.4×29.8 cm이다.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엮어져 전장법도(典章法度)는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다. 같은 해 2월 찬집제신(纂輯諸臣)에게 명하여 이 조례(條例)를 편집하게 하고 1867년(고종 4)에 인쇄, 경외 각 아문(京外各衙門)에 반전(頒典)하였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 ·조례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
6전의 구성과 관청분포가 이전(吏典)에는 종친부·의정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이조·사헌부·승정원·사간원·상서원·내수사·내시부·액정서, 호전(戶典)에는 호조·선혜청·균역청·양향청·한성부·군자감·광흥창·사도시·사재감·제용감·평시서·내자시·내섬시·전설사·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오부, 예전(禮典)에는 예조·사직서·종묘서·영희전·정전·경모궁·봉상시·장악원·기로소·규장각·교서관·경연청·홍문관·예문관·춘추관·성균관·세자시강원·보양청·강학청·세손강서원·관상감·내의원·승문원·통례원·전의감·사역원·전생서·예빈시·빙고·혜민서·도화서·활인서·사학, 병전(兵典)에는 중추부·병조·세자익위사·세손위종사·도총부·오위장·부장·훈련원·능마아청·사복시·내시·군기시·훈련도감·금위영·노량진·어영청·총융청·장산진·북한산성·호위청·포도청·선전관청·무겸·수문장청·별군직청·충장위청·충익위청·공궐위장·의장고·순청·무신당상군직청·문신당하군직청·대보단·선무사, 형전(刑典)에는 형조·의금부·전옥서, 공전(工典)에는 공조·준천사·주교사·장생전·상의원·선공감·분선공감·영선·오소장·자문감·장원서·조지서·와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대전회통》은 《경국대전》과 그 이후 편찬된 여러 성문 법전의 중복된 입법 내용을 피하여 고종 초기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맞게 《경국대전》을 기본법으로 삼고 《속대전》과 《대전통편》의 조문 입법규정 내용을 비교 나열하면서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할 보충적 입법규정 등을 새 전교(傳敎)의 규정으로서 보완하였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원(原)으로 표기하고, 《속대전》에 처음 보이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증(增)으로 표기하였으며,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보이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보(補)로 표기하고 있다.
《대전회통》도 《경국대전》과 마찬가지로 봉건국가의 기본행정기관인 6조의 조직형식을 따라 6전(六典)으로 나누고 그 6전 체계 속에서 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제반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문(條文)을 보면, 이전(吏典)은 내명부(內命婦) 등 31개 조문을, 호전(戶典)은 경비 등 29개 조문을, 예전(禮典)은 제과(諸科) 등 62개 조문을, 병전(兵典)은 경관직(京官職) 등 53개 조문을, 형전(刑典)은 용률(用律) 등 37개 조문을, 공전(工典)은 교로(橋路) 등 1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26개 조문으로 엮어져 있다. 이와 같이 《대전회통》의 편제는 《경국대전》의 6전체계와 각 조문의 입법규정에 《속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보충규정으로서 새 전교(傳敎)의 순으로 그 항목을 차례대로 싣고 있어, 제도 전반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이전 법전과 마찬가지로 관직체계인 6전체계에 의거하여 편찬된 나머지 원칙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관청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법전 규정의 대부분은 국가 행정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며 관청과 관료에 대한 직무 명령 또는 준칙이었다. 물론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인(私人)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민중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인 점에서 관료가 준행 해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 후기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광무 9)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과 그 밖의 민사법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적 법체계의 형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 시점이라 근대적 ·자주적인 법체계의 수립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8. 육전조례 (六典條例)
조선 후기 각 관청에서 맡은 사목(事目) 및 시행규례(施行規例)를 수록한 책으로 활자본이며 10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세로가 19.4×29.8 cm이다. 1865년(고종 2)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엮어져 전장법도(典章法度)는 구비되었으나 여기에 빠진 사례가 많다. 같은 해 2월 찬집제신(纂輯諸臣)에게 명하여 이 조례(條例)를 편집하게 하고 1867년(고종 4)에 인쇄, 경외 각 아문(京外各衙門)에 반전(頒典)하였다.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육전을 강(綱)으로 하여 그 밑에 해당 각 관청을 분속(分屬)시키고, 소장사목(所掌事目) ·조례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집이다.
6전의 구성과 관청분포가 이전(吏典)에는 종친부·의정부·충훈부·의빈부·돈녕부·이조·사헌부·승정원·사간원·상서원·내수사·내시부·액정서, 호전(戶典)에는 호조·선혜청·균역청·양향청·한성부·군자감·광흥창·사도시·사재감·제용감·평시서·내자시·내섬시·전설사·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오부, 예전(禮典)에는 예조·사직서·종묘서·영희전·정전·경모궁·봉상시·장악원·기로소·규장각·교서관·경연청·홍문관·예문관·춘추관·성균관·세자시강원·보양청·강학청·세손강서원·관상감·내의원·승문원·통례원·전의감·사역원·전생서·예빈시·빙고·혜민서·도화서·활인서·사학, 병전(兵典)에는 중추부·병조·세자익위사·세손위종사·도총부·오위장·부장·훈련원·능마아청·사복시·내시·군기시·훈련도감·금위영·노량진·어영청·총융청·장산진·북한산성·호위청·포도청·선전관청·무겸·수문장청·별군직청·충장위청·충익위청·공궐위장·의장고·순청·무신당상군직청·문신당하군직청·대보단·선무사, 형전(刑典)에는 형조·의금부·전옥서, 공전(工典)에는 공조·준천사·주교사·장생전·상의원·선공감·분선공감·영선·오소장·자문감·장원서·조지서·와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추천자료
 한구과 일본의 경제 발전 비교
한구과 일본의 경제 발전 비교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경제개혁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경제개혁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비교분석]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 비교분석] 중국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중국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1920년대 일제하의 공업 발전과 조선인 공업발전
1920년대 일제하의 공업 발전과 조선인 공업발전 기생을 통해 살펴본 조선의 문화콘텐츠적 성격
기생을 통해 살펴본 조선의 문화콘텐츠적 성격 70년대 석유파동과 일본경제
70년대 석유파동과 일본경제 [우수평가자료]명대의 사회경제와 문화의 발달
[우수평가자료]명대의 사회경제와 문화의 발달 내가 바라본 조선업계의 전망
내가 바라본 조선업계의 전망 [한국민족운동사] 1930년대 노동운동(노동운동의 배경과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상...
[한국민족운동사] 1930년대 노동운동(노동운동의 배경과 조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상... [의복의 역사] 조선시대 복식과 장신구(귀걸이와 비녀)
[의복의 역사] 조선시대 복식과 장신구(귀걸이와 비녀) [비교발전행정론] 그리스 정부의 형성과 특성 경제 발전 전략
[비교발전행정론] 그리스 정부의 형성과 특성 경제 발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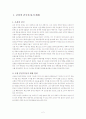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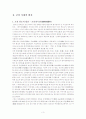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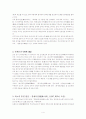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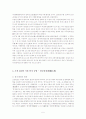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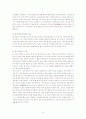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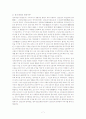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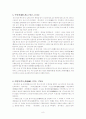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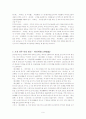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