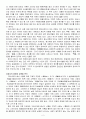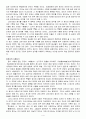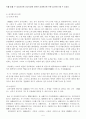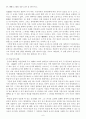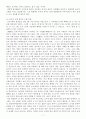목차
1)음서제도의 성립
2)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3)음서의 시행시기
4) 음서제도의 운영
(1) 음서의 연령
(2) 초음관직
(3) 탁음자의 관품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2)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3)음서의 시행시기
4) 음서제도의 운영
(1) 음서의 연령
(2) 초음관직
(3) 탁음자의 관품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본문내용
동안 재임하는데 한번만의 음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실제로 음서 시향의 사례를 볼 때에도 1인의 관료가 여러 사람의 자손에게 음서를 준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一人多子」또는 再蔭, 三蔭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구체적 명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실제의 시행 사례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부음의 경우, 음서의 시행에서 이 음서를 제수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였다는 사실은 규정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부음의 탁음자들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품 이상 고위관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또 父가 이미 3품의 고위관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신음서를 받으려 한 경우도 실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祖蔭의 경우에도 사후에 탁음자가 많다는 사실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볼 때에 같은 인물이 재음, 삼음의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사례에서 찾아지는 것은 그다지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실사례에서 75명의 탁음자가 있는데 그 중 5명만이 2회 이상 탁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자료가 찾아지면 이러한 숫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재음 이상의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이다.
또 형제 간에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위해서 보면 이들이 받은 음서의 명창이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관리 한명이 여러 차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부음. 조음 등의 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숙부음, 외숙부음과 같은 종류의 음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품 이상의 관리는 1회의 음서 기회를 가질 뿐이었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여러 형제가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음서는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음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음서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려의 문벌귀족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는 음서를 통하여 관계에 조기 진출하여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음서 출신자들은 限品의 제약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 41.9%나 되는 인물들이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이후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음서를 제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 대신에 과거로 진출하여 하였으며 음서를 통하여 고위관리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관리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음서가 시행되는 우너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규정이나 시행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좀 더 넓은 시작에서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때 고려 음서제도의 역사적 의의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 형제 간에 여러 명이 음서를 받는 경우에도, 여러 형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위해서 보면 이들이 받은 음서의 명창이나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 관리 한명이 여러 차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부음. 조음 등의 음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음서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숙부음, 외숙부음과 같은 종류의 음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5품 이상의 관리는 1회의 음서 기회를 가질 뿐이었지만,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음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여러 형제가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즉 음서는 이러한 운영 원리를 가짐으로써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게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음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다. 음서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고려의 문벌귀족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가 된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회에서는 음서를 통하여 관계에 조기 진출하여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이 음서 출신자들은 限品의 제약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음서 출신의 인물 가운데 41.9%나 되는 인물들이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음서를 받아 관리가 된 이후에 다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관리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음서를 제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서 대신에 과거로 진출하여 하였으며 음서를 통하여 고위관리가 된 이후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하는 관리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음서가 시행되는 우너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규정이나 시행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좀 더 넓은 시작에서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검토가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때 고려 음서제도의 역사적 의의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