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영일 냉수리 신라비
Ⅲ. 울진 봉평 신라비
Ⅳ. 울주 천전리 서석
Ⅴ. 영천 청제비
Ⅵ. 단양 적성비
Ⅶ. 진흥왕 순수비
Ⅷ. 남산 신성비
Ⅸ. 결론
Ⅱ. 영일 냉수리 신라비
Ⅲ. 울진 봉평 신라비
Ⅳ. 울주 천전리 서석
Ⅴ. 영천 청제비
Ⅵ. 단양 적성비
Ⅶ. 진흥왕 순수비
Ⅷ. 남산 신성비
Ⅸ. 결론
본문내용
가 발견된 이래, 1972년까지 총 5基의 비가 발견되었다.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홍섭은 제 1비문에 보이는 ‘罪敎事爲問敎令誓事之’는‘ 罪敎事’와 ‘爲問敎令誓事之’의 두가지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써, ‘敎’는 ‘令’, ‘罪敎’는 ‘令罪’, ‘事’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敎令誓’도 ‘令誓’의 뜻으로 보았다. ‘阿良邏頭’ 이하로는 남산신성 축성에 관여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맡은 축성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기록방법은 직명, 속부, 인명, 관등의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진흥왕순수비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문에 보이는 관직에 대해서는 ‘阿良邏頭’는 상하아량촌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郡上村主阿良村’은 아량촌을 총괄하던 군의 상주촌의 의미로, 이 비에 참여한 촌주는 같은 상촌주이면서도 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匠尺’, ‘文尺’은 일종의 기술자, 즉 장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城使’는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직명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성에 관계가 있는 직명으로 파악하였다. 대사는 儒理王 9년에 제정한 17관등 중에 12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관직을 호칭한 사람은 비교적 지방직위로서는 높은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만이 ‘사훼’이라는 부명을 명시하였다. 제 2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훼’은 屬部로써, 속부명을 기록한 사람은 列記人名 중에 가장 직위가 높고 경관직인 小舍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명에 대해서 ‘阿且兮村’은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보았고, ‘答大支村’은 지금의 경주 상주군 화서면, ‘阿大兮村’은 지금의 충북 옥천군 안남면으로 추측하였다. 제 3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문 ‘啄部主刀里受作云云’에서 ‘啄部’는 6부중 하나이고, ‘主刀里’는 인명으로 볼 수가 있으나 지명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作上人’은 구체적인 직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비문의 찬자 또는 서자로 보았다. 속부명에서 탁부는 이 비에서 처음 나오는 부명이며, 그 위에 다른 부명이나 촌명의 기록이 없다. 제 4비의 내용으로는 비문에 보이는 ‘古生城△’은 속부명에 보이는 ‘古生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書尺’은 ‘尺’자가 붙은 장인으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예가 된다고 보았고, 진흥왕순수비에 ‘書人’, 오작비에 ‘文作人’ 등이 있는데 이것을 찬자의 의미로 본다면 여기에서도 서자를 의미하여 이 비를 쓴 사람으로 보았다.
남산신성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현재 남산에는 蟹目嶺을 포위하여 축조된 성이 있고 성내에는 長倉址가 3개소가 남아있는데, 명칭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조에 ‘春正月作長倉於南山新城’이라 하였고, 또한 동서 진평왕조에 ‘秋七月築南山城周二千八百五十四步’라 하여 남산에는 본래 남산성이 있었고, 별도로 새로운 남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 종래의 남산성을 그 후 수축하여 신성이라 이름지어 남산신성이라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축성경위에 있어서도 출신촌명이나 인명에 중복이 전혀 없고 수작거리가 다른 점, 비의 발견 지점이 다른 점 등을 들어 분단별로 수작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비문의 체제는 당시의 격식에 의하였으나 전단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는 자유로이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지방에서 동원된 것이 보이고, 축성은 엄격한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축성공사의 力役動員體制에 대해서, 이종욱은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즉 비문에 보이는 인원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하였다. 첫째, 邏頭와 道使라는 지방관으로 이들은 6부 출신이었으며 한 군에서 3명씩 동원되었고, 이들의 임무는 주로 국가의 명령전달과 작업에 대한 총 책임을 진 것으로 보았다. 둘째, 村主群으로 역시 군을 단위로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지방관을 통하여 국가의 명령을 전달받았고 인력동원과 축성공사를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作上群으로 실제로 잡역부를 거느리고 축성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촌을 단위로 하여 전국적으로 200집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남산신성비의 발견은 비문에 있는 인물의 분석을 통한 인명기록 방법, 관등을 통한 신라 중고 신분체계 및 촌락구조, 신라 중고의 축성을 위한 力役體系, 비문에 보이고 있는 지명을 통한 신라 중고의 지방행정체제 등에 해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Ⅸ. 결론
이상과 같이 신라 중고 금석문에 대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금석문을 통하여 신라사회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통하여 5세기경 내물왕대에 6부체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면에서 신라는 왕경육부체제의 지배형태였고, 그 중에서도 喙와 沙喙의 이부지배체제라는 6부의 체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또 갈문왕에 대해서도,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울진 봉평 신라비에 의하면 국왕은 상대등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국왕이 귀족회의 의장으로서 귀족들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고, 국왕도 다른 귀족세력을 초월하는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등 설치를 계기로 국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관등제에 대해서 신라의 17관등제가 늦어도 법흥왕대 초까지는 확립되었다는 학계의 통설을 확인시켜주기도 했고, 율령이 법흥왕대에 처음으로 수용하여 반포하면서 율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령은 그 편목은 알 수 없지만 신라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신라 중고 지방통치 체계의 한 특징도 보여주며, 力役체제에 대해서도 영천 청제비는 알려준다. 이 밖에도 이 신라중고의 금석문이 입증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신라사회의 모습이 많은데, 이처럼 금석문은 1차사료로서 당시의 문화 및 사회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역사학에 있어서 1차 사료의 연구와 검증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금석문 연구를 통해, 한국 고대사를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고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어줄 금석문이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또다른 금석문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홍섭은 제 1비문에 보이는 ‘罪敎事爲問敎令誓事之’는‘ 罪敎事’와 ‘爲問敎令誓事之’의 두가지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써, ‘敎’는 ‘令’, ‘罪敎’는 ‘令罪’, ‘事’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敎令誓’도 ‘令誓’의 뜻으로 보았다. ‘阿良邏頭’ 이하로는 남산신성 축성에 관여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맡은 축성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의 기록방법은 직명, 속부, 인명, 관등의 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진흥왕순수비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문에 보이는 관직에 대해서는 ‘阿良邏頭’는 상하아량촌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郡上村主阿良村’은 아량촌을 총괄하던 군의 상주촌의 의미로, 이 비에 참여한 촌주는 같은 상촌주이면서도 격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匠尺’, ‘文尺’은 일종의 기술자, 즉 장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城使’는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직명을 찾아볼 수 없으며, 성에 관계가 있는 직명으로 파악하였다. 대사는 儒理王 9년에 제정한 17관등 중에 12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관직을 호칭한 사람은 비교적 지방직위로서는 높은 직책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만이 ‘사훼’이라는 부명을 명시하였다. 제 2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훼’은 屬部로써, 속부명을 기록한 사람은 列記人名 중에 가장 직위가 높고 경관직인 小舍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명에 대해서 ‘阿且兮村’은 경북 의성군 안계면으로 보았고, ‘答大支村’은 지금의 경주 상주군 화서면, ‘阿大兮村’은 지금의 충북 옥천군 안남면으로 추측하였다. 제 3비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문 ‘啄部主刀里受作云云’에서 ‘啄部’는 6부중 하나이고, ‘主刀里’는 인명으로 볼 수가 있으나 지명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作上人’은 구체적인 직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비문의 찬자 또는 서자로 보았다. 속부명에서 탁부는 이 비에서 처음 나오는 부명이며, 그 위에 다른 부명이나 촌명의 기록이 없다. 제 4비의 내용으로는 비문에 보이는 ‘古生城△’은 속부명에 보이는 ‘古生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書尺’은 ‘尺’자가 붙은 장인으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예가 된다고 보았고, 진흥왕순수비에 ‘書人’, 오작비에 ‘文作人’ 등이 있는데 이것을 찬자의 의미로 본다면 여기에서도 서자를 의미하여 이 비를 쓴 사람으로 보았다.
남산신성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현재 남산에는 蟹目嶺을 포위하여 축조된 성이 있고 성내에는 長倉址가 3개소가 남아있는데, 명칭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조에 ‘春正月作長倉於南山新城’이라 하였고, 또한 동서 진평왕조에 ‘秋七月築南山城周二千八百五十四步’라 하여 남산에는 본래 남산성이 있었고, 별도로 새로운 남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 종래의 남산성을 그 후 수축하여 신성이라 이름지어 남산신성이라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축성경위에 있어서도 출신촌명이나 인명에 중복이 전혀 없고 수작거리가 다른 점, 비의 발견 지점이 다른 점 등을 들어 분단별로 수작거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비문의 체제는 당시의 격식에 의하였으나 전단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는 자유로이 건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지방에서 동원된 것이 보이고, 축성은 엄격한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축성공사의 力役動員體制에 대해서, 이종욱은 신라 중고의 지방통치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즉 비문에 보이는 인원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하였다. 첫째, 邏頭와 道使라는 지방관으로 이들은 6부 출신이었으며 한 군에서 3명씩 동원되었고, 이들의 임무는 주로 국가의 명령전달과 작업에 대한 총 책임을 진 것으로 보았다. 둘째, 村主群으로 역시 군을 단위로 동원되었는데 이들은 지방관을 통하여 국가의 명령을 전달받았고 인력동원과 축성공사를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았다. 셋째, 作上群으로 실제로 잡역부를 거느리고 축성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촌을 단위로 하여 전국적으로 200집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남산신성비의 발견은 비문에 있는 인물의 분석을 통한 인명기록 방법, 관등을 통한 신라 중고 신분체계 및 촌락구조, 신라 중고의 축성을 위한 力役體系, 비문에 보이고 있는 지명을 통한 신라 중고의 지방행정체제 등에 해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Ⅸ. 결론
이상과 같이 신라 중고 금석문에 대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금석문을 통하여 신라사회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영일 냉수리 신라비를 통하여 5세기경 내물왕대에 6부체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면에서 신라는 왕경육부체제의 지배형태였고, 그 중에서도 喙와 沙喙의 이부지배체제라는 6부의 체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또 갈문왕에 대해서도,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울진 봉평 신라비에 의하면 국왕은 상대등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국왕이 귀족회의 의장으로서 귀족들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고, 국왕도 다른 귀족세력을 초월하는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상대등 설치를 계기로 국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관등제에 대해서 신라의 17관등제가 늦어도 법흥왕대 초까지는 확립되었다는 학계의 통설을 확인시켜주기도 했고, 율령이 법흥왕대에 처음으로 수용하여 반포하면서 율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령은 그 편목은 알 수 없지만 신라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신라 중고 지방통치 체계의 한 특징도 보여주며, 力役체제에 대해서도 영천 청제비는 알려준다. 이 밖에도 이 신라중고의 금석문이 입증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신라사회의 모습이 많은데, 이처럼 금석문은 1차사료로서 당시의 문화 및 사회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역사학에 있어서 1차 사료의 연구와 검증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금석문 연구를 통해, 한국 고대사를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고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어줄 금석문이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또다른 금석문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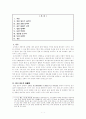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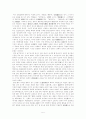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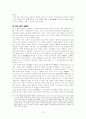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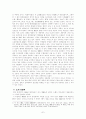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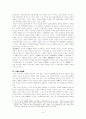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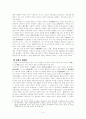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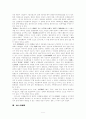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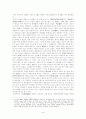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