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백제의 요서경략설 관련기사 검토
1. 중국의 남조계사서와 『삼국사기』
2. 『위서』
3. 『북제서』
Ⅲ. 요서경략설에 대한 긍정, 부정
1. 부정적 입장
2. 긍정적 입장
3. 요서경략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Ⅳ.백제의 중국진출 시기와 배경
Ⅴ. 결론
Ⅱ. 백제의 요서경략설 관련기사 검토
1. 중국의 남조계사서와 『삼국사기』
2. 『위서』
3. 『북제서』
Ⅲ. 요서경략설에 대한 긍정, 부정
1. 부정적 입장
2. 긍정적 입장
3. 요서경략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
Ⅳ.백제의 중국진출 시기와 배경
Ⅴ. 결론
본문내용
동부유역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난하 유역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상의 기록들은 백제가 246년 이전에 이미 지금의 난하 유역에 진출했음을 알게 해준다. 백제가 진출했던 난하유역은 앞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요서군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백제는 언제까지 요서군 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을까?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에 관한 가장 늦은 기록은『북제서』「후주기」와 『삼국사기』「백제본기」위덕왕 17년조이다. 북제 후주가 백제의 위덕왕을 使持節都督東靑州刺史로 삼았다는 것이다. 백제의 위덕왕이 동청주의 문무대권을 장악한 것을 북제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북제의 후주 緯가 재위했던 연대는 565년부터 577년까지이다. 북위가 분열하여 534년에 동위, 535년에 서위가 섰다가 이들이 각각 북제와 북주라 하였는데, 577년에 북제는 북주에게 멸망당하고 581년에 북주의 정권은 외척인 楊堅에게 넘어가 수나라가 건국되었다. 수나라는 589년에 남쪽의 陳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의 위덕왕이 중국 북제의 후주로부터 사지절도독동청주자사를 제수받은 것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불과 10여 년 전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제가 중국 동부 해안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 시기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기이거나 그보다 불과 몇 년 앞선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백제는 246년 이전부터 588년경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중국 동부 해안지역을 지배했다. 그 영역은 초기에는 난하 유역부터 하북성 중부까지였으나 그 영역을 점차 남쪽으로 확대하여 산동성을 포괄하고 강소성 남부에까지 이르렀다. 최치원의 글에 따르면 절강성도 백제의 지배권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광서장족자치구 옹녕현 지역에도 근거지를 기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백제가 거대한 중국의 동북 해안지역을 지배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리고 백제가 그곳에 진출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백제가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했던 시기는 한족들의 세력은 지극히 약화되어 중국대륙을 지배할 능력이 없었고 그때까지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북방 지역은 여러 이민족들에게 유린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 북방을 유린했던 흉노갈선비저강 등은 고구려나 백제보다 강한 세력은 결코 아니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에 진출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강대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북위가 북제와 북주로 나누어지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 특히 북위의 군대는 기병이 중심이 되었는데 백제의 기병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한 것은 백제가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백제와 고구려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고구려 고국원왕 때에 전쟁을 하면서부터였다. 그 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고구려가 백제를 친 것은 고국원왕 39넌으로서 369년이었다. 백제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난하 유역에 진출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백제가 난하 유역에 진출했던 시기는 고구려와 우의가 돈독했던 때였다. 앞에 인용된 『삼국사기』「백제본기」고이왕 13년조에 따르면,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쳤을 때 백제의 좌장 진충은 북위의 낙랑군을 공격하였다. 백제가 낙랑군을 친 것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고구려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 369년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치른 뒤 두 나라 사이의 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다.
『남제서』백제전에는 백제의 진출지역에서 공로를 세운 백제의 장수와 관리들에게 백제가 관직을 제수했음은 물론, 南濟에서도 관직을 제수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南朝는 漢族의 정권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북방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던 남조로서는 북방회복에 백제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백제로서도 漢族 정권인 남조의 관직을 제수받는 것이 그 지역 토착민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는 백제와 남조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고 백제와 북조와는 소원한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북조의 역사서에 백제의 중국 진출에 관한 기록이 빠진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조도 백제의 중국 진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제가 백제 위덕왕을 사지절도독동청주자사로 제수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Ⅴ. 결론
처음에 이 주제를 접했을 때는 아주 낯설었고, 그래서 혹시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일본측 사료에 의존하는 반면, 요서경략설은 오히려 중국측 사료에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의 사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사료를 비교해 본 결과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백제의 요서진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백제가 중국에 진출한 시기는 264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앞서 고구려는 이미 당시의 요동(지금의 난하 유역) 지역에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두 차례 요동을 경략했지만 백제가 그에 상응하는 ‘요서경략’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남조사가들이 사서를 통해서 주변국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모종의 사료적 근거’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록이 우리측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나 찬란한 역사를 운운하는 긍정적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료를 검토해 봤을 때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쪽에 근접해 가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나아가면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기록들은 백제가 246년 이전에 이미 지금의 난하 유역에 진출했음을 알게 해준다. 백제가 진출했던 난하유역은 앞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요서군 지역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백제는 언제까지 요서군 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을까? 이미 확인한 것처럼 이에 관한 가장 늦은 기록은『북제서』「후주기」와 『삼국사기』「백제본기」위덕왕 17년조이다. 북제 후주가 백제의 위덕왕을 使持節都督東靑州刺史로 삼았다는 것이다. 백제의 위덕왕이 동청주의 문무대권을 장악한 것을 북제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북제의 후주 緯가 재위했던 연대는 565년부터 577년까지이다. 북위가 분열하여 534년에 동위, 535년에 서위가 섰다가 이들이 각각 북제와 북주라 하였는데, 577년에 북제는 북주에게 멸망당하고 581년에 북주의 정권은 외척인 楊堅에게 넘어가 수나라가 건국되었다. 수나라는 589년에 남쪽의 陳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였다.
그러므로 백제의 위덕왕이 중국 북제의 후주로부터 사지절도독동청주자사를 제수받은 것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불과 10여 년 전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백제가 중국 동부 해안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 시기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기이거나 그보다 불과 몇 년 앞선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백제는 246년 이전부터 588년경까지 매우 오랜 기간을 중국 동부 해안지역을 지배했다. 그 영역은 초기에는 난하 유역부터 하북성 중부까지였으나 그 영역을 점차 남쪽으로 확대하여 산동성을 포괄하고 강소성 남부에까지 이르렀다. 최치원의 글에 따르면 절강성도 백제의 지배권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광서장족자치구 옹녕현 지역에도 근거지를 기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백제가 거대한 중국의 동북 해안지역을 지배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리고 백제가 그곳에 진출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백제가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했던 시기는 한족들의 세력은 지극히 약화되어 중국대륙을 지배할 능력이 없었고 그때까지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북방 지역은 여러 이민족들에게 유린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 중국 북방을 유린했던 흉노갈선비저강 등은 고구려나 백제보다 강한 세력은 결코 아니었다. 이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가 중국에 진출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강대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북위가 북제와 북주로 나누어지고 백제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 특히 북위의 군대는 기병이 중심이 되었는데 백제의 기병을 당해내지 못하고 패한 것은 백제가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백제와 고구려의 사이가 나빠진 것은 고구려 고국원왕 때에 전쟁을 하면서부터였다. 그 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한 사실은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고구려가 백제를 친 것은 고국원왕 39넌으로서 369년이었다. 백제는 이보다 훨씬 전부터 난하 유역에 진출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백제가 난하 유역에 진출했던 시기는 고구려와 우의가 돈독했던 때였다. 앞에 인용된 『삼국사기』「백제본기」고이왕 13년조에 따르면,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쳤을 때 백제의 좌장 진충은 북위의 낙랑군을 공격하였다. 백제가 낙랑군을 친 것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고구려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 369년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치른 뒤 두 나라 사이의 상황은 바뀌었을 것이다.
『남제서』백제전에는 백제의 진출지역에서 공로를 세운 백제의 장수와 관리들에게 백제가 관직을 제수했음은 물론, 南濟에서도 관직을 제수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에 南朝는 漢族의 정권이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 북방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던 남조로서는 북방회복에 백제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백제로서도 漢族 정권인 남조의 관직을 제수받는 것이 그 지역 토착민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는 백제와 남조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만들었고 백제와 북조와는 소원한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다. 북조의 역사서에 백제의 중국 진출에 관한 기록이 빠진 것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조도 백제의 중국 진출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북제가 백제 위덕왕을 사지절도독동청주자사로 제수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Ⅴ. 결론
처음에 이 주제를 접했을 때는 아주 낯설었고, 그래서 혹시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백제의 ‘요서경략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임나일본부가 일본측 사료에 의존하는 반면, 요서경략설은 오히려 중국측 사료에서 그 존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백제의 사료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사료를 비교해 본 결과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백제의 요서진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백제가 중국에 진출한 시기는 264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이보다 앞서 고구려는 이미 당시의 요동(지금의 난하 유역) 지역에 진출해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가 두 차례 요동을 경략했지만 백제가 그에 상응하는 ‘요서경략’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남조사가들이 사서를 통해서 주변국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점에서 ‘모종의 사료적 근거’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기록이 우리측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나 찬란한 역사를 운운하는 긍정적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료를 검토해 봤을 때 백제의 요서경략설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쪽에 근접해 가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나아가면서 섣부른 판단보다는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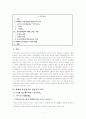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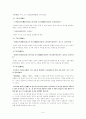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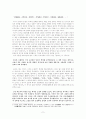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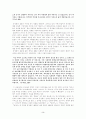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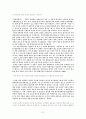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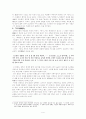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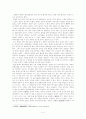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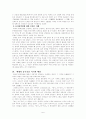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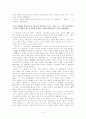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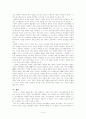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