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는 글
Ⅱ. 펴는 글
1. 판소리계 소설의 기원과 그 개념
2.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3. 판소리계 소설의 언어유희 양상
4. 판소리계 소설 작품
5. 세태소설 들어가기
6. 세태소설의 개념
7. 세태소설의 특성
8. 세태소설 작품
Ⅱ. 펴는 글
1. 판소리계 소설의 기원과 그 개념
2.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3. 판소리계 소설의 언어유희 양상
4. 판소리계 소설 작품
5. 세태소설 들어가기
6. 세태소설의 개념
7. 세태소설의 특성
8. 세태소설 작품
본문내용
, 아니 실은 끝없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파산하게 된다. 흥부박이 세 통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네 배가 넘는 박을 설정한 것에서 놀부를 징치하고자 했던 민중의 적대감을 엿볼 수 있다.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놀부가 재물을 빼앗겨 가는 구체적인 과정들이다. 놀부박 안에는 수백 수천의 거지떼, 풍각쟁이패, 사당패, 초라니패, 짐꾼들을 비롯하여 몰락 양반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이들이 때로는 완력으로, 때로는 놀이값으로, 때로는 점쳐 준 대가로, 때로는 속량(屬良) 대가로 돈을 뜯어 가는 것이다. 왜 하필 이들인가? 여기서 우리는 작품 서두에 열거된 놀부의 심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심술은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지만, ‘궁반 보면 관 찢기’, ‘걸인 보면 자루 찢기’, ‘초라니패 소고(小鼓) 도둑’, ! ‘옹기짐의 작대기 차기’ 등등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놀부박에서 나와 놀부를 파멸로 몰아가던 인물들은 그에게 온갖 수모를 받아야만 했던 바로 그들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놀부와 같은 몇몇 부류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산출시켰던 조선 후기 농촌사회의 구조적 희생자들, 곧 하층 유랑민들이기도 했다. 이제 그들 개개인이 당했던 수모를,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모여 비로소 몇 배로 분풀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가진 자들은 본래 ‘단합된 무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위인들이 아니던가?
그런 점에서 제비다리를 제 손으로 부러뜨려 재앙의 씨앗을 뿌려 중간에 그만두어도 될 박을 탐욕으로 계속 타다 결국 파멸하고 만 것이 자업자득이라면, 이들에 의한 파멸이야말로 ‘진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 후기 내내 끊이지 않던 민란을 연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흥부전에서는 니를 그처럼 살벌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여기서 잠시 놀부박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박이 딱 쪼개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패, 여사당, 거사, 초라니패, 각설이패, 모다 이런 것들이 나오것다. ‘아, 거 나오던 중 기중 낫다마는, 그럼 어디 한 번 놀아 봐라.’ ‘아이 샌님, 그렇게 함부로 얼른 노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어쩐다냐?’ ‘여기서 한 번 우리가 노는 데 행하(行下, 구경값)가 천 냥이올시다.’ ‘뭣이, 천 냥이여? 아따 너무 비싸다.’ ‘아따, 샌님도. 이왕 없어진 돈, 뭣이 그리 아까워서 그래 쌓소. 천 냥 주고 한 번 재밌게 노시요.’ ‘그려. 어디 한 번 노는 구경이나 해 보자. 한 번 놀아 봐라.’
온갖 놀이패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들이 벌인 흥겨운 놀이에 웃고 즐기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놀부는 자기 전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까닭은 원수 같은 놀부의 파멸을 통쾌하게 여기던 민중들에게 신명나는 놀이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문학적 배려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물에 그토록 악착같던 놀부가 놀이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4-5) 참고 문헌
- 송지은, 「흥부전의 주제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강재홍, 「이본생성원리를 활용한 흥부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승호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이해>
4-2. 「옥단춘전」
1) 연구사
「옥단춘전」은 애정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옥단춘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속속들이 새로운 「옥단춘전」에 대한 시각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옥단춘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발표된 김종철의 논문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본 정리를 비롯해서 기존의 야담, 민요, 판소리(춘향전) 관련설 논의를 검토한 다음 「옥단춘전」의 갈등 구조와 그 의미, 그리고 「옥단춘전」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 짧게나마 논의하였다.
그러나 1949년 정한영의 논문에서는 <춘향전>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넘어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태준은 1939년에 『조선소설사』에서 암행어사 이몽룡과 이혈룡, 춘향과 옥단춘 등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든가, 작품의 구상, 그리고 소재를 볼 때에 「옥단춘전」은 「춘향전」과 ‘바로 한쌍의 자매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준이 「춘향전」과 「옥단춘전」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때는 1935년 첫 논문인 ‘옥단춘전설고’에서이다. 그는 이때부터 「옥단춘전」과 「춘향전」과의 관련성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들 때문에 「옥단춘전」은 독자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의 자매편, 내지는 아류작으로 분류되어 교과서에도 실리었다. 나는 앞으로 「옥단춘전」과 다른 일반 애정소설을 비교, 분석하거나 일반 애정소설의 대명사격인 「춘향전」과 대조시켜 「옥단춘전」의 독자성을 밝혀내겠다.
2) 작가소개 & 이본연구
「옥단춘전」 역시 다른 고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작자미상의 작품이다. 「옥단춘전」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깊은 연구를 했던 김종철의 논문에 따르면 이본은 목판본은 없고 필사본 10종과 1916년에 박문서관 (博文書館)과 청송당서점 (靑松堂書店), 1926년 대성서림 (大成書林)에서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961년에 세창서관 (世昌書館)에서 발행한 것까지의 활자본 총15종으로 크게 이 두 계열로 나뉜다고 했다. 필사본 6종은 독자적으로 전해 온 계통으로 한 계열을 이루며, 활자본의 경우에는 출판사도 다르고 쪽수도 다르지만 내용상의 별 차이는 없고 단지 오식과 누락으로 인한 차이점만 보인다. 이들 활자본과 함께 활자본을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4종이 다른 한 계열을 이룬다.
3) 줄거리
숙종대왕 시절 나라가 편안한 때, 서울에 사는 김 정승, 이 정승이 친하였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던 중 각각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김진희와 이혈룡이라 하였다. 둘은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누구든 먼저 출세하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하여 돕기로 약속한다. 그 뒤 이 승상과 김 승상이 병에 걸려 죽고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지만 이혈룡은 과거에 실패한다. 이혈룡은 과거에 실패하고 가난을 견디지 못해 평양 감사의 잔치에 찾아가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을 모른다고
그런 점에서 제비다리를 제 손으로 부러뜨려 재앙의 씨앗을 뿌려 중간에 그만두어도 될 박을 탐욕으로 계속 타다 결국 파멸하고 만 것이 자업자득이라면, 이들에 의한 파멸이야말로 ‘진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조선 후기 내내 끊이지 않던 민란을 연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흥부전에서는 니를 그처럼 살벌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여기서 잠시 놀부박의 한 대목을 보기로 하자.
박이 딱 쪼개져 노니, 박통 속에서 남사당패, 여사당, 거사, 초라니패, 각설이패, 모다 이런 것들이 나오것다. ‘아, 거 나오던 중 기중 낫다마는, 그럼 어디 한 번 놀아 봐라.’ ‘아이 샌님, 그렇게 함부로 얼른 노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럼 어쩐다냐?’ ‘여기서 한 번 우리가 노는 데 행하(行下, 구경값)가 천 냥이올시다.’ ‘뭣이, 천 냥이여? 아따 너무 비싸다.’ ‘아따, 샌님도. 이왕 없어진 돈, 뭣이 그리 아까워서 그래 쌓소. 천 냥 주고 한 번 재밌게 노시요.’ ‘그려. 어디 한 번 노는 구경이나 해 보자. 한 번 놀아 봐라.’
온갖 놀이패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들이 벌인 흥겨운 놀이에 웃고 즐기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놀부는 자기 전재산을 탕진하고 만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까닭은 원수 같은 놀부의 파멸을 통쾌하게 여기던 민중들에게 신명나는 놀이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문학적 배려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재물에 그토록 악착같던 놀부가 놀이판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4-5) 참고 문헌
- 송지은, 「흥부전의 주제의식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강재홍, 「이본생성원리를 활용한 흥부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승호 <판소리와 판소리계 소설의 이해>
4-2. 「옥단춘전」
1) 연구사
「옥단춘전」은 애정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요즈음 들어 「옥단춘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속속들이 새로운 「옥단춘전」에 대한 시각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옥단춘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발표된 김종철의 논문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본 정리를 비롯해서 기존의 야담, 민요, 판소리(춘향전) 관련설 논의를 검토한 다음 「옥단춘전」의 갈등 구조와 그 의미, 그리고 「옥단춘전」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 짧게나마 논의하였다.
그러나 1949년 정한영의 논문에서는 <춘향전>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넘어서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태준은 1939년에 『조선소설사』에서 암행어사 이몽룡과 이혈룡, 춘향과 옥단춘 등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든가, 작품의 구상, 그리고 소재를 볼 때에 「옥단춘전」은 「춘향전」과 ‘바로 한쌍의 자매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준이 「춘향전」과 「옥단춘전」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때는 1935년 첫 논문인 ‘옥단춘전설고’에서이다. 그는 이때부터 「옥단춘전」과 「춘향전」과의 관련성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들 때문에 「옥단춘전」은 독자적인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의 자매편, 내지는 아류작으로 분류되어 교과서에도 실리었다. 나는 앞으로 「옥단춘전」과 다른 일반 애정소설을 비교, 분석하거나 일반 애정소설의 대명사격인 「춘향전」과 대조시켜 「옥단춘전」의 독자성을 밝혀내겠다.
2) 작가소개 & 이본연구
「옥단춘전」 역시 다른 고대소설과 마찬가지로 작자미상의 작품이다. 「옥단춘전」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깊은 연구를 했던 김종철의 논문에 따르면 이본은 목판본은 없고 필사본 10종과 1916년에 박문서관 (博文書館)과 청송당서점 (靑松堂書店), 1926년 대성서림 (大成書林)에서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961년에 세창서관 (世昌書館)에서 발행한 것까지의 활자본 총15종으로 크게 이 두 계열로 나뉜다고 했다. 필사본 6종은 독자적으로 전해 온 계통으로 한 계열을 이루며, 활자본의 경우에는 출판사도 다르고 쪽수도 다르지만 내용상의 별 차이는 없고 단지 오식과 누락으로 인한 차이점만 보인다. 이들 활자본과 함께 활자본을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4종이 다른 한 계열을 이룬다.
3) 줄거리
숙종대왕 시절 나라가 편안한 때, 서울에 사는 김 정승, 이 정승이 친하였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던 중 각각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김진희와 이혈룡이라 하였다. 둘은 친형제처럼 지내면서 누구든 먼저 출세하면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천거하여 돕기로 약속한다. 그 뒤 이 승상과 김 승상이 병에 걸려 죽고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하지만 이혈룡은 과거에 실패한다. 이혈룡은 과거에 실패하고 가난을 견디지 못해 평양 감사의 잔치에 찾아가지만 김진희는 이혈룡을 모른다고
추천자료
 괴테의 작품 {독일 피난민들의 대화}의 단편소설적 형식 연구
괴테의 작품 {독일 피난민들의 대화}의 단편소설적 형식 연구 (현대문학강독) 최서해 작품에 나타난 신경향파적 특징과 1920년대 후반 프로소설의 주요 특징
(현대문학강독) 최서해 작품에 나타난 신경향파적 특징과 1920년대 후반 프로소설의 주요 특징 고소설 5작품 감상문 (금오신화/ 홍길동전/ 구운몽/ 양반전/ 춘향전)
고소설 5작품 감상문 (금오신화/ 홍길동전/ 구운몽/ 양반전/ 춘향전) 북한의 시와 소설 작품 분석
북한의 시와 소설 작품 분석 시대별 애정소설과 현대작품
시대별 애정소설과 현대작품 소설가 나도향 ― 작가연보, 작가생애, 작품목록, 작품줄거리
소설가 나도향 ― 작가연보, 작가생애, 작품목록, 작품줄거리 고전소설(고소설) 춘향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심청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홍...
고전소설(고소설) 춘향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심청전 작품분석, 고전소설(고소설) 홍... 고소설(고전소설) 임진록 작품분석, 고소설(고전소설) 사씨남정기, 고소설(고전소설) 위경천...
고소설(고전소설) 임진록 작품분석, 고소설(고전소설) 사씨남정기, 고소설(고전소설) 위경천... [문학의이해공통형] 중국인거리(유년의뜰) 다음 소설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교재 123~131쪽...
[문학의이해공통형] 중국인거리(유년의뜰) 다음 소설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교재 123~131쪽... 서사문학의 이해와 창작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잘 아는 소설을 한 편 선택하시오. 그 중 자...
서사문학의 이해와 창작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잘 아는 소설을 한 편 선택하시오. 그 중 자... 염상섭(廉想涉) (염상섭 작가소개, 염상섭의 작품세계, 「표본실과 청개구리」, 「만세전」, ...
염상섭(廉想涉) (염상섭 작가소개, 염상섭의 작품세계, 「표본실과 청개구리」, 「만세전」, ... 『소설 박현성 - 불사조라 불리운 사나이』 문예작품 조사 _ 지은이 : 유병철
『소설 박현성 - 불사조라 불리운 사나이』 문예작품 조사 _ 지은이 : 유병철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두 연작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두 명(연작소설 두 편)을 골라...
[현대소설론 공통] 다음 두 연작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두 명(연작소설 두 편)을 골라... 작품 속에 나타난 지식인의 현실 (현진건-빈처, 술 권하는 사회박태원-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작품 속에 나타난 지식인의 현실 (현진건-빈처, 술 권하는 사회박태원-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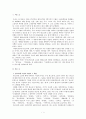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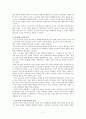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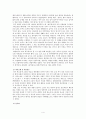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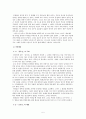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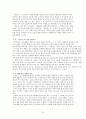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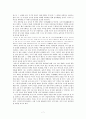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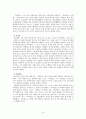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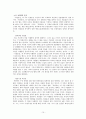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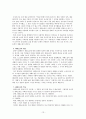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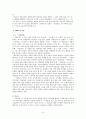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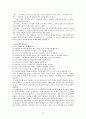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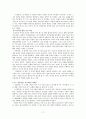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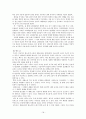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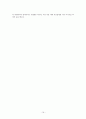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