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의회에 관한 논쟁
ⅱ. 혁명 세력에 관한 논쟁
ⅲ. 종교에 관한 논쟁
Ⅲ. 결 론
Ⅱ. 본 론
ⅰ. 의회에 관한 논쟁
ⅱ. 혁명 세력에 관한 논쟁
ⅲ. 종교에 관한 논쟁
Ⅲ. 결 론
본문내용
Ⅲ. 결 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휘그-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휘그-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투영시켜 ‘영국 혁명’이라고 부른다. 반면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영국 내란’ 또는 ‘내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혁명’이라는 개념을 기존 세력과 또 다른 그에 대립되는 신 세력이 존재할 때, 기존 세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신 세력이 전복시켜서 권력 구도를 변환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휘그-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들은 당연히 왕과 왕의 추종 세력 혹은 귀족들이라는 기존 세력에 대항하여 영국민을 대표하는 혹은 신흥 경제계급 세력이 기존 권력 구도를 전복시켜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명칭하였다. 반면에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혁명이라고 보지 않는다.
첫째는 기존 세력과 신 세력이라는 두 대립된 힘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세력은 서로 교차하거나 중복되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두 대립된 세력이 애초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두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기존 세력과 신 세력 간의 권력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은 두 세력이 더 큰 사회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배세력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이 지배세력이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권력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내전’ 혹은 ‘내란’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과연 ‘영국 혁명’인가 ‘영국 내전’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토론을 거쳤다. 우리가 보는 혁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배 세력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만이 혁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17세기 중반 영국을 해석한다면, 이는 ‘혁명’이라기보다는 ‘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한 주체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주의적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의회파나 왕당파라고 하는 다소 구조적인 파당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 교차하고 중복된다는 점에서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당시의 대립된 두 세력을 귀족과 지주를 포함한 왕당파 세력, 그리고 신흥 부르주아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젠트리 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사관이 중시하는 역사단계 발전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현실을 너무 거칠게 이분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스톤과 힐 같은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두 번이나 패함으로써(1640년대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지주 엘리트, 상인 엘리트, 금융 엘리트 같은 신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을 터 주었다면서 혁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민제, 위의 책, pp. 60-61.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점은,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의회와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련의 사건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관된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각 파들이 종교를 빌미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고 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는 의회가 무능력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있어서, 휘그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만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혁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혁명으로 인해 의회가 절대주의적 왕권에 승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혁명’ 전에도 왕권은 의회에 의해 견제되었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명’ 전에도 절대주의 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의회의 정치적 권력이 ‘혁명’ 후에 더욱 강해졌다고 파악하는 것만이 옳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단지 정치적 권력의 강화라고 풀이할 수는 있을 지언즉 혁명이라고 말한 만큼의 급격한 정치적 전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17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혁명’이라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내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왕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 또한 공화정의 경험 등은 이후의 영국 역사에서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 절대주의적 왕권의 출현을 방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의 선구자로 평가 받게 되는 계기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세력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문헌
김민제,《영국 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1998.
김민제, <의회와 \'영국 내전\' (English Civil War) - 휘그, 수정주의, 후-수정주의 해석>. 《서양사론》42, 1994
나종일, <지방 Gentry와 영국혁명>,《역사학보》40, 1968.
김중낙, <영국혁명과 잉글랜드 혁명 : 수정주의의 한계와 극복>, 《역사교육논집 제23,24합집》, 1999.
나종일, <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종교와 정치 - 장기의회의 장노파와 독립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82, 1979.
김창민,, 《사총》32, 1987.
이태숙, <17세기 영국 내전의 부르주아 혁명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 《역사학보》153, 1997.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휘그-마르크스주의적 해석과 수정주의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휘그-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들은 긍정적인 의미를 투영시켜 ‘영국 혁명’이라고 부른다. 반면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영국 내란’ 또는 ‘내전’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혁명’이라는 개념을 기존 세력과 또 다른 그에 대립되는 신 세력이 존재할 때, 기존 세력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신 세력이 전복시켜서 권력 구도를 변환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휘그-마르크스주의적 역사가들은 당연히 왕과 왕의 추종 세력 혹은 귀족들이라는 기존 세력에 대항하여 영국민을 대표하는 혹은 신흥 경제계급 세력이 기존 권력 구도를 전복시켜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명칭하였다. 반면에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혁명이라고 보지 않는다.
첫째는 기존 세력과 신 세력이라는 두 대립된 힘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세력은 서로 교차하거나 중복되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두 대립된 세력이 애초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두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기존 세력과 신 세력 간의 권력 구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은 두 세력이 더 큰 사회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배세력으로 포괄할 수 있으며, 이 지배세력이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인 권력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정주의적 역사가들은 ‘혁명’이라는 표현보다는 ‘내전’ 혹은 ‘내란’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조는 이번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과연 ‘영국 혁명’인가 ‘영국 내전’인가에 대하여 수많은 토론을 거쳤다. 우리가 보는 혁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의 주체 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배 세력의 교체가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만이 혁명인 것이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17세기 중반 영국을 해석한다면, 이는 ‘혁명’이라기보다는 ‘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한 주체 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정주의적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의회파나 왕당파라고 하는 다소 구조적인 파당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 교차하고 중복된다는 점에서 혁명을 주도한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당시의 대립된 두 세력을 귀족과 지주를 포함한 왕당파 세력, 그리고 신흥 부르주아라고 파악할 수 있는 젠트리 세력이라고 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사관이 중시하는 역사단계 발전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현실을 너무 거칠게 이분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스톤과 힐 같은 마르크스주의 진영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분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이 두 번이나 패함으로써(1640년대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해) 지주 엘리트, 상인 엘리트, 금융 엘리트 같은 신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을 터 주었다면서 혁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민제, 위의 책, pp. 60-61.
두 번째로 보아야 할 점은,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의회와 왕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련의 사건들은 수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일관된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분열된 각 파들이 종교를 빌미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고 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는 의회가 무능력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있어서, 휘그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의회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만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혁명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혁명으로 인해 의회가 절대주의적 왕권에 승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혁명’ 전에도 왕권은 의회에 의해 견제되었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명’ 전에도 절대주의 왕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의회의 정치적 권력이 ‘혁명’ 후에 더욱 강해졌다고 파악하는 것만이 옳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단지 정치적 권력의 강화라고 풀이할 수는 있을 지언즉 혁명이라고 말한 만큼의 급격한 정치적 전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17세기 중반에 있었던 영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혁명’이라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내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왕이 처형을 당하는 사건, 또한 공화정의 경험 등은 이후의 영국 역사에서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하고 절대주의적 왕권의 출현을 방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의 선구자로 평가 받게 되는 계기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세력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문헌
김민제,《영국 혁명의 꿈과 현실》, 역민사, 1998.
김민제, <의회와 \'영국 내전\' (English Civil War) - 휘그, 수정주의, 후-수정주의 해석>. 《서양사론》42, 1994
나종일, <지방 Gentry와 영국혁명>,《역사학보》40, 1968.
김중낙, <영국혁명과 잉글랜드 혁명 : 수정주의의 한계와 극복>, 《역사교육논집 제23,24합집》, 1999.
나종일, <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종교와 정치 - 장기의회의 장노파와 독립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82, 1979.
김창민,
이태숙, <17세기 영국 내전의 부르주아 혁명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 《역사학보》153,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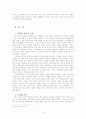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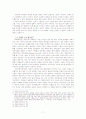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