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혁개방과 종교의 부활
1. 문제의 제기
1. 중국의 전통종교관
2.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관
3. 개혁개방 이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3. 종교에 대한 제도적 통제
Ⅳ. 개혁개방 이후 중국 종교의 부활 양상
1. 신앙 자유 회복의 법적 보장
2. 각 종교 협회의 조직 회복
3. 각 종교 활동의 회복
Ⅴ. 중국 종교 부활의 이단 파룬궁
·1. 파룬궁의 형성 배경
Ⅵ. 결론
1. 문제의 제기
1. 중국의 전통종교관
2. 사회주의 중국의 종교관
3. 개혁개방 이전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
3. 종교에 대한 제도적 통제
Ⅳ. 개혁개방 이후 중국 종교의 부활 양상
1. 신앙 자유 회복의 법적 보장
2. 각 종교 협회의 조직 회복
3. 각 종교 활동의 회복
Ⅴ. 중국 종교 부활의 이단 파룬궁
·1. 파룬궁의 형성 배경
Ⅵ. 결론
본문내용
국교회가 장악한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성직자와 교우의 세대가 교체됨에 다라 점진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천주교인의 수는 1991년 관방 자료에 의하면 360만명이나 홍콩 성신연구센터의 1996년과 1999년의 자료는 각각 1천만 명과 1천 2백만 명이었다.
기독교의 경우 1979년 중국공산당은 구 예배당을 개방하여 삼자 애국 교회에 돌려주었다. 가정교회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애국교회가 중국공산당의 종교도구라고 여기고 있어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며 삼자교회에 가입하려 하지 않아 종종 지방간부가 신도를 구류 징병 박해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교회는 해외교회와 연결되어 있어 중국 당국은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강경한 탄압을 하지는 않고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1992년에 삼자 교회가 6천 5백 개의 교회당과 2만개의 집회장소, 600만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의 신자 수는 약 6천만으로 추산된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삼자교회의 신자가 1천만에서 1천 5백만 명 가정교회가 6천만에서 8천만 명에 이른다.
이상에서 개혁개방 이후 각 종교의 사원 및 성직자수 그리고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본질적 의도와 관계없이 종교 활동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지하 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 종교관에 기초한 지하종교의 성장 역시 본질 적인 종교 활동의 회복과 다양한 발전 나아가서 중국 사회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룬궁의 출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Ⅴ. 중국 종교 부활의 이단 파룬궁
·1. 파룬궁의 형성 배경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는 1952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1970년에서 1978년 사이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201부대와 삼림경찰대에서 나팔수 등으로 복무했으며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에는 삼림경찰대 소속 초소대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1982년 이후에는 창춘 식량석유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공에 몰입, 파룬궁의 이론 체계를 갖춘 뒤 1992년부터 설법에 나섰다고 한다.
Ⅵ. 결론
중국이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는 현대화 과정으로 진입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일원적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세속화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이 국가의 목표가 되면서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정비 및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라는 전반적 틀의 전환 속에서 종교정책도 개혁개방 이전의 탄압일변도 정책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최대 선결과제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적 고려와 개혁개방 이전 시기 종교 탄압 정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삼신위기를 들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 따른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의 변화는 각 종교의 소생을 가져왔다.
위로부터의 개혁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사회변천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중국의 전체적인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미에서 종교와 사회주의 중국이 추구하는 종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정치적 공산당 통제와 경제적 시장주의라는 ‘정좌 경우’ 정책은 종교의 사회 변동적 요인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정치적으로 중국 사회를 일정부분 통제할 힘과 체제를 갖고 있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범주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종교 활성화를 통한 변혁과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산당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종교의 소생, 부활, 활성화는 결국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에서 그 단초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이 언제까지 종교를 통일전선의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도입이후 이미 사회다원화 시기에 진입했음을 인정했고 현대화 과정의 통례인 민주화의 요구를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중국 내 종교 활동의 성장이 중국 공산당 및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와 각종 사회세력 및 인민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주시하면서 중국의 사회변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 1979년 중국공산당은 구 예배당을 개방하여 삼자 애국 교회에 돌려주었다. 가정교회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애국교회가 중국공산당의 종교도구라고 여기고 있어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며 삼자교회에 가입하려 하지 않아 종종 지방간부가 신도를 구류 징병 박해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교회는 해외교회와 연결되어 있어 중국 당국은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강경한 탄압을 하지는 않고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1992년에 삼자 교회가 6천 5백 개의 교회당과 2만개의 집회장소, 600만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정교회의 신자 수는 약 6천만으로 추산된다.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삼자교회의 신자가 1천만에서 1천 5백만 명 가정교회가 6천만에서 8천만 명에 이른다.
이상에서 개혁개방 이후 각 종교의 사원 및 성직자수 그리고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중국 정부의 의지와 본질적 의도와 관계없이 종교 활동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회복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지하 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중국 정부의 종교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 종교관에 기초한 지하종교의 성장 역시 본질 적인 종교 활동의 회복과 다양한 발전 나아가서 중국 사회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룬궁의 출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Ⅴ. 중국 종교 부활의 이단 파룬궁
·1. 파룬궁의 형성 배경
파룬궁의 창시자 리홍즈는 1952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1970년에서 1978년 사이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201부대와 삼림경찰대에서 나팔수 등으로 복무했으며 1978년에서 1982년 사이에는 삼림경찰대 소속 초소대의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1982년 이후에는 창춘 식량석유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공에 몰입, 파룬궁의 이론 체계를 갖춘 뒤 1992년부터 설법에 나섰다고 한다.
Ⅵ. 결론
중국이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는 현대화 과정으로 진입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일원적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세속화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이 국가의 목표가 되면서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정비 및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라는 전반적 틀의 전환 속에서 종교정책도 개혁개방 이전의 탄압일변도 정책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최대 선결과제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전선 전술적 고려와 개혁개방 이전 시기 종교 탄압 정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삼신위기를 들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에 따른 중국 당국의 종교정책의 변화는 각 종교의 소생을 가져왔다.
위로부터의 개혁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사회변천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중국의 전체적인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제는 종교적 또는 사회적 의미에서 종교와 사회주의 중국이 추구하는 종교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정치적 공산당 통제와 경제적 시장주의라는 ‘정좌 경우’ 정책은 종교의 사회 변동적 요인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정치적으로 중국 사회를 일정부분 통제할 힘과 체제를 갖고 있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범주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종교 활성화를 통한 변혁과 변동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산당의 의지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종교의 소생, 부활, 활성화는 결국 중국 종교 정책의 변화에서 그 단초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중국이 언제까지 종교를 통일전선의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중국은 시장경제도입이후 이미 사회다원화 시기에 진입했음을 인정했고 현대화 과정의 통례인 민주화의 요구를 겪게 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중국 내 종교 활동의 성장이 중국 공산당 및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와 각종 사회세력 및 인민 개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주시하면서 중국의 사회변동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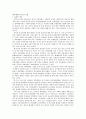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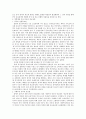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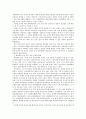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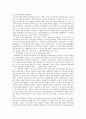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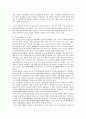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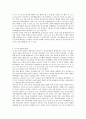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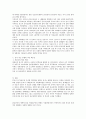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