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역개괄>
경주 남산(慶州南山)
<첫째날>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둘째날>
배리삼릉(拜理三陵)
냉골석불좌상(冷谷石佛坐像)
냉골선각육존불상(冷谷線刻六尊佛像)
냉골석조여래좌상(冷谷石佛如來坐像)
상선암(上禪庵)
상사바위
용장사지(茸長寺址)
<셋째날>
분황사(芬皇寺)
황룡사지(皇龍寺址)
<부 록>
참고자료
경주 남산(慶州南山)
<첫째날>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둘째날>
배리삼릉(拜理三陵)
냉골석불좌상(冷谷石佛坐像)
냉골선각육존불상(冷谷線刻六尊佛像)
냉골석조여래좌상(冷谷石佛如來坐像)
상선암(上禪庵)
상사바위
용장사지(茸長寺址)
<셋째날>
분황사(芬皇寺)
황룡사지(皇龍寺址)
<부 록>
참고자료
본문내용
변 약13m, 높이 약 1.06m로 크기가 제각기 다른 막돌로 쌓았다. 밑에는 상당히 큰 돌을 쌓았고 탑신 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해지고 있다. 기단 위에는 네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동물 한 마리씩을 배치하였다. 현재 탑신부는 3층까지 남아있으며 회흑색의 안산암을 작은 벽돌모양으로 잘라서 쌓았는데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간 좁다. 탑신 네 면에는 입구가 뚫려져 있는 감실을 개설하고 입구 좌우에 인왕상을 배치하였으며 두 짝의 돌문을 달아 여닫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불볍을 수호하는 신답게 막강한 힘을 느끼게 하는 조각으로 7세기 삼국 시대의 조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탑 옆에는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지금도 관광객의 목을 축여주고 있다고 한다. 우물의 겉모양은 팔각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외부의 팔각모양은 부처가 가르친 팔정도를 상징하며 내부의 원형은 원불(圓佛)의 진리를 상징한다. 고려시대에는 평장사(平章事) 한문준(韓文俊)이 지은 원효의 화쟁국사비(和諍國師碑)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원효를 기리는 비로 1101년(고려 숙종 6년)때 세워졌다. 현재는 비신을 받쳤던 비대좌가 남아 있다, 비대좌 위에 추사 김정희가 쓴 ‘차신라화쟁국사지비적(此新羅和諍國師之碑蹟)’이라는 글씨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황룡사지(皇龍寺址)
사적 제 6호
경주시 구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월성과 안압지 동쪽에 있는 황룡사는 1976년부터 7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총면적 2만여평의 동양 최대 사찰임이 밝혀졌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남문,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중심선상에 있고 중금당 좌우에 각각 회랑을 갖춘 동서 금당이 위치한 일탑삼금당의 양식이다. 황룡사에서는 가람배치를 남문3칸, 중문5칸, 목탑 7칸, 금당 9칸, 강당 11칸으로 점차 수를 늘려 아늑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황룡사가 창건된 것은 553년(진흥왕 14년)의 일이다. 불교가 공인된 이래 불심이 높았던 진흥왕은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지으려 하였다가 그 자리에 황룡이 나타나 이를 보고 절을 짓게 되었다. 진흥왕때부터 시작하여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이르러 자장의 권유에 따라 구층목탑이 착공되어 2년 뒤 완성한 황룡사는 4대왕, 93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완공되었다.
신라 역대 왕들은 이곳에서 친히 불사에 참례하였고, 외국의 사신도 자주 와서 불상에 예배하였다. 신라가 망한 후에도 여전히 중요히 여겨진 절이었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솔거가 그렸다는 이 절의 벽화 또한 유명하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성덕대왕신종보다도 4배나 크고 17년 앞서 주조된 종이 있다는 기록 또한 『삼국유사』에 남아있다.
구층목탑터(九層木塔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나라로 유학 갔던 자장(慈藏)<590~658 >이 태화못가를 지나는데 신인이 나타나 ‘황룡사에 돌아가 구층탑을 세우면 근심이 없고 태평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장이 구층탑 건립을 선덕여왕에게 건의 하자 선덕여왕은 백제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탑을 만들게 하였다. 정면과 측면은 모두 일곱 칸의 사각평면 형식이었다. 탑을 9층으로 한 것은 1층부터 일본, 중화, 오월, 탁라, 응유, 말갈, 단국, 여적, 예맥 등 아홉 개의 이웃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작에 나타난 특징은 백제의 조탑 기술의 도입이다. 미륵사 목탑을 축조한 아비지는 다시 신라 황룡사 목탑가지 조성하였다.
여러 차례 벼락과 지진 등으로 파손 되어 수리하거나 재건하였음이 『찰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종 25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황룡사 가람 전체가 불탈 때 함께 없어지고 지금은 초석과 심초석만 남았다. 심초석은 탑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층 목탑 자리는 한 변의 길이가 사방 22.2m인데 여기에 높이가 183척, 상륜부가 42척, 합해서 225척(80m)이나 되는 거대한 탑이다.
금동삼존장륙상대좌(金銅三尊丈六像臺座)
정면 9칸 측면 4칸의 금당 안에는 높이가 1장 6척이나 되는 거대한 석가여래삼존상(釋迦如來三尊像)을 중심으로 좌우에 십대 제자상, 신장상 2구가 있었다. 신라 최고 국보로 여겨졌던 금동장륙상은 <삼국유사>에도 언급이 되어있을 만큼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금당 중앙에 남아 있는 3개의 석조대석이 바로 이 금동삼존장륙상을 안치하였던 대좌이다. 대좌의 크기로 보아 불상의 크기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대좌는 자연그대로 생긱 바위의 윗면을 일단 평평하게 고른 뒤 장륙상의 발이 들어가게 홈을 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앞부분이 넓고 뒤로 갈수록 좁은 형태로 좌우 협시불의 대좌와 같은 형식이다.
관련 유물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에서는 금제합, 명문판, 염주, 청동방함, 은합 등이 나왔다. 유물로는 금동불 입상과 금봉보상불두가 있다. 황룡사 강당자리 북동쪽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례없이 큰 것이었다. 이를 통해 치미가 사용된 건물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치미는 길상과 벽사의 의미로 궁궐이나 절의 용마루 끝에 사용되던 장식기와이아.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굽지 못하고 아래위 둘로 나누어 만들어졌다. 또한 양쪽 옆면과 뒷면에 교대로 연꽃무늬와 웃는 남녀를 엇갈려 배치한 독특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경주」, 돌베개,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1991
김상현 外, 『빛깔있는 책들』「불국사」, 대원사, 1997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국립 경주박물관, 『경주의 신라유적』, 통천문화사, 1994
윤장섭 윤재신, 『석불사』, 학천, 1998
윤정렬, 『경주 남산, 둘』, 대원사, 1989
신영훈, 『경주 남산』, 조선일보사, 1999
박흥국 안장헌,『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 한길아트, 2002
『99년도 추계 정기 답사지』, 중앙대학교 사학과, 1999
참고 사이트
http://100.naver.com
http://www.kjnamsan.co.kr
탑 옆에는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데 이는 신라시대에 만든 것으로 지금도 관광객의 목을 축여주고 있다고 한다. 우물의 겉모양은 팔각이고 내부는 원형이다. 외부의 팔각모양은 부처가 가르친 팔정도를 상징하며 내부의 원형은 원불(圓佛)의 진리를 상징한다. 고려시대에는 평장사(平章事) 한문준(韓文俊)이 지은 원효의 화쟁국사비(和諍國師碑)가 건립되었는데 이는 원효를 기리는 비로 1101년(고려 숙종 6년)때 세워졌다. 현재는 비신을 받쳤던 비대좌가 남아 있다, 비대좌 위에 추사 김정희가 쓴 ‘차신라화쟁국사지비적(此新羅和諍國師之碑蹟)’이라는 글씨만 희미하게 남아있다.
황룡사지(皇龍寺址)
사적 제 6호
경주시 구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월성과 안압지 동쪽에 있는 황룡사는 1976년부터 7년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총면적 2만여평의 동양 최대 사찰임이 밝혀졌다.
황룡사의 가람배치는 남쪽에서부터 차례로 남문, 중문, 탑, 금당, 강당이 중심선상에 있고 중금당 좌우에 각각 회랑을 갖춘 동서 금당이 위치한 일탑삼금당의 양식이다. 황룡사에서는 가람배치를 남문3칸, 중문5칸, 목탑 7칸, 금당 9칸, 강당 11칸으로 점차 수를 늘려 아늑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황룡사가 창건된 것은 553년(진흥왕 14년)의 일이다. 불교가 공인된 이래 불심이 높았던 진흥왕은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지으려 하였다가 그 자리에 황룡이 나타나 이를 보고 절을 짓게 되었다. 진흥왕때부터 시작하여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이르러 자장의 권유에 따라 구층목탑이 착공되어 2년 뒤 완성한 황룡사는 4대왕, 93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완공되었다.
신라 역대 왕들은 이곳에서 친히 불사에 참례하였고, 외국의 사신도 자주 와서 불상에 예배하였다. 신라가 망한 후에도 여전히 중요히 여겨진 절이었으나 1238년(고려 고종 25년)몽고군에 의해 불타버렸다.
솔거가 그렸다는 이 절의 벽화 또한 유명하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성덕대왕신종보다도 4배나 크고 17년 앞서 주조된 종이 있다는 기록 또한 『삼국유사』에 남아있다.
구층목탑터(九層木塔址)
『삼국유사』에 의하면 당나라로 유학 갔던 자장(慈藏)<590~658 >이 태화못가를 지나는데 신인이 나타나 ‘황룡사에 돌아가 구층탑을 세우면 근심이 없고 태평할 것이다.’고 하였다.
자장이 구층탑 건립을 선덕여왕에게 건의 하자 선덕여왕은 백제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탑을 만들게 하였다. 정면과 측면은 모두 일곱 칸의 사각평면 형식이었다. 탑을 9층으로 한 것은 1층부터 일본, 중화, 오월, 탁라, 응유, 말갈, 단국, 여적, 예맥 등 아홉 개의 이웃나라로부터 시달림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작에 나타난 특징은 백제의 조탑 기술의 도입이다. 미륵사 목탑을 축조한 아비지는 다시 신라 황룡사 목탑가지 조성하였다.
여러 차례 벼락과 지진 등으로 파손 되어 수리하거나 재건하였음이 『찰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종 25년 몽고군의 침입으로 황룡사 가람 전체가 불탈 때 함께 없어지고 지금은 초석과 심초석만 남았다. 심초석은 탑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층 목탑 자리는 한 변의 길이가 사방 22.2m인데 여기에 높이가 183척, 상륜부가 42척, 합해서 225척(80m)이나 되는 거대한 탑이다.
금동삼존장륙상대좌(金銅三尊丈六像臺座)
정면 9칸 측면 4칸의 금당 안에는 높이가 1장 6척이나 되는 거대한 석가여래삼존상(釋迦如來三尊像)을 중심으로 좌우에 십대 제자상, 신장상 2구가 있었다. 신라 최고 국보로 여겨졌던 금동장륙상은 <삼국유사>에도 언급이 되어있을 만큼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금당 중앙에 남아 있는 3개의 석조대석이 바로 이 금동삼존장륙상을 안치하였던 대좌이다. 대좌의 크기로 보아 불상의 크기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대좌는 자연그대로 생긱 바위의 윗면을 일단 평평하게 고른 뒤 장륙상의 발이 들어가게 홈을 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앞부분이 넓고 뒤로 갈수록 좁은 형태로 좌우 협시불의 대좌와 같은 형식이다.
관련 유물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에서 발견된 사리 장엄구에서는 금제합, 명문판, 염주, 청동방함, 은합 등이 나왔다. 유물로는 금동불 입상과 금봉보상불두가 있다. 황룡사 강당자리 북동쪽에서 출토된 대형 치미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례없이 큰 것이었다. 이를 통해 치미가 사용된 건물이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치미는 길상과 벽사의 의미로 궁궐이나 절의 용마루 끝에 사용되던 장식기와이아. 워낙 크기 때문에 한 번에 굽지 못하고 아래위 둘로 나누어 만들어졌다. 또한 양쪽 옆면과 뒷면에 교대로 연꽃무늬와 웃는 남녀를 엇갈려 배치한 독특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경주」, 돌베개,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원, 1991
김상현 外, 『빛깔있는 책들』「불국사」, 대원사, 1997
황수영,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국립 경주박물관, 『경주의 신라유적』, 통천문화사, 1994
윤장섭 윤재신, 『석불사』, 학천, 1998
윤정렬, 『경주 남산, 둘』, 대원사, 1989
신영훈, 『경주 남산』, 조선일보사, 1999
박흥국 안장헌,『신라의 마음 경주 남산』, 한길아트, 2002
『99년도 추계 정기 답사지』, 중앙대학교 사학과, 1999
참고 사이트
http://100.naver.com
http://www.kjnamsa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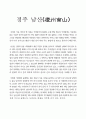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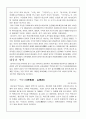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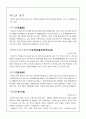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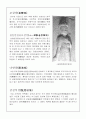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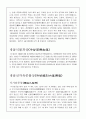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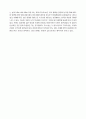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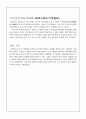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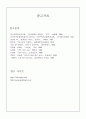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