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경전(經典, scripture)의 의미
1.1 경의 의미
2.경전의 성립-불경의 결집
2.1 경전의 형식
2.2 불경의 結集
3.寫經
3.1 寫經의 참뜻
3.2寫經의 대상(對象)
3.3 신앙의식(信仰儀式)
3.4寫經을 통한 수행(修行)과 그 공덕(功德)
3.5대장경과 경전의 서사
3.6금자, 은자 경전들
4. 참고사항
4.1 일체경(一切經)이란?
4.2불교(佛敎, Buddhism])란 ?
4.3 인도불교사 연표
5. 불교용어 및 해설
1.1 경의 의미
2.경전의 성립-불경의 결집
2.1 경전의 형식
2.2 불경의 結集
3.寫經
3.1 寫經의 참뜻
3.2寫經의 대상(對象)
3.3 신앙의식(信仰儀式)
3.4寫經을 통한 수행(修行)과 그 공덕(功德)
3.5대장경과 경전의 서사
3.6금자, 은자 경전들
4. 참고사항
4.1 일체경(一切經)이란?
4.2불교(佛敎, Buddhism])란 ?
4.3 인도불교사 연표
5. 불교용어 및 해설
본문내용
·중서게(重誓偈), 《법화경(法華經)》의 여래수량품게(如來壽量品偈) ·보문품게(普門品偈) 등 불교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게들이 있다.
3구분교, 십이분교: 부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이나 서술의 형식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12부경(部經)이라고도 한다. 이 분류법은 불경의 최초 편찬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① 경:계경이라고도 한다. 산문(散文)에 의하여 설교된 가르침의 요강, 즉 사상적으로 그 뜻을 완전히 갖춘 경문(經文)을 말한다. 수트라(修多羅). ② 중송(重頌):응숭(應頌)이라고도 한다. 경(수트라)을 게송(偈頌)으로써 재설(再說)한 것으로 운을 붙이지 않은 시체 형식이며, 산문으로 된 본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게야(geya, 祗夜). ③ 수기(授記):기별(記別)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나, 그 미래에 대해서 기설(記說)한 것이다. 즉 부처가 제자들에게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성불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경문의 부분이다. 뱌카라나(vykarana, 和伽羅那). ④ 고기송(孤起頌):송(頌)·풍송(諷頌)이라고도 한다. 가르침을 게송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본문과는 관계없이 노래한 운문을 말한다. 가타(gtha, 伽陀). ⑤ 무문자설(無問自說):자설(自說)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부처가 우희(憂喜)의 감흥에 의해서 스스로 설법한 것, 즉 부처가 체험한 감격을 누구의 질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설한 경전을 말한다. 우다나(udna, 優陀那). ⑥ 인연(因緣):연기(緣起)라고도 한다. 경이나 율이 설법된 연유를 밝힌 것이다. 즉 어떤 경전을 설법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서술한 부분을 말한다. 니다나(nidna, 尼陀那). ⑦ 비유(譬喩):부처 이외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과거세(過去世) 이야기이다. 즉 경전 가운데서 비유나 우언(寓言)으로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을 말한다. 아바다나(avadna, 阿波陀那). ⑧ 여시어(如是語):<이와 같이 세존(世尊)은 설법하였다>라고 시작되는 부분, 즉 경전의 첫머리의 <여시아문(如是我聞)>, 곧 <이와같이 내가 들었노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 속에는 부처가 이와 같이 설법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과거세 이야기의 한 가지로 보는 전승도 있음)·이티브리타카(itivrttaka, 伊帝目多伽). ⑨ 본생(本生):부처의 전생 이야기, 즉 부처가 전생에 수행하였던 이야기를 적은 경문을 말한다. 자타카(jtaka). ⑩ 방광(方廣):방등(方等)이라고도 한다. 심원한 법의(法義)를 넓게 설법한 것이다. 즉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깊고 넓게 확대, 심화시켜 가는 철학적 내용의 성격을 띤 경문을 말한다. 바이풀랴(vaipulya, 昆佛略). ⑪ 미증유법(未曾有法):희법(稀法)이라고도 한다. 부처나 불제자들의 공덕이 희유(稀有)·
최승(最勝)인 것을 설법한 것, 즉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말한 부분이다. ⑫ 논의(論議):부처의 가르침을 논의·해설한 것, 즉 해석하고 논술한 연구논문 형식의 경문을 말하는데, 부처가 논의하고 문답하여 온갖 법의 내용을 명백히 밝힌 부분이다. 9분교(또는 9부경)는 이상에서 ⑥ ⑦ ⑫ 를 제외한 것, 또는 ⑥ 대신에 ⑤ 나 ⑨ 나 ⑪ 을 제외하는 것 등 몇 가지의 전승이 있다.
4오부사아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석존의 설법을 모아서 분류한 원시경전이다. 여기서 오부는 오아함(五阿含)을 뜻하며, 남방불교에서 전하는 팔리어와 인도어로 쓰였고, 사아함은 한역된 것이다. 오부와 사아함은 유사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오부(五部) 사아함(四阿含)
장부(長部) 장아함(長阿含)
중부(中部) 중아함(中阿含)
상응부(相應部) 잡아함(雜阿含)
증지부(增支部) 증일아함(增一阿含)
소부(小部) [잡장(雜藏)]
5경장(經藏): 부처의 교의(敎義)를 집성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 직후에 열린 제 1 결집(結集)에서였다. 가섭(迦葉)이 초집하고 우바리(優婆離)가 율(律)을, 아난다(阿難陀)가 교법을 편집했는데, 500여 명의 비구(比丘)가 모였으므로 오백결집이라고도 한다. 제 2 결집은 불멸(석가모니의 열반) 100년 후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며, 칠백결집이라고도 한다. 제 3 결집은 불멸 200년 후 아소카왕 18년에 이루어졌으며, 천인결집(千人結集)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비로소 문자화되었다. 제 4결집은 2세기 무렵 카니슈카왕 아래 파르시바·바수미트라를 중심으로 3장(藏)을 편집했다.
6율장(律藏): 부처가 제정한 교단생활의 규칙이며 계본(戒本)·건도부·경분별(經分別)·부수(附隨)로 이루어진다. 율장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 직후 제 1 결집 때의 일이며, 이때 결집된 율이 그 후 점차 정리, 조직되어 오늘에 전해진 율장이 되었다.
7논장(論藏): 제자들이 경설(經說)을 조직화하고 대계화(大系化)한 논의를 설하는 것으로 아비달마장(阿毘達磨藏)·아비담장(阿毘曇藏)이라고도 한다. 초기의 것으로는 팔리어(語)의 칠론서(七論書), 한역(漢譯)의 육족론(六足論)·발지론(發智論) 등을 들 수 있다.
*삼장(三藏, Tri-Pitaka):경(經)·율(律)·논(論)의 세 불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불경에는 경(經)·율(律)·논(論)의 3가지가 있는데 석가의 가르침을 경(經)이라 하고, 석가가 가르친 윤리·도덕적인 실천규범을 율이라 하며, 석가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철학 체계를 논(論)이라고 한다. 장이란 이것을 간직하여 담고 있는 광주리를 뜻한다.
이 3가지를 모은 것을 각각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이라 하며, 이를 총칭한 것이 삼장이다. 또 경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강사(講師),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율사(律師), 논장을 짓거나 가르치는 스승을 논사(論師)라고 한다. 처음에는 석가의 제자들이 이들 경전을 패엽(貝葉:pattra)이라는 나뭇잎에 새겼는데, 경장·율장·논장을 3개의 광주리에 따로 담아 보관하였으므로 3개의 광주리를 뜻하는 삼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3구분교, 십이분교: 부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이나 서술의 형식에 따라 12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12부경(部經)이라고도 한다. 이 분류법은 불경의 최초 편찬과 더불어 이루어진 것이다. ① 경:계경이라고도 한다. 산문(散文)에 의하여 설교된 가르침의 요강, 즉 사상적으로 그 뜻을 완전히 갖춘 경문(經文)을 말한다. 수트라(修多羅). ② 중송(重頌):응숭(應頌)이라고도 한다. 경(수트라)을 게송(偈頌)으로써 재설(再說)한 것으로 운을 붙이지 않은 시체 형식이며, 산문으로 된 본문의 뜻을 거듭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게야(geya, 祗夜). ③ 수기(授記):기별(記別)이라고도 한다. 부처가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나, 그 미래에 대해서 기설(記說)한 것이다. 즉 부처가 제자들에게 다음 세상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성불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경문의 부분이다. 뱌카라나(vykarana, 和伽羅那). ④ 고기송(孤起頌):송(頌)·풍송(諷頌)이라고도 한다. 가르침을 게송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본문과는 관계없이 노래한 운문을 말한다. 가타(gtha, 伽陀). ⑤ 무문자설(無問自說):자설(自說)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부처가 우희(憂喜)의 감흥에 의해서 스스로 설법한 것, 즉 부처가 체험한 감격을 누구의 질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설한 경전을 말한다. 우다나(udna, 優陀那). ⑥ 인연(因緣):연기(緣起)라고도 한다. 경이나 율이 설법된 연유를 밝힌 것이다. 즉 어떤 경전을 설법하게 된 사정이나 동기 등을 서술한 부분을 말한다. 니다나(nidna, 尼陀那). ⑦ 비유(譬喩):부처 이외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과거세(過去世) 이야기이다. 즉 경전 가운데서 비유나 우언(寓言)으로 교리를 해석하고 설명한 부분을 말한다. 아바다나(avadna, 阿波陀那). ⑧ 여시어(如是語):<이와 같이 세존(世尊)은 설법하였다>라고 시작되는 부분, 즉 경전의 첫머리의 <여시아문(如是我聞)>, 곧 <이와같이 내가 들었노라>라고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말 속에는 부처가 이와 같이 설법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다만 과거세 이야기의 한 가지로 보는 전승도 있음)·이티브리타카(itivrttaka, 伊帝目多伽). ⑨ 본생(本生):부처의 전생 이야기, 즉 부처가 전생에 수행하였던 이야기를 적은 경문을 말한다. 자타카(jtaka). ⑩ 방광(方廣):방등(方等)이라고도 한다. 심원한 법의(法義)를 넓게 설법한 것이다. 즉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더 깊고 넓게 확대, 심화시켜 가는 철학적 내용의 성격을 띤 경문을 말한다. 바이풀랴(vaipulya, 昆佛略). ⑪ 미증유법(未曾有法):희법(稀法)이라고도 한다. 부처나 불제자들의 공덕이 희유(稀有)·
최승(最勝)인 것을 설법한 것, 즉 경전 가운데 불가사의한 일을 말한 부분이다. ⑫ 논의(論議):부처의 가르침을 논의·해설한 것, 즉 해석하고 논술한 연구논문 형식의 경문을 말하는데, 부처가 논의하고 문답하여 온갖 법의 내용을 명백히 밝힌 부분이다. 9분교(또는 9부경)는 이상에서 ⑥ ⑦ ⑫ 를 제외한 것, 또는 ⑥ 대신에 ⑤ 나 ⑨ 나 ⑪ 을 제외하는 것 등 몇 가지의 전승이 있다.
4오부사아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으로, 석존의 설법을 모아서 분류한 원시경전이다. 여기서 오부는 오아함(五阿含)을 뜻하며, 남방불교에서 전하는 팔리어와 인도어로 쓰였고, 사아함은 한역된 것이다. 오부와 사아함은 유사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오부(五部) 사아함(四阿含)
장부(長部) 장아함(長阿含)
중부(中部) 중아함(中阿含)
상응부(相應部) 잡아함(雜阿含)
증지부(增支部) 증일아함(增一阿含)
소부(小部) [잡장(雜藏)]
5경장(經藏): 부처의 교의(敎義)를 집성한 것이다. 불교의 경전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 직후에 열린 제 1 결집(結集)에서였다. 가섭(迦葉)이 초집하고 우바리(優婆離)가 율(律)을, 아난다(阿難陀)가 교법을 편집했는데, 500여 명의 비구(比丘)가 모였으므로 오백결집이라고도 한다. 제 2 결집은 불멸(석가모니의 열반) 100년 후 바이샬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며, 칠백결집이라고도 한다. 제 3 결집은 불멸 200년 후 아소카왕 18년에 이루어졌으며, 천인결집(千人結集)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비로소 문자화되었다. 제 4결집은 2세기 무렵 카니슈카왕 아래 파르시바·바수미트라를 중심으로 3장(藏)을 편집했다.
6율장(律藏): 부처가 제정한 교단생활의 규칙이며 계본(戒本)·건도부·경분별(經分別)·부수(附隨)로 이루어진다. 율장이 최초로 성립된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 직후 제 1 결집 때의 일이며, 이때 결집된 율이 그 후 점차 정리, 조직되어 오늘에 전해진 율장이 되었다.
7논장(論藏): 제자들이 경설(經說)을 조직화하고 대계화(大系化)한 논의를 설하는 것으로 아비달마장(阿毘達磨藏)·아비담장(阿毘曇藏)이라고도 한다. 초기의 것으로는 팔리어(語)의 칠론서(七論書), 한역(漢譯)의 육족론(六足論)·발지론(發智論) 등을 들 수 있다.
*삼장(三藏, Tri-Pitaka):경(經)·율(律)·논(論)의 세 불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불경에는 경(經)·율(律)·논(論)의 3가지가 있는데 석가의 가르침을 경(經)이라 하고, 석가가 가르친 윤리·도덕적인 실천규범을 율이라 하며, 석가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철학 체계를 논(論)이라고 한다. 장이란 이것을 간직하여 담고 있는 광주리를 뜻한다.
이 3가지를 모은 것을 각각 경장(經藏)·율장(律藏)·논장(論藏)이라 하며, 이를 총칭한 것이 삼장이다. 또 경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강사(講師),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을 율사(律師), 논장을 짓거나 가르치는 스승을 논사(論師)라고 한다. 처음에는 석가의 제자들이 이들 경전을 패엽(貝葉:pattra)이라는 나뭇잎에 새겼는데, 경장·율장·논장을 3개의 광주리에 따로 담아 보관하였으므로 3개의 광주리를 뜻하는 삼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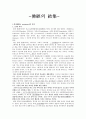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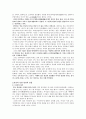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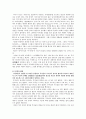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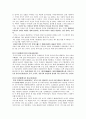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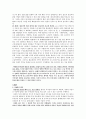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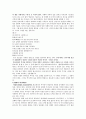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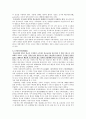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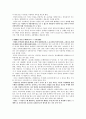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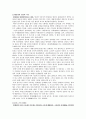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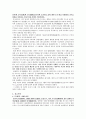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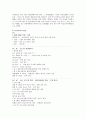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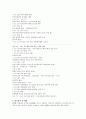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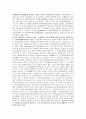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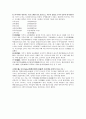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