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광개토왕릉비의 硏究에 關하여
1. 능비(陵碑)가 발견되어 비문(碑文)이 공개되기까지
2. 비문 연구의 진전
3. 전후(戰後)의 비문 연구 - 李進熙의 비문변조설을 중심으로
4. 비문 연구의 문제점
Ⅲ. 광개토왕릉비의 內容에 關하여
1. 신묘년(辛卯年) 기사
2. 광개토대왕릉비에서 보이는 수묘제(守墓制)
3. 광개토대왕비에 나타난 대외관계
Ⅳ. 광개토왕릉비의 世界性에 關하여
Ⅲ. 결론
Ⅱ. 광개토왕릉비의 硏究에 關하여
1. 능비(陵碑)가 발견되어 비문(碑文)이 공개되기까지
2. 비문 연구의 진전
3. 전후(戰後)의 비문 연구 - 李進熙의 비문변조설을 중심으로
4. 비문 연구의 문제점
Ⅲ. 광개토왕릉비의 內容에 關하여
1. 신묘년(辛卯年) 기사
2. 광개토대왕릉비에서 보이는 수묘제(守墓制)
3. 광개토대왕비에 나타난 대외관계
Ⅳ. 광개토왕릉비의 世界性에 關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하였다. 이때의 국제 정세는 고구려-신라, 백제-임나가라-왜의 대립구도였는데, 이를 계기로 고구려와 신라의 조공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③ 고구려-왜의 관계
능비문의 고구려-왜의 관계기사는 한일 양국에 있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고구려의 왜에 대한 토벌 작전은 오히려 성격이 명확하다. 고구려의 남진에 있어 왜는 백제, 신라와는 달리 복속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면 당시 왜는 고정된 거점이 있었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에 있어 정복의 주요 대상은 백제, 신라, 동부여였으며, 왜와 비려 등은 부수적인 대상으로 단지 토멸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Ⅳ. 광개토왕릉비의 世界性에 關하여
중국에서는 한 대(漢代) 건안(建安) 10년(205)을 시작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걸쳐 시행된 묘전금비령(墓前禁碑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진에서 남북조까지 남아있는 비문자료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비(禁碑)풍조가 고구려에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이 능비의 “自上祖先以來 墓上不安石碑”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질서로 보아 중국의 여러 국가보다 광대한 영토를 장학하고 높은 문화와 매우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고 있던 고구려는 중국 중원의 삼국분란이나 위진 교체기, 또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기의 혼란한 중국을 넘볼 수 있었던 동북아의 패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인 광개토왕이나 그 아들 장수왕이 중국의 금법(禁法)을 그리 크게 중시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장수왕은 상조선왕(上祖先王) 이래로 처음이면서도 동북아에서 최대의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념비는 지금까지도 동북아에서 최대의 것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 능비와 관계있는 연구 논문 중에 나진옥의 「高麗好太王碑跋」(1909)에서는 이 능비가 해동 고각(古刻)의 으뜸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水谷悌二郞도 “중국 고비(古碑)가 호태왕비의 거대함만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중희는 “금석문은 경사(經史)를 돕는 데 있으며 …… 이 두 편의 문자는 서로 선후하며 영광을 드높이면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능비문의 서법과 비의 존재 가치를 칭송하였지만 이는 분에 넘치는 찬사만은 아니다. 이 능비는 비신(碑身)의 위려함, 서체의 질박함, 비문의 호방함, 그리고 자품(字品)의 근엄함뿐만 아니라 도처에 독창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거대한 광개토왕비의 문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법재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방 금석학(金石學)상에서도 매우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능비문은 서법사(書法史)상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Ⅴ. 결론
광개토왕릉비는 광개토왕의 훈적(勳績)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능비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1880년경에 능비가 재발견된 이래 1백년이 넘도록 한ㆍ중ㆍ일 3국 역사학계에서는 이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다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비문 연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한 일본학계의 자기만족적인 안이한 태도로 말미암아 비문 연구는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1950년대 후반 이래 비문의 탁본들에 대한 비교 검토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비문 재검토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으며, 이로써 지난날의 정체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문 연구열이 갑자기 고조되어 한일 양국 학계에서 격심한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양국 학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도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비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판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현재 비면에 석회를 바르기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탁본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판별하는 문제를 놓고서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의 정복 사업 내용 중 전반적으로 역사지리 문제의 암초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른바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진 연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그 조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명과 관련하여 당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세계의 국제관계를 구명하는 노력이 긴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수묘인 연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왕릉을 지키는 묘지기의 사회신분을 규정하는 작업은 필경 고구려 사회의 내부적 발전에 대한 깊은 인식 아래 그와 결부시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광개토왕의 정복전쟁이 고구려의 역사발전단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를 추구하는 작업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구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광개토왕릉비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점들은 장차 역사학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비문에 대한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 학자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에도 사로잡힘이 없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손영종,《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중심, 2001
안춘배,〈광개토대왕릉비문 연구(1)-비석의 문단과 해석을 중심으로〉,《고고역사학지》8,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2
이형구,〈광개토왕릉비 연구-소위 신묘전기사와 경자년기사를 중심으로〉《국사관론집》45, 국사편찬위원회, 1993
임기환,〈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천관우,〈광개토왕의 정복활동〉,《한국사시민강좌》3, 일조각, 1987
이기동,〈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百濟關係記事의 檢討〉,《百濟硏究》, 충남대학교 박물관, 1986
③ 고구려-왜의 관계
능비문의 고구려-왜의 관계기사는 한일 양국에 있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고구려의 왜에 대한 토벌 작전은 오히려 성격이 명확하다. 고구려의 남진에 있어 왜는 백제, 신라와는 달리 복속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면 당시 왜는 고정된 거점이 있었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에 있어 정복의 주요 대상은 백제, 신라, 동부여였으며, 왜와 비려 등은 부수적인 대상으로 단지 토멸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점이다.
Ⅳ. 광개토왕릉비의 世界性에 關하여
중국에서는 한 대(漢代) 건안(建安) 10년(205)을 시작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걸쳐 시행된 묘전금비령(墓前禁碑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진에서 남북조까지 남아있는 비문자료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비(禁碑)풍조가 고구려에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이 능비의 “自上祖先以來 墓上不安石碑”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질서로 보아 중국의 여러 국가보다 광대한 영토를 장학하고 높은 문화와 매우 안정된 생활을 영유하고 있던 고구려는 중국 중원의 삼국분란이나 위진 교체기, 또는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 시기의 혼란한 중국을 넘볼 수 있었던 동북아의 패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사자인 광개토왕이나 그 아들 장수왕이 중국의 금법(禁法)을 그리 크게 중시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장수왕은 상조선왕(上祖先王) 이래로 처음이면서도 동북아에서 최대의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념비는 지금까지도 동북아에서 최대의 것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이 능비와 관계있는 연구 논문 중에 나진옥의 「高麗好太王碑跋」(1909)에서는 이 능비가 해동 고각(古刻)의 으뜸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水谷悌二郞도 “중국 고비(古碑)가 호태왕비의 거대함만은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오중희는 “금석문은 경사(經史)를 돕는 데 있으며 …… 이 두 편의 문자는 서로 선후하며 영광을 드높이면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 능비문의 서법과 비의 존재 가치를 칭송하였지만 이는 분에 넘치는 찬사만은 아니다. 이 능비는 비신(碑身)의 위려함, 서체의 질박함, 비문의 호방함, 그리고 자품(字品)의 근엄함뿐만 아니라 도처에 독창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거대한 광개토왕비의 문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서법재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동방 금석학(金石學)상에서도 매우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능비문은 서법사(書法史)상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Ⅴ. 결론
광개토왕릉비는 광개토왕의 훈적(勳績)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능비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1880년경에 능비가 재발견된 이래 1백년이 넘도록 한ㆍ중ㆍ일 3국 역사학계에서는 이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왔다. 다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비문 연구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한 일본학계의 자기만족적인 안이한 태도로 말미암아 비문 연구는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1950년대 후반 이래 비문의 탁본들에 대한 비교 검토가 본격화되면서부터 비문 재검토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으며, 이로써 지난날의 정체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문 연구열이 갑자기 고조되어 한일 양국 학계에서 격심한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양국 학계를 사로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도 미해결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비문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판독문을 작성하는 일이다. 현재 비면에 석회를 바르기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탁본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진위를 판별하는 문제를 놓고서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비문에 보이는 광개토왕의 정복 사업 내용 중 전반적으로 역사지리 문제의 암초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른바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진 연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그 조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명과 관련하여 당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세계의 국제관계를 구명하는 노력이 긴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수묘인 연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왕릉을 지키는 묘지기의 사회신분을 규정하는 작업은 필경 고구려 사회의 내부적 발전에 대한 깊은 인식 아래 그와 결부시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지금은 아직 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지만, 광개토왕의 정복전쟁이 고구려의 역사발전단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를 추구하는 작업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구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광개토왕릉비문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이같은 문제점들은 장차 역사학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비문에 대한 연구는 한ㆍ중ㆍ일 3국 학자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에도 사로잡힘이 없이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는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손영종,《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중심, 2001
안춘배,〈광개토대왕릉비문 연구(1)-비석의 문단과 해석을 중심으로〉,《고고역사학지》8,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2
이형구,〈광개토왕릉비 연구-소위 신묘전기사와 경자년기사를 중심으로〉《국사관론집》45, 국사편찬위원회, 1993
임기환,〈광개토왕비의 국연과 간연〉,《역사와 현실》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천관우,〈광개토왕의 정복활동〉,《한국사시민강좌》3, 일조각, 1987
이기동,〈廣開土王陵碑文에 보이는 百濟關係記事의 檢討〉,《百濟硏究》, 충남대학교 박물관,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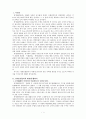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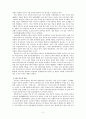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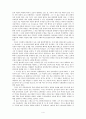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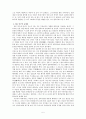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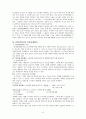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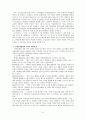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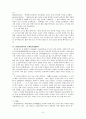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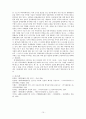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