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운문 작품
척독(편지글)작품
산문작품
산문작품 중 사물을 벗 삼은 작품
나오는 말
[참고자료]
운문 작품
척독(편지글)작품
산문작품
산문작품 중 사물을 벗 삼은 작품
나오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그가 기른 곡식과 화초가 날로 번성하여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권근은 김씨가 삼은 이 세 가지 벗이야 말로 공자가 말한 유익한 벗이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이 물욕에 사로잡힌 지 오래되어 어떻게 하면 유익한 벗의 힘을 빌려 자신의 마음 밭에 자란 가시덤불을 벨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그런데 삽과 칼과 낫은 물건들 중에서도 제일 보잘 것 없는 물건이다. 쳐다보아도 눈을 즐겁게 하지 못하며, 사용해도 근심을 풀어 주지 못하니, 사람으로 말한다면 하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감히 벗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벗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의 인격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 나의 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도를 가진 사람을 벗하면 나의 덕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벗하면 그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귀하고 천함이 다르더라도 참으로 도가 같고 뜻이 일치한다면 모두 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이 악을 미워하는 데 있고 저들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내가 그 힘을 빌려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을 벗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대게 곡식을 가꾸는 사람은 반드시 가리지를 제거하고, 난초와 혜초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부터 잘라내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물욕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를 제거해야 하는 법이다. (중략) 그런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벗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농기구는 벗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 위 부분은 권근이 삽과 칼과 낫이 왜 벗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다. 권근은 세 벗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벗이라 여겨 유익한 벗이라고 하였다. 마음에 담긴 물욕과 추악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농기구가 잡초를 잘라내 주는 것에 빗대어 생각한 것이다. 앞의 작품이었던 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사물을 벗 삼아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자신의 내면과 연결 지어 깊은 깨달음을 찾고 있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벗이 과연 유익한 벗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온 듯하다. 그리고 유익한 벗이라 여겼을 땐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벗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본받기에 노력했던 것 같다. 삼우설(三友說)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도구로만 여겼던 농기구를 통해 농기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적인 의미를 찾고 농기구를 벗하여 마음까지도 다스리고자 했던 숨겨진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본다.
□ 나오는 말
친구, 우정, 만남이라는 너무도 친숙한 주제들의 고전 작품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학교를 거치며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우정을 쌓아왔다. 곁에 있는 친구의 존재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도 했던 우정에 대해 고전을 접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숙하게 생각해보았다. 이 고전들을 접하면서 과연 친구란, 우정이란 무엇일까 라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우리 주변에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저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고전작품을 이런 친숙한 주제로 접하게 되니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참고자료]
*(국역)청장관 전서 - 이덕무,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집
*책에 미친 바보(이덕무 산문선) - 이덕무 지음, 권정원 옮김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 - 김지용 지음
*박지원 작품집(1) - 역사 홍기문, 문예출판사
*가요집(2) - 김상훈 저, 한국문화사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연암 박지원이 가족과 벗에게 보낸 편지 - 박지원 지음, 박희병 옮김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 강희맹외 지음, 손광성, 임종대, 김경수 (공)편역
*나는 껄걸 선생이라오 - 박지원, 홍기문 옮김
*비슷한 것은 가짜다 - 정민 저
*한국 고전문학 입문 - 박기석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의식 - 한국학연구소 편
*동명왕의 노래 - 이규보 지음, 김상훈 외 옮김, 보리
*궁핍한 날의 벗 - 박제가 지음, 안대희 옮김, 태학사
「그런데 삽과 칼과 낫은 물건들 중에서도 제일 보잘 것 없는 물건이다. 쳐다보아도 눈을 즐겁게 하지 못하며, 사용해도 근심을 풀어 주지 못하니, 사람으로 말한다면 하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감히 벗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벗이란 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의 인격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다 나의 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도를 가진 사람을 벗하면 나의 덕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벗하면 그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비록 귀하고 천함이 다르더라도 참으로 도가 같고 뜻이 일치한다면 모두 나의 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이 악을 미워하는 데 있고 저들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내가 그 힘을 빌려서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들을 벗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대게 곡식을 가꾸는 사람은 반드시 가리지를 제거하고, 난초와 혜초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부터 잘라내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물욕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간사한 무리를 제거해야 하는 법이다. (중략) 그런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벗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농기구는 벗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 위 부분은 권근이 삽과 칼과 낫이 왜 벗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부분이다. 권근은 세 벗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벗이라 여겨 유익한 벗이라고 하였다. 마음에 담긴 물욕과 추악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을 농기구가 잡초를 잘라내 주는 것에 빗대어 생각한 것이다. 앞의 작품이었던 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사물을 벗 삼아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자신의 내면과 연결 지어 깊은 깨달음을 찾고 있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벗이 과연 유익한 벗일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온 듯하다. 그리고 유익한 벗이라 여겼을 땐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벗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본받기에 노력했던 것 같다. 삼우설(三友說)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도구로만 여겼던 농기구를 통해 농기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적인 의미를 찾고 농기구를 벗하여 마음까지도 다스리고자 했던 숨겨진 의미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본다.
□ 나오는 말
친구, 우정, 만남이라는 너무도 친숙한 주제들의 고전 작품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학교를 거치며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우정을 쌓아왔다. 곁에 있는 친구의 존재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도 했던 우정에 대해 고전을 접하면서 좀 더 진지하고 깊숙하게 생각해보았다. 이 고전들을 접하면서 과연 친구란, 우정이란 무엇일까 라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우리 주변에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저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항상 멀게만 느껴졌던 고전작품을 이런 친숙한 주제로 접하게 되니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참고자료]
*(국역)청장관 전서 - 이덕무,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집
*책에 미친 바보(이덕무 산문선) - 이덕무 지음, 권정원 옮김
*박지원의 문학과 사상 - 김지용 지음
*박지원 작품집(1) - 역사 홍기문, 문예출판사
*가요집(2) - 김상훈 저, 한국문화사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연암 박지원이 가족과 벗에게 보낸 편지 - 박지원 지음, 박희병 옮김
*아름다운 우리 고전 수필 - 강희맹외 지음, 손광성, 임종대, 김경수 (공)편역
*나는 껄걸 선생이라오 - 박지원, 홍기문 옮김
*비슷한 것은 가짜다 - 정민 저
*한국 고전문학 입문 - 박기석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의식 - 한국학연구소 편
*동명왕의 노래 - 이규보 지음, 김상훈 외 옮김, 보리
*궁핍한 날의 벗 - 박제가 지음, 안대희 옮김, 태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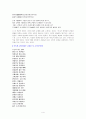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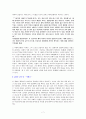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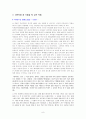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