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작품에 관하여
(1) 원문 및 해석
(2) 작품의 형식
(3) 작품의 성격
(4) 제목의 의미
(5) 동동무(動動舞)
3. 나오며
2, 작품에 관하여
(1) 원문 및 해석
(2) 작품의 형식
(3) 작품의 성격
(4) 제목의 의미
(5) 동동무(動動舞)
3. 나오며
본문내용
중종대에는 남녀가 상열(相悅)하는 말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견해들을을 고려하여 알아보아야하겠다.
같은 『고려사』의 악지에서 <자하동(紫霞洞)>에 대하여 \"시중(侍中)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것이다. 홍철(洪哲)이 자하동에 살면서 그 집을 중화당(中和堂)이라 편액하고 날로 기로(耆老)들을 모셔 즐겼는데, 이 노래를 지어 가비(家婢)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다. 그 노래말은 대개 선어(仙語)인데 자하(紫霞)의 신선(神仙)이 중화당(中和堂)에서 기영회(耆英會)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이 가사를 노래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고 한 것을 참고하여 \'선어\'(仙語)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풍입송(風入松)에는 송도(頌禱)의 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송도\'(頌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多有頌禱之詞 盖效仙語而爲之\" 가운데의 \'多有\'라는 표현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곧 이 <동동>의 전부가 송도(頌禱)이거나 선어(仙語)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연모(戀慕)도 상열(相悅)이라 규정하였기에 이 작품을 남녀상열(男女相悅)이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상사\'(相思)도 어떤 경우의 것이냐에 따라 그 서정은 다를 수 있다. 이미 저승으로 가 버린 님에 대한 상사(相思)로서의 <이상곡>의 서정과, 지금 눈 앞에서 나를 두고 떠나는 님에 대한 상사(相思)로서의 <서경별곡>이나 <가시리>의 서정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동>은 결코 송도지사가 아니다. 모두 13연 가운데 서연 하나의 언어 때문에 송(頌)은 차치하고라도 도(禱)의 사(詞)라고 할지 모르나, 눈앞에 살아 있는 사람에게 술잔을 드리고 권주가를 부른다면 그 말은 송도지사(頌禱之詞)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 버리고 여기에 없는 자 앞에 술잔을 드리고 그의 명복(命服)을 빈다고 해 보아도, 또 그가 내 님이었다면 헛부기 그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님이 없는 처지에서 덕(德)과 복(福)을 빈들 허허롭기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는 13연의 정중앙이 되는 제7연의 가사를 통해서 노래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넓기 이를 데 없이 황량한 이 세상에 나무에도 돌에 조차도 기댈 수 없는 고혈(孤孑)한 청상(靑孀)의 절규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제목의 의미
앞서 이 작품의 형식을 설명하며, 이 노래의 제목인 \'동동\'이 북소리 \'둥둥\'의 의성적 묘사라고 언급하였다.
이익(李瀷)은 『악학궤범』에 전해지는 <동동곡(動動曲)>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다음과 같이 추구하였다. 즉, 동동(動動)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 지금 창우(唱優)들이 입으로 북소리를 내어 춤의 절조를 삼는 것이다. \'동동\'(動動)은 오히려 \'동동\'( )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최치원(崔致遠)의 시(詩)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그의 <속독(束毒)> 시는 \"蓬頭藍面異人間 狎隊來庭學舞鸞 打鼓 風瑟瑟 南奔北躍也舞端\"인데, \'동동\'(動動)은 틀림없이 \"打鼓 \"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동동\"(動動)이란 북소리의 의음(擬音)이란 것을 밝힌 셈인데, 아마 조선조에 와서 이 <동동>을 채록하면서 입으로 흉내 낸 북소리 \"둥둥\"을 \"動動\"으로 한자화하였고, 이 작품의 제명(題名)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한다.
2월 보름에 높이 켜 단 등불같고, 봄이 무르익은 3월 활짝 핀 오얏꽃이었지만, 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꾀꼬리만도 못해 옛날을 잊고 돌아오지 못하는 님에, 온 누리에 홀로 지내는 나는 재앙이 묻혀 있다고 함께 버린 빗이요, 쓸모없이 저며진 보로쇠 같으며, 처음부터 어긋난 운명의 장난으로 춥고 긴긴 밤 불기 없는 봉당자리에 한삼덮고 옹송그려 가련하고 불쌍하게도 혼자 가신 님을 생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님 곁으로 가기(죽기)를 기원하는 한 정녀(貞女)의 모습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이다. 이러한 서정에 \'둥둥\'하는 북소리의 울림은 뭇 사람의 심금을 소리 없이 울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5) 동동무(動動舞)
<동동>은 반주에 노래와 춤이 함께 연희되며 아박무(牙拍舞)라고도 한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녀(妓女) 둘이 먼저 나가 북쪽을 향해 좌우로 갈라 서서 손을 여미어 족도(足蹈)하고는 큰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아박(牙拍)을 받들고 <동동>의 가사 기구(起句)를 부른다. 여러 기녀들은 이에 따라 화창(和唱)하고 향악(鄕樂)은 <동동>의 곡을 연주한다. 두 기녀는 꿇어 앉아서 아박(牙拍)을 띠 사이에 꽂고 악이 일강(一腔)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서고, 악이 이강(二腔)을 끝내면 손을 여미어 무도(舞蹈)하고, 악이 삼강(三腔)을 끝내면 아박(牙拍)을 뽑아서 한 번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한 번은 마주 보고 한 번은 등지고 하여, 악의 절차에 따라 혹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혹은 무릎에 혹은 어깨에 서로 아박(牙拍)을 치며 무도(舞蹈) 한다. 악이 거두어지기를 기다려 두 기녀는 앞서와 같이 손을 여미어 족도(足蹈) 하고는 큰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3. 나오며
이상에서 우리는 <동동>의 내용과 그 형식 및 성격을 살펴보고 제목이 주는 의미와 동동무(動動舞)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동>에 대해 우리는 표면적인 언어에만 이끌려, 고적한 한 여인으로서의 서정적 자아의 내밀하고도 절실함이 간과되어왔다. 이 <동동>은 결코 송도지사(頌禱之詞)가 아니다. 넓기 이를 데 없이 황량한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한 청상(靑孀)의 절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정에 \"둥둥\"하는 북소리의 울림은 사람들의 심금을 소리없이 울려놓을 것이다.
<동동>의 형식은 그 내용을 보고 월령체가 아닌 달거리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월별의 자연 변화를 제시하면서 각 달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서정적 자아의 감정 변화를 진술하는 월령체 혹은 달거리 형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각 연의 3분(三分), 매월의 시간적 상황과 서정, 그리고 \"아으 동동다리\"는 서정의 지극한 해화(諧和)를 가져 온다.
같은 『고려사』의 악지에서 <자하동(紫霞洞)>에 대하여 \"시중(侍中) 채홍철(蔡洪哲)이 지은 것이다. 홍철(洪哲)이 자하동에 살면서 그 집을 중화당(中和堂)이라 편액하고 날로 기로(耆老)들을 모셔 즐겼는데, 이 노래를 지어 가비(家婢)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였다. 그 노래말은 대개 선어(仙語)인데 자하(紫霞)의 신선(神仙)이 중화당(中和堂)에서 기영회(耆英會)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이 가사를 노래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고 한 것을 참고하여 \'선어\'(仙語)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 \"풍입송(風入松)에는 송도(頌禱)의 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송도\'(頌禱)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多有頌禱之詞 盖效仙語而爲之\" 가운데의 \'多有\'라는 표현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곧 이 <동동>의 전부가 송도(頌禱)이거나 선어(仙語)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연모(戀慕)도 상열(相悅)이라 규정하였기에 이 작품을 남녀상열(男女相悅)이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상사\'(相思)도 어떤 경우의 것이냐에 따라 그 서정은 다를 수 있다. 이미 저승으로 가 버린 님에 대한 상사(相思)로서의 <이상곡>의 서정과, 지금 눈 앞에서 나를 두고 떠나는 님에 대한 상사(相思)로서의 <서경별곡>이나 <가시리>의 서정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동>은 결코 송도지사가 아니다. 모두 13연 가운데 서연 하나의 언어 때문에 송(頌)은 차치하고라도 도(禱)의 사(詞)라고 할지 모르나, 눈앞에 살아 있는 사람에게 술잔을 드리고 권주가를 부른다면 그 말은 송도지사(頌禱之詞)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 버리고 여기에 없는 자 앞에 술잔을 드리고 그의 명복(命服)을 빈다고 해 보아도, 또 그가 내 님이었다면 헛부기 그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님이 없는 처지에서 덕(德)과 복(福)을 빈들 허허롭기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이 노래는 13연의 정중앙이 되는 제7연의 가사를 통해서 노래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넓기 이를 데 없이 황량한 이 세상에 나무에도 돌에 조차도 기댈 수 없는 고혈(孤孑)한 청상(靑孀)의 절규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다.
(4) 제목의 의미
앞서 이 작품의 형식을 설명하며, 이 노래의 제목인 \'동동\'이 북소리 \'둥둥\'의 의성적 묘사라고 언급하였다.
이익(李瀷)은 『악학궤범』에 전해지는 <동동곡(動動曲)>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다음과 같이 추구하였다. 즉, 동동(動動)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 지금 창우(唱優)들이 입으로 북소리를 내어 춤의 절조를 삼는 것이다. \'동동\'(動動)은 오히려 \'동동\'( )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최치원(崔致遠)의 시(詩)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그의 <속독(束毒)> 시는 \"蓬頭藍面異人間 狎隊來庭學舞鸞 打鼓 風瑟瑟 南奔北躍也舞端\"인데, \'동동\'(動動)은 틀림없이 \"打鼓 \"과 같은 것일 것이다. 즉, \"동동\"(動動)이란 북소리의 의음(擬音)이란 것을 밝힌 셈인데, 아마 조선조에 와서 이 <동동>을 채록하면서 입으로 흉내 낸 북소리 \"둥둥\"을 \"動動\"으로 한자화하였고, 이 작품의 제명(題名)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한다.
2월 보름에 높이 켜 단 등불같고, 봄이 무르익은 3월 활짝 핀 오얏꽃이었지만, 4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꾀꼬리만도 못해 옛날을 잊고 돌아오지 못하는 님에, 온 누리에 홀로 지내는 나는 재앙이 묻혀 있다고 함께 버린 빗이요, 쓸모없이 저며진 보로쇠 같으며, 처음부터 어긋난 운명의 장난으로 춥고 긴긴 밤 불기 없는 봉당자리에 한삼덮고 옹송그려 가련하고 불쌍하게도 혼자 가신 님을 생각하기 보다는, 차라리 님 곁으로 가기(죽기)를 기원하는 한 정녀(貞女)의 모습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이다. 이러한 서정에 \'둥둥\'하는 북소리의 울림은 뭇 사람의 심금을 소리 없이 울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5) 동동무(動動舞)
<동동>은 반주에 노래와 춤이 함께 연희되며 아박무(牙拍舞)라고도 한다. 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녀(妓女) 둘이 먼저 나가 북쪽을 향해 좌우로 갈라 서서 손을 여미어 족도(足蹈)하고는 큰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아박(牙拍)을 받들고 <동동>의 가사 기구(起句)를 부른다. 여러 기녀들은 이에 따라 화창(和唱)하고 향악(鄕樂)은 <동동>의 곡을 연주한다. 두 기녀는 꿇어 앉아서 아박(牙拍)을 띠 사이에 꽂고 악이 일강(一腔)을 끝내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서고, 악이 이강(二腔)을 끝내면 손을 여미어 무도(舞蹈)하고, 악이 삼강(三腔)을 끝내면 아박(牙拍)을 뽑아서 한 번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고, 한 번은 마주 보고 한 번은 등지고 하여, 악의 절차에 따라 혹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혹은 무릎에 혹은 어깨에 서로 아박(牙拍)을 치며 무도(舞蹈) 한다. 악이 거두어지기를 기다려 두 기녀는 앞서와 같이 손을 여미어 족도(足蹈) 하고는 큰 절을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3. 나오며
이상에서 우리는 <동동>의 내용과 그 형식 및 성격을 살펴보고 제목이 주는 의미와 동동무(動動舞)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동>에 대해 우리는 표면적인 언어에만 이끌려, 고적한 한 여인으로서의 서정적 자아의 내밀하고도 절실함이 간과되어왔다. 이 <동동>은 결코 송도지사(頌禱之詞)가 아니다. 넓기 이를 데 없이 황량한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한 청상(靑孀)의 절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서정에 \"둥둥\"하는 북소리의 울림은 사람들의 심금을 소리없이 울려놓을 것이다.
<동동>의 형식은 그 내용을 보고 월령체가 아닌 달거리로 구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월별의 자연 변화를 제시하면서 각 달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서정적 자아의 감정 변화를 진술하는 월령체 혹은 달거리 형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각 연의 3분(三分), 매월의 시간적 상황과 서정, 그리고 \"아으 동동다리\"는 서정의 지극한 해화(諧和)를 가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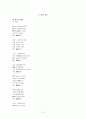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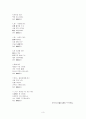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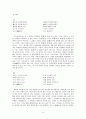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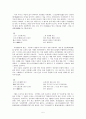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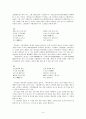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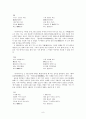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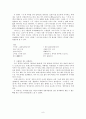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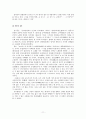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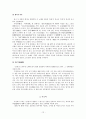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