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작품의 원문 및 해석
1)원문
2)해석
2. 작품의 배경 및 형성 과정
3. 작품의 성격
1) 각 단락의 화자의 태도
2)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서정적 자아 비교
4. 작품의 쟁점
1) 작품의 창작연대 및 작자
2) 합가설
Ⅲ. 결론
Ⅱ.본론
1. 작품의 원문 및 해석
1)원문
2)해석
2. 작품의 배경 및 형성 과정
3. 작품의 성격
1) 각 단락의 화자의 태도
2) 서경별곡과 가시리의 서정적 자아 비교
4. 작품의 쟁점
1) 작품의 창작연대 및 작자
2) 합가설
Ⅲ. 결론
본문내용
활발했던 대상국이 송과 원으로 이들 상인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본 작품의 여인이 사랑한 대상인은 송이나 원의 상인일 확률이 크지만 첫연에 나오는 여인의 주업인 길쌈베를 짜지 않는 나라는 아라비아국으로 여인을 버리고 떠나는 님은 곧 외국상인으로 짐작된다. 당시 원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된 시기는 왕실끼리의 결혼이 이루어지던 충렬왕 이후 공민왕대까지였다. 이 시기에는 고려의 역대 왕이 공주를 맞이해서 결혼하던 일종의 駙馬國(부마국) 이었던 때이고 그로 인해 원의 퇴폐적인 풍속의 전래로 성적인 문란이 일반화되던 사회상황이었으니 遊女(유녀)들의 문란함은 물론이거니와 \'네가지 럼난디 몰라셔\'에서 남편의 부재시는 누구나 쉽게 性 (성희)에 젖을 수 있음을 뱃사공의 아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니 이러한 시대의 배경을 안고 창작된 시가로 보아 충렬왕代 이후 공민왕代까지로 보여진다. 본 작품이 성종실록에서 쌍화점과 같이 남녀상열지사로 문제되었던 사실도 사회사적인 배경에서 동일 연대의 제작으로 볼 수 잇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작자는 성의 문란함을 기탄없이 받아들이는 시대의 遊女(유녀)로서 이국상인을 사랑한 고려여인으로 보여진다.
2) 합가설
<서경별곡>은 고려 당시의 서로 다른 민요들로 간주하고 각각의 노래들이 새로 들어온 가락에 맞추어져서 합가·조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통설로 되어있다. <滿殿春別詞(만전춘별사)>처럼 여러개의 노래가 모여서 하나로 합성된 가요가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서경별곡> 역시 그런 성격의 고려 속요로 규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합가설 중 첫 번째 견해는, 합가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 \'구스리…\'로 시작되는 둘째 단락이 근거가 된다. 서경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속요인 <정석가(鄭石歌)>의 제6연과 사설이 일치하는 두 번째 단락과, 대동강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으로 구조가 나누어진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에도 한역되어 있어 당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가요(민요)로 짐작된다. 이런 연유로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 형태상 의미상의 괴리와 이질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이 작품의 형성이 제 1연의 서경노래, 제 2연의 당대에 유행했던 민요, 제 3연의 대동강 노래, 이렇게 세 가요(민요)를 당대에 새로 유입된 궁중의 속악 악곡에 맞추어 연마다 여음구나 후렴을 붙여 합성 조절한 가요라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고려사」악지에 주로 생성 동기만 적혀 있는 <西京> 및 <大洞江>이라는 속악와 이 <서경별곡>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견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합가설 두 번째 견해는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서로 별개의 노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로 묶여져 있던 노래라는 것이다. 이 둘은 의미 연결면에서 충돌이나 모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앞단락에서 뒷 단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마치 여백이 없는 그림처럼 너무 여유가 없이 빽빽하고 고조된 흥분의 연속이기에 이런 분위기를 깨고 노래 전체에 유연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편사자가 2단락을 삽입시킨 것이라는 설이있다.
그 다음으론 <서경별곡>이 단일가라는 견해 이른바 창자의 複數說(복수설)이다. 각 연의 정조(情調)를 중시하여 제 1연과 3연이 불길 같은 감정의 표출을 담은 여성의 사설임에 반해, 제 2연은 싸늘한 이성(理性)의 소리로 된 남성의 사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대화를 담은 희곡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 이에 대한 다른 근거는 구슬 詞(사)는 남자가(달래는 노래), 그 앞뒤의 단락은 여자의 노래(우는 노래, 원망의 노래)라는 것인데, 두 번째 단락의 \'긴힛힝 그츠리힝가\'에서의 끈의 의미가 혼속에서 말하는 청실·홍실의 개념으로 보고 이런 혼속의 능동자는 신랑이므로 男詞(남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석가>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의 구슬단락의 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의문 앞에서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일가의 두번째 견해는 여성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한 작품에 담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선 적극성을 보이다가, 두 번째 단락에선 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침착성을, 세 번째 단락에선 불안과 함께 격정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조에서는 <서경별곡>의 형성과정과 문학적 해석, 해석에 따른 쟁점 그리고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의 형성과정에서 합가설의 근거를 마련해 준 작품으로 해석된다. 민간에서 떠도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를 묶어 궁중연회에 쓰이는 하나의 음악의 가사로 만들었다. 즉, 서경별곡은 서경곡과 구슬곡, 대동강곡이라는 독립된 노래들의 묶음이다. 그러나 그 묶음의 원칙은 논리적 치밀성에 있다기보다는 정감과 상황의 일치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고려 국어가요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작품을 논리적 전개에 맞추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서경별곡은 님과 이별에 처한 여인의 노래이다. 이별에 처해서도 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 님과 이별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은 동시대의 가시리에서도 볼 수 있고, 소월의 진달래꽃에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Ⅳ. 참고자료
<한국문학통사 2> 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임기중, 경운출판사 1993
<고려가요의 연구> 박노준, 새문사, 1990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고려시가의 연구> 윤영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1
<고려 속요의 연구> 전규태 , 학예사 1982
<새로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박병채, 국학자료원 1994
<고려가요 연구> 최용수/ 계명문화사 1993
<고려시가의 연구> 이성주, 웅비사 1991
<고려시가의 정서> 김대행, 개문사 1990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김열규, 신동욱 새문사 1982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와 분석> 강동엽, 최웅, 김의숙, 이경수 (주)북스힐 2001
<고려사 6제 71권 지> 여강출판사 1991
이렇게 볼 때 작자는 성의 문란함을 기탄없이 받아들이는 시대의 遊女(유녀)로서 이국상인을 사랑한 고려여인으로 보여진다.
2) 합가설
<서경별곡>은 고려 당시의 서로 다른 민요들로 간주하고 각각의 노래들이 새로 들어온 가락에 맞추어져서 합가·조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통설로 되어있다. <滿殿春別詞(만전춘별사)>처럼 여러개의 노래가 모여서 하나로 합성된 가요가 있는 것을 상기할 때 <서경별곡> 역시 그런 성격의 고려 속요로 규정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
합가설 중 첫 번째 견해는, 합가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 \'구스리…\'로 시작되는 둘째 단락이 근거가 된다. 서경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과, 같은 속요인 <정석가(鄭石歌)>의 제6연과 사설이 일치하는 두 번째 단락과, 대동강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세 번째 단락으로 구조가 나누어진다. 여기서 두 번째 단락은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小樂府)>에도 한역되어 있어 당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가요(민요)로 짐작된다. 이런 연유로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 형태상 의미상의 괴리와 이질성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이 작품의 형성이 제 1연의 서경노래, 제 2연의 당대에 유행했던 민요, 제 3연의 대동강 노래, 이렇게 세 가요(민요)를 당대에 새로 유입된 궁중의 속악 악곡에 맞추어 연마다 여음구나 후렴을 붙여 합성 조절한 가요라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고려사」악지에 주로 생성 동기만 적혀 있는 <西京> 및 <大洞江>이라는 속악와 이 <서경별곡>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견해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합가설 두 번째 견해는 첫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서로 별개의 노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로 묶여져 있던 노래라는 것이다. 이 둘은 의미 연결면에서 충돌이나 모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앞단락에서 뒷 단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마치 여백이 없는 그림처럼 너무 여유가 없이 빽빽하고 고조된 흥분의 연속이기에 이런 분위기를 깨고 노래 전체에 유연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편사자가 2단락을 삽입시킨 것이라는 설이있다.
그 다음으론 <서경별곡>이 단일가라는 견해 이른바 창자의 複數說(복수설)이다. 각 연의 정조(情調)를 중시하여 제 1연과 3연이 불길 같은 감정의 표출을 담은 여성의 사설임에 반해, 제 2연은 싸늘한 이성(理性)의 소리로 된 남성의 사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대화를 담은 희곡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하나 이에 대한 다른 근거는 구슬 詞(사)는 남자가(달래는 노래), 그 앞뒤의 단락은 여자의 노래(우는 노래, 원망의 노래)라는 것인데, 두 번째 단락의 \'긴힛힝 그츠리힝가\'에서의 끈의 의미가 혼속에서 말하는 청실·홍실의 개념으로 보고 이런 혼속의 능동자는 신랑이므로 男詞(남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정석가>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의 구슬단락의 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의문 앞에서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일가의 두번째 견해는 여성화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한 작품에 담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락에선 적극성을 보이다가, 두 번째 단락에선 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침착성을, 세 번째 단락에선 불안과 함께 격정적으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Ⅲ. 결론
우리 조에서는 <서경별곡>의 형성과정과 문학적 해석, 해석에 따른 쟁점 그리고 성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서경별곡은 고려가요의 형성과정에서 합가설의 근거를 마련해 준 작품으로 해석된다. 민간에서 떠도는 남녀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를 묶어 궁중연회에 쓰이는 하나의 음악의 가사로 만들었다. 즉, 서경별곡은 서경곡과 구슬곡, 대동강곡이라는 독립된 노래들의 묶음이다. 그러나 그 묶음의 원칙은 논리적 치밀성에 있다기보다는 정감과 상황의 일치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고려 국어가요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작품을 논리적 전개에 맞추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오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서경별곡은 님과 이별에 처한 여인의 노래이다. 이별에 처해서도 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어떻게 해서든 님과 이별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은 동시대의 가시리에서도 볼 수 있고, 소월의 진달래꽃에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Ⅳ. 참고자료
<한국문학통사 2> 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고려가요의 문학사회학> 임기중, 경운출판사 1993
<고려가요의 연구> 박노준, 새문사, 1990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최철,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고려시가의 연구> 윤영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1
<고려 속요의 연구> 전규태 , 학예사 1982
<새로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박병채, 국학자료원 1994
<고려가요 연구> 최용수/ 계명문화사 1993
<고려시가의 연구> 이성주, 웅비사 1991
<고려시가의 정서> 김대행, 개문사 1990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김열규, 신동욱 새문사 1982
<한국 고전문학의 이해와 분석> 강동엽, 최웅, 김의숙, 이경수 (주)북스힐 2001
<고려사 6제 71권 지> 여강출판사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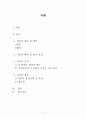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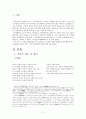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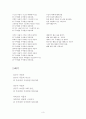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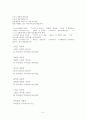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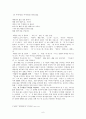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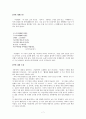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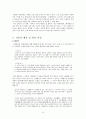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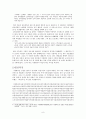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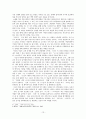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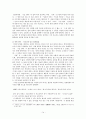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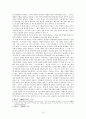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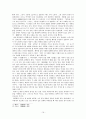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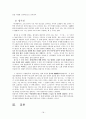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