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家族과 親族의 개념
2. 가족-친족의 발생과 변천
3. 삼국시대의 가족 및 친족제도
4. 고려시대의 가족제
5. 고려시대의 친족제(혼인)와 상속제
Ⅲ. 結論
Ⅱ. 本論
1. 家族과 親族의 개념
2. 가족-친족의 발생과 변천
3. 삼국시대의 가족 및 친족제도
4. 고려시대의 가족제
5. 고려시대의 친족제(혼인)와 상속제
Ⅲ. 結論
본문내용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부부간 소유권 구별
고려시대 노비의 상속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속문서 또는 戶口單子와 고문서에는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父邊, 妻邊, 母邊으로 전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노비의 所傳來를 명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의 所傳來를 명시한 것은 이들 노비의 소유권이 결혼에 의해 夫에 귀속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균분상속이었던 노비의 소유권은 매우 중시되었다. 이는 결국 家産으로서의 노비가 다시 그들 자녀에게 상속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 夫가 사망하여 妻가 본가로 되돌아갈 경우는 본래의 자기 소유 노비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상속시킬 자녀가 없이 夫妻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本家孫에게 나누어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부부간의 소유권 구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田丁連立과 嫡長子單獨相續說
고려시대의 토지는 토지소유주가 매매, 상속, 증여를 할 수 있는 民田과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수조권)가 개인에게 양도된 公田으로 2大別 할 수 있을 것이다. 民田은 자녀간 均分相續 되어졌지만 고려시대의 상속규정에 의하면 公田에서는 다른 상속형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노비와 民田의 상속과 달리 公田은 적장자단독상속이었으나 國有였던 토지의 私有化가 진전됨에 따라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도 노비와 같이 균분상속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田丁連立에 관련된 친족관계의 해석을 중심으로 토지의 사유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단체적 소유와 그를 배경으로 적장자단독상속제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적장자단독상속제를 반증하는 자료로써 중요사료는 다음과 같다.
靖宗 12年에 判하기를 모든 田丁의 連立은 嫡子가 없으면 嫡孫에게, 嫡孫이 없으면 同母弟에게, 同母弟가 없으면 庶孫에게 하며, 男孫이 없으면 女孫에게 하도록 한다.
(『高麗史』卷 84, 刑法志 1)
위에서는 연립의 대상으로 嫡子 - 嫡孫 - (嫡子)同母弟 - 庶孫 -女孫(外孫)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嫡長子로부터 嫡長孫으로 상속되는 것으로써 外孫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적장자우선에 의거한 상속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職役과 관련하여 분급된 토지인 만큼 分割相續되었을 리 없고, 또 그 상속에는 장자가 우선적으로 해당되었으리라 주장하는 것이 嫡長子單獨相續說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田丁連立은 적자 - 적손 -(적자)동모제 - 서손 - 여손(외손)의 순서로 이어지는 內 · 外族을 포함한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직계자손 중 여손 즉 외손이 승계권자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적장자단독상속설의 부계 혈족집단에 의한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長子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가족의 경제적 기반도 장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장자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장자와 同居하는 경우가 많았어야 논리상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구조를 볼 수 없다. 嫡長子單獨相續說이 성립된다면 고려시대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경우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적장자단독상속이 토지의 私有化의 진전에 따라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도 노비처럼 자녀균분상속제로 되었다는 주장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실상을 잘못 파악한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토지는 私有制였기 때문이다.
즉, 정전의 상속에 규정되어 있는 적장자주의는 法制的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마치 법제상으로는 동종지자의 양자는 昭穆之序에 적합한 양자를 해야 한다고 법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의 양자를 하지 않았던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자녀 간에 노비나 토지를 均分相續하였던 것에서도, 고려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唐이나 조선 후기와 같은 嫡長子優先主義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이상까지 가족의 발생과 변천과정 그리고 고려의 전시대인 삼국시대의 가족제도를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고려시대의 가족제와 상속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 친족은 전시대를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의 非父系的 非單系的 요소의 공존에서 시대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로 非父系的(非單系的) 요소는 약화되고 반대로 父系的 요소는 점차로 강화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父系的 색채만을 띠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되짚어보면 혼인 후 거주규칙은 신라와 고려는 留婦家의 기간이 길었으나, 조선 전기를 거쳐 후기로 내려올수록 그 기간이 단축되어갔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져 갔는데 고려시대까지는 결혼한 女와 女와 外孫을 포함하는 가족, 사위의 입장에서 보면 장인이나 장모를 포함하는 가족이 理想的인 가족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女와 女 또는 丈人과 丈母는 제외되고 長子와 長子婦, 長孫과 長孫婦와 생활을 같이하는 直系家族이 理想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도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이 재산을 均分相續하였으나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그들 간의 차별이 아들 우대 장자 우대로 기울어져 갔던 것이다.
정리하면 고려시대는 父系血緣親만의 조직이나 집단도 없었으며, 嫡系主義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계혈연집단의 존재, 이를 위한 養子制度, 宗子(宗孫) 우대의 적계주의, 상속의 자녀차대, 제사의 적계주의, 외가 처가의 차대 등의 구조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나 존재하였지 고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처럼 고려사회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사회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였다. 이를 알고 고려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안목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최재석,『韓國家族制度史硏究』, 一志社, 1986
허흥식,『高麗社會史硏究』, 亞細亞文化史, 1981
이광규,『韓國家族의 史的硏究』, 一志社, 1986
노명호,「家族制度」,『韓國史』15, 國史編纂委員會, 1995
박용운,『高麗時代史』, 一志社, 2002
허흥식,「家族制와 相續制」,『高麗時代史講義』, 늘함께, 1997
(2) 부부간 소유권 구별
고려시대 노비의 상속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속문서 또는 戶口單子와 고문서에는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父邊, 妻邊, 母邊으로 전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노비의 所傳來를 명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의 所傳來를 명시한 것은 이들 노비의 소유권이 결혼에 의해 夫에 귀속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균분상속이었던 노비의 소유권은 매우 중시되었다. 이는 결국 家産으로서의 노비가 다시 그들 자녀에게 상속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 夫가 사망하여 妻가 본가로 되돌아갈 경우는 본래의 자기 소유 노비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상속시킬 자녀가 없이 夫妻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本家孫에게 나누어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부부간의 소유권 구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田丁連立과 嫡長子單獨相續說
고려시대의 토지는 토지소유주가 매매, 상속, 증여를 할 수 있는 民田과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수조권)가 개인에게 양도된 公田으로 2大別 할 수 있을 것이다. 民田은 자녀간 均分相續 되어졌지만 고려시대의 상속규정에 의하면 公田에서는 다른 상속형태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노비와 民田의 상속과 달리 公田은 적장자단독상속이었으나 國有였던 토지의 私有化가 진전됨에 따라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도 노비와 같이 균분상속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田丁連立에 관련된 친족관계의 해석을 중심으로 토지의 사유가 발달하지 못하고 가족 내의 단체적 소유와 그를 배경으로 적장자단독상속제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적장자단독상속제를 반증하는 자료로써 중요사료는 다음과 같다.
靖宗 12年에 判하기를 모든 田丁의 連立은 嫡子가 없으면 嫡孫에게, 嫡孫이 없으면 同母弟에게, 同母弟가 없으면 庶孫에게 하며, 男孫이 없으면 女孫에게 하도록 한다.
(『高麗史』卷 84, 刑法志 1)
위에서는 연립의 대상으로 嫡子 - 嫡孫 - (嫡子)同母弟 - 庶孫 -女孫(外孫)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토지는 嫡長子로부터 嫡長孫으로 상속되는 것으로써 外孫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적장자우선에 의거한 상속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職役과 관련하여 분급된 토지인 만큼 分割相續되었을 리 없고, 또 그 상속에는 장자가 우선적으로 해당되었으리라 주장하는 것이 嫡長子單獨相續說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田丁連立은 적자 - 적손 -(적자)동모제 - 서손 - 여손(외손)의 순서로 이어지는 內 · 外族을 포함한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점, 직계자손 중 여손 즉 외손이 승계권자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적장자단독상속설의 부계 혈족집단에 의한 것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長子가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가족의 경제적 기반도 장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만큼 장자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장자와 同居하는 경우가 많았어야 논리상 타당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구조를 볼 수 없다. 嫡長子單獨相續說이 성립된다면 고려시대의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경우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의 적장자단독상속이 토지의 私有化의 진전에 따라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도 노비처럼 자녀균분상속제로 되었다는 주장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실상을 잘못 파악한데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려 말에 이르러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된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토지는 私有制였기 때문이다.
즉, 정전의 상속에 규정되어 있는 적장자주의는 法制的인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마치 법제상으로는 동종지자의 양자는 昭穆之序에 적합한 양자를 해야 한다고 법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의 양자를 하지 않았던 것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자녀 간에 노비나 토지를 均分相續하였던 것에서도, 고려에서는 실제에 있어서 唐이나 조선 후기와 같은 嫡長子優先主義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Ⅲ. 결론
이상까지 가족의 발생과 변천과정 그리고 고려의 전시대인 삼국시대의 가족제도를 살펴보고 그를 토대로 고려시대의 가족제와 상속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족 친족은 전시대를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의 非父系的 非單系的 요소의 공존에서 시대의 경과와 더불어 점차로 非父系的(非單系的) 요소는 약화되고 반대로 父系的 요소는 점차로 강화되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父系的 색채만을 띠게 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되짚어보면 혼인 후 거주규칙은 신라와 고려는 留婦家의 기간이 길었으나, 조선 전기를 거쳐 후기로 내려올수록 그 기간이 단축되어갔다.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달라져 갔는데 고려시대까지는 결혼한 女와 女와 外孫을 포함하는 가족, 사위의 입장에서 보면 장인이나 장모를 포함하는 가족이 理想的인 가족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女와 女 또는 丈人과 丈母는 제외되고 長子와 長子婦, 長孫과 長孫婦와 생활을 같이하는 直系家族이 理想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또한 상속에 있어서도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이 재산을 均分相續하였으나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그들 간의 차별이 아들 우대 장자 우대로 기울어져 갔던 것이다.
정리하면 고려시대는 父系血緣親만의 조직이나 집단도 없었으며, 嫡系主義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계혈연집단의 존재, 이를 위한 養子制度, 宗子(宗孫) 우대의 적계주의, 상속의 자녀차대, 제사의 적계주의, 외가 처가의 차대 등의 구조적 특징은 조선 후기에나 존재하였지 고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처럼 고려사회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사회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다양한 사회였다. 이를 알고 고려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 새로운 안목과 보다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한다.
【참고문헌】
최재석,『韓國家族制度史硏究』, 一志社, 1986
허흥식,『高麗社會史硏究』, 亞細亞文化史, 1981
이광규,『韓國家族의 史的硏究』, 一志社, 1986
노명호,「家族制度」,『韓國史』15, 國史編纂委員會, 1995
박용운,『高麗時代史』, 一志社, 2002
허흥식,「家族制와 相續制」,『高麗時代史講義』, 늘함께,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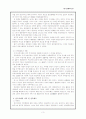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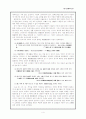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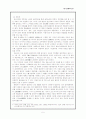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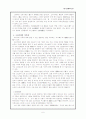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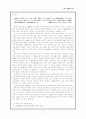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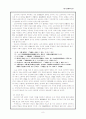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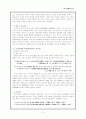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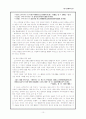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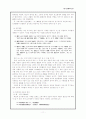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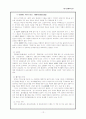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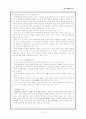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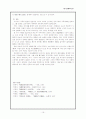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