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본론 1. 길동의 어머니 - 춘섬
2. 초란은 악녀?
3. 홍승상의 부인
4. 홍승상의 부인과 큰 아들 길현
5. 홍승상의 세 부인 & 길동의 세 부인
6. 홍승상
― 결론
― 본론 1. 길동의 어머니 - 춘섬
2. 초란은 악녀?
3. 홍승상의 부인
4. 홍승상의 부인과 큰 아들 길현
5. 홍승상의 세 부인 & 길동의 세 부인
6. 홍승상
― 결론
본문내용
는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다. 하지만「홍길동전」에서는 아버지인 홍승상은 온화하며 적당히 연민을 보이는 지극히 평면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리고 홍길동은 시종일관 아버지인 홍승상을 극진히 대한다. 모해의 주동자인 ‘초란’을 죽이려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물임을 생각하고는 칼을 던졌고 사회적인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다가도 아버지와 형이 인질로 잡히자 자수를 했으며 김일렬, [고전소설신론](새문사, 2003) p.169
출국을 한 후에, 홍승상이 임종하자 선왕으로 추대하고 마치 국릉처럼 호화롭게 묘를 꾸미고 장례를 모신다. 길동 자신을 서얼로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며 그 때문에 고초를 겪을 때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 비난을 가할 법도 하나, 「홍길동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찾아 볼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관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길동이 개인적, 사회적 성공을 거둔 후에는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홍학희, “허균:‘남성-양반’ 중심의 개혁론자” [한문학사의 여성인식](집문사, 2003), p.205
이것은 홍길동의 과도기적인 영웅의 모습, 즉 윤리적 제약으로 인한 것 김일렬, [고전소설신론](새문사, 2003) p.169
이라 이해될 수 있으나 허균이 이 소설 속에서 다른 여성인물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엄연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홍길동전」을 양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작품 속에서 양성성에 어긋나는 몇 가지를 바라볼 때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과의 적정선을 찾는 것에 고심하였다.
허균이 급진적 개혁론자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도 당시 명문가에서 성장한 사대부였기에 작품 속에서 그의 시선이나 생각의 범위가 양반계층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는「홍길동전」속의 여성차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다처제 혹은 일부일처축첩제라는 제도라 보았다. 이 구조로 인해 길동어미의 비극도, 초란의 살인극도, 길동이 서얼로서 고통 받는 것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홍길동전」에서 허균이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허균의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듯 성차별 혹은 양성성의 문제는 허균과 같이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도 넘을 수 없었던 개인의 한계이자, 시대적 한계였던 것이다.
그리고 홍길동은 시종일관 아버지인 홍승상을 극진히 대한다. 모해의 주동자인 ‘초란’을 죽이려다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인물임을 생각하고는 칼을 던졌고 사회적인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다가도 아버지와 형이 인질로 잡히자 자수를 했으며 김일렬, [고전소설신론](새문사, 2003) p.169
출국을 한 후에, 홍승상이 임종하자 선왕으로 추대하고 마치 국릉처럼 호화롭게 묘를 꾸미고 장례를 모신다. 길동 자신을 서얼로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며 그 때문에 고초를 겪을 때도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 비난을 가할 법도 하나, 「홍길동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은 찾아 볼 수 없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관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길동이 개인적, 사회적 성공을 거둔 후에는 그 성과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다. 홍학희, “허균:‘남성-양반’ 중심의 개혁론자” [한문학사의 여성인식](집문사, 2003), p.205
이것은 홍길동의 과도기적인 영웅의 모습, 즉 윤리적 제약으로 인한 것 김일렬, [고전소설신론](새문사, 2003) p.169
이라 이해될 수 있으나 허균이 이 소설 속에서 다른 여성인물을 대하고 바라보는 시각과 엄연한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홍길동전」을 양성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작품 속에서 양성성에 어긋나는 몇 가지를 바라볼 때 그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과의 적정선을 찾는 것에 고심하였다.
허균이 급진적 개혁론자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도 당시 명문가에서 성장한 사대부였기에 작품 속에서 그의 시선이나 생각의 범위가 양반계층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는「홍길동전」속의 여성차별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부다처제 혹은 일부일처축첩제라는 제도라 보았다. 이 구조로 인해 길동어미의 비극도, 초란의 살인극도, 길동이 서얼로서 고통 받는 것도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홍길동전」에서 허균이 이러한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허균의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듯 성차별 혹은 양성성의 문제는 허균과 같이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도 넘을 수 없었던 개인의 한계이자, 시대적 한계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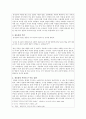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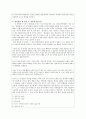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