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르네상스의 축제
1) 축제의 일반적인 기능
2) 카니발의 기원과 사회적 영향
3) 축제의 유형―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4) 축제의 의미
5) 중세 축제의 계급적 이데올로기
6) 축제의 혁명적 성격
․ 축제는 질서 변혁의 도구인가?―양면성에 대한 고찰
․ 축제는 파시즘인가?
2. 민담에 대하여
1) 민담의 의의
2) 민담의 유형
3) 프랑스 농민들의 마더 구스 이야기 ― 당시 민담의 폭력성, 선정성의 이유
4) ‘고양이 대학살‘에 나타난 민중 의식
․ ‘고양이 대학살’이란?
․ ‘고양이 대학살’의 내용
․ 그런데 왜 ‘고양이’라는 동물인가?
․ ‘고양이 대학살’로 본 인쇄공들의 모습
# 참고문헌
1) 축제의 일반적인 기능
2) 카니발의 기원과 사회적 영향
3) 축제의 유형―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4) 축제의 의미
5) 중세 축제의 계급적 이데올로기
6) 축제의 혁명적 성격
․ 축제는 질서 변혁의 도구인가?―양면성에 대한 고찰
․ 축제는 파시즘인가?
2. 민담에 대하여
1) 민담의 의의
2) 민담의 유형
3) 프랑스 농민들의 마더 구스 이야기 ― 당시 민담의 폭력성, 선정성의 이유
4) ‘고양이 대학살‘에 나타난 민중 의식
․ ‘고양이 대학살’이란?
․ ‘고양이 대학살’의 내용
․ 그런데 왜 ‘고양이’라는 동물인가?
․ ‘고양이 대학살’로 본 인쇄공들의 모습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닭’이라고 불리는 몇 안되는 부유한 농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징수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농민의 잉여생산물을 사야만 했다. 그들은 가난한 농민에게는 영주나 교회의 십일조 징수자들 만큼이나 증오의 대상이었다. 이웃은 적대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들은 당신을 염탐하며 당신의 텃밭을 훔쳐갈 수 있는 존재였다.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마을의 생활은 생존 경쟁이었고, 생존이란 빈자와 극빈자를 나누는 경계선 위에 있다는 것을 뜻했다.
이렇듯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모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이건 아이이건 이 시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 중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교훈있는 이야기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매일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18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약간의 과장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 아이들의 삶이었다. 우리가 민담의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록된 사료는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중세의 설교자들은 도덕적 논의를 예증하기 위하여 구전의 전통을 이용하였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훈화(訓話)\'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설교는 19세기에 민속학자들이 농촌의 오두막에서 채록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세문학의 상당 부분(기사도 이야기, 무훈시, 우화)이 대중들의 구전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잠자는 미녀」는 14세기의 아더왕 전설에 나타났으며 「신데렐라」는 1547년의 노엘 뒤 펠의 『농촌의 이야기』에서 표면화되었다. 이 책은 이야기를 농민들의 전승으로 추적하여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입증하였다. 왜냐하면 뒤 펠은 중요한 프랑스 관례인 \'야회(夜會)\'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적고 있는데, 이것은 저녁에 난롯가에 모여서 남자들은 연장을 수선하고 여자들은 뜨개질을 하며, 삼백 년 후에 민속학자들에 의해 기록될, 그리고 아마 수백 년이나 된 이야기를 듣던 모임이다. 어른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건, 아니면 「빨강 모자」의 경고적인 이야기의 경우처럼 어린이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건, 그 이야기들은 농민들이 수세기에 걸쳐 놀랄 정도로 손상하지 않고 소장해 왔던 대중문화의 축적에 속하는 것이다.
4)‘고양이 대학살’에 나타난 민중의식
‘고양이 대학살’이란?
1730년대 생세브랑 가의 한 인쇄소에서 당시 인쇄소의 견습공들이 일으킨 사건으로써 노동자인 ‘니콜라 콩타’가 기록한 것이다.
‘고양이 대학살’의 내용
생세브랑 가의 한 인쇄소에서는 제롬과 레베이예라는 견습공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춥고 더러운 방에서 살면서 찌꺼기로 연명했으며 근무시간에는 상급자와 주인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그들이 다니던 인쇄소주인의 부인이 기르던 ‘그리스’라는 고양이는 구운 새고기를 먹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한편 당시 그 거리에 살던 많은 도둑고양이들은 밤새 견습공들의 숙소 주위에 와서 밤새도록 울어대며 피로에 지친 견습공들을 괴롭혔다. 이런 이중고에 견디다 못한 견습공중 레베이예는 주인과 부인의 침실 근처에서 고양이 흉내를 내 밤새도록 울어대며 그 부부를 괴롭혔다. 그러자 참다못한 그 내외는 견습공들에게 고양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에 그들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띄는 모든 고양이를 잡아서 반쯤 죽인채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를 본 주인의 부인은 ‘그리스’도 죽였을 거라고 기겁을 했으나 할수 없이 집안으로 물러가고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이 사건후 레베이예는 최소한 스무 번에 걸쳐서 당시의 상황들을 무언극으로 재연했고 모든 노동자들이 기뻐하였다.
그런데 왜 ‘고양이’라는 동물일까?
책의 저자 ‘로버트 단턴’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고양이가 마법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밤에 마주치는 고양이와 마녀를 동일시 하였다.
둘째, 고양이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예컨대 집을 수호하기 위해 고양이를 벽 속에 넣는다든지 잡초를 없앤다하여 고양이를 생매장하는 풍습이 널리 있었다.
셋째, 고양이가 성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즉 고양이는 암코양이, 새끼고양이, 털고양이 등의 속어로 여성의 음부라는 의미를 지니며 음란한 단어로 사용되었다.
넷째, 고양이는 생식력과 여성의 성욕을 암시했다. 여성의 성욕이 과할 경우 남편이 오쟁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의 울음은 마법과 광란의 향연, 오쟁이질, 학살 등을 연상시켰으며, 인쇄소 직원들과 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양이 대학살’로 본 인쇄공들의 모습
당시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해 인쇄소 견습공들은 여주인이 아끼던 그리스를 죽임으로써 실지로 여주인을 마녀라고 기소했으며 이런 장난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던 인쇄소의 견습공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근세 초의 축제는 모의재판과 처형으로 끝이 나는데, 그와 비슷한 의식으로 고양이를 처형함으로써 견습공들은 ‘부르주아’가 유죄라고 선언한 것이다. 인쇄공들에게 있어서 ‘부르주아’들의 죄는 견습공들을 혹사시키고 제대로 먹이지 않는 죄, 사치 속에서 살아간 죄, 인쇄업 초기와는 다르게 노동자와의 유대감이 없이 학대한 죄가 있으며 노동자 들은 그러한 그들과 당시의 체제를 증오했으며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조롱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푸른숲
P. Burke, PoPular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 ch. 7 \"The World of Carnival\"
여홍상,『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지성사
R. 단튼,『고양이 대학살』. 문학과지성사
장 뒤비뇨,『축제와 문명』. 한길사
이렇듯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아름답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모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른이건 아이이건 이 시대의 이야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민들 중 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교훈있는 이야기는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매일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다.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18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약간의 과장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 아이들의 삶이었다. 우리가 민담의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록된 사료는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중세의 설교자들은 도덕적 논의를 예증하기 위하여 구전의 전통을 이용하였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훈화(訓話)\'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설교는 19세기에 민속학자들이 농촌의 오두막에서 채록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중세문학의 상당 부분(기사도 이야기, 무훈시, 우화)이 대중들의 구전 전통에 의존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잠자는 미녀」는 14세기의 아더왕 전설에 나타났으며 「신데렐라」는 1547년의 노엘 뒤 펠의 『농촌의 이야기』에서 표면화되었다. 이 책은 이야기를 농민들의 전승으로 추적하여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입증하였다. 왜냐하면 뒤 펠은 중요한 프랑스 관례인 \'야회(夜會)\'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적고 있는데, 이것은 저녁에 난롯가에 모여서 남자들은 연장을 수선하고 여자들은 뜨개질을 하며, 삼백 년 후에 민속학자들에 의해 기록될, 그리고 아마 수백 년이나 된 이야기를 듣던 모임이다. 어른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었건, 아니면 「빨강 모자」의 경고적인 이야기의 경우처럼 어린이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건, 그 이야기들은 농민들이 수세기에 걸쳐 놀랄 정도로 손상하지 않고 소장해 왔던 대중문화의 축적에 속하는 것이다.
4)‘고양이 대학살’에 나타난 민중의식
‘고양이 대학살’이란?
1730년대 생세브랑 가의 한 인쇄소에서 당시 인쇄소의 견습공들이 일으킨 사건으로써 노동자인 ‘니콜라 콩타’가 기록한 것이다.
‘고양이 대학살’의 내용
생세브랑 가의 한 인쇄소에서는 제롬과 레베이예라는 견습공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춥고 더러운 방에서 살면서 찌꺼기로 연명했으며 근무시간에는 상급자와 주인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그들이 다니던 인쇄소주인의 부인이 기르던 ‘그리스’라는 고양이는 구운 새고기를 먹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다. 한편 당시 그 거리에 살던 많은 도둑고양이들은 밤새 견습공들의 숙소 주위에 와서 밤새도록 울어대며 피로에 지친 견습공들을 괴롭혔다. 이런 이중고에 견디다 못한 견습공중 레베이예는 주인과 부인의 침실 근처에서 고양이 흉내를 내 밤새도록 울어대며 그 부부를 괴롭혔다. 그러자 참다못한 그 내외는 견습공들에게 고양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에 그들은 ‘그리스’로부터 시작하여 눈에 띄는 모든 고양이를 잡아서 반쯤 죽인채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한다. 그런데 이를 본 주인의 부인은 ‘그리스’도 죽였을 거라고 기겁을 했으나 할수 없이 집안으로 물러가고 노동자들은 기뻐했다. 이 사건후 레베이예는 최소한 스무 번에 걸쳐서 당시의 상황들을 무언극으로 재연했고 모든 노동자들이 기뻐하였다.
그런데 왜 ‘고양이’라는 동물일까?
책의 저자 ‘로버트 단턴’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고양이가 마법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밤에 마주치는 고양이와 마녀를 동일시 하였다.
둘째, 고양이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예컨대 집을 수호하기 위해 고양이를 벽 속에 넣는다든지 잡초를 없앤다하여 고양이를 생매장하는 풍습이 널리 있었다.
셋째, 고양이가 성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즉 고양이는 암코양이, 새끼고양이, 털고양이 등의 속어로 여성의 음부라는 의미를 지니며 음란한 단어로 사용되었다.
넷째, 고양이는 생식력과 여성의 성욕을 암시했다. 여성의 성욕이 과할 경우 남편이 오쟁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고양이의 울음은 마법과 광란의 향연, 오쟁이질, 학살 등을 연상시켰으며, 인쇄소 직원들과 적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양이 대학살’로 본 인쇄공들의 모습
당시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으로 인해 인쇄소 견습공들은 여주인이 아끼던 그리스를 죽임으로써 실지로 여주인을 마녀라고 기소했으며 이런 장난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던 인쇄소의 견습공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근세 초의 축제는 모의재판과 처형으로 끝이 나는데, 그와 비슷한 의식으로 고양이를 처형함으로써 견습공들은 ‘부르주아’가 유죄라고 선언한 것이다. 인쇄공들에게 있어서 ‘부르주아’들의 죄는 견습공들을 혹사시키고 제대로 먹이지 않는 죄, 사치 속에서 살아간 죄, 인쇄업 초기와는 다르게 노동자와의 유대감이 없이 학대한 죄가 있으며 노동자 들은 그러한 그들과 당시의 체제를 증오했으며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조롱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 푸른숲
P. Burke, PoPular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 ch. 7 \"The World of Carnival\"
여홍상,『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지성사
R. 단튼,『고양이 대학살』. 문학과지성사
장 뒤비뇨,『축제와 문명』. 한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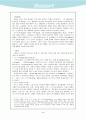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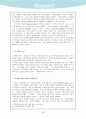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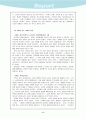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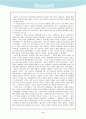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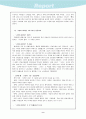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