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1. 불교의 수도생활
1.1 승가의 성립
1.2 승가계율
1.3 무소유
1.4 승가의 대중공사
1.5 출가자의 독신생활
2. 가톨릭의 수도생활
2.1 수도회의 성립
2.2 수도회의 규칙
2.3 가난
2.4 공동체 생활과 순명
2.5 독신생활
3. 불교와 가톨릭의 수도생활 비교
결 론
1. 불교의 수도생활
1.1 승가의 성립
1.2 승가계율
1.3 무소유
1.4 승가의 대중공사
1.5 출가자의 독신생활
2. 가톨릭의 수도생활
2.1 수도회의 성립
2.2 수도회의 규칙
2.3 가난
2.4 공동체 생활과 순명
2.5 독신생활
3. 불교와 가톨릭의 수도생활 비교
결 론
본문내용
음에는 남자만 출가할 수 있었으나, 약 5년이 지난 후 여자들의 출가가 허락되었다. 최후의 여자 출가자는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였다. 이렇게 되어 비구와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봉양하는 재가신도들인 우바새와 우바이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구와 비구니, 우바새와 우바이를 사부대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승가라는 용어는 좁은 의미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 비구, 비구니, 재가 남신도, 재가 여신도들의 모임 역시 승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을 넓은 의미에서 승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같은 책, 58.
1.2 승가계율
계율이란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규범이며 출가자의 궁극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 요건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계는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치는 의미로서 수행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서원이고, 율은 규율로서 어겼을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불교승가는 계(戒)정(定)혜(慧), 세 가지 배움의 길(三學)을 기본 실천 덕목으로 가지고 있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 삼학을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수행으로 간주하였는데,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의 준수와 실행이 필요로 한다.
이 계율은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어떤 일들로 인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각 계율들이 생겨났는데, 이들 계율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크게 열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를 십구의(十句義)라고 한다.
첫 번째, 대중의 통솔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대중의 화합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대중의 안락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부끄러워할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 번째,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이다.
아홉 번째, 후세의 욕망과 악행을 끊기 위한 것이다.
열 번째, 정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율이 어떻게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부처님 생전 당시 제자들은 스승의 심오한 말씀을 문자화하기를 꺼려하였다. 그것은 문자화 작업으로 인해 말씀의 내적인 의미와 깊이가 좁아들고, 또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송으로, 즉 스승의 말씀을 전부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 사이에 더 이상 세월이 흘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처님의 계율을 문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정리하여 편찬하였는데 이를 결집이라고 한다. 제 1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해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하 부근의 칠엽굴에서 개최되었는데, 500명의 비구가 모여 경과 율의 이장(二藏)의 내용을 정하여 기록하였다. 이때 율장에 있어서는 부처님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법회에도 가장 많이 참석하였던 아난다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제 1차 결집을 ‘500결집’ 또는 ‘상좌결집’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 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 경, 계율에 대한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하여 생겨났다. 당시 인도 웨살리 지역의 젊은 비구들은 이미 제정된 계율과 의견을 달리하는 십사(十事) 십사(十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적은 양의 소금은 지녀도 좋다. 두 번째, ‘해시계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 개가 지난 뒤에라도 공양할 수 있다. 세 번째, 밥을 먹은 뒤에 더 먹을 수 있다. 네 번째, 도량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도 먹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우유에 꿀과 설탕을 타서 먹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덜 익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일곱 번째, 신체의 크기에 따라 좌구를 만들 수 있다. 여덟 번째, 선배가 하던 일을 따르면 설사 율이 아니더라도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대중에게 갈마법(승가의 대중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술하는 것)을 짓고, 나중에 다른 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열 번째, 금이나 은을 지녀도 된다.
를 제시하고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명의 비구가 웨살리에 모여 십사(十事)가 계율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그 뒤 정통 계율에 대한 결집을 하였다. 이를 제 2차 결집 또는 700결집이라고 한다. 참조: 수산, 불교와의 만남, 도서출판 마하야나, 2002, 66-68.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 내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보수파의 상좌부와 진보파의 대중부로 갈라지는 근본분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후 불교는 20여개의 부파로 나눠지게 된다. 이 분파와 함께 각 부파별로 나름대로의 계율이 정리되어 오늘날 여러 가지의 율장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현재 비구는 250가지, 비구니는 348가지의 계를 지킨다. 이중에서 바라이(Parajika) 대음계(大淫戒), 대도계(大盜戒), 대살계(代殺戒), 대망어계(大妄語系).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하는 것이다. 이 계를 범하면 스님의 신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스님이 될 수 없게 된다. 이 바라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비구에게는 네 가지이며, 비구니에게는 여덟 가지가 있다. 비구에게 해당되는 바라이 네 가지는 음행, 큰 도둑질, 살인 혹은 살인이나 자살교사 및 방조, 큰 거짓말이다.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네 가지가 더해진다. 흑심을 품은 남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흑심을 품은 남자와 함께 여덟 가지 일을 기약해서는 안 된다.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숨겨서는 안 된다. 대중에서
1.2 승가계율
계율이란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 규범이며 출가자의 궁극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 필수 요건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계는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치는 의미로서 수행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서원이고, 율은 규율로서 어겼을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다. 불교승가는 계(戒)정(定)혜(慧), 세 가지 배움의 길(三學)을 기본 실천 덕목으로 가지고 있다. 근본 불교에서는 이 삼학을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수행으로 간주하였는데,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의 준수와 실행이 필요로 한다.
이 계율은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되는 어떤 일들로 인해,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각 계율들이 생겨났는데, 이들 계율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크게 열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를 십구의(十句義)라고 한다.
첫 번째, 대중의 통솔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대중의 화합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 대중의 안락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 부끄러워할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일곱 번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을 키워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 번째, 현세의 번뇌를 끊기 위한 것이다.
아홉 번째, 후세의 욕망과 악행을 끊기 위한 것이다.
열 번째, 정법을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율이 어떻게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을까? 부처님 생전 당시 제자들은 스승의 심오한 말씀을 문자화하기를 꺼려하였다. 그것은 문자화 작업으로 인해 말씀의 내적인 의미와 깊이가 좁아들고, 또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송으로, 즉 스승의 말씀을 전부 외워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 사이에 더 이상 세월이 흘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부처님의 계율을 문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정리하여 편찬하였는데 이를 결집이라고 한다. 제 1결집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해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하 부근의 칠엽굴에서 개최되었는데, 500명의 비구가 모여 경과 율의 이장(二藏)의 내용을 정하여 기록하였다. 이때 율장에 있어서는 부처님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법회에도 가장 많이 참석하였던 아난다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제 1차 결집을 ‘500결집’ 또는 ‘상좌결집’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 2차 결집은 불멸 후 100년 경, 계율에 대한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면서,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하여 생겨났다. 당시 인도 웨살리 지역의 젊은 비구들은 이미 제정된 계율과 의견을 달리하는 십사(十事) 십사(十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적은 양의 소금은 지녀도 좋다. 두 번째, ‘해시계의 그림자가 손가락 두 개가 지난 뒤에라도 공양할 수 있다. 세 번째, 밥을 먹은 뒤에 더 먹을 수 있다. 네 번째, 도량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도 먹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우유에 꿀과 설탕을 타서 먹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덜 익은 술을 마실 수 있다. 일곱 번째, 신체의 크기에 따라 좌구를 만들 수 있다. 여덟 번째, 선배가 하던 일을 따르면 설사 율이 아니더라도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대중에게 갈마법(승가의 대중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진술하는 것)을 짓고, 나중에 다른 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열 번째, 금이나 은을 지녀도 된다.
를 제시하고 실행하였다. 이로 인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명의 비구가 웨살리에 모여 십사(十事)가 계율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그 뒤 정통 계율에 대한 결집을 하였다. 이를 제 2차 결집 또는 700결집이라고 한다. 참조: 수산, 불교와의 만남, 도서출판 마하야나, 2002, 66-68.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불교 내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보수파의 상좌부와 진보파의 대중부로 갈라지는 근본분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후 불교는 20여개의 부파로 나눠지게 된다. 이 분파와 함께 각 부파별로 나름대로의 계율이 정리되어 오늘날 여러 가지의 율장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현재 비구는 250가지, 비구니는 348가지의 계를 지킨다. 이중에서 바라이(Parajika) 대음계(大淫戒), 대도계(大盜戒), 대살계(代殺戒), 대망어계(大妄語系).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하는 것이다. 이 계를 범하면 스님의 신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스님이 될 수 없게 된다. 이 바라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비구에게는 네 가지이며, 비구니에게는 여덟 가지가 있다. 비구에게 해당되는 바라이 네 가지는 음행, 큰 도둑질, 살인 혹은 살인이나 자살교사 및 방조, 큰 거짓말이다.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네 가지가 더해진다. 흑심을 품은 남자를 만져서는 안 된다. 흑심을 품은 남자와 함께 여덟 가지 일을 기약해서는 안 된다.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줄 알면서도 숨겨서는 안 된다. 대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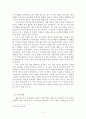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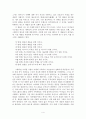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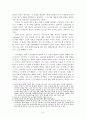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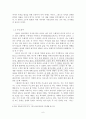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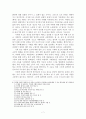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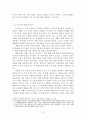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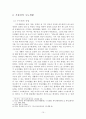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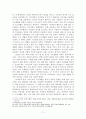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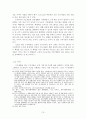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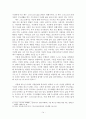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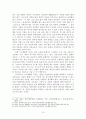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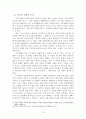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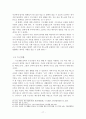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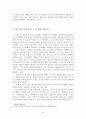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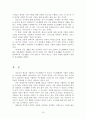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