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분이란
2. 삼국시대 고분의 형태
3.백제시대 고분
4.능산리 고분
5.송산리 고분
6.무령왕릉
2. 삼국시대 고분의 형태
3.백제시대 고분
4.능산리 고분
5.송산리 고분
6.무령왕릉
본문내용
어 있다. 표면의 유약은 전체적으로 산화되었으나 입과 목의 안쪽에는 흑갈색의 유(釉)가 남아 있다. 유약은 원래는 흑색유를 시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받침있는 은잔
동탁은잔은 청동제 받침(동탁)과 은으로 만든 잔(은잔)을 합친 것이다. 받침 은 낮은 대각이 달린 접시 모양인데 정 중앙에는 은잔을 받치기 위한 속이 빈 원통형의 받침이 솟아 있다. 여기에 은잔의 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걸치게 고안되어 있다.
마치 단아한 산봉우리와 같이 만든 잔 뚜껑에는 산과 산사이의 골짜기에 짐승이 노닐고 있으며, 위로 올라가며 나무가 새겨져 있고 꼭대기에는 연꽃잎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뚜껑 덮인 잔의 윗부분에는 구름무늬가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그 밑으로 3 마리의 용이 유유히 날고 있으며, 이 모두를 연꽃과 고사리 같은 꽃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금동그릇
모두 3점 출토되었다. 1점(A)은 왕비의 머리 쪽에서, 2점(B,C)은 연도입구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A의 전체형태는 반원상이다. 구연 내면에 턱진 점은 위의 발과 같다. 구연 바로 아래에 2줄의 횡침선을 돌렸다. 굽은 0.9cm정도로 높은 편이다. B와 C는 모두 구연이 외반되었고 구연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1cm가량 돌출된 돌대를 2줄 돌렸다. 굽 은 0.6cm내외의 높이로 A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금동접시
전체적인 형태는 깊이가 얕은 원형의 용기이며 내면에 침선이 있어 뚜껑보다는 접시로 사용되었을 것 같다. 구연은 윗면이 둥글며 두툼하고 아랫면이 직선적인데 구연 끝을 뾰족하다.
▼금동수저
무령왕릉 출토 수저 가운데 숟가락은 몸체가 은행알 모양이고 손잡이가 끝으로 가면서 넓어져서 길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젓가락의 경우는 지름면이 각(角)져 있다. 무령왕릉의 숟가락은 여러 줄의 돋을선과 가는선을 새겨서 화려하게 장식하여 그 품격을 더해주고 있으며 젓가락 가운데에는 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 고려시대의 젓가락처럼 끈으로 묶는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무령왕릉의 숟가락과 꼭 같은 숟가락이 이와 비슷한 시기의 일본의 무덤에서 출 토 된 바 있어 백제와 일본과의 문물교류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목관
무령왕, 왕비의 목관은 모두 5cm 두께로 잘 다듬은 판재를 짜 맞추어 상자모양의 관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장의 판재를 짜 맞춘 뚜껑을 덮어 마치 맞배지붕의 가옥처럼 만들었다. 목관 판재의 안팎에는 두텁게 옻칠을 하고 관고리와 관못에도 은꽃으로 장식하여 그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왕, 왕비의 목관 모두 홈을 파서 결합하고 못의 모양이나 장식 그리고 관을 운반하기 위한 관고리 가 모두 같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왕의 목관이 5장의 판재 뚜껑을 짜 맞춘데 비하여 왕비의 목관은 보다 넓은 판재 3장으로 짜 맞춘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한편 목관의 뚜껑과 측판의 안에는 금박이 입혀진 작은 청동 못들이 각각 3열,1열씩 박 혀 있어 관내부에 비단과 같은 천을 붙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목관은 무령왕릉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무덤인 익산 쌍릉에서도 나왔다. 그러 나 관못이나 관고리 장식이 같은 점 이외에, 머리 쪽이 넓고 발쪽이 좁으며 한 장의 판재 로 만든 뚜껑 등은 낙랑의 목관에 많이 보인다. 따라서 무령왕릉의 목관은 무령왕릉 목관 만이 지니는 독특한 구조로 된 목관이라 할 수 있다.
왕 관련 유물
관장식 뒤꽃이 귀걸이
허리띠 장식 신발 발받침
용 봉황을 장식한 큰 칼 청동거울 청동거울
왕비관련 유물
관장식 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글자있는 은팔찌 베개 발받침 신발
청동 다리미 금 은장식된 칼
③무령왕릉 발견의 의의
무령왕릉 발견의 가장 큰 의의는 수많은 삼국시대 고분 중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첫 번째 왕릉이라는 사실이다. 경주에 155개의고분이 있지만 출토 유물의 피장자가 확인 된 예는 하나도 없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령왕릉 출토품은 백제뿐만 아 니라 신라, 고구려 나아가서 일본 유물의 편년을 잡는 기준이 되었다. 더욱이 무령왕릉의 지석에 적혀 있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 고대사의 기록에 대한 정확성을 보증해준 첫 번째 쾌거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백제의 미술, 백제의 문화에 대하여 심정적으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유물의 부족으로 실증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신라, 고구려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백제의 역사를 다시 무대 위로 부상시켜 놓은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려의 정 통성을 신라에 두고 기술함으로서 백제는 항시 부차적으로 설명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 기서 기준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1300년간 땅속에 묻혔던 백제의 역사를 지 상으로 끌어올렸다는 말까지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령왕릉의 구조와 출토 유물은 중국 양나 라 양식을 충분히 모방해다는 것이다. 즉 왕과 왕비의 시신이 무덤 안쪽(북쪽)이 아니라 문쪽(남쪽)으로 머리를 둔 점, 중국식의 돌짐승 지킴이, 중국 청자 항아리와 병, 중국 백자 등잔, 한나라 거울을 본뜬 청동거울, 중국화폐인 오수전, 양나라식의 연화문 벽돌 등을 보 면 만약에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이 나오지 않았다면 많은 학자들이 양나라에서 귀화해 온 귀족이나 장수의 무덤이었다고 추측했을 만큼 중국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무령왕의 단순한 ‘외국상품 선호취미’가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성취를 따 라 잡으려는 노력이며, 그런 그의 대담한 문화적 개방성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흑자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이 일본에만 있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과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백제가 고대 해상제국이라고 보 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이를 완전히 허구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참고문헌◀
『백제의 고분문화』, 이남석, 서경, 2002
『국립 부여 박물관』싸이트
『국립 공주 박물관』싸이트
각종 인터넷 자료
▼받침있는 은잔
동탁은잔은 청동제 받침(동탁)과 은으로 만든 잔(은잔)을 합친 것이다. 받침 은 낮은 대각이 달린 접시 모양인데 정 중앙에는 은잔을 받치기 위한 속이 빈 원통형의 받침이 솟아 있다. 여기에 은잔의 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걸치게 고안되어 있다.
마치 단아한 산봉우리와 같이 만든 잔 뚜껑에는 산과 산사이의 골짜기에 짐승이 노닐고 있으며, 위로 올라가며 나무가 새겨져 있고 꼭대기에는 연꽃잎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뚜껑 덮인 잔의 윗부분에는 구름무늬가 부드럽게 표현되었고, 그 밑으로 3 마리의 용이 유유히 날고 있으며, 이 모두를 연꽃과 고사리 같은 꽃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다.
▼금동그릇
모두 3점 출토되었다. 1점(A)은 왕비의 머리 쪽에서, 2점(B,C)은 연도입구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A의 전체형태는 반원상이다. 구연 내면에 턱진 점은 위의 발과 같다. 구연 바로 아래에 2줄의 횡침선을 돌렸다. 굽은 0.9cm정도로 높은 편이다. B와 C는 모두 구연이 외반되었고 구연 끝이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동체부에는 1cm가량 돌출된 돌대를 2줄 돌렸다. 굽 은 0.6cm내외의 높이로 A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금동접시
전체적인 형태는 깊이가 얕은 원형의 용기이며 내면에 침선이 있어 뚜껑보다는 접시로 사용되었을 것 같다. 구연은 윗면이 둥글며 두툼하고 아랫면이 직선적인데 구연 끝을 뾰족하다.
▼금동수저
무령왕릉 출토 수저 가운데 숟가락은 몸체가 은행알 모양이고 손잡이가 끝으로 가면서 넓어져서 길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젓가락의 경우는 지름면이 각(角)져 있다. 무령왕릉의 숟가락은 여러 줄의 돋을선과 가는선을 새겨서 화려하게 장식하여 그 품격을 더해주고 있으며 젓가락 가운데에는 손잡이 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들어 고려시대의 젓가락처럼 끈으로 묶는 고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무령왕릉의 숟가락과 꼭 같은 숟가락이 이와 비슷한 시기의 일본의 무덤에서 출 토 된 바 있어 백제와 일본과의 문물교류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목관
무령왕, 왕비의 목관은 모두 5cm 두께로 잘 다듬은 판재를 짜 맞추어 상자모양의 관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장의 판재를 짜 맞춘 뚜껑을 덮어 마치 맞배지붕의 가옥처럼 만들었다. 목관 판재의 안팎에는 두텁게 옻칠을 하고 관고리와 관못에도 은꽃으로 장식하여 그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왕, 왕비의 목관 모두 홈을 파서 결합하고 못의 모양이나 장식 그리고 관을 운반하기 위한 관고리 가 모두 같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왕의 목관이 5장의 판재 뚜껑을 짜 맞춘데 비하여 왕비의 목관은 보다 넓은 판재 3장으로 짜 맞춘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한편 목관의 뚜껑과 측판의 안에는 금박이 입혀진 작은 청동 못들이 각각 3열,1열씩 박 혀 있어 관내부에 비단과 같은 천을 붙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목관은 무령왕릉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무덤인 익산 쌍릉에서도 나왔다. 그러 나 관못이나 관고리 장식이 같은 점 이외에, 머리 쪽이 넓고 발쪽이 좁으며 한 장의 판재 로 만든 뚜껑 등은 낙랑의 목관에 많이 보인다. 따라서 무령왕릉의 목관은 무령왕릉 목관 만이 지니는 독특한 구조로 된 목관이라 할 수 있다.
왕 관련 유물
관장식 뒤꽃이 귀걸이
허리띠 장식 신발 발받침
용 봉황을 장식한 큰 칼 청동거울 청동거울
왕비관련 유물
관장식 귀걸이 금목걸이 금팔찌
글자있는 은팔찌 베개 발받침 신발
청동 다리미 금 은장식된 칼
③무령왕릉 발견의 의의
무령왕릉 발견의 가장 큰 의의는 수많은 삼국시대 고분 중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첫 번째 왕릉이라는 사실이다. 경주에 155개의고분이 있지만 출토 유물의 피장자가 확인 된 예는 하나도 없다. 고구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령왕릉 출토품은 백제뿐만 아 니라 신라, 고구려 나아가서 일본 유물의 편년을 잡는 기준이 되었다. 더욱이 무령왕릉의 지석에 적혀 있는 기록이 『삼국사기』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 고대사의 기록에 대한 정확성을 보증해준 첫 번째 쾌거이다.
또 하나는 그동안 백제의 미술, 백제의 문화에 대하여 심정적으로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유물의 부족으로 실증하지 못했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신라, 고구려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다. 백제가 멸망한 뒤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백제의 역사를 다시 무대 위로 부상시켜 놓은 것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려의 정 통성을 신라에 두고 기술함으로서 백제는 항시 부차적으로 설명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여 기서 기준을 잡게 되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1300년간 땅속에 묻혔던 백제의 역사를 지 상으로 끌어올렸다는 말까지 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령왕릉의 구조와 출토 유물은 중국 양나 라 양식을 충분히 모방해다는 것이다. 즉 왕과 왕비의 시신이 무덤 안쪽(북쪽)이 아니라 문쪽(남쪽)으로 머리를 둔 점, 중국식의 돌짐승 지킴이, 중국 청자 항아리와 병, 중국 백자 등잔, 한나라 거울을 본뜬 청동거울, 중국화폐인 오수전, 양나라식의 연화문 벽돌 등을 보 면 만약에 무령왕과 왕비의 지석이 나오지 않았다면 많은 학자들이 양나라에서 귀화해 온 귀족이나 장수의 무덤이었다고 추측했을 만큼 중국풍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는 무령왕의 단순한 ‘외국상품 선호취미’가 아니라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성취를 따 라 잡으려는 노력이며, 그런 그의 대담한 문화적 개방성은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흑자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관이 일본에만 있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과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백제가 고대 해상제국이라고 보 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이를 완전히 허구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참고문헌◀
『백제의 고분문화』, 이남석, 서경, 2002
『국립 부여 박물관』싸이트
『국립 공주 박물관』싸이트
각종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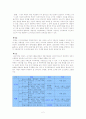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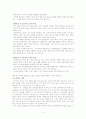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