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땅에.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죠?’ ‘모든 여자는 떠나지 않아요. 남자가 움직일 뿐이죠’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세대는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며 의식의 변화를 꾀한다. 또 ‘엄마도 바보처럼 굴지 마. 부끄러움의 시대는 끝났어. 떠날 거 없어, 보상 받아야 해’라는 대사를 통해 수잔은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새롭게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잔은 미군을 상대할 때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부딪칠 때도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지배자인 미국인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남들 앞에 자신을 당당히 내세운다. 수잔은 한국 역사속에서 고착화된 인식 즉, 식민주의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더러운 피’를 가진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며, 엄마에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따라 떠나는 수동적인 사고 대신에 능동적으로 남자를 이 한국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엄마의 과거는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여 사회에 고착화된 혼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다.
그런 점에서 수잔을 억압과 사회의 지탄에 강렬하게 도전하는 주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수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식민체제라는 비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혼혈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이 작품은 삼대에 걸친 여인의 수난사를 통해 식민주의가 가져온 불행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수잔이라는 인물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온갖 일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친족으로부터 살해당한다는 잔인한 결말을 맞이하며, 이것이 매우 직접적인 대사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에 나오는 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뒤따르는 관념과 표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미개하고 암흑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식해 왔다.
어둠이 있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빛이 존재해야 하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들이 지닌 민주주의나 합리성, 과학성 등을 한국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마치 그들이 한국의 평화와 근대화를 원조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그들의 식민체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것이다. 이 점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 서구인들이 말하는 동양의 이미지가 그들의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사이드(Said)의 명저.
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구세계가 식민지 지배와 정복, 억압과 고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백인우월주의나 유럽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인들의 사고가 일부 민족의식을 잃어버린 한국인들에게 진리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친일행동과 지배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탈식민주의 희곡은 점차 이러한 사회 현실을 떠올리고, 단순히 지배국의 횡포를 꼬집어 내어 비판하는 것에서 확대되어 최근에는 식민주의자나 제국주의자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배격하고, 한 나라 안의 내재적 모순과 병폐에도 눈을 돌려 소수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내적 식민주의’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
오늘날 이른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식민화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 미국의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정보의 주도하에 전세계 민중들의 물질적 재생산과 정신의 영역이 지구적 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흡수되어 자신의 문화와 전통,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그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제적 문화적 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명목상의 식민체제를 벗어난 지금의 현실상황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놓여 있다. 식민통치의 종식이 곧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맞설 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다시금 식민현실을 겪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현대극의 탈식민성>, 공주대학교 출판부, 송재일, 이동배, 2004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죠?’ ‘모든 여자는 떠나지 않아요. 남자가 움직일 뿐이죠’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세대는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며 의식의 변화를 꾀한다. 또 ‘엄마도 바보처럼 굴지 마. 부끄러움의 시대는 끝났어. 떠날 거 없어, 보상 받아야 해’라는 대사를 통해 수잔은 엄마가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새롭게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잔은 미군을 상대할 때나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부딪칠 때도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지배자인 미국인과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남들 앞에 자신을 당당히 내세운다. 수잔은 한국 역사속에서 고착화된 인식 즉, 식민주의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더러운 피’를 가진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며, 엄마에게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말한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을 따라 떠나는 수동적인 사고 대신에 능동적으로 남자를 이 한국으로 불러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엄마의 과거는 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여 사회에 고착화된 혼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다.
그런 점에서 수잔을 억압과 사회의 지탄에 강렬하게 도전하는 주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수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식민체제라는 비극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혼혈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있다.
이 작품은 삼대에 걸친 여인의 수난사를 통해 식민주의가 가져온 불행을 지적하고 그것에서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수잔이라는 인물은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온갖 일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친족으로부터 살해당한다는 잔인한 결말을 맞이하며, 이것이 매우 직접적인 대사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 저항정신을 불러일으킨다.
이 작품에 나오는 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뒤따르는 관념과 표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미개하고 암흑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식해 왔다.
어둠이 있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빛이 존재해야 하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부정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들이 지닌 민주주의나 합리성, 과학성 등을 한국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마치 그들이 한국의 평화와 근대화를 원조해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그들의 식민체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것이다. 이 점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 <오리엔탈리즘 Orientalism> : 서구인들이 말하는 동양의 이미지가 그들의 편견과 왜곡에서 비롯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비판한 사이드(Said)의 명저.
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구세계가 식민지 지배와 정복, 억압과 고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백인우월주의나 유럽중심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널리 유포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국인들의 사고가 일부 민족의식을 잃어버린 한국인들에게 진리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친일행동과 지배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하여 탈식민주의 희곡은 점차 이러한 사회 현실을 떠올리고, 단순히 지배국의 횡포를 꼬집어 내어 비판하는 것에서 확대되어 최근에는 식민주의자나 제국주의자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배격하고, 한 나라 안의 내재적 모순과 병폐에도 눈을 돌려 소수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내적 식민주의’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
오늘날 이른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의 식민화는 거대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 미국의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정보의 주도하에 전세계 민중들의 물질적 재생산과 정신의 영역이 지구적 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흡수되어 자신의 문화와 전통,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그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된 경제적 문화적 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명목상의 식민체제를 벗어난 지금의 현실상황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놓여 있다. 식민통치의 종식이 곧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맞설 때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다시금 식민현실을 겪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현대극의 탈식민성>, 공주대학교 출판부, 송재일, 이동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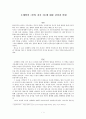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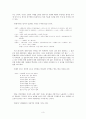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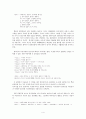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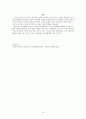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