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공동제작영화란?
1) 공동제작의 정의
2) 공동제작의 역사
2. 공동제작영화의 특징
1) 공동제작영화의 배경
2) 공동제작영화의 목적
3)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공동제작 영화 목적변화
3. 공동제작영화의 유형
1) 공동제작의 유형
2) 한국 중심 유형별 정리
4. 사례분석 - 영화 데이지
1) 선정 이유 및 줄거리
2) 영화 제작과정
3) 홍보
4) 흥행정도
5) 네티즌, 평론가 평가
(1) 네티즌 평가
(2) 평론가 평가 - 각종 영화관련 매체 참고
6) 문제점
5. 공동제작의 문제점과 대안
1) 공동제작영화의 문제점
(1)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지원 부족
(2) 의사소통 지연, 문화적 차이 문제
(3) 관세와 세금
(4) 한국에서 공동제작 영화 규정
(5)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통제력과 문화적 특수성의 상실
Ⅲ. 결론
Ⅱ. 본론
1. 국제공동제작영화란?
1) 공동제작의 정의
2) 공동제작의 역사
2. 공동제작영화의 특징
1) 공동제작영화의 배경
2) 공동제작영화의 목적
3)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공동제작 영화 목적변화
3. 공동제작영화의 유형
1) 공동제작의 유형
2) 한국 중심 유형별 정리
4. 사례분석 - 영화 데이지
1) 선정 이유 및 줄거리
2) 영화 제작과정
3) 홍보
4) 흥행정도
5) 네티즌, 평론가 평가
(1) 네티즌 평가
(2) 평론가 평가 - 각종 영화관련 매체 참고
6) 문제점
5. 공동제작의 문제점과 대안
1) 공동제작영화의 문제점
(1) 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지원 부족
(2) 의사소통 지연, 문화적 차이 문제
(3) 관세와 세금
(4) 한국에서 공동제작 영화 규정
(5)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통제력과 문화적 특수성의 상실
Ⅲ. 결론
본문내용
화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공동제작 영화가 특별히 자국 영화와 분리되어 적용되는 세금은 프린트를 국내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다. 현재 공동제작영화에 부과되는 관세는 자국영화 해외 로케이션과 외화 수입의 중간 지점 정도 수준이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공동제작 영화를 자국영화와 동일하게 분류 취급해야 공동제작영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관세를 자국영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고려할만하다.
(4) 한국에서 공동제작 영화 규정
한국 영화진흥법 시행규칙(1쪽, <표1 한국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참고)에서 공동제작영화를 규정한 항목 따라서 <임소요 Unknwon Pleasure> <크라잉 우먼 Crying Woman> <라스트 씬 Last Scene> 과 같은 영화가 2002년 이전에는 한국배우가 출연하지 않거나 한국감독이 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공동제작영화로 인정을 받아 한국영화 국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규제 개혁이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진흥법의 진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제작 영화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이 매우 단순하다는 이전 연구 지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제작 규정에서 출자비율을 규정하는 이유는 한쪽에서 일방적인 투자나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얼마나 투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자국영화 인정 기준을 변화시켰다. 프랑스에서 얼마의 돈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그 영화의 국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가 주요한 역할(majority)로 참여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전혀 프랑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프랑스영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자동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영국은 85년 영화법(99년 개정) 1번 항목에 근거해 영국영화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영화로 인정되려면 EC가 협력협정에 서명한 EU,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가 제작한 영화여야 하며 영화제작비의 70%가 영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돼야한다는 등의 세부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동제작 영화 규정이 단순히 공동제작영화제작을 고무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동제작 영화 활성화를 통해 자국영화 시장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자본 비율만을 규정하는 선에서 벗어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자국에서 소비되는 영화 자본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공동제작 영화에 불과한 작품들이 단순화된 규정, 풀린 규제를 악용해 속출하는 사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통제력과 문화적 특수성의 상실
단순한 투자만이 이루어진 소위 ‘예술영화’ 체계가 아니라면 공동제작물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특징 있는 인력에 관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문화적인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수반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EU 차원의 공동제작물에 대해 ‘유로푸딩(europudding)’ 이라는 달갑지 않은 명칭을 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때문에 공동제작 영화는 동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드라마나 탐정 모험시리즈와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게 한다. 아마 미국 같이 자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공동제작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며 또한 이것은 공동제작의 이유이기도 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Ⅲ. 결 론
공동제작영화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 있고, 한 걸음 더 진보된 영화를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영화제작에 있어서 공동제작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만들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류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역시 이러한 공동제작영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그 흐름에 편승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류열풍도 언젠가는 사그라질 것이지만 잘 다져놓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발전된 공동제작영화를 계속 선보인다면 관객들의 만족과 신뢰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공동제작 형태의 배경과 특징, 장/단점 등을 정확하게 인지, 활용하는 영리한 머리, 그리고 다국적 관객들의 감성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대다수의 공동제작영화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제반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은 이제 당연시되는 영화제작의 한 축이다. 공동제작영화는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 제작방식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동제작영화가 화려한 캐스팅과 광고에만 치우친 ‘빛 좋은 개살구’였다면, 이제는 속까지 꽉 찬 알짜배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공동제작영화가 한국영화산업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말 그대로 ‘문화의 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영화진흥연구원, <국제 공동제작에 관한 연구>,2001
영화진흥연구원, <아시아 공동제작 현황과 발전 방안>,2002-3
영화진흥연구원, <아시아 영화산업 현황과 지역내 협력방안 연구>,2000
▣ 참고 사이트
씨네 21 (www.cine21.com)
무비위크 (http://www.movieweek.co.kr)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공동제작 영화가 특별히 자국 영화와 분리되어 적용되는 세금은 프린트를 국내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다. 현재 공동제작영화에 부과되는 관세는 자국영화 해외 로케이션과 외화 수입의 중간 지점 정도 수준이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공동제작 영화를 자국영화와 동일하게 분류 취급해야 공동제작영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관세를 자국영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고려할만하다.
(4) 한국에서 공동제작 영화 규정
한국 영화진흥법 시행규칙(1쪽, <표1 한국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참고)에서 공동제작영화를 규정한 항목 따라서 <임소요 Unknwon Pleasure> <크라잉 우먼 Crying Woman> <라스트 씬 Last Scene> 과 같은 영화가 2002년 이전에는 한국배우가 출연하지 않거나 한국감독이 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공동제작영화로 인정을 받아 한국영화 국적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규제 개혁이나 간소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진흥법의 진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동제작 영화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이 매우 단순하다는 이전 연구 지적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제작 규정에서 출자비율을 규정하는 이유는 한쪽에서 일방적인 투자나 소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얼마나 투자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자국영화 인정 기준을 변화시켰다. 프랑스에서 얼마의 돈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그 영화의 국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가 주요한 역할(majority)로 참여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전혀 프랑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프랑스영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자동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영국은 85년 영화법(99년 개정) 1번 항목에 근거해 영국영화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영화로 인정되려면 EC가 협력협정에 서명한 EU, 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가 제작한 영화여야 하며 영화제작비의 70%가 영국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돼야한다는 등의 세부 항목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공동제작 영화 규정이 단순히 공동제작영화제작을 고무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동제작 영화 활성화를 통해 자국영화 시장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 자본 비율만을 규정하는 선에서 벗어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자국에서 소비되는 영화 자본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내용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늬만 공동제작 영화에 불과한 작품들이 단순화된 규정, 풀린 규제를 악용해 속출하는 사례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통제력과 문화적 특수성의 상실
단순한 투자만이 이루어진 소위 ‘예술영화’ 체계가 아니라면 공동제작물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특징 있는 인력에 관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문화적인 문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수반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EU 차원의 공동제작물에 대해 ‘유로푸딩(europudding)’ 이라는 달갑지 않은 명칭을 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 때문에 공동제작 영화는 동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드라마나 탐정 모험시리즈와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게 한다. 아마 미국 같이 자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여 공동제작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며 또한 이것은 공동제작의 이유이기도 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Ⅲ. 결 론
공동제작영화는 영화의 시작과 함께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 있고, 한 걸음 더 진보된 영화를 원하는 관객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영화제작에 있어서 공동제작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만들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류라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한국 역시 이러한 공동제작영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그 흐름에 편승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한류열풍도 언젠가는 사그라질 것이지만 잘 다져놓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발전된 공동제작영화를 계속 선보인다면 관객들의 만족과 신뢰 역시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공동제작 형태의 배경과 특징, 장/단점 등을 정확하게 인지, 활용하는 영리한 머리, 그리고 다국적 관객들의 감성을 파악하는 날카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대다수의 공동제작영화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와 같은 제반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제작은 이제 당연시되는 영화제작의 한 축이다. 공동제작영화는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며, 그 제작방식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동제작영화가 화려한 캐스팅과 광고에만 치우친 ‘빛 좋은 개살구’였다면, 이제는 속까지 꽉 찬 알짜배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공동제작영화가 한국영화산업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말 그대로 ‘문화의 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참고 문헌
영화진흥연구원, <국제 공동제작에 관한 연구>,2001
영화진흥연구원, <아시아 공동제작 현황과 발전 방안>,2002-3
영화진흥연구원, <아시아 영화산업 현황과 지역내 협력방안 연구>,2000
▣ 참고 사이트
씨네 21 (www.cine21.com)
무비위크 (http://www.movieweek.co.kr)
티켓링크 (http://www.ticketlink.co.kr)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
키워드
추천자료
 한국 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영화의 현황과 문제점 한.일 양국간의 교역구조로 본 한.일 FTA
한.일 양국간의 교역구조로 본 한.일 FTA [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구조 및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과 ...
[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구조 및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쟁과 ... [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한국영화와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한국영화산업 자본 및...
[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한국영화와 한국영화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한국영화산업 자본 및... [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한국영화사,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스크린쿼터의 변천사, 스크린쿼...
[한국영화][한국영화산업]한국영화사,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스크린쿼터의 변천사, 스크린쿼...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민족교육]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
[재일동포][재일교포][동포][교포][민족교육]재일동포의 사회적 의미, 재일동포의 형성과 분... 미국 헐리우드(할리우드)영화 역사와 성장, 미국 헐리우드(할리우드)영화 특성과 현황, 미국 ...
미국 헐리우드(할리우드)영화 역사와 성장, 미국 헐리우드(할리우드)영화 특성과 현황, 미국 ... 지역사회내 위 가정들의 한국문화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프로그
지역사회내 위 가정들의 한국문화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고 프로그 태평양의 강수알고리즘, 태평양의 어업생물조사, 태평양의 꽁치자원, 태평양과 한국영화해외...
태평양의 강수알고리즘, 태평양의 어업생물조사, 태평양의 꽁치자원, 태평양과 한국영화해외... 동북아시아(동북아) 농업교류, 동북아시아(동북아) 문화협력, 동북아시아(동북아) 환경협력회...
동북아시아(동북아) 농업교류, 동북아시아(동북아) 문화협력, 동북아시아(동북아) 환경협력회...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과 주요 사업(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점센터, 지...
[다문화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황과 주요 사업(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거점센터, 지... 본인 거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을 한 곳 선정하여 해당 현장의 운영주체, 설립목적, ...
본인 거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실천 현장을 한 곳 선정하여 해당 현장의 운영주체, 설립목적, ...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 혹은 실패하는 사례를 ...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성공 혹은 실패하는 사례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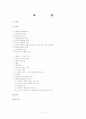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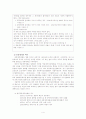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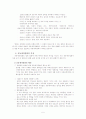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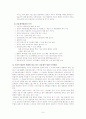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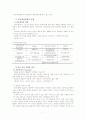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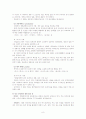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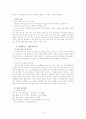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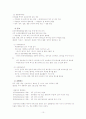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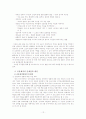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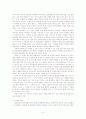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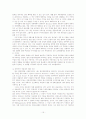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