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1)최씨정권의 성립
2) 최씨가의 권력세습
3) 최씨정권의 붕괴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1)최씨정권의 성립
2) 최씨가의 권력세습
3) 최씨정권의 붕괴
본문내용
에 이르러 무너지고 말았다. 최의가 권력을 계승한 후 불과 11개월만인 고종 45년(1258)의 일이었다. 최의는 최항의 심복이었던 金陵 柳璥 등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김준 유경 등이 최의를 제거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최의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된 데에 있었다한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최씨정권의 몰락 이유가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대 62년 동안 지속되었던 최씨정권의 몰락을 단순히 최의와 김준 유경 등의 인간관계에서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씨정권을 지탱해 온 여러 요인들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최씨정권은 몰락했다고 이해된다.
최씨가의 마지막 집권자인 최의는 불과 11개월을 집권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몰락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 초의집권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몰락의 징후는 그 이전부터 최씨정권에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주목되는 것은 최항의 권력 계승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불만이 최씨정권 내부 인물들 사이에 심각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붕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항 정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항은 애초부터 최이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었다. 최이가 처음에 그의 후계자로 내정한 인물은 그의 사이인 김약선이었던 것이다. 김약선의 후계자 지명과 함께 최이는 그의 서자인 萬宗과 萬全을 송광사에 출가시켰다. 그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한다. 만전은 최항이란 이름으로 환속하기 전까지 선승이었던 것이다. 최항이 최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김약선을 피해출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에는 그가 적자가 아닌 서자였으며, 더구나 그의 기생출신 모계가 천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충헌 정권을 성립시킨 무인들은 비교적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의 자손들 역시 최씨정권 아래에서 크게 출세하였다. 즉 최씨정권 아래서는 기존의 신분질서가 존중되었다고 판단해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기생의 소생인 최항은 당시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된다. 최항이 김약선을 피해 송광사에 출가했다가 환속하여 최이의 후계자가 된 것은 최이에 의해 김약선이 제거된 이후였다.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최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진통은 겪었다.
최항은 관료들을 철저하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崔泫나 崔搖를 비롯한 당시의 재상들이 몽과와의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항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것은 최이정권 아래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최항정권에서는 최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최항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개편이 불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최항정권은 최이정권과는 달리 일정한 한계를 진고 있었다. 그것은 4차에 걸친 국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封侯立府’를 거절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러한 입부는 당시로서는 집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했던 것 같다. 최이의 경우, 고종 8년에 입부를 거절했다가 21년에는 부를 설치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최이가 봉후입부를 고사했던 것은. 이 때가 그의 집권 초기였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시기였던 것이다.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과정이나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료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던 최항은, 집권 이후 그의 심복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그의 심복으로는 우선 최씨가의 가노였던 이공주 최양백 김준등을 들 수 있다. 집권자의 심복이 그들의 지위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최항 심복들의 경우 최충헌이나 최이의 심복들보다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최항이 관리들 내부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최항의 심복들은 최의가 권력을 승계한 것을 계기로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 즉 김준은 최의가 최양백과 유능만을 총애하고 신임하여 자신을 소외시킨 데 대해 불평ㅇ르 품었다 한다. 사실 정치권력의 핵심에 근접해 있는 심복들 간에 집권자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집권자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심복들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집권자의 심복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심복들 간의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항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의는 최항과 마찬가지로 모계가 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렸다. 그의 어머니느 장군 宋의 여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심복에 대한 그의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심복들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없었음도 무리가 아니다. 정권을 지탱해 온 심복들의 내부 분열은 결국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준은 추밀원사 崔과 상장군 朴成梓를 그 주모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최온은 최항의 장인이었다. 철원최씨인 그의 가문은 최충헌의 집안과 중첩적인 혼인을 맺은 당대 최고의 귀족가문이었다. 한편 박성재는 최항의 문객이었다. 김준이 최의 제거의 주모자로 이들을 내세운 것은 최씨정권과 밀착한 인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었다. 최온과 박성재는 김준에게 협력하였다. 이는 최씨정권에 밀착되었던 다수의 인물들이 최씨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따라서 최의 제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최씨정권은 오랫동안 최씨가에 충성을 바쳐 온 인물들에 의해 막을 내렸다. 야별초와 신의군, 그리고 도방이 최의 제거에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야별초나 신의군도 도방과 마찬가지로 최씨가의 사병처럼 이용되어 온 부대였음을 감안하면, 최의는 최씨정권이 의존해 온 군사력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해 온 최씨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그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치권력도 최씨정권과 밀착되었던 인물들이 장악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최씨가의 마지막 집권자인 최의는 불과 11개월을 집권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몰락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 초의집권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몰락의 징후는 그 이전부터 최씨정권에 내재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주목되는 것은 최항의 권력 계승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불만이 최씨정권 내부 인물들 사이에 심각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붕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항 정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항은 애초부터 최이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었다. 최이가 처음에 그의 후계자로 내정한 인물은 그의 사이인 김약선이었던 것이다. 김약선의 후계자 지명과 함께 최이는 그의 서자인 萬宗과 萬全을 송광사에 출가시켰다. 그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한다. 만전은 최항이란 이름으로 환속하기 전까지 선승이었던 것이다. 최항이 최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김약선을 피해출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데에는 그가 적자가 아닌 서자였으며, 더구나 그의 기생출신 모계가 천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충헌 정권을 성립시킨 무인들은 비교적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의 자손들 역시 최씨정권 아래에서 크게 출세하였다. 즉 최씨정권 아래서는 기존의 신분질서가 존중되었다고 판단해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기생의 소생인 최항은 당시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된다. 최항이 김약선을 피해 송광사에 출가했다가 환속하여 최이의 후계자가 된 것은 최이에 의해 김약선이 제거된 이후였다.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최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진통은 겪었다.
최항은 관료들을 철저하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崔泫나 崔搖를 비롯한 당시의 재상들이 몽과와의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항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것은 최이정권 아래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최항정권에서는 최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최항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개편이 불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최항정권은 최이정권과는 달리 일정한 한계를 진고 있었다. 그것은 4차에 걸친 국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封侯立府’를 거절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러한 입부는 당시로서는 집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했던 것 같다. 최이의 경우, 고종 8년에 입부를 거절했다가 21년에는 부를 설치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최이가 봉후입부를 고사했던 것은. 이 때가 그의 집권 초기였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시기였던 것이다.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과정이나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료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던 최항은, 집권 이후 그의 심복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그의 심복으로는 우선 최씨가의 가노였던 이공주 최양백 김준등을 들 수 있다. 집권자의 심복이 그들의 지위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최항 심복들의 경우 최충헌이나 최이의 심복들보다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최항이 관리들 내부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최항의 심복들은 최의가 권력을 승계한 것을 계기로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 즉 김준은 최의가 최양백과 유능만을 총애하고 신임하여 자신을 소외시킨 데 대해 불평ㅇ르 품었다 한다. 사실 정치권력의 핵심에 근접해 있는 심복들 간에 집권자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집권자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심복들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집권자의 심복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심복들 간의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항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의는 최항과 마찬가지로 모계가 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렸다. 그의 어머니느 장군 宋의 여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심복에 대한 그의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심복들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없었음도 무리가 아니다. 정권을 지탱해 온 심복들의 내부 분열은 결국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준은 추밀원사 崔과 상장군 朴成梓를 그 주모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최온은 최항의 장인이었다. 철원최씨인 그의 가문은 최충헌의 집안과 중첩적인 혼인을 맺은 당대 최고의 귀족가문이었다. 한편 박성재는 최항의 문객이었다. 김준이 최의 제거의 주모자로 이들을 내세운 것은 최씨정권과 밀착한 인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었다. 최온과 박성재는 김준에게 협력하였다. 이는 최씨정권에 밀착되었던 다수의 인물들이 최씨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따라서 최의 제거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음을 말해준다. 결국 최씨정권은 오랫동안 최씨가에 충성을 바쳐 온 인물들에 의해 막을 내렸다. 야별초와 신의군, 그리고 도방이 최의 제거에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야별초나 신의군도 도방과 마찬가지로 최씨가의 사병처럼 이용되어 온 부대였음을 감안하면, 최의는 최씨정권이 의존해 온 군사력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해 온 최씨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그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치권력도 최씨정권과 밀착되었던 인물들이 장악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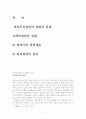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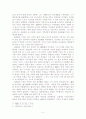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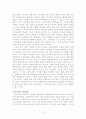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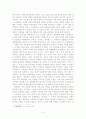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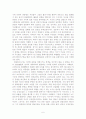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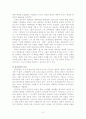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