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 문
3. 결 론
2. 본 문
3. 결 론
본문내용
의 꼭지점이 대립하는 다른 꼭지점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채란읜 경우에는 재상가의 정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재상가의 정처를 차지함으로써 부(富)와 지휘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는 동청도 마찬가지이다, 교채란과 다른점이 있다면 부와 지위 뿐만 아니라 미색(美色)도 욕망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냉진의 경우, 욕망의 대상은 부와 미색이다. 동청의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 교채란을 차지할 수 있으며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실의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이러한 기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채란, 동청, 냉진이 욕망하는 상대역의 위치는 중세의 현실에서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의 세계이며, 이러한 기득권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은 중세체제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욕망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이들은 ‘모략(謀略)’과 ‘참소(讒訴)’, ‘배신(背信)’ 등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책을 수단으로 동원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연수와 사정옥이 재회한 이후에 전개되는 작품의 종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씨남정기』는 이들 욕망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아무런 장애없이 현실에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서사적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신들의 기도를 실현시켜 나가는 반면 욕망의 대상들은 너무도 무력하게 이들에게 패배해 나간다. 너무도 우연히 그리고 급작스럽게 설매가 자신의 전비(前非)를 뉘우치고, 황제가 자신의 혼암(昏暗)을 깨우치지 못했던들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여전히 현실의 승리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이처럼 욕망의 공간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작품의 세계에서처럼 이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무력한 것이라면 중세 사회의 명분론적 질서가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품세계에서는 유연수가 교채란의 계교에 휩싸여 정처인 사정옥을 폐출했지만, 이는 정처를 폐출하고 첩을 정처로 삼는 일이 명분론적 질서를 얼마나 훼손하는 것인가를 심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도적으로 되외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처(妻)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린될 것에 대비하여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소박정처죄(疏薄正妻罪)>와 같은 법적인 규제였다, 유신(儒臣)의 신분으로 정처를 소박했을 때는 중죄로 다루었던 것이다. 첩에 미혹되어 정처를 소박한 유신을 중죄한 예는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잘 소개되어 있다.
박용옥, 「이조여성사」, 한국일보사, 1976
한희수,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일조각 1994
백관의 비행 규찰과 풍속 교정이 가장 큰 임무였던 사헌부에서는 처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대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규찰을 철저히 하였다. 사헌부에서 사대부를 규찰한 점은 처첩간의 분별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가, 부당하게 기처(棄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박용옥, 앞의 책, 65~6면.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규제보다 더욱 효율적인 기제는 ‘양반의 혈통적인 공인’이었다. 양반신분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모(母)와 처에 의한 것이므로 모나 처의 신분뿐 아니라 그들의 행실까지도 늘 정치적인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측에서 기처할 경우, 그 명분을 처의 실행(失行)과 같은 것에 둘 수가 없었다, 기처한 처의 경우일지라도 처의 실행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읠 입신출세에 타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의 책. 68면.
처첩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현실의 기제에서 알 수 있듯이, 명분론적 질서를 훼손하는 욕망의추구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기제를 도외시한 채 욕망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에서 이처럼 욕망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교화주의적 의도를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준동하는 욕망에 대처하는 현실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현실의 명분론적 질서가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 욕망 제어의 현실적 기제를 소거하고 욕망의 공간을 허용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씨남정기』에서는 욕망을 통헤하는 현실의 기제를 소거함으로써 욕망의 대상이 되는 중심인물인 사정옥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고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씨남정기』에 선행하면서 『사씨남정기』의 창작에 일정하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선감의록』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경환은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에 선행하며, 『사씨남정기』는 『창선감의록』을 ‘축소모방’하여 단순구성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의글 334면)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에 선행한다는 추정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볼 여지는 있으나 필자도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사씨남정기』가 『창선감의록』을 ‘축소’해서 ‘모방’한 것이라는 판단에는동의하지 않는다. 『사씨남정기』가 『창선감의록』에 비해 서사적 편폭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있으나 ‘모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유연수와 혼인한다, 혼인의 과정에서 시아버지 유현은 우화함 묘혜를 사정옥에게 보내 관음찬을 짓게 하여 이를 보고 사정옥의 재덕을 확인한다.
㉯ 후사가 없자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교채란을 천거하여 첩으로 맞아들인다.
㉰ 교채란이 탄금하는 소리르 듣고 이를 타이르다. 유연수가 동청을 서사로 들이자 동청의 사람됨이 정직하지 못함을 알고 곁에 두지 말 것을 간청하다.
㉱ 아들 인아를 생산하다.
㉲ 교채란과 동청의 계교로 폐출되어 시부모 묘하에 거처하다.
㉳ 교채란과 동청의 계교를 피해 배를 얻어 타고 장사로 떠나다.
㉴ 풍랑에 쫓겨 동정 악양루에 이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다가 묘혜에게 구조되어 군산사 수월암에 가안돈하다.
㉵ 묘혜와 함께 동청에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실의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의 이러한 기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채란, 동청, 냉진이 욕망하는 상대역의 위치는 중세의 현실에서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기득권의 세계이며, 이러한 기득권의 세계에 도전하는 것은 중세체제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욕망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이들은 ‘모략(謀略)’과 ‘참소(讒訴)’, ‘배신(背信)’ 등 인간의 삶을 왜곡하는 정당하지 못한 방책을 수단으로 동원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연수와 사정옥이 재회한 이후에 전개되는 작품의 종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사씨남정기』는 이들 욕망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아무런 장애없이 현실에 관철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서사적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자신들의 기도를 실현시켜 나가는 반면 욕망의 대상들은 너무도 무력하게 이들에게 패배해 나간다. 너무도 우연히 그리고 급작스럽게 설매가 자신의 전비(前非)를 뉘우치고, 황제가 자신의 혼암(昏暗)을 깨우치지 못했던들 이들 욕망의 주체들은 여전히 현실의 승리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이처럼 욕망의 공간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작가의 의도에 의한 것이다. 작품의 세계에서처럼 이들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이 무력한 것이라면 중세 사회의 명분론적 질서가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품세계에서는 유연수가 교채란의 계교에 휩싸여 정처인 사정옥을 폐출했지만, 이는 정처를 폐출하고 첩을 정처로 삼는 일이 명분론적 질서를 얼마나 훼손하는 것인가를 심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의도적으로 되외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처(妻)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린될 것에 대비하여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소박정처죄(疏薄正妻罪)>와 같은 법적인 규제였다, 유신(儒臣)의 신분으로 정처를 소박했을 때는 중죄로 다루었던 것이다. 첩에 미혹되어 정처를 소박한 유신을 중죄한 예는 대단히 많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잘 소개되어 있다.
박용옥, 「이조여성사」, 한국일보사, 1976
한희수,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 일조각 1994
백관의 비행 규찰과 풍속 교정이 가장 큰 임무였던 사헌부에서는 처의 지위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대부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규찰을 철저히 하였다. 사헌부에서 사대부를 규찰한 점은 처첩간의 분별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가, 부당하게 기처(棄妻)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박용옥, 앞의 책, 65~6면.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규제보다 더욱 효율적인 기제는 ‘양반의 혈통적인 공인’이었다. 양반신분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모(母)와 처에 의한 것이므로 모나 처의 신분뿐 아니라 그들의 행실까지도 늘 정치적인 주요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자측에서 기처할 경우, 그 명분을 처의 실행(失行)과 같은 것에 둘 수가 없었다, 기처한 처의 경우일지라도 처의 실행은 자신과 자신의 자손읠 입신출세에 타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위의 책. 68면.
처첩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현실의 기제에서 알 수 있듯이, 명분론적 질서를 훼손하는 욕망의추구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사씨남정기』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기제를 도외시한 채 욕망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에서 이처럼 욕망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교화주의적 의도를 극대화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준동하는 욕망에 대처하는 현실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현실의 명분론적 질서가 얼마나 훼손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 욕망 제어의 현실적 기제를 소거하고 욕망의 공간을 허용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사씨남정기』에서는 욕망을 통헤하는 현실의 기제를 소거함으로써 욕망의 대상이 되는 중심인물인 사정옥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고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씨남정기』에 선행하면서 『사씨남정기』의 창작에 일정하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창선감의록』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경환은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에 선행하며, 『사씨남정기』는 『창선감의록』을 ‘축소모방’하여 단순구성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앞의글 334면)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에 선행한다는 추정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볼 여지는 있으나 필자도 대체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사씨남정기』가 『창선감의록』을 ‘축소’해서 ‘모방’한 것이라는 판단에는동의하지 않는다. 『사씨남정기』가 『창선감의록』에 비해 서사적 편폭이 ‘축소’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있으나 ‘모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유연수와 혼인한다, 혼인의 과정에서 시아버지 유현은 우화함 묘혜를 사정옥에게 보내 관음찬을 짓게 하여 이를 보고 사정옥의 재덕을 확인한다.
㉯ 후사가 없자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교채란을 천거하여 첩으로 맞아들인다.
㉰ 교채란이 탄금하는 소리르 듣고 이를 타이르다. 유연수가 동청을 서사로 들이자 동청의 사람됨이 정직하지 못함을 알고 곁에 두지 말 것을 간청하다.
㉱ 아들 인아를 생산하다.
㉲ 교채란과 동청의 계교로 폐출되어 시부모 묘하에 거처하다.
㉳ 교채란과 동청의 계교를 피해 배를 얻어 타고 장사로 떠나다.
㉴ 풍랑에 쫓겨 동정 악양루에 이르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다가 묘혜에게 구조되어 군산사 수월암에 가안돈하다.
㉵ 묘혜와 함께 동청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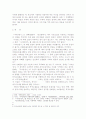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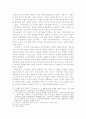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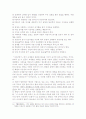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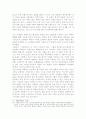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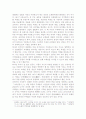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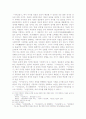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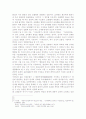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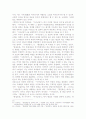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