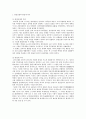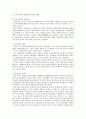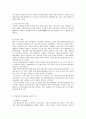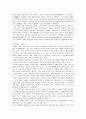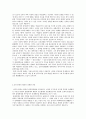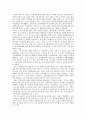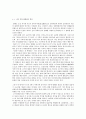목차
1. 통일전쟁과 통일체 의식
1)통일전쟁의 경과
2)통일체 의식
2.신라중대의 전제왕권과 민중의 생활
1)신라중대의 전제왕권
2)민중의 생활
3.발해사의 전개과정과 사회의 구조
1)발해사의 전개과정
2)사회의 구조
4.남북국시대론과 신라-발해의 관계
1)남북국 시대론
2)신라-발해의 관계
2-1. 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화 과정
4-1. 신라 중대 발해관의 변천
1)통일전쟁의 경과
2)통일체 의식
2.신라중대의 전제왕권과 민중의 생활
1)신라중대의 전제왕권
2)민중의 생활
3.발해사의 전개과정과 사회의 구조
1)발해사의 전개과정
2)사회의 구조
4.남북국시대론과 신라-발해의 관계
1)남북국 시대론
2)신라-발해의 관계
2-1. 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화 과정
4-1. 신라 중대 발해관의 변천
본문내용
세기 초반에 발해로부터 사신이 왔다는 기록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이 기록은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 기록에 대조영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王]이 아닌 유목민의 부족장을 의미하는 추장[酋長]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사신에게 제 5품 대아찬의 관등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신라는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가 아닌 단순히 말갈족이 세운 부족국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신속[臣屬]을 뜻하는 관직수여라는 형태로 보아 당시 적대관계이던 말갈의 회유-무마의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당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당연히 고구려도 자신들에 의하여 통일 되었다는 의식이 있었다. 또한 당시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의 내지로 많이 사민된 상태였고, 주민구성에 있어 다수가 말갈 계통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해가 건국된 직후 가장 중시하였던 일은 바로 주변 말갈의 병합[倂合]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체제의 정비는 아직 뒷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당과 관련이 있다. 당은 고구려를 멸한 이후 요동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보장왕 이래 고구려의 왕손을 고구려조선군왕[高句麗朝鮮群王]으로 봉하여 당의 수도에 안치시키고, 요동도독을 파견하여 유민을 통치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왕실의 적통이 당의 번왕[藩王]으로 있는데,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다는 것은 당시 발해의 외교적인 위치를 약화시킬 뿐이었다. 당이 발해를 발해말갈, 말갈발해, 말갈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원래 중화주의적 자존의식[中華主義的 自尊意識 = 중화사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신라는 발해를 과거 만주와 한반도에 산재하였던 말갈과 비슷한 인식을 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당의 이이제이정책[以夷制夷政策]이 맞물렸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인식이 더욱 고착화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약 반세기가 흐른 8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기존에 발해를 말갈로 인식하던 입장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발해 무왕[武王]시기 이후 계속된 고구려계승의식[高句麗繼承意識]의 표방과 함께 문왕[文王]시기의 대내외적인 성장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고구려계승의식은 무왕의 인안[仁安]9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처음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중국은 단순히 이 국서에서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일부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한 것에 반해 일본학계는 대일본 외교를 위하여, 노태돈을 비롯한 한국학계는 이를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해는 무왕대에 이르러 동북방에 있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확장된 영토와 주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계승과 정통성을 표방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위의 이유에 덧붙여 발해는 고구려 유민에 말갈족 뿐만이 아닌 다른 거란과 일부 서역민족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다민족 국가였다. 그러므로 발해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과거의 강국이었던 고구려를 표방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문왕대에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 대흠무[高麗國王 大欽武] 라고 하였고, 이에 일본에서는 발해왕[渤海王]을 고려국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천손사상을 인용하여 일본에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고구려의 천하관[天下觀]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세계질서등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당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강국이 되었고, 이는 신라의 발해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발해를 발해, 고려등으로 대외적 표기를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서 발해와의 대외관계 또한 좋아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은 신라도를 통한 교섭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는 당이 안사의 난을 겪는 시기라서 대외 규제력이 떨어진 시기였기도 하였다. 과거 중국이 삼국[三國]을 삼한[三韓]이라고 한 것처럼 풍속과 언어, 인종등이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다른 외부민족과 비교해 볼때 스스로를 구분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이들 이민족들 보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대라는 기간 동안 신라는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겪으며 발해를 동일민족으로 인식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은 당대부터 남북국시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당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지 얼마 안 되었고, 당연히 고구려도 자신들에 의하여 통일 되었다는 의식이 있었다. 또한 당시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의 내지로 많이 사민된 상태였고, 주민구성에 있어 다수가 말갈 계통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해가 건국된 직후 가장 중시하였던 일은 바로 주변 말갈의 병합[倂合]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체제의 정비는 아직 뒷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당과 관련이 있다. 당은 고구려를 멸한 이후 요동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보장왕 이래 고구려의 왕손을 고구려조선군왕[高句麗朝鮮群王]으로 봉하여 당의 수도에 안치시키고, 요동도독을 파견하여 유민을 통치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 왕실의 적통이 당의 번왕[藩王]으로 있는데,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다는 것은 당시 발해의 외교적인 위치를 약화시킬 뿐이었다. 당이 발해를 발해말갈, 말갈발해, 말갈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원래 중화주의적 자존의식[中華主義的 自尊意識 = 중화사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신라는 발해를 과거 만주와 한반도에 산재하였던 말갈과 비슷한 인식을 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당의 이이제이정책[以夷制夷政策]이 맞물렸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인식이 더욱 고착화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약 반세기가 흐른 8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기존에 발해를 말갈로 인식하던 입장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발해 무왕[武王]시기 이후 계속된 고구려계승의식[高句麗繼承意識]의 표방과 함께 문왕[文王]시기의 대내외적인 성장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고구려계승의식은 무왕의 인안[仁安]9년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처음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중국은 단순히 이 국서에서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일부 지역을 장악하였다고 한 것에 반해 일본학계는 대일본 외교를 위하여, 노태돈을 비롯한 한국학계는 이를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해는 무왕대에 이르러 동북방에 있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병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확장된 영토와 주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고구려의 계승과 정통성을 표방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이유로는 위의 이유에 덧붙여 발해는 고구려 유민에 말갈족 뿐만이 아닌 다른 거란과 일부 서역민족들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다민족 국가였다. 그러므로 발해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과거의 강국이었던 고구려를 표방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문왕대에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국왕 대흠무[高麗國王 大欽武] 라고 하였고, 이에 일본에서는 발해왕[渤海王]을 고려국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천손사상을 인용하여 일본에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고구려의 천하관[天下觀]을 도입하여 독자적인 세계질서등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당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강국이 되었고, 이는 신라의 발해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발해를 발해, 고려등으로 대외적 표기를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서 발해와의 대외관계 또한 좋아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것은 신라도를 통한 교섭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는 당이 안사의 난을 겪는 시기라서 대외 규제력이 떨어진 시기였기도 하였다. 과거 중국이 삼국[三國]을 삼한[三韓]이라고 한 것처럼 풍속과 언어, 인종등이 비슷하였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다른 외부민족과 비교해 볼때 스스로를 구분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이들 이민족들 보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중대라는 기간 동안 신라는 발해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겪으며 발해를 동일민족으로 인식하였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것은 당대부터 남북국시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추천자료
 고고학적 견해로 본 신라의 국가성립
고고학적 견해로 본 신라의 국가성립 화랑도를 통해서 고찰해 본 신라의 불교
화랑도를 통해서 고찰해 본 신라의 불교 울진 봉평 신라비
울진 봉평 신라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영일 냉수리 신라비 [쟁점 한국사] 신라시대의 여왕들에대한 분석과 나의 비평
[쟁점 한국사] 신라시대의 여왕들에대한 분석과 나의 비평 [전략경영]'신라호텔'의 경영전략 분석(A+리포트)
[전략경영]'신라호텔'의 경영전략 분석(A+리포트) 천년의 왕국 신라를 읽고
천년의 왕국 신라를 읽고 속일본기를 통해본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
속일본기를 통해본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 일본서기에 나타난 신라 사절 성격 이해
일본서기에 나타난 신라 사절 성격 이해 사천왕사지와 장항리사지를 통해 본 신라의 불교
사천왕사지와 장항리사지를 통해 본 신라의 불교 [서비스마케팅]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의 서비스마케팅 분석
[서비스마케팅] 롯데호텔과 신라호텔의 서비스마케팅 분석 [국제경영학] 농심 신라면 중국진출 배경, 중국진출 성공 요인, 기업전략 분석, 중국시장 분...
[국제경영학] 농심 신라면 중국진출 배경, 중국진출 성공 요인, 기업전략 분석, 중국시장 분... 지방세력과 종교 [신라하대 종교계 동향]
지방세력과 종교 [신라하대 종교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