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랑과 문방
문방의 구상
문방사우란
종이
채륜의 종이
우리나라의 종이
시전
붓에 쓰이는 털
좋은 붓 고르기
붓의 종류
붓의 보장법
우리나라의 필장과 필방
발굴된 붓
먹의 기원
우리나라의 먹
먹 다루는 법
벼루의 기원
우리나라 벼루의 시작
우리나라 벼루와 벼룻돌
그 밖의 문방 용품
문방의 구상
문방사우란
종이
채륜의 종이
우리나라의 종이
시전
붓에 쓰이는 털
좋은 붓 고르기
붓의 종류
붓의 보장법
우리나라의 필장과 필방
발굴된 붓
먹의 기원
우리나라의 먹
먹 다루는 법
벼루의 기원
우리나라 벼루의 시작
우리나라 벼루와 벼룻돌
그 밖의 문방 용품
본문내용
근씨를 빼놓을 수가 없다.
발굴된 붓
얼마 전에 경남 의창군 다호리에 있는 목관분속에서 기원전의 문화 유물을 대량 발굴했다는 기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는데, 특히 필자의 눈과 마음을 끈 것은 마침 필자가 붓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던 때인 만큼 5자루의 붓에 대한 보도였다. 출토된 5자루의 붓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원전에 이미 필묵이 있었으며 문한 생활을 했던 문화 민족이었다는 요지부동한 물적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문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먹
먹의 기원
먹이 없었던 상고시대에 중국에서는 석날로 글씨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석묵으로 쓴 글씨는 희미하고 쉽게 지워지므로 석묵에 옻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옻만으로 쓰기도 했다. 위와 진때에 비로소 옻과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묵환을 만들었다. 이 묵환을 물에 타거나 벼루에 갈아 먹물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은 먹물을 담아 두기 위하여 요심연을 많이 사용하였다.
도씨라는 사람이 쓴 ‘묵경’ 에는 “예전에는 석묵와 송연 2가지가 있었고 위,진대 이후는 송연먹을 썼다”라고 했다. 중국은 한나라때 이미 그을음으로 먹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에 소나무 그을음과 녹교로 송연먹을 제조하였다. ‘문방사고묵담’이라는 책에 “고려에서 당나라에 송연먹을 선물하였는데 노송나무 그을음을 사슴의 아교와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먹
채색먹
먹은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채색먹과 그림없이 글자만 쓰거나 그림을 양각한 무채먹이 있다.
채색먹의 종류로는 해운신제, 영귀정, 사중가, 제국독립문, 책재기상, 봉구추, 방락미앙, 만년장춘, 만유천세, 해월정청, 우저명월, 부용상련 등이 있다.
무채먹
무채먹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양가으로 그림이 새겨진 먹도 있다. 종류로는 헌람풍월, 장락춘운, 모란봉, 용잠자운, 남대문, 광화문, 장락미앙, 천추광, 충효먹, 용비봉무 등이 있다.
발묵론
발묵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있는데, 첫째는 산수화 중에서도 특히 비오는 경치를 그릴 때 쓰는 수묵법이다. 마치 먹물을 쏟아 부은 듯이 거대한 점을 그리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는 먹빛의 좋고 나쁜 것을 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먹빛이 진할 뿐만 아니라 옻이나 기름을 바른 듯이 반질반질 하고 은은한 청자색이 나는 것을 발묵이라 하기도 한다.
여하튼 먹은 발묵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며 먹이 좋고 나쁜 것은 발묵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름과 같은 조건을 잦추지 못하면 좋은 발묵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옛 먹의 값
한림풍월묵 1동 : 쌀 10말
중진묵 1동 : 8전 5푼
중반진묵 6정 1동 : 모미 3말
우배묵 1동 : 쌀 10말
소진묵 1동 : 쌀 2말
양우리견대묵 1동 : 쌀 10말
먹 다루는 법
먹은 가벼워야 하며 탁하지 않고 맑아야 한다. 또 향기가 좋고 먹을 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벼루에 맑은 새 물로 먹을 갈되, 급히 갈면 먹 찌꺼지
발굴된 붓
얼마 전에 경남 의창군 다호리에 있는 목관분속에서 기원전의 문화 유물을 대량 발굴했다는 기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는데, 특히 필자의 눈과 마음을 끈 것은 마침 필자가 붓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던 때인 만큼 5자루의 붓에 대한 보도였다. 출토된 5자루의 붓은 우리나라에서도 기원전에 이미 필묵이 있었으며 문한 생활을 했던 문화 민족이었다는 요지부동한 물적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를 향한 우리들의 문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
먹
먹의 기원
먹이 없었던 상고시대에 중국에서는 석날로 글씨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석묵으로 쓴 글씨는 희미하고 쉽게 지워지므로 석묵에 옻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옻만으로 쓰기도 했다. 위와 진때에 비로소 옻과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묵환을 만들었다. 이 묵환을 물에 타거나 벼루에 갈아 먹물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은 먹물을 담아 두기 위하여 요심연을 많이 사용하였다.
도씨라는 사람이 쓴 ‘묵경’ 에는 “예전에는 석묵와 송연 2가지가 있었고 위,진대 이후는 송연먹을 썼다”라고 했다. 중국은 한나라때 이미 그을음으로 먹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초기에 소나무 그을음과 녹교로 송연먹을 제조하였다. ‘문방사고묵담’이라는 책에 “고려에서 당나라에 송연먹을 선물하였는데 노송나무 그을음을 사슴의 아교와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먹
채색먹
먹은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 채색먹과 그림없이 글자만 쓰거나 그림을 양각한 무채먹이 있다.
채색먹의 종류로는 해운신제, 영귀정, 사중가, 제국독립문, 책재기상, 봉구추, 방락미앙, 만년장춘, 만유천세, 해월정청, 우저명월, 부용상련 등이 있다.
무채먹
무채먹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양가으로 그림이 새겨진 먹도 있다. 종류로는 헌람풍월, 장락춘운, 모란봉, 용잠자운, 남대문, 광화문, 장락미앙, 천추광, 충효먹, 용비봉무 등이 있다.
발묵론
발묵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있는데, 첫째는 산수화 중에서도 특히 비오는 경치를 그릴 때 쓰는 수묵법이다. 마치 먹물을 쏟아 부은 듯이 거대한 점을 그리는 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둘째는 먹빛의 좋고 나쁜 것을 가르는 말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먹빛이 진할 뿐만 아니라 옻이나 기름을 바른 듯이 반질반질 하고 은은한 청자색이 나는 것을 발묵이라 하기도 한다.
여하튼 먹은 발묵을 극히 중요하게 여기며 먹이 좋고 나쁜 것은 발묵의 좋고 나쁨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름과 같은 조건을 잦추지 못하면 좋은 발묵의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
옛 먹의 값
한림풍월묵 1동 : 쌀 10말
중진묵 1동 : 8전 5푼
중반진묵 6정 1동 : 모미 3말
우배묵 1동 : 쌀 10말
소진묵 1동 : 쌀 2말
양우리견대묵 1동 : 쌀 10말
먹 다루는 법
먹은 가벼워야 하며 탁하지 않고 맑아야 한다. 또 향기가 좋고 먹을 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벼루에 맑은 새 물로 먹을 갈되, 급히 갈면 먹 찌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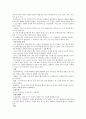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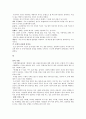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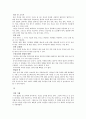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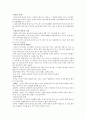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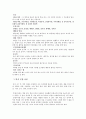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