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육보가 중심기보법으로 민간악보에서 사용되는 역사적 변천이 생겼고, 이러한 전통이 20세기 전반까지 계속 되었던 것이다. 생황자보는 조선후기의 생황으로 연주되었던 가곡 반주음악을 후대에 남겨주었을 뿐만아니라. 그 기보법은 정간보처럼 시가를 나타낼 수 있었던 유량 악보였기 때문에 음악사에서 중요시 된다. 연음표는 가곡의 노래선율을 후대에 전하는 유일의 기보법이었다는 이유에서 중요시 된다. 유예지의 생황자보, 이 기보법은 시가를 표시한 검은 점은 짧은 소리를 내었고 하나의 흰점은 중간 길이의 소리를 표시하였으며, 두 개의 흰 점은 긴 소리를 의미했다. 시가의 표시를 위한 생황자보의이러한 표기법은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보법 중에서 시가에 관련된 기보법은 오직 정간보 뿐이었지만, 유예지의 생황자보도 시가를 나타내는 유량악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곡원류의 연음표 : 생황자보나 연음표는 모두 19세기 풍류방에서 가곡을 즐기던 가객과 풍류객들에 의해 사용되었던 기보법이고, 그것은 정악이라는 음악문화의 일면을 잘 나타낸 실례들이다. 두 기보법이 현재까지 전승되지는 못했지만, 조선 후기의 음악사적 관점에서 중요시되어야 마땅하다. 두 기보법에 의해서 19세기 가곡의 악보가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는 첫째 이유 이외에도 특히 생황자보가 일중의 유량악보였다는 둘째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생황자보에서 시가를 표시한 방법이 후대에 전승되어 발전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기보법사가 새 양상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까닭에서이다.
추천자료
 국악, 사물놀이, 민요, 국악가요에 대하여
국악, 사물놀이, 민요, 국악가요에 대하여 국악악곡 이야기
국악악곡 이야기 국악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국악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국악감상에 앞서 이루어지는 마음가짐의 정리와 국악감상문
국악감상에 앞서 이루어지는 마음가짐의 정리와 국악감상문 국악기(한국전통악기) 장구(장고) 유래와 바른자세, 국악기(한국전통악기) 장구(장고) 연습과...
국악기(한국전통악기) 장구(장고) 유래와 바른자세, 국악기(한국전통악기) 장구(장고) 연습과... 한국전통악기(국악기, 전통악기) 태평소와 아쟁, 한국전통악기(국악기, 전통악기) 가야금, 한...
한국전통악기(국악기, 전통악기) 태평소와 아쟁, 한국전통악기(국악기, 전통악기) 가야금, 한... 한국전통음악지도(국악교육)의 중요성, 한국전통음악지도(국악교육)의 장단지도, 창작지도, ...
한국전통음악지도(국악교육)의 중요성, 한국전통음악지도(국악교육)의 장단지도, 창작지도, ... 국악의 개념 및 종류와 국악기의 활용방법 조사분석
국악의 개념 및 종류와 국악기의 활용방법 조사분석 국악의 역사, 유래, 정의, 국악 악기의 특징, 인식, 양악과의 비교, 활성화 방안, 고전의 재...
국악의 역사, 유래, 정의, 국악 악기의 특징, 인식, 양악과의 비교, 활성화 방안, 고전의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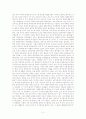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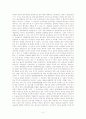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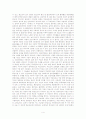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