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악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1. 국악과 화성
2. 국악 장단(리듬형)의 특징
3. 국악의 빠르기(Tempo)
4. 국악의 기준 음높이
6. 국악 악보
(1) 음악의 훈민정음 정간보
(2) 악보의 한계
(3) 정간보와 5선 악보의 차이
7. 국악 합주와 지휘자
8. 국악의 작곡자
9. 위대한 음악가 세종대왕
10. 국악곡과 연주형태
1. 국악과 화성
2. 국악 장단(리듬형)의 특징
3. 국악의 빠르기(Tempo)
4. 국악의 기준 음높이
6. 국악 악보
(1) 음악의 훈민정음 정간보
(2) 악보의 한계
(3) 정간보와 5선 악보의 차이
7. 국악 합주와 지휘자
8. 국악의 작곡자
9. 위대한 음악가 세종대왕
10. 국악곡과 연주형태
본문내용
로 섬길 수 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국악 역사 속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우리 후손들이 못나서 그런 분들을 알아 모시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특히, 판소리 쪽으로는 모차르트 이상가는 대천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등.)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국악 역사상 가장 큰 별은 세종대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양의 독일 음악이 바하에서 비롯된다면 우리 한국음악은 바로 세종대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세종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현악기인 금과 슬을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임금으로 즉위하자 음악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국악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음악문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주요 음악 업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계 음악인 아악을 박연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여 외래 음악 수용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보여줌.
② 제례악(제사음악), 회례악(대신(大臣)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작곡하여 종래 중국계 음악 일변도에서 탈피하게 함.
③ 여민락을 작곡하여 음악을 통한 백성 사랑을 실천함. (비록, 여민락이 궁중에서만 연주되었지만.)
④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인 정간보를 발명함.
⑤ 편종, 편경의 자체 생산을 가능케 함.
물론, 이러한 훌륭한 음악 업적은 세종대왕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충신이었던 박연(1378~1458), 맹사성(1359~1438) 등과 같은 음악인들의 힘도 크게 한 몫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중의 한 명인 박연은 대금의 명수였고, 세종대왕 밑에서 많은 음악활동을 한 분입니다. 특히, 박연의 음악에 관한 상소문은 그가 얼마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가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박연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향악보다는 중국의 아악을 더 상위 개념의 음악으로 생각했던 사대적(事大的)인 음악관을 가진 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의정 벼슬까지 지냈던 맹사성은 당시 향악의 최고 권위자 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충신을 만나야 하고, 신하는 성군(聖君)을 만나야 함은 음악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 더욱 감동적인 것은, 당시 대왕은 박연과 같이 중국사대주의적 음악관에 빠져 있었던 신하들에게 끊임없는 상소(上疏)를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민족적인 음악관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음악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음악가가 한 분만 더 계셨더라도... 우리나라 각 학교 음악실에, 아니 딴나라의 학교 음악실에까지도 우리의 위대한 음악가 세종대왕의 사진이 걸리게 될 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 국악곡과 연주형태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도 서너개, 또는 대여섯개 달라고 하지 정확하게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식으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서너개, 또는 대여섯개를 달라고 하면 또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은 눈치껏 알아서 집어 줍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손님이 \'두서너개\'를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때도 가게 주인은 능숙하게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되지요. 서양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성간에 연애를 할 때도 \'싫고 좋음\'의 감정표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식 연애법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갑돌이와 갑순이식의 비극적 사랑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갑돌이 갑순이식 사랑은 무척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부부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식으로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완곡하고, 비(非)수학적이며, 은유적인 한국인의 기질은 음악의 연주 형태에서도 나타납니다. 국악곡은 서양음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연주형태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합주곡이 독주곡으로 연주되기도 하고, 성악곡이 기악곡으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서양곡에 비해 연주형태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악곡을 통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서 국악곡 중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산회상\'의 경우는 연주 형태의 변화를 엄청나게 겪었던 곡입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해서 국악에서는 곡 하나를 가지고 여러 연주형태로 삶아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는 셈이죠. 서양 음악에서도 최근에는 어느 특정한 곡을 여러 연주형태로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향곡은 교향곡, 현악 4중주곡은 현악 4중주곡의 원래 연주 형태를 고수하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주형태로 편곡해서 연주해봤자 원곡만큼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가끔 \'무도회의 권유\'처럼 원곡인 피아노곡 보다 편곡된 관현악곡이 더 높이 평가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국악에서는 연주형태가 달라져도 대등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악곡에서 연주형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기질탓도 있지만 국악곡 자체의 음악적 특징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악곡에서는 합주곡이 독주곡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는 국악 합주곡의 각 파트가 독립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악은 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이 아니므로 합주곡에서 각 파트가 어느 특정파트에 매어 있지 않고 그 파트 나름대로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락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떼어서 연주하면 독주곡이 되고, 두 파트만 떼어서 연주하면 병주(2중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악 오케스트라라는 각 파트의 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니 가장 민주적인 합주인 셈입니다. 더구나 각 파트가 개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도 조화가 잘 되거든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국악 역사 속에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았습니다. 단지, 우리 후손들이 못나서 그런 분들을 알아 모시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특히, 판소리 쪽으로는 모차르트 이상가는 대천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등.)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우리 국악 역사상 가장 큰 별은 세종대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양의 독일 음악이 바하에서 비롯된다면 우리 한국음악은 바로 세종대왕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세종 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현악기인 금과 슬을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임금으로 즉위하자 음악적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국악 역사상 가장 찬란한 음악문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주요 음악 업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계 음악인 아악을 박연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하여 외래 음악 수용에 있어서의 주체성을 보여줌.
② 제례악(제사음악), 회례악(대신(大臣)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인 보태평과 정대업을 작곡하여 종래 중국계 음악 일변도에서 탈피하게 함.
③ 여민락을 작곡하여 음악을 통한 백성 사랑을 실천함. (비록, 여민락이 궁중에서만 연주되었지만.)
④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인 정간보를 발명함.
⑤ 편종, 편경의 자체 생산을 가능케 함.
물론, 이러한 훌륭한 음악 업적은 세종대왕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충신이었던 박연(1378~1458), 맹사성(1359~1438) 등과 같은 음악인들의 힘도 크게 한 몫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중의 한 명인 박연은 대금의 명수였고, 세종대왕 밑에서 많은 음악활동을 한 분입니다. 특히, 박연의 음악에 관한 상소문은 그가 얼마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가를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박연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향악보다는 중국의 아악을 더 상위 개념의 음악으로 생각했던 사대적(事大的)인 음악관을 가진 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의정 벼슬까지 지냈던 맹사성은 당시 향악의 최고 권위자 였다고 합니다. 임금은 충신을 만나야 하고, 신하는 성군(聖君)을 만나야 함은 음악사업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 더욱 감동적인 것은, 당시 대왕은 박연과 같이 중국사대주의적 음악관에 빠져 있었던 신하들에게 끊임없는 상소(上疏)를 받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민족적인 음악관을 굽히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음악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음악가가 한 분만 더 계셨더라도... 우리나라 각 학교 음악실에, 아니 딴나라의 학교 음악실에까지도 우리의 위대한 음악가 세종대왕의 사진이 걸리게 될 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 국악곡과 연주형태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도 서너개, 또는 대여섯개 달라고 하지 정확하게 한 개면 한 개, 두 개면 두 개 식으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서너개, 또는 대여섯개를 달라고 하면 또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은 눈치껏 알아서 집어 줍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손님이 \'두서너개\'를 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 때도 가게 주인은 능숙하게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야말로 \'이심전심(以心傳心)\'이 되지요. 서양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성간에 연애를 할 때도 \'싫고 좋음\'의 감정표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식 연애법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갑돌이와 갑순이식의 비극적 사랑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갑돌이 갑순이식 사랑은 무척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은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부부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식으로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완곡하고, 비(非)수학적이며, 은유적인 한국인의 기질은 음악의 연주 형태에서도 나타납니다. 국악곡은 서양음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연주형태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합주곡이 독주곡으로 연주되기도 하고, 성악곡이 기악곡으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서양곡에 비해 연주형태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국악곡을 통시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져서 국악곡 중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영산회상\'의 경우는 연주 형태의 변화를 엄청나게 겪었던 곡입니다.
조금 속되게 표현해서 국악에서는 곡 하나를 가지고 여러 연주형태로 삶아 먹기도 하고, 지져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는 셈이죠. 서양 음악에서도 최근에는 어느 특정한 곡을 여러 연주형태로 편곡해서 연주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향곡은 교향곡, 현악 4중주곡은 현악 4중주곡의 원래 연주 형태를 고수하는게 관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주형태로 편곡해서 연주해봤자 원곡만큼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가끔 \'무도회의 권유\'처럼 원곡인 피아노곡 보다 편곡된 관현악곡이 더 높이 평가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국악에서는 연주형태가 달라져도 대등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국악곡에서 연주형태가 비교적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을 싫어하는 한국인의 기질탓도 있지만 국악곡 자체의 음악적 특징에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악곡에서는 합주곡이 독주곡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는 국악 합주곡의 각 파트가 독립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악은 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음악이 아니므로 합주곡에서 각 파트가 어느 특정파트에 매어 있지 않고 그 파트 나름대로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락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만 떼어서 연주하면 독주곡이 되고, 두 파트만 떼어서 연주하면 병주(2중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악 오케스트라라는 각 파트의 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니 가장 민주적인 합주인 셈입니다. 더구나 각 파트가 개성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도 조화가 잘 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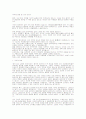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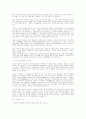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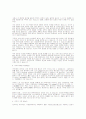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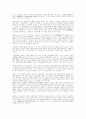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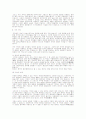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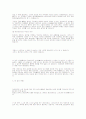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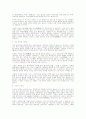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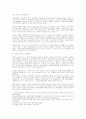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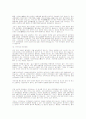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