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자기의 구분
2. 삼국 시대까지의 도자기
3. 청자
4. 백자
2. 삼국 시대까지의 도자기
3. 청자
4. 백자
본문내용
발색이 아름다운 갑번(匣燔)백자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경부터 상업자본의 발달은 이를 더 부채질하여 왕실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갑번의 상품 백자를 사치스럽고 권세와 돈이 있는 양반과 부호들이 앞을 다투어 구하려 하기 때문에 광주 분원 운영에 커다란 문제로까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 후반부터 점차 상품·중품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중기부터는 상품·하품의 구분이 없어져 모두가 상품화(上品化)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백자질의 평준화라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화백자는 수효는 적으나 간결하고 기품이 있는 난초계의 초화문이 기면의 국한된 일부에 시문되어 청정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우리나라 청화백자는 15세기 중엽과 후반에 단순화된 회화적 구성의 주문양만이 있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였으나, 그때의 문양인 산수·인물·송·매·조(鳥)·죽문 등이 중국 명대 북종화계의 준법이나 수지법과 유사하였다.
18세기 전반기의 중기 청화백자는 문양이 간결·독특할 뿐 아니라, 주제나 표현수법 등이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어서 우리나라 청화백자사상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겠다.
철화문은 전기 말에 이어 중기 초까지 운룡문·초화문 등이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고 간결하게 도식화된 국화문계를 주로 한 문양이 등장하고, 중기 후반은 매우 희귀하나 철화운룡문·철화죽문 등이 있으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이어져서는 철화의 사용은 청화백자에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한 예는 매우 드물다.
백자진사문은 중기 초 무렵에 하나의 실례가 있을 뿐이며, 중기 후반에 만들어진 양각·청화·철화·동화를 같이 사용한 병이 있고, 중기 후반과 후기 전반에 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가 비교적 많다.
동정색(銅呈色)인 붉은색으로만 대나무·포도·송학·연화·국화문 등을 매우 자유분방한 필치로 대담하게 그린 각병·항아리 등이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오면 각이 진 항아리, 키가 큰 작은 항아리 등에도 치졸하고 간결한 진사문양이 있는 예가 많으며, 이들은 광주 관요산이 아닌 경기도 어느 지방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 밖에 매우 드물지만 백자에 청화와 철화로 또는 철화와 진사로 문양을 나타낸 것이 있으며, 더욱 희귀하게는 백자에 청화와 철화와 진사로 문양을 나타낸 것도 있다. 백자에 물감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 이외에 양인각(陽印刻)으로 문양을 나타낸 경우와 투각으로 문양을 나타낸 경우가 매우 희귀하지만 이 시대의 말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후기에 가면 그 수효가 많아지고 독특한 세련을 보인다.
석간주자기〔黑釉磁器〕·철채자기·철유자기 중 석간주(흑유)는 유약 속에 산화철분이 8% 내외 들어가 유약의 발색이 갈색 내지는 흑갈색인 것을 말한다. 철채자기는 백자태토로 그릇을 만들고 그릇 표면 전면에 철분을 바른 다음 그 위에 다시 백자 유약을 입혀 구워낸 것이며, 철유자기는 백자태토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산화철분이 15% 이상 함유된 유약을 입혀 구워낸다. 철채의 경우는 표면이 쇠녹색〔鐵呈色〕이 나는데 겉이 반짝이고 윤이 나며, 철유는 표면이 쇠녹색인데 표면은 유리질 유약 성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광택이 없다. 석간주는 철화를 지칭하기도 하나 보통 암갈색의 흑유가 입혀진 항아리나 병들을 석간주 항아리, 석간주 병이라고 한다.
각이 진 것이 대부분이고 중기 말 무렵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후기에 많이 사용된다. 철채와 철유자기도 중기로부터 전기보다 다른 기형과 기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후기에 독특한 세련을 보인다. 중기 전반의 광주관요는 실촌면 유사리와 신대리 등에 있고, 중기 후반의 가마는 도척면 궁평리와 퇴촌면 관음리, 실촌면 오향리, 남종면 금사리 등에 있었다.
(후기) 후기는 1752년(영조 28)부터 19세기말의 조선조 말까지이다. 분원 자체는 1883년(고종 20)에 중앙관요로서의 임무를 끝내고 도서원(都署員)에 의해서 책임 운영되는 민영의 왕실용 사기 공급 도급업체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조선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사실상 침략과 일본 도자기의 대량 유입, 일본 자본에 의한 대규모 도자기공장의 국내 설립 등으로 분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도자기는 조선조 후기에는 종전에 없었던 매우 다종다양한 종류와 기형과 문양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중기 후반부터 그 싹이 터서 후기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중기는 종전에 없었던 각이 지거나 면을 이용한 도자기와 접시·대접 등의 평범한 기형에 높은 받침이 있는 제기(祭器)의 등장, 새로운 형태의 문방구류의 제작과 기타 일반 기형의 다양화, 전혀 새롭고 간결한 청화문양·철화문양 등의 시문으로 도자기에 다양하고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 바람이 후기인 분원기에 대담하게 확산 정착되고 세련되었다.
또한, 이때는 종전의 순수한 백자만을 드높이고 숭상하던 풍조에 비판을 가하여 오히려 이와 같은 백자 숭상이 국가의 검약을 위주로 하는 정책과 일치하여 다양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누구나 순수한 백자를 제일 좋아하였지만, 특히 분원 후기는 백자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청화문양이 종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지고 종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청화채백자와 동화·동채백자도 등장하며 압형 성형한 것도 다양하게 나온다. 기형의 종류와 그 다양함도 종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 도자기가 매우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나 일제의 침략으로 불행하게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19세기 말 무렵부터 주로 일본의 규슈지방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무미건조하고, 선의 변화가 전혀 없으나 두껍고 견고하며, 매끈하게 생긴 백자류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또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자본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공장을 세워서 이와 같은 기계생산 제품을 대량 시중에 내놓아 등요(登窯)에서 나무로 불을 때서 자기를 번조하고 물레를 발로 돌리며 손으로 빚는 애정 어린 창작품과 같던 우리 도자기들은 독깨그릇과 질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더욱이, 17세기 후반 경부터 상업자본의 발달은 이를 더 부채질하여 왕실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갑번의 상품 백자를 사치스럽고 권세와 돈이 있는 양반과 부호들이 앞을 다투어 구하려 하기 때문에 광주 분원 운영에 커다란 문제로까지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 후반부터 점차 상품·중품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중기부터는 상품·하품의 구분이 없어져 모두가 상품화(上品化)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백자질의 평준화라는 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화백자는 수효는 적으나 간결하고 기품이 있는 난초계의 초화문이 기면의 국한된 일부에 시문되어 청정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우리나라 청화백자는 15세기 중엽과 후반에 단순화된 회화적 구성의 주문양만이 있어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였으나, 그때의 문양인 산수·인물·송·매·조(鳥)·죽문 등이 중국 명대 북종화계의 준법이나 수지법과 유사하였다.
18세기 전반기의 중기 청화백자는 문양이 간결·독특할 뿐 아니라, 주제나 표현수법 등이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이어서 우리나라 청화백자사상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겠다.
철화문은 전기 말에 이어 중기 초까지 운룡문·초화문 등이 있었으나 점차 줄어들고 간결하게 도식화된 국화문계를 주로 한 문양이 등장하고, 중기 후반은 매우 희귀하나 철화운룡문·철화죽문 등이 있으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로 이어져서는 철화의 사용은 청화백자에 곁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한 예는 매우 드물다.
백자진사문은 중기 초 무렵에 하나의 실례가 있을 뿐이며, 중기 후반에 만들어진 양각·청화·철화·동화를 같이 사용한 병이 있고, 중기 후반과 후기 전반에 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예가 비교적 많다.
동정색(銅呈色)인 붉은색으로만 대나무·포도·송학·연화·국화문 등을 매우 자유분방한 필치로 대담하게 그린 각병·항아리 등이 있으며, 19세기에 들어오면 각이 진 항아리, 키가 큰 작은 항아리 등에도 치졸하고 간결한 진사문양이 있는 예가 많으며, 이들은 광주 관요산이 아닌 경기도 어느 지방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 밖에 매우 드물지만 백자에 청화와 철화로 또는 철화와 진사로 문양을 나타낸 것이 있으며, 더욱 희귀하게는 백자에 청화와 철화와 진사로 문양을 나타낸 것도 있다. 백자에 물감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 이외에 양인각(陽印刻)으로 문양을 나타낸 경우와 투각으로 문양을 나타낸 경우가 매우 희귀하지만 이 시대의 말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후기에 가면 그 수효가 많아지고 독특한 세련을 보인다.
석간주자기〔黑釉磁器〕·철채자기·철유자기 중 석간주(흑유)는 유약 속에 산화철분이 8% 내외 들어가 유약의 발색이 갈색 내지는 흑갈색인 것을 말한다. 철채자기는 백자태토로 그릇을 만들고 그릇 표면 전면에 철분을 바른 다음 그 위에 다시 백자 유약을 입혀 구워낸 것이며, 철유자기는 백자태토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산화철분이 15% 이상 함유된 유약을 입혀 구워낸다. 철채의 경우는 표면이 쇠녹색〔鐵呈色〕이 나는데 겉이 반짝이고 윤이 나며, 철유는 표면이 쇠녹색인데 표면은 유리질 유약 성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광택이 없다. 석간주는 철화를 지칭하기도 하나 보통 암갈색의 흑유가 입혀진 항아리나 병들을 석간주 항아리, 석간주 병이라고 한다.
각이 진 것이 대부분이고 중기 말 무렵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후기에 많이 사용된다. 철채와 철유자기도 중기로부터 전기보다 다른 기형과 기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후기에 독특한 세련을 보인다. 중기 전반의 광주관요는 실촌면 유사리와 신대리 등에 있고, 중기 후반의 가마는 도척면 궁평리와 퇴촌면 관음리, 실촌면 오향리, 남종면 금사리 등에 있었다.
(후기) 후기는 1752년(영조 28)부터 19세기말의 조선조 말까지이다. 분원 자체는 1883년(고종 20)에 중앙관요로서의 임무를 끝내고 도서원(都署員)에 의해서 책임 운영되는 민영의 왕실용 사기 공급 도급업체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체계가 조선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사실상 침략과 일본 도자기의 대량 유입, 일본 자본에 의한 대규모 도자기공장의 국내 설립 등으로 분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도자기는 조선조 후기에는 종전에 없었던 매우 다종다양한 종류와 기형과 문양의 발전이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은 중기 후반부터 그 싹이 터서 후기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중기는 종전에 없었던 각이 지거나 면을 이용한 도자기와 접시·대접 등의 평범한 기형에 높은 받침이 있는 제기(祭器)의 등장, 새로운 형태의 문방구류의 제작과 기타 일반 기형의 다양화, 전혀 새롭고 간결한 청화문양·철화문양 등의 시문으로 도자기에 다양하고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 바람이 후기인 분원기에 대담하게 확산 정착되고 세련되었다.
또한, 이때는 종전의 순수한 백자만을 드높이고 숭상하던 풍조에 비판을 가하여 오히려 이와 같은 백자 숭상이 국가의 검약을 위주로 하는 정책과 일치하여 다양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었다. 누구나 순수한 백자를 제일 좋아하였지만, 특히 분원 후기는 백자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청화문양이 종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지고 종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청화채백자와 동화·동채백자도 등장하며 압형 성형한 것도 다양하게 나온다. 기형의 종류와 그 다양함도 종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 도자기가 매우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나 일제의 침략으로 불행하게도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19세기 말 무렵부터 주로 일본의 규슈지방에서 기계로 대량 생산되는 무미건조하고, 선의 변화가 전혀 없으나 두껍고 견고하며, 매끈하게 생긴 백자류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또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대자본을 투입하여 대규모의 공장을 세워서 이와 같은 기계생산 제품을 대량 시중에 내놓아 등요(登窯)에서 나무로 불을 때서 자기를 번조하고 물레를 발로 돌리며 손으로 빚는 애정 어린 창작품과 같던 우리 도자기들은 독깨그릇과 질그릇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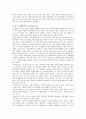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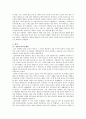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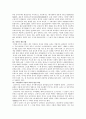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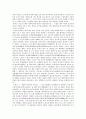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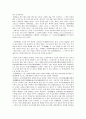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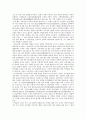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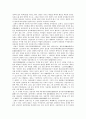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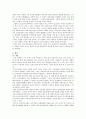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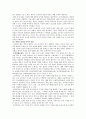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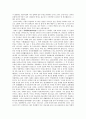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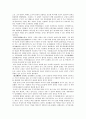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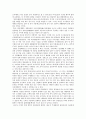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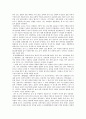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