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각색의 변
2.무대설명도, 무대구분도
3.조명용어 사용의미
4.안녕, 먼 곳의 친구들이여
2.무대설명도, 무대구분도
3.조명용어 사용의미
4.안녕, 먼 곳의 친구들이여
본문내용
한 삼십대 초반의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그녀와의 대화대용은…
최은혜 :
아까도 가게주인이 얘기했지만 왜 남의 얘기를 전하려고 해요? 난 입이 없나요? 흥! 내 이야기는 내가 하겠어요. 제 작업은 하나의 이벤트예요. 음악은 뺄 수 없는 그 한 부분이지요. 장사익도 있고, 정태춘도 있고, 하드록도 있고, 주인공이 본 것처럼 뉴에이지 계통의 음악을 사용할 때도 있구요.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거죠. 제 포즈를 위한 거요. 금붕어인 내가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어항 속의 물 같은 거요. 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 제 일에 만족감을 느껴요. 정신적인 충족감이 없다면 다시없는 고역이죠.
주인공 :
(명전. 주인공 전면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하하. 사실 두 사내의 인상이나 행동거지가 앵벌이 조직이나 어떤 은밀한 거래를 하는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서울역 사내를 불러 잠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막상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명함부터 건내줬죠. 그리고 더듬거리며 월간 『일과 사람』의 새로운 연재기획물인 ‘이런 일, 이런 사람’에서 그 사내를 취재하고 싶다. 둘이 어떤 사인지 알고 싶다. 그 사람이 인터뷰에 응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이 그 사내와 친하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하. 즉흥적이지만 아주 적절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짓던 서울역 사내는 그제서야 얼굴을 풀면서 ‘걸인 사내와는 친구사인데, 지금은 기차시간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 연락을 하겠다. 다시 만나자.’ 고 하더군요.
서울역 사내 :
이 친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니깐... 처음에 저 친구가 저를 툭치면서 이야기를 건낼 때는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하. 지금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하지만... 주인공이 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처음 본 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페이드아웃.).
주인공 :
(주인공 의자로 가서 앉는다. 핀조명.) 저는 처치 곤란한 낡은 가구처럼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음향효과 - 피아노)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줄이 풀려 음정이 들쭉날쭉이었죠. 피아노 뚜껑을 덮고 매일매일 노동의 산물과 그 창조적 과정이 노동의 궁극적 동기가 되며 또 유희이며 문화가 되는 나의 노동, 즉 다시 작곡을 하고 음악을 하는 일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걸인 사내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걸인 사내 :
처음 형씨가 나에게 와서 인터뷰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소. 나는 나의 퍼포먼스를 끝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어쨌든 약속을 했기에 내가 퍼포먼스를 하던 곳으로 갔는데 형씨가 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소.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육 개월 간의 퍼포먼스는 내게 삶과 예술의 구분이 아니라 딱 하나였소. 그러나 형씨는 나의 퍼포먼스, 아니 나의 삶을 예술과 구분하려했소. 나는 육 개월 동안 걸인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걸인이었소. 나는 형씨가 말한 그 ‘이런 일, 이런 사람’인가 하는 연재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소. 노동을 분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요.
주인공 :
(명전. 페이드인.) 흠. 별로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기자분들이 약속을 해주시면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하고, 아니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기자1, 2, 3 :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는 기사화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
(살짝 미소띠며.)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저하죠. ‘이런 일, 이런 사람’의 첫 회분 원고를 퇴고하다가 문득 최은혜씨의 벗은 몸을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게 아무런 욕망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포즈를 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비늘을 반짝이며 파닥이고 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건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죠. 저는 알몸이 되어 수십 개의 진지한 눈빛들이 날아와 꽂히는 무대 위에서 역시 알몸인 채로 포즈를 잡고 있는 그녀를 포옹하는 엽기적은 상상을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하. 옷을 입은 그녀보다 벗은 그녀가 제 욕망을 자극했던 것은 알몸이 주는 선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니라 쉴 때의 그녀보다 일할 때의 그녀의 모습이 훨씬 더 도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에 몰입한 그녀의 열정이 절정에 도달한 여인의 교성처럼 나를 욕망의 늪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신통력 있는 종교전도사처럼 전파하고 있었을 껍니다. 하하. 그래서 제가 다시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작곡노트를 들춰내어 뒤적거렸던 거였죠. 이상입니다. 최은혜씨를 앉고 싶다. 그런 얘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럼 이만하도록 하죠(페이드아웃. 암전.).
주인공 :
(페이드인. 중앙무대 중앙에서.) 구걸하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걸인과 피를 보는 주먹다짐까지 했던 것은 그가 걸인 흉내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걸인생활의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삶은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치열한 것이니깐…. 또 서울역 사내를 만나 자신이 구걸해 모은 돈을 전달한 것은 그가 말한대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삶과 예술로 구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숱한 의문들을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역 사내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걸인 사내가 트랙킹 도중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에게 쪽지를 건내주었죠. (종이쪽지를 하나 꺼내 보여준 후 들여다본다.) 전자우편을 프린트한 쪽지였습니다. 걸인 사내가 서울역 사내에게 보낸 전자우편이었습니다(페이드아웃. 암전.).
걸인 사내 :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네. 이번 퍼포먼스는 내 자신이 행위자인 동시에 유일한 관객이 될 것이네. 먼 곳에서 인사하네. 잘 있게 친구.
최은혜 :
아까도 가게주인이 얘기했지만 왜 남의 얘기를 전하려고 해요? 난 입이 없나요? 흥! 내 이야기는 내가 하겠어요. 제 작업은 하나의 이벤트예요. 음악은 뺄 수 없는 그 한 부분이지요. 장사익도 있고, 정태춘도 있고, 하드록도 있고, 주인공이 본 것처럼 뉴에이지 계통의 음악을 사용할 때도 있구요.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거죠. 제 포즈를 위한 거요. 금붕어인 내가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어항 속의 물 같은 거요. 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한 선입견이 있지만 전 제 일에 만족감을 느껴요. 정신적인 충족감이 없다면 다시없는 고역이죠.
주인공 :
(명전. 주인공 전면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하하. 사실 두 사내의 인상이나 행동거지가 앵벌이 조직이나 어떤 은밀한 거래를 하는 사이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서울역 사내를 불러 잠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막상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명함부터 건내줬죠. 그리고 더듬거리며 월간 『일과 사람』의 새로운 연재기획물인 ‘이런 일, 이런 사람’에서 그 사내를 취재하고 싶다. 둘이 어떤 사인지 알고 싶다. 그 사람이 인터뷰에 응할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이 그 사내와 친하면 도움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하. 즉흥적이지만 아주 적절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짓던 서울역 사내는 그제서야 얼굴을 풀면서 ‘걸인 사내와는 친구사인데, 지금은 기차시간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 연락을 하겠다. 다시 만나자.’ 고 하더군요.
서울역 사내 :
이 친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먼.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할 수 있게 해달라니깐... 처음에 저 친구가 저를 툭치면서 이야기를 건낼 때는 별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하. 지금하고 있는 꼴을 보세요. 하지만... 주인공이 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는 처음 본 사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페이드아웃.).
주인공 :
(주인공 의자로 가서 앉는다. 핀조명.) 저는 처치 곤란한 낡은 가구처럼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음향효과 - 피아노)건반을 눌러보았습니다. 줄이 풀려 음정이 들쭉날쭉이었죠. 피아노 뚜껑을 덮고 매일매일 노동의 산물과 그 창조적 과정이 노동의 궁극적 동기가 되며 또 유희이며 문화가 되는 나의 노동, 즉 다시 작곡을 하고 음악을 하는 일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걸인 사내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걸인 사내 :
처음 형씨가 나에게 와서 인터뷰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소. 나는 나의 퍼포먼스를 끝낼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어쨌든 약속을 했기에 내가 퍼포먼스를 하던 곳으로 갔는데 형씨가 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소. 무슨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육 개월 간의 퍼포먼스는 내게 삶과 예술의 구분이 아니라 딱 하나였소. 그러나 형씨는 나의 퍼포먼스, 아니 나의 삶을 예술과 구분하려했소. 나는 육 개월 동안 걸인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걸인이었소. 나는 형씨가 말한 그 ‘이런 일, 이런 사람’인가 하는 연재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없었소. 노동을 분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요.
주인공 :
(명전. 페이드인.) 흠. 별로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기자분들이 약속을 해주시면 남은 이야기를 마저 하고, 아니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기자1, 2, 3 :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이야기는 기사화하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
(살짝 미소띠며.)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마저하죠. ‘이런 일, 이런 사람’의 첫 회분 원고를 퇴고하다가 문득 최은혜씨의 벗은 몸을 안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게 아무런 욕망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포즈를 잡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비늘을 반짝이며 파닥이고 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건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죠. 저는 알몸이 되어 수십 개의 진지한 눈빛들이 날아와 꽂히는 무대 위에서 역시 알몸인 채로 포즈를 잡고 있는 그녀를 포옹하는 엽기적은 상상을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하. 옷을 입은 그녀보다 벗은 그녀가 제 욕망을 자극했던 것은 알몸이 주는 선정적인 느낌 때문이 아니라 쉴 때의 그녀보다 일할 때의 그녀의 모습이 훨씬 더 도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에 몰입한 그녀의 열정이 절정에 도달한 여인의 교성처럼 나를 욕망의 늪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신통력 있는 종교전도사처럼 전파하고 있었을 껍니다. 하하. 그래서 제가 다시 깊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작곡노트를 들춰내어 뒤적거렸던 거였죠. 이상입니다. 최은혜씨를 앉고 싶다. 그런 얘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럼 이만하도록 하죠(페이드아웃. 암전.).
주인공 :
(페이드인. 중앙무대 중앙에서.) 구걸하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걸인과 피를 보는 주먹다짐까지 했던 것은 그가 걸인 흉내의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니라 걸인생활의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삶은 한 치의 여유도 없이 치열한 것이니깐…. 또 서울역 사내를 만나 자신이 구걸해 모은 돈을 전달한 것은 그가 말한대로 자신의 퍼포먼스를 삶과 예술로 구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숱한 의문들을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역 사내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걸인 사내가 트랙킹 도중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에게 쪽지를 건내주었죠. (종이쪽지를 하나 꺼내 보여준 후 들여다본다.) 전자우편을 프린트한 쪽지였습니다. 걸인 사내가 서울역 사내에게 보낸 전자우편이었습니다(페이드아웃. 암전.).
걸인 사내 :
새로운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네. 이번 퍼포먼스는 내 자신이 행위자인 동시에 유일한 관객이 될 것이네. 먼 곳에서 인사하네. 잘 있게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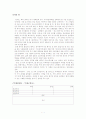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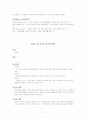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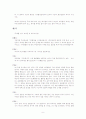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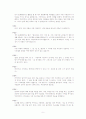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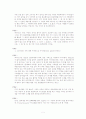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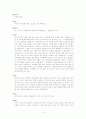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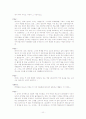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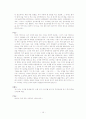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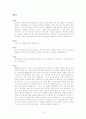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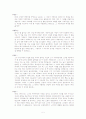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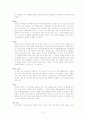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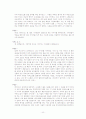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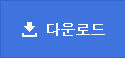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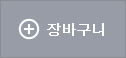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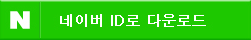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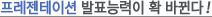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