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判決의 紹介
가. 事實關係
나. 原審
다. 大法院
1) 多數意見(大法院長 李容勳, 大法官 高鉉哲, 梁承泰, 金滉植, 李鴻薰, 朴一煥, 安大熙)
2) 反對意見(大法官 金英蘭, 朴時煥, 金知衡, 金能煥, 田秀安)
3)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大法官 梁承泰, 金滉植, 安大熙)
4) 多數意見에 對한 第2補充意見(大法官 李鴻薰)
5)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大法官 金英蘭, 朴時煥, 金知衡)
6) 多數意見에 對한 再補充意見(大法官 安大熙)
2. 爭點의 確定
3. 이 事件은 立法問題인가?
가. 論議의 實益
나. 論理構造
1) 立法問題로 볼 境遇
2) 立法問題가 아니라 볼 境遇
다. 이 事件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의 論議
1) 立法問題로 보는 듯한 意見
가)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
나) 多數意見에 對한 再補充意見
다) 反對意見
라)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
2) 立法問題로 보지 않는 듯한 意見
가) 多數意見에 對한 第2補充意見
3) 小結
라. 中間結論
4. 이 事件 立法意圖의 把握 ― “法律變遷”의 問題
가. 問題의 所在
나. 法律解釋方法에 對한 學說
1) 序
2) 意圖主義(intentionalism)
3) 文言主義(textualism)
4) 目的主義(purposivism)
5) 備考
6) 小結
다. 이 事件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의 論議
1) 現在의 國會 態度를 强調하는 듯한 見解 ―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
2) 制定時 國會 態度를 强調하는 듯한 見解 ―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
3) 小結
라. 檢討
마. 中間結論
5. 結論
가. 事實關係
나. 原審
다. 大法院
1) 多數意見(大法院長 李容勳, 大法官 高鉉哲, 梁承泰, 金滉植, 李鴻薰, 朴一煥, 安大熙)
2) 反對意見(大法官 金英蘭, 朴時煥, 金知衡, 金能煥, 田秀安)
3)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大法官 梁承泰, 金滉植, 安大熙)
4) 多數意見에 對한 第2補充意見(大法官 李鴻薰)
5)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大法官 金英蘭, 朴時煥, 金知衡)
6) 多數意見에 對한 再補充意見(大法官 安大熙)
2. 爭點의 確定
3. 이 事件은 立法問題인가?
가. 論議의 實益
나. 論理構造
1) 立法問題로 볼 境遇
2) 立法問題가 아니라 볼 境遇
다. 이 事件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의 論議
1) 立法問題로 보는 듯한 意見
가)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
나) 多數意見에 對한 再補充意見
다) 反對意見
라)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
2) 立法問題로 보지 않는 듯한 意見
가) 多數意見에 對한 第2補充意見
3) 小結
라. 中間結論
4. 이 事件 立法意圖의 把握 ― “法律變遷”의 問題
가. 問題의 所在
나. 法律解釋方法에 對한 學說
1) 序
2) 意圖主義(intentionalism)
3) 文言主義(textualism)
4) 目的主義(purposivism)
5) 備考
6) 小結
다. 이 事件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의 論議
1) 現在의 國會 態度를 强調하는 듯한 見解 ― 多數意見에 對한 第1補充意見
2) 制定時 國會 態度를 强調하는 듯한 見解 ― 反對意見에 對한 補充意見
3) 小結
라. 檢討
마. 中間結論
5. 結論
본문내용
해 가만히 있다면, 이는 어떤 의미일까? 경우의 수는 단 2개뿐이다. ① 의회의 권한방임 현상이거나, ② 의회의 뜻과 같은 경우다. ① 前者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므로, ② 後者에 한해 논하자.
이 사건 관련법률 \"제정 당시\" 업무상 공무상 재해 개념에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것이 법률제정자의 의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법률해석의 주체들이, 양자에 차이를 두는 해석을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그에 대해 반발하지도,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지도 않는다면, 입법자의 뜻은, \"이제는\" 결국 그들의 해석과 같다.
逆으로, \"이제는\" 국회가 양자 재해의 개념에 차이를 두려고 나서는데, 이미 다른 해석주체들이 같은 문언을 보고 차이를 둔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국회가 이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法律變遷\"이라고 부르자. 이 개념은,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헌법변천이란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 당해 헌법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입법 행정 또는 사법작용이나 헌법적 관행의 반복에 의해 그 헌법조문의 의미 내용이 암묵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특질설은) 헌법변천은 \'헌법의 파괴\'도 아니고 관습에 불과한 것도 아니며 헌법이라는 \'법\' 그 자체라고 이해한다.
) 林智奉, \"헌법변천과 헌법침해,\"「考試硏究」30권 6호 (2003.06), 고시연구사, 2003, 216-221.
헌법변천과 마찬가지로, \"法律變遷\"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법률 文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에 대한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이 제정 당시와 다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변천이 헌법제 개정권력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변천 역시 법률제 개정권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
의회의 眞正한 의사의 존중, 法的 安定性 보장의 견지에서, 法律變遷을 肯定해야 한다. \"제정법의 一般的인 목적\"에 따라 법률해석을 하는 Hart의 입장에 따를 때, 法律變遷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法律解釋方法으로는 目的主義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해석이 입법자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입법자가 법률을 분명히 해 주면 족하다. 즉 法律變遷의 限界가 바로 法律改正이다.
마. 中間結論
사안의 경우, 업무상 공무상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不作爲했다. 이는 立法者 스스로 法律變遷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새로운 慣行은 立法者의 態度에 符合한다. 눈에 보이는 법률개정은 없었지만, 분명 實質的으로는 입법자가 改正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변천은 \"소리 없는 법률개정\"이라 할 수 있다.
5. 結論
① 이 사건은 立法問題다. ② 이 사건 立法態度는, 出 退勤時 交通事故는 공무상재해일 수는 있어도 業務上災害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 청구를 기각한 大法院에 贊同한다.
6. 補論
\"위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모법인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제1보충의견에는, 행정부가 \"B\"라고 본다면 사법부 역시 이를 존중해 \"B\"로 보아야 한다는 印象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는 \"불명료한 경우, 행정기관의 해석실무에 복종해야 한다\"는 Chevron deference
) [각주 9] 참조.
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다만 Chevron deference는 靜的 법률해석이론이므로, 動的 狀況 국회의 태도 변화 에 있어서는 有效하지 않을 것이다.
) 제한된 분량에서 논하기에, 餘白이 없다.
이 사건 관련법률 \"제정 당시\" 업무상 공무상 재해 개념에 차이를 두지 않으려는 것이 법률제정자의 의도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법률해석의 주체들이, 양자에 차이를 두는 해석을 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그에 대해 반발하지도, 명문규정을 두어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지도 않는다면, 입법자의 뜻은, \"이제는\" 결국 그들의 해석과 같다.
逆으로, \"이제는\" 국회가 양자 재해의 개념에 차이를 두려고 나서는데, 이미 다른 해석주체들이 같은 문언을 보고 차이를 둔 해석을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국회가 이 점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法律變遷\"이라고 부르자. 이 개념은, 憲法變遷(Verfassungswandlung)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헌법변천이란 \"헌법개정에 의하지 않고, 당해 헌법조문은 그대로 있으면서 입법 행정 또는 사법작용이나 헌법적 관행의 반복에 의해 그 헌법조문의 의미 내용이 암묵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헌법특질설은) 헌법변천은 \'헌법의 파괴\'도 아니고 관습에 불과한 것도 아니며 헌법이라는 \'법\' 그 자체라고 이해한다.
) 林智奉, \"헌법변천과 헌법침해,\"「考試硏究」30권 6호 (2003.06), 고시연구사, 2003, 216-221.
헌법변천과 마찬가지로, \"法律變遷\"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 법률 文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에 대한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이 제정 당시와 다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변천이 헌법제 개정권력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변천 역시 법률제 개정권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는다.
의회의 眞正한 의사의 존중, 法的 安定性 보장의 견지에서, 法律變遷을 肯定해야 한다. \"제정법의 一般的인 목적\"에 따라 법률해석을 하는 Hart의 입장에 따를 때, 法律變遷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法律解釋方法으로는 目的主義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해석이 입법자의 뜻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입법자가 법률을 분명히 해 주면 족하다. 즉 法律變遷의 限界가 바로 法律改正이다.
마. 中間結論
사안의 경우, 업무상 공무상 재해를 달리 취급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不作爲했다. 이는 立法者 스스로 法律變遷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새로운 慣行은 立法者의 態度에 符合한다. 눈에 보이는 법률개정은 없었지만, 분명 實質的으로는 입법자가 改正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변천은 \"소리 없는 법률개정\"이라 할 수 있다.
5. 結論
① 이 사건은 立法問題다. ② 이 사건 立法態度는, 出 退勤時 交通事故는 공무상재해일 수는 있어도 業務上災害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③ 청구를 기각한 大法院에 贊同한다.
6. 補論
\"위 시행규칙의 규정들은 모법인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제1보충의견에는, 행정부가 \"B\"라고 본다면 사법부 역시 이를 존중해 \"B\"로 보아야 한다는 印象이 강하다. 그렇다면, 이는 \"불명료한 경우, 행정기관의 해석실무에 복종해야 한다\"는 Chevron deference
) [각주 9] 참조.
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다만 Chevron deference는 靜的 법률해석이론이므로, 動的 狀況 국회의 태도 변화 에 있어서는 有效하지 않을 것이다.
) 제한된 분량에서 논하기에, 餘白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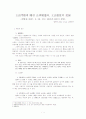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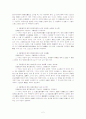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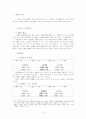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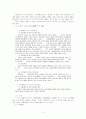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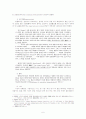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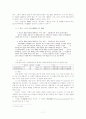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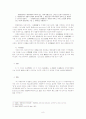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