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우리나라 승탑의 기원
☉ 석탑양식의 성립
☉ 양식의 변화
☉ 이 형 석 탑
☉ 전 탑
☉ 고려시대의 승탑
☉ 통일 신라시대의 특징
♣ 통일신라신대의 토기 특징
☉ 무덤 출토 토기
☉ 마애삼존불상
☉ 석탑양식의 성립
☉ 양식의 변화
☉ 이 형 석 탑
☉ 전 탑
☉ 고려시대의 승탑
☉ 통일 신라시대의 특징
♣ 통일신라신대의 토기 특징
☉ 무덤 출토 토기
☉ 마애삼존불상
본문내용
승 탑
우리나라 승탑의 기원
우리나라승탑의 건립은 불교가 전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승탑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모든 승려의 유골이 화장된 후 승탑에 안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신라의 고승 원효는 죽은 후 유골로 초상이 만들어져 분황사에 안치되었고 자장의 유해는 석혈에 봉안되었으며, 백제의 승려 혜현의 시신은 석실에 두어 호랑이 밥이 되게 하였고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는 죽은 후 제자들이 흩어지려는 유골을 모아 흙 속에 매장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승들의 장례에도 승탑이 세워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오히려 진표율사와 같은 경우는 유골을 흙 속에 매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한 곳이 파손되어 유골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바람에 일부는 잃어버리는 수난까지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한편에서는 고승들의 유골을 안전하게 납골하여 보전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을 것인데 마침 중국으로 건너가 유학하고 귀국한 학승들로부터 승탑을 세우는 새로운 장례법이 들어봐 이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승탑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승탑들을 탐고하면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는 상당한 지위와 덕망을 갖춘 특별한 승려들에 한하여 승탑이 조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승탑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신라 원광법사의 부도가 금곡사에 있고 혜숙스님의 부도가 안강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백제의 승려 혜현의 유골은 후에 석탑을 만들어 그 속을 안장하였다고 하므로 삼국시대 말기에는 우리나라에 승탑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나마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중국에서도 고승 구마라습의 사리탑이 조영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승탑도 이러한 당나라 고승의 장례법을 들여 온 결과로 보여지며 이러한 국내외의 정황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승탑의 기원은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된다.
석탑양식의 성립
삼국을 통일한 신라왕조에서는 삼국의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며 특히 석탑에 있어서는 신라적인 요소와 백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의성탑리 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약간 돋아진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는데 기단과 탑신에 별개의 기둥을 배치하고 각 층의 부재들은 여러개의 석재들로 짜맞추고 있다. 초창탑신의 앞면에는 문틀을 내고 감실을 마련하여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처마 밑과 윗 쪽의 경사면을 층단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본적으로목탑을 본뜬 백제식의 석탑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지붕의 형태는 분황사 모전석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백제탑과 신라탑의 절충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석탑인 경주 부근동해변은 감은사지삼층석탑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의 고선사지삼층석탑에서는 기단이 2층으로 높아지고 탑신부의 지붕돌 윗면은 밋밋한 빗면을 처리하면서 처마 끝이 네 귀에서 살짝 들리는 등 진전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감은사는 신문왕 2년 (682)에 낙성된 사찰이므로 탑의 건립 또한 이때로 추정되는데 2층 기단은 여려 개의 기둥돌과 벽판석으로 짜맞추어 잘 정비되어 있다. 탑신은 네 개의 기둥돌과 네 개의 벽판석으로 짜여지고 지붕돌은 여
우리나라 승탑의 기원
우리나라승탑의 건립은 불교가 전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는 있으나 처음부터 승탑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모든 승려의 유골이 화장된 후 승탑에 안장되는 것도 아니었다.
신라의 고승 원효는 죽은 후 유골로 초상이 만들어져 분황사에 안치되었고 자장의 유해는 석혈에 봉안되었으며, 백제의 승려 혜현의 시신은 석실에 두어 호랑이 밥이 되게 하였고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는 죽은 후 제자들이 흩어지려는 유골을 모아 흙 속에 매장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승들의 장례에도 승탑이 세워지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오히려 진표율사와 같은 경우는 유골을 흙 속에 매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한 곳이 파손되어 유골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바람에 일부는 잃어버리는 수난까지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한편에서는 고승들의 유골을 안전하게 납골하여 보전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을 것인데 마침 중국으로 건너가 유학하고 귀국한 학승들로부터 승탑을 세우는 새로운 장례법이 들어봐 이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승탑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남아있는 승탑들을 탐고하면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는 상당한 지위와 덕망을 갖춘 특별한 승려들에 한하여 승탑이 조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의 승탑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삼국유사에는 신라 원광법사의 부도가 금곡사에 있고 혜숙스님의 부도가 안강의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며 백제의 승려 혜현의 유골은 후에 석탑을 만들어 그 속을 안장하였다고 하므로 삼국시대 말기에는 우리나라에 승탑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나마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중국에서도 고승 구마라습의 사리탑이 조영되고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승탑도 이러한 당나라 고승의 장례법을 들여 온 결과로 보여지며 이러한 국내외의 정황을 참고하면 우리나라 승탑의 기원은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된다.
석탑양식의 성립
삼국을 통일한 신라왕조에서는 삼국의 문화적 융합이 이루어지며 특히 석탑에 있어서는 신라적인 요소와 백제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시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는 의성탑리 오층석탑을 들 수 있다. 이 탑은 약간 돋아진 기단위에 5층의 탑신을 올리고 있는데 기단과 탑신에 별개의 기둥을 배치하고 각 층의 부재들은 여러개의 석재들로 짜맞추고 있다. 초창탑신의 앞면에는 문틀을 내고 감실을 마련하여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지붕의 형태는 처마 밑과 윗 쪽의 경사면을 층단형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기본적으로목탑을 본뜬 백제식의 석탑을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지붕의 형태는 분황사 모전석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백제탑과 신라탑의 절충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석탑인 경주 부근동해변은 감은사지삼층석탑이나 국립경주박물관의 고선사지삼층석탑에서는 기단이 2층으로 높아지고 탑신부의 지붕돌 윗면은 밋밋한 빗면을 처리하면서 처마 끝이 네 귀에서 살짝 들리는 등 진전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감은사는 신문왕 2년 (682)에 낙성된 사찰이므로 탑의 건립 또한 이때로 추정되는데 2층 기단은 여려 개의 기둥돌과 벽판석으로 짜맞추어 잘 정비되어 있다. 탑신은 네 개의 기둥돌과 네 개의 벽판석으로 짜여지고 지붕돌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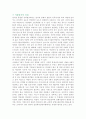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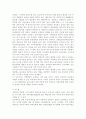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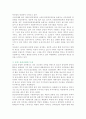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