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領土條項과 그 意味
1. 領土條項 ‘韓半島’의 意味
2. 領土條項의 意味
3. 憲法 第3條의 存廢論에 대한 見解의 對立
4. 北韓地域의 憲法上 地位
Ⅲ. 平和統一 條項과 그 意味
1. 統一의 意味
2. 平和的 統一의 意味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Ⅳ. 兩條項의 矛盾性 檢討
1.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와의 關係
2.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의 矛盾性 檢討
Ⅴ. 結
Ⅱ. 領土條項과 그 意味
1. 領土條項 ‘韓半島’의 意味
2. 領土條項의 意味
3. 憲法 第3條의 存廢論에 대한 見解의 對立
4. 北韓地域의 憲法上 地位
Ⅲ. 平和統一 條項과 그 意味
1. 統一의 意味
2. 平和的 統一의 意味
3. 自由民主的 基本秩序
Ⅳ. 兩條項의 矛盾性 檢討
1.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와의 關係
2. 憲法 第3條와 憲法 第4條의 矛盾性 檢討
Ⅴ. 結
본문내용
그러한 모순적법을 근거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헌법 제3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이 견해는 헌법 제4조와의 모순성과 헌법에 시대적인 상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 제3조와 같은 조항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니면 옛날의 서독처럼 아예 남한 지역으로 영토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헌법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타당치 않으며 이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서 문제인데 헌법조항을 꼭 이렇게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 당장 고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개정론은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시대적인 분위기를 참작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 \"영토조항 명확한 해결방법은 조항 삭제\" 노컷뉴스 2005.10.26 CBS뉴스레이다 5부
※ 모순론 관련 인터뷰 기사 한겨레 2005.10.28 “헌법상 영토조항은 북 실체 부정하는 것”
적어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아우른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교 변호사가 이 조항의 개선 또는 삭제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인 김 변호사는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 조항이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9월19일 북핵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주제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주최한 심포지엄이었다. 김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을 9·19 공동성명의 대표적 걸림돌로 꼽았다. 김 변호사가 보기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법상 주권국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세계 150여개 국가와 정식 수교를 체결했고 유엔에도 가입했다.
이 영토조항을 확대하면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전체, 특히 탈북주민들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한국이 재외 탈북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은 동독 거주민, 동독여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외국 주재 서독 대사관·영사관(에 들어온 동독주민)에 대해서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영토조항은 과거 냉전구조 아래서 북진통일론을 배경으로 규정된 것”인데다 “동서냉전 해소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비롯해 여러 남북 합의사항 등과도 양립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등과 상충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에 장애물이 된 영토조항을 개선·삭제하고, 북한의 국가성과 합법적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개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같은 학술대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해 이 합의서의 국내법적인 규범성을 높이면서,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 하루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Ⅳ. 結
결국 북한은 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휴전선 이북을 통치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되 그것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 즉, 헌법 제3조는 통일 후의 북한지역에 대하여 잠재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주권이 현재화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하나의 실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북한과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며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는 그 실체를 인정하되 현재의 휴전상황과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재전의 위험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적 국제해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와 북한의 민족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4조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인 것이다.
즉,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되 그것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적\'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는 모순되는 조항이 아니며 어느 한 조항을 폐지할 필요도 개정할 필요도 없다.
※ 참고자료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5
강경근, 『헌법학강론』, 일신사, 1993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8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김철수, 『법과 통치』, 교육과학사, 1995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3』, 역사비평사, 2000
이한기, 『한국의 영토-영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헌법 제3조의 삭제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이 견해는 헌법 제4조와의 모순성과 헌법에 시대적인 상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 제3조와 같은 조항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조항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아니면 옛날의 서독처럼 아예 남한 지역으로 영토 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헌법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일부 보수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타당치 않으며 이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서 문제인데 헌법조항을 꼭 이렇게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지금 당장 고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개정론은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석하면서 시대적인 분위기를 참작하여 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 \"영토조항 명확한 해결방법은 조항 삭제\" 노컷뉴스 2005.10.26 CBS뉴스레이다 5부
※ 모순론 관련 인터뷰 기사 한겨레 2005.10.28 “헌법상 영토조항은 북 실체 부정하는 것”
적어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아우른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승교 변호사가 이 조항의 개선 또는 삭제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인 김 변호사는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 조항이 “북한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9월19일 북핵 6자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주제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이 주최한 심포지엄이었다. 김 변호사는 발표문을 통해 현행 헌법의 영토조항을 9·19 공동성명의 대표적 걸림돌로 꼽았다. 김 변호사가 보기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법상 주권국가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북한은 이미 세계 150여개 국가와 정식 수교를 체결했고 유엔에도 가입했다.
이 영토조항을 확대하면 북한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전체, 특히 탈북주민들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한국이 재외 탈북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게 김 변호사의 판단이다. 과거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은 동독 거주민, 동독여권 사용자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외국 주재 서독 대사관·영사관(에 들어온 동독주민)에 대해서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영토조항은 과거 냉전구조 아래서 북진통일론을 배경으로 규정된 것”인데다 “동서냉전 해소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거스른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비롯해 여러 남북 합의사항 등과도 양립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등과 상충하고 남북간 화해협력에 장애물이 된 영토조항을 개선·삭제하고, 북한의 국가성과 합법적 실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개헌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국가형성이라는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같은 학술대회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국회에서 비준 처리해 이 합의서의 국내법적인 규범성을 높이면서,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 하루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Ⅳ. 結
결국 북한은 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휴전선 이북을 통치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되 그것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일 뿐이다. 즉, 헌법 제3조는 통일 후의 북한지역에 대하여 잠재적인 상태에 놓여 있던 주권이 현재화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하나의 실체,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북한과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며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혹은 실수로 혼동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는 그 실체를 인정하되 현재의 휴전상황과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재전의 위험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적 국제해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와 북한의 민족적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4조에서 말하는 평화적 통일인 것이다.
즉,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되 그것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적\'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는 모순되는 조항이 아니며 어느 한 조항을 폐지할 필요도 개정할 필요도 없다.
※ 참고자료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5
강경근, 『헌법학강론』, 일신사, 1993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199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3
김철수, 『판례교재 헌법』, 법문사, 198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1995
김철수, 『법과 통치』, 교육과학사, 1995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3』, 역사비평사, 2000
이한기, 『한국의 영토-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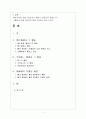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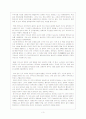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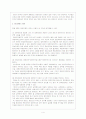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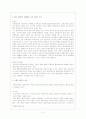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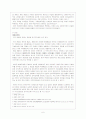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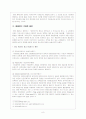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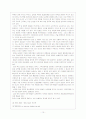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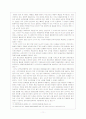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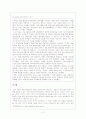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