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장 ․ 문체의 정의
1. 문장
2. 문체
Ⅱ. 구어문과 문어문
1.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
2. 문장 종류에 따른『구어문』사용
Ⅲ. 시대별 문장의 흐름
1. 명치 이전의 문장
2. 명치 초기의 문장
3. 언문일치 이후의 문장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문장
2. 문체
Ⅱ. 구어문과 문어문
1. 시대흐름에 따른 변화
2. 문장 종류에 따른『구어문』사용
Ⅲ. 시대별 문장의 흐름
1. 명치 이전의 문장
2. 명치 초기의 문장
3. 언문일치 이후의 문장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생と구명を부けたほどで、처は피の명であったものを、かれは금その처に사なれたのであす。
연までに애がられた、대사はられた피の처は、결して연までに부を사はなかった。위は위は통일편であったけれども、は소しも불족に사はぬのみか、それが녀자も성としんじてゐたのである。
(『다정다한』)
이후 서きことば에서 문말의 지정형식은 이와 같이 「である」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의 구두점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③ 전통적인 문장
등에 의해 화주의에 대한 반대 움직임 및 국수보존의 풍조에 동반해 전통적인 문장도 그 기세가 커졌다.
정자규에 의해 시작된 생문은 마치 카메라의 눈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충실히 비추는 듯한 사실적 태도로, 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썼다. 생문이 무엇을 묘사하기 보다는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문제시하여 인 여유를 가지고 문장에 대해 연구를 한 다. 이에 반해 자연주의는 있는 그대로 평이하게 묘사하는 입장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이 문체는 명치 43년 창간된 『백화』에 속하는 작가들의 노력에 의해 한층 세련미가 더해져 구어문이 거의 완성된다. 백화파 중에서도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로 쓴 것이 이다.
백화파 작가들에 의해 자연주의부터 근대 문장에서 이상으로 여겨진 이야기하듯이 쓰는, 언문일치의 목적을 달성된다. 그러나 이야기하듯이 쓴다는 요구가 충족되자 이번에는 고도의 예술성을 추구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쓰는 듯이 쓴다는 사고방식으로 신감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정 말년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리얼리즘에 철저한 입각하여 인간생활 및 사회의 현실을 속어를 섞어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편, 구어문을 순화하여 새로운 문어체 문장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와 발맞춰 는 한어를 이용해 말에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을 썼다. 박영숙, 『일본어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2, 157-158.
(2) 문학 외의 분야에서의 언문일치
언문일치의 운동은 문예 분야에 한하지 않고 일반 계몽서나 신문 분야에서도 진행된다.
① 신문에서의 언문일치
명치시대에 들어와 신문이 발달하였다. 정론을 주로 하는 대신문(おおしんぶん)은 まじり의 문어체로 쓰인데 반해, 소신문(こしんぶん)으로 불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 본위의 신문은 「ます」「です」「でござる」「でございます」등을 문말에 사용하고 문장도 ふりがな 등을 붙여 읽기 쉽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소신문의 문체도 문어체의 문장이 되고, 대신문 가 「である」체의 구어체로 쓰이게 된 것은 대정 10년대부터이다.
② 일반사회에서의 언문일치 : 국정교과서
언문일치 운동은 문예 분야에 한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 명치33년에 제국교육회의 내부에 언문일치가 결성되어 『언문일치론집』 『언문일치창가』등이 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운동에 의해 명치37년부터 전국의 소학교에 사용되어 최초의 국정교과서『국정교과서』에 전면적으로 구어체가 채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경향을 가져다준다. 박영숙, 159-160.
▶ 독본 교과서.(태평양 전쟁 전까지의)초등학교 국어과의 교과서
의 문말 형식
국어교과서에서도 ‘학제(학제) 학교에 관한 제도. 1972년(명치5)에 제도화된 일본 최초의 근대학교제도에 관한 규정. 구미의 학교제도를 참고하여, 전국을 대학구·중학구·소학구로 분류, 각학구에 대학교·중학교·소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계획대로는 실시되지 않고, 79년(명치12)교육령의 제정에 의해 폐지
’가 나온 초기부터 「담화조」의 문장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때 반대도 있어서 담화조는 중지되었으나 명치10년이 지나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である, であります, でござり(い)ます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명치 20년 전후에는 「であります, ます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제1차 ‘심상소학독본(보통소학교과서)’(명치36,1903)부터는 「です, ます조」가 일반적이게 된다. 다음의 문장 등은, 지금 보아도 별로 위화감이 없다.
かぜが、だんだん、あたたかになってきて、목もめをだしました。초もみどりになってきました。야원には、たんぼぼやすみれなどが、いちめんに、さきそろってゐます。공では、ひばりがさへづってゐますし、림では、うぐひすがないでゐます。ちょちょは、화おはなとおちよとがつみくさをしてゐますと、태랑も、문길も、あそびに、きました。
(문부성『심상소학독본』오、명치삼십칠년)
소학교 저학년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일상의 ‘담화’ 창고가 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중’한 표현의 방법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だ」나 「である」등은 다소 고학년이 되어서 나타난다.
다만, 당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문」이라고 불리는 문어체의 문장이 쓰이고 있었기에 3, 4학년생보다 고학년이 되면 그 문장이 나타난다. 제2차의 소학독본의 예는 아래와 같다.
사が국도るところ명승の지にとぼしからざれども、よく인공の미と천연の미とを병せたるは일광に여くはなし。されな일년중려관자적を절たず、하の성りの경、추の홍엽の절には래り유ぶもの최も다し。외국인の사が국に래る자역필ずここに유びて、일광も결구を상せざるものなし。
(문부성『심상소학독본』권구、명치사십삼년)
③ 공용문
또한 법령문 같은 공용문에는 문어체의 문장이 길게 관용되어 쓰였다. 하지만 전쟁 후의 소화21년의 관청공용문(관청공용문)에는 「である」나「ます」가 채택되어 사용돼, 여기에 처음으로 공용문의 구어화가 실현되었다.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참고 문헌
고전동삭, 『일본어』, , 1994
김공칠, 『일본어학개론』, 평화출판사, 1978.
이한섭, 『일어학 개설』, 한신문화사, 1989.
북원보웅, 『일본어학개론』, 불이문화, 2003.
진전신치,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사』, 어문학사, 2004.
일본어교육학회, 『일본어교육사전』, 제이앤씨, 2006.
박영숙, 『일본어학개론』, 형설출판사, 2002
▶ 참고 사이트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http://ja.wikipedia.org/
연までに애がられた、대사はられた피の처は、결して연までに부を사はなかった。위は위は통일편であったけれども、は소しも불족に사はぬのみか、それが녀자も성としんじてゐたのである。
(『다정다한』)
이후 서きことば에서 문말의 지정형식은 이와 같이 「である」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의 구두점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③ 전통적인 문장
등에 의해 화주의에 대한 반대 움직임 및 국수보존의 풍조에 동반해 전통적인 문장도 그 기세가 커졌다.
정자규에 의해 시작된 생문은 마치 카메라의 눈으로 대상을 관찰하여 충실히 비추는 듯한 사실적 태도로, 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썼다. 생문이 무엇을 묘사하기 보다는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문제시하여 인 여유를 가지고 문장에 대해 연구를 한 다. 이에 반해 자연주의는 있는 그대로 평이하게 묘사하는 입장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이 문체는 명치 43년 창간된 『백화』에 속하는 작가들의 노력에 의해 한층 세련미가 더해져 구어문이 거의 완성된다. 백화파 중에서도 마치 이야기하는 듯한 어조로 쓴 것이 이다.
백화파 작가들에 의해 자연주의부터 근대 문장에서 이상으로 여겨진 이야기하듯이 쓰는, 언문일치의 목적을 달성된다. 그러나 이야기하듯이 쓴다는 요구가 충족되자 이번에는 고도의 예술성을 추구하여 개성적인 표현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쓰는 듯이 쓴다는 사고방식으로 신감각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정 말년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이 일어난다. 이것은 리얼리즘에 철저한 입각하여 인간생활 및 사회의 현실을 속어를 섞어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편, 구어문을 순화하여 새로운 문어체 문장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와 발맞춰 는 한어를 이용해 말에 군더더기가 없는 문장을 썼다. 박영숙, 『일본어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2, 157-158.
(2) 문학 외의 분야에서의 언문일치
언문일치의 운동은 문예 분야에 한하지 않고 일반 계몽서나 신문 분야에서도 진행된다.
① 신문에서의 언문일치
명치시대에 들어와 신문이 발달하였다. 정론을 주로 하는 대신문(おおしんぶん)은 まじり의 문어체로 쓰인데 반해, 소신문(こしんぶん)으로 불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 본위의 신문은 「ます」「です」「でござる」「でございます」등을 문말에 사용하고 문장도 ふりがな 등을 붙여 읽기 쉽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소신문의 문체도 문어체의 문장이 되고, 대신문 가 「である」체의 구어체로 쓰이게 된 것은 대정 10년대부터이다.
② 일반사회에서의 언문일치 : 국정교과서
언문일치 운동은 문예 분야에 한하지 않고 일반 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 명치33년에 제국교육회의 내부에 언문일치가 결성되어 『언문일치론집』 『언문일치창가』등이 간행되었다. 특히, 이러한 운동에 의해 명치37년부터 전국의 소학교에 사용되어 최초의 국정교과서『국정교과서』에 전면적으로 구어체가 채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언어생활에 큰 경향을 가져다준다. 박영숙, 159-160.
▶ 독본 교과서.(태평양 전쟁 전까지의)초등학교 국어과의 교과서
의 문말 형식
국어교과서에서도 ‘학제(학제) 학교에 관한 제도. 1972년(명치5)에 제도화된 일본 최초의 근대학교제도에 관한 규정. 구미의 학교제도를 참고하여, 전국을 대학구·중학구·소학구로 분류, 각학구에 대학교·중학교·소학교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지만, 계획대로는 실시되지 않고, 79년(명치12)교육령의 제정에 의해 폐지
’가 나온 초기부터 「담화조」의 문장을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 때 반대도 있어서 담화조는 중지되었으나 명치10년이 지나자 다시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である, であります, でござり(い)ます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명치 20년 전후에는 「であります, ます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제1차 ‘심상소학독본(보통소학교과서)’(명치36,1903)부터는 「です, ます조」가 일반적이게 된다. 다음의 문장 등은, 지금 보아도 별로 위화감이 없다.
かぜが、だんだん、あたたかになってきて、목もめをだしました。초もみどりになってきました。야원には、たんぼぼやすみれなどが、いちめんに、さきそろってゐます。공では、ひばりがさへづってゐますし、림では、うぐひすがないでゐます。ちょちょは、화おはなとおちよとがつみくさをしてゐますと、태랑も、문길も、あそびに、きました。
(문부성『심상소학독본』오、명치삼십칠년)
소학교 저학년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일상의 ‘담화’ 창고가 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중’한 표현의 방법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だ」나 「である」등은 다소 고학년이 되어서 나타난다.
다만, 당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문」이라고 불리는 문어체의 문장이 쓰이고 있었기에 3, 4학년생보다 고학년이 되면 그 문장이 나타난다. 제2차의 소학독본의 예는 아래와 같다.
사が국도るところ명승の지にとぼしからざれども、よく인공の미と천연の미とを병せたるは일광に여くはなし。されな일년중려관자적を절たず、하の성りの경、추の홍엽の절には래り유ぶもの최も다し。외국인の사が국に래る자역필ずここに유びて、일광も결구を상せざるものなし。
(문부성『심상소학독본』권구、명치사십삼년)
③ 공용문
또한 법령문 같은 공용문에는 문어체의 문장이 길게 관용되어 쓰였다. 하지만 전쟁 후의 소화21년의 관청공용문(관청공용문)에는 「である」나「ます」가 채택되어 사용돼, 여기에 처음으로 공용문의 구어화가 실현되었다.
Ⅳ.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참고 문헌
고전동삭, 『일본어』, , 1994
김공칠, 『일본어학개론』, 평화출판사, 1978.
이한섭, 『일어학 개설』, 한신문화사, 1989.
북원보웅, 『일본어학개론』, 불이문화, 2003.
진전신치, 『이해하기 쉬운 일본어사』, 어문학사, 2004.
일본어교육학회, 『일본어교육사전』, 제이앤씨, 2006.
박영숙, 『일본어학개론』, 형설출판사, 2002
▶ 참고 사이트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http://ja.wikipedia.org/
키워드
추천자료
 함석헌의 윤리사상
함석헌의 윤리사상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고
김훈의 칼의 노래를 읽고  북한의 언어표현 및 남북한의 특이한 어휘
북한의 언어표현 및 남북한의 특이한 어휘 나의 소원-민족 국가
나의 소원-민족 국가 중국고대산문
중국고대산문 [과외]중학 국어 1-1학기 기말 6단원 언어의 세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1학기 기말 6단원 언어의 세계 예상문제(교사용) [과외]중학 국어 1-1학기 기말 6단원 언어의 세계 예상문제
[과외]중학 국어 1-1학기 기말 6단원 언어의 세계 예상문제 [황순원][소나기][독후감][독서감상문][서평][문학]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황순원의 소나기...
[황순원][소나기][독후감][독서감상문][서평][문학]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황순원의 소나기... 영어학의 분류 ,
영어학의 분류 ,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우리말은 어떻게 쓰였을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우리말은 어떻게 쓰였을까? [인문과학] 박지원과 연암소설
[인문과학] 박지원과 연암소설 [모음][동시조음][모음조화][모음체계]모음의 분류기준, 모음의 동시조음, 모음조화의 개념, ...
[모음][동시조음][모음조화][모음체계]모음의 분류기준, 모음의 동시조음, 모음조화의 개념, ... 한문산문과 개화기 한문학
한문산문과 개화기 한문학 [국어 종결어미][서술어미][명사어미][의문어미]국어 종결어미와 서술어미, 국어 종결어미와 ...
[국어 종결어미][서술어미][명사어미][의문어미]국어 종결어미와 서술어미, 국어 종결어미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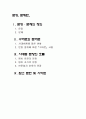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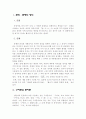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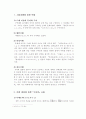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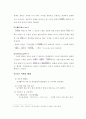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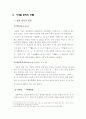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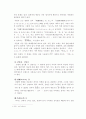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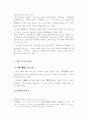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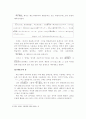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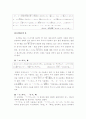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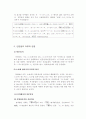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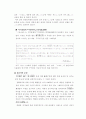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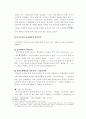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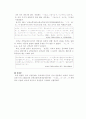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