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최치원의 생애
3. 최치원 문학세계의 통시적 접근
(1) 당나라에 유학한 시기
(2) 귀국 이후부터 은거 전 시기
(3) 방랑 은거 시기
4. 맺음말
2. 최치원의 생애
3. 최치원 문학세계의 통시적 접근
(1) 당나라에 유학한 시기
(2) 귀국 이후부터 은거 전 시기
(3) 방랑 은거 시기
4. 맺음말
본문내용
를 통해 그가 세상에 대해서 애착은 있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자기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애써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게 하여 현실을 피해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제가야산독서당>이 세속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담고 있다면, 은거 이 후 순수하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의 뛰어난 절경을 사실적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보듯이 묘사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창작한 시인 <임경대(臨鏡臺)>가 있다.
烟巒簇簇水溶溶(연만족족수용용) 안개 낀 산 빽빽하고 강물은 넘실넘실
鏡裏人家對碧峯(경리인가대벽봉) 거울 속인가 푸른 산 마주하였네.
何處孤帆飽風去(하처고범포풍거) 외로운 돛단배 바람 안고 어디로 가는가
瞥然飛鳥杳無(변연비조묘무종) 새처럼 언듯 지나쳐 자취 없네.
이 시는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산수시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화폭을 그려 보이면서 조국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고국의 아름답고 장려한 산천을 노래하고 있다. 시 속에 실로 그림이 있는 듯, 그림 속에 시가 있는 듯 경물묘사에서의 사실주의적 묘사특징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 손영선 , 조선 한국학 연구 제1집
또,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전하는 8편의 <둔세시(遯世詩)>는 시제나 작자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치운이 산에 은거한 후 그의 만년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추론된다. 8편 중 제 6편을 살펴보기로 하자.
擬說林泉興(의설임천흥) 산 속의 흥취 말은 들었다지만
何人識此機(하인식차기) 어느 사람이 이 기틀을 알리
無心見月色(무심견월색) 무심코 달빛 보며
坐忘歸(묵묵좌망귀) 묵묵히 앉아 돌아갈 길을 잊었네.
이 <둔세시>는 최치운이 가야산에 은거한 후의 작품인 듯하며 그의 심정과 사상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여기에서 그는 참다운 자연미를 발견하였고 자연에 귀의함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안주할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은거시기의 작품 중, 최치원의 세상에 대한 부정성을 엿볼 수 있는 <증산승(贈山僧)>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그가 세속을 떠나 속세로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僧乎莫道 靑山好(승호막도 청산호) 스님들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씀들 하지 마시오.
山好何事 更出山(산호하사 갱출산) 산이 좋다면 왜 자주 산 밖으로 나오시는가.
試看後日 吾踪跡(시간타일 오종적) 두고 보시라. 나의 뒷날 자취를
一入靑山 更不還(일입청산 갱불환)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테니.
최치원이 산 속의 스님에게 전해준 이 시에서 입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산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인간 속세로는 나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입산을 하면서 이 시를 남겼고, 뒷날 최치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이바지하고자 했던 신라 사회에 대한 상심과 환멸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최치원의 삶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의 작품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그가 처한 현실에 따라 그의 문학세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의 문학 속에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유학시기에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당나라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한탄 그리고 외로움의 정서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귀국 후에는 신라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모순과 세태를 풍자하여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켰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방랑과 은거를 하던 시기에는 현실 세계를 잊지 못하는 모습과 세속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작품의 차이, 곧 그의 문학 세계의 다양성은 통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의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였을 때 더욱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삶의 역정에 따른 시풍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당나라의 세련된 근체시(近體詩)를 신라 문단에 옮겨놓음으로써, 당시 오언시만이 겨우 산출되던 신라문단이 최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근체시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최치원의 이러한 시풍은 그야말로 이 후에 우리 민족문학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4. 맺음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치원은 그가 처한 현실에 따라 특징적인 문학적 인식과 표현방법을 달리하였다. 그의 문학작품은 어떤 한 사물 혹은 현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진실하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폭로, 비판하고 있으며, 자연 현상 혹은 사물을 빌어 사회 현실 혹은 자신의 사상 감정을 특유의 대비, 풍유, 은유, 상징의 수법 및 풍자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최치원의 문학은 남다른 진실성, 구체성, 전형성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게 구체적이고도 전형적인 의의를 띠는 생활 현상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 인물 혹은 사물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묘사를 통해 형상화 시켰다.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 손영선 , 조선 한국한 연구 제1집
결코 평탄하다 말할 수 없는 삶속에서, 최치원은 한국의 한문학을 크게 발전 시켰다. 그가 이룩한 사상과 문학적 업적은 전례 없는 것이었고, 후기 한국문학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처절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의 비판적 태도. 그의 현실 개혁 노력과 실패 후의 방랑과 은거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가능하기 힘든 삶이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오늘날 한문학에서의 그를 그 같은 위치에 있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 참고 문헌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손영선, 조선 한국학 연구 제1집
<최치원과 그의 작품> 하진화, 조선 한국학 연구 제8집
<최치원의 문학 사상> 이복규,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청람어문학회
<최치원 문학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이구의, 한국 사상과 문화 제16집
<최치원 문학 연구> 김중렬
<제가야산독서당>이 세속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담고 있다면, 은거 이 후 순수하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자연의 뛰어난 절경을 사실적으로 한 폭의 풍경화를 보듯이 묘사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창작한 시인 <임경대(臨鏡臺)>가 있다.
烟巒簇簇水溶溶(연만족족수용용) 안개 낀 산 빽빽하고 강물은 넘실넘실
鏡裏人家對碧峯(경리인가대벽봉) 거울 속인가 푸른 산 마주하였네.
何處孤帆飽風去(하처고범포풍거) 외로운 돛단배 바람 안고 어디로 가는가
瞥然飛鳥杳無(변연비조묘무종) 새처럼 언듯 지나쳐 자취 없네.
이 시는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산수시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화폭을 그려 보이면서 조국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사랑과 함께 고국의 아름답고 장려한 산천을 노래하고 있다. 시 속에 실로 그림이 있는 듯, 그림 속에 시가 있는 듯 경물묘사에서의 사실주의적 묘사특징을 아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 손영선 , 조선 한국학 연구 제1집
또,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전하는 8편의 <둔세시(遯世詩)>는 시제나 작자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치운이 산에 은거한 후 그의 만년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추론된다. 8편 중 제 6편을 살펴보기로 하자.
擬說林泉興(의설임천흥) 산 속의 흥취 말은 들었다지만
何人識此機(하인식차기) 어느 사람이 이 기틀을 알리
無心見月色(무심견월색) 무심코 달빛 보며
坐忘歸(묵묵좌망귀) 묵묵히 앉아 돌아갈 길을 잊었네.
이 <둔세시>는 최치운이 가야산에 은거한 후의 작품인 듯하며 그의 심정과 사상을 분명히 알게 해준다. 여기에서 그는 참다운 자연미를 발견하였고 자연에 귀의함으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안주할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 다른 은거시기의 작품 중, 최치원의 세상에 대한 부정성을 엿볼 수 있는 <증산승(贈山僧)>이라는 시를 살펴보면 그가 세속을 떠나 속세로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僧乎莫道 靑山好(승호막도 청산호) 스님들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씀들 하지 마시오.
山好何事 更出山(산호하사 갱출산) 산이 좋다면 왜 자주 산 밖으로 나오시는가.
試看後日 吾踪跡(시간타일 오종적) 두고 보시라. 나의 뒷날 자취를
一入靑山 更不還(일입청산 갱불환) 한번 청산에 들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을 테니.
최치원이 산 속의 스님에게 전해준 이 시에서 입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산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인간 속세로는 나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입산을 하면서 이 시를 남겼고, 뒷날 최치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이바지하고자 했던 신라 사회에 대한 상심과 환멸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최치원의 삶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의 작품적 성향을 살펴보았다. 그가 처한 현실에 따라 그의 문학세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그의 문학 속에는 시기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유학시기에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당나라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한탄 그리고 외로움의 정서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귀국 후에는 신라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모순과 세태를 풍자하여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켰으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방랑과 은거를 하던 시기에는 현실 세계를 잊지 못하는 모습과 세속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작품의 차이, 곧 그의 문학 세계의 다양성은 통시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의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였을 때 더욱 쉽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의 이러한 삶의 역정에 따른 시풍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당나라의 세련된 근체시(近體詩)를 신라 문단에 옮겨놓음으로써, 당시 오언시만이 겨우 산출되던 신라문단이 최치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근체시의 시대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최치원의 이러한 시풍은 그야말로 이 후에 우리 민족문학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4. 맺음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치원은 그가 처한 현실에 따라 특징적인 문학적 인식과 표현방법을 달리하였다. 그의 문학작품은 어떤 한 사물 혹은 현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도 진실하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폭로, 비판하고 있으며, 자연 현상 혹은 사물을 빌어 사회 현실 혹은 자신의 사상 감정을 특유의 대비, 풍유, 은유, 상징의 수법 및 풍자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최치원의 문학은 남다른 진실성, 구체성, 전형성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은 대게 구체적이고도 전형적인 의의를 띠는 생활 현상들을 소재로 하고 있어 인물 혹은 사물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묘사를 통해 형상화 시켰다.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 손영선 , 조선 한국한 연구 제1집
결코 평탄하다 말할 수 없는 삶속에서, 최치원은 한국의 한문학을 크게 발전 시켰다. 그가 이룩한 사상과 문학적 업적은 전례 없는 것이었고, 후기 한국문학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처절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의 비판적 태도. 그의 현실 개혁 노력과 실패 후의 방랑과 은거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을 때 가능하기 힘든 삶이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세상의 이면을 바라보는 그의 안목이 오늘날 한문학에서의 그를 그 같은 위치에 있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 참고 문헌
<최치원 문학의 사실주의 탐구> 손영선, 조선 한국학 연구 제1집
<최치원과 그의 작품> 하진화, 조선 한국학 연구 제8집
<최치원의 문학 사상> 이복규,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청람어문학회
<최치원 문학에 나타난 현실 인식> 이구의, 한국 사상과 문화 제16집
<최치원 문학 연구> 김중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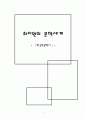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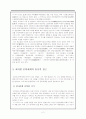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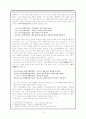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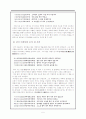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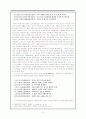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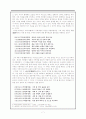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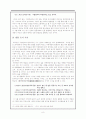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