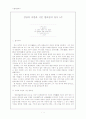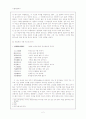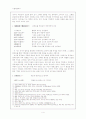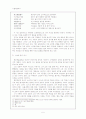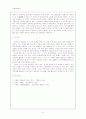목차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성당의 자연파 시인 맹호연
Ⅲ. 맹호연의 작품 속으로(당시)
Ⅳ. 시속에 담긴 의식
Ⅴ. 나오며
Ⅰ. 들어가며
Ⅱ. 성당의 자연파 시인 맹호연
Ⅲ. 맹호연의 작품 속으로(당시)
Ⅳ. 시속에 담긴 의식
Ⅴ. 나오며
본문내용
에 벼슬을 내쳐두고, 흰머리로 늙을 때까지 산림간에 누워 계셨다.’ 라고 맹호연을 노래했지만, 맹호연은 늘 ‘위궐魏闕’에 마음이 가 있었으며 금마문에서의 대조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설사 벼슬의 바깥쪽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벼슬을 지향하는 맹호연의 모습은 기실 중국의 전통시기에 출사를 본령으로 하는 사인계층의 공통된 심리로 파악된다. 이처럼 맹호연의 문학이 비록 사인계층이 담당하는 문학이라는 전통시기 중국문학의 기본 틀을 끝내 깨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문학의 물꼬를 열어 준 의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이 그의 시대에 이르러 사인계층 전반에 사기를 진작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낳았지만, 사인의 신분을 출사로 이행시키는 데에 실패하는 인사가 불가피하게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맹호연 이후에도 늘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Ⅴ. 나오며
지금까지 맹호연과 그가 지은 당시를 통해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맹호연,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벼슬에 뜻을 두었으면서도 방랑과 은둔으로 생애를 마감한 불우한 인물이다. 이는 그의 현존하는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시 대부분이 전원과 산수를 노래한 것이 많으며, 시의 특징 또한 청려하고 아정한 맛을 풍겨서 중국의 전통시기의 산수전원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때는 중국 서정시의 최성기이고, 그 시는 중국문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학에도 위대한 유산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원류(源流)를 이루는 것은 위(魏) ·진(晉) 이후, 귀족 사회에서 발달되어 온 육조(六朝)의 시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원숙한 예술로서 결실을 보게 된 밑바닥에는 일어서기 시작한 상공업자 ·농민의 굳센 생활력과 이민족(異民族)과의 접촉으로 인한 세계의 확대가 있었다.
육조의 시가 인간을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인생의 절망을 주로 노래한 데 대하여, 당나라의 시인들이 이 절망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태도를 시의 골격으로 삼은 것은 시대의 흐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 자연파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써 맹호연은 그의 삶을 시를 통해 잘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1. 이해원,『황하에 흐르는 명시』, 현학사, 2004.
2. 김원중,『唐詩』, 을유문화사, 2004.
3. 이남종,『孟浩然詩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Ⅴ. 나오며
지금까지 맹호연과 그가 지은 당시를 통해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맹호연,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탓에 벼슬에 뜻을 두었으면서도 방랑과 은둔으로 생애를 마감한 불우한 인물이다. 이는 그의 현존하는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시 대부분이 전원과 산수를 노래한 것이 많으며, 시의 특징 또한 청려하고 아정한 맛을 풍겨서 중국의 전통시기의 산수전원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때는 중국 서정시의 최성기이고, 그 시는 중국문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학에도 위대한 유산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원류(源流)를 이루는 것은 위(魏) ·진(晉) 이후, 귀족 사회에서 발달되어 온 육조(六朝)의 시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원숙한 예술로서 결실을 보게 된 밑바닥에는 일어서기 시작한 상공업자 ·농민의 굳센 생활력과 이민족(異民族)과의 접촉으로 인한 세계의 확대가 있었다.
육조의 시가 인간을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인생의 절망을 주로 노래한 데 대하여, 당나라의 시인들이 이 절망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태도를 시의 골격으로 삼은 것은 시대의 흐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잘 알려진 시인은 아니지만 자연파를 대표하는 시인으로써 맹호연은 그의 삶을 시를 통해 잘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1. 이해원,『황하에 흐르는 명시』, 현학사, 2004.
2. 김원중,『唐詩』, 을유문화사, 2004.
3. 이남종,『孟浩然詩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