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비평의 본질
2. 신비평의 분석 방법
3. 신비평의 수용 양상
4. 신비평이 문학교실에 미친 공적
5. 신비평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신비평의 분석 방법
3. 신비평의 수용 양상
4. 신비평이 문학교실에 미친 공적
5. 신비평에 대한 비판적 견해
본문내용
점은 교육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이나 모든 책임을 신비평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 있듯 신비평이 문학 교육을 지식 교육화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식 교육화한 교육 풍토가 신비평의 분석방법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교육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현장에서 문학교육을 하다보면 분석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학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싫증을 유발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신비평은 고형화된 지식, 이해의 대상이 아닌 암기의 대상이 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개념이 시를 풍부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문학의 교수나 연구가 모두 정답의 탐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학작품을 읽고 삶의 한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비평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문학 교육 자체는 충분한 반성의 대상이 된다. 시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명하는 일은 신비평이 아닌 다른 이론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비평 방법이든 어떤 문학 연구 방법이든 한 가지 방법만이 유용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런 신비평을 비판 만할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중시하는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작품을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비평의 기초지식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세히 읽기를 문학교육에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 읽기에서 지나치게 세밀한 분석은 삼가야 하며 시의 분석은 반드시 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 수업의 토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비평의 개념이나 분석 방법을 기초 지식으로 익힌 후, 실제의 수업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비평 이론을 수용하고 풍부한 교과서, 열린 교과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주영중,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1095~60년대 신비평의 수용과 새로운 비평의 모색」, 한국근대문학회, 2004.
교육 현장에서 문학교육을 하다보면 분석위주의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학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싫증을 유발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신비평은 고형화된 지식, 이해의 대상이 아닌 암기의 대상이 되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개념이 시를 풍부히 이해하고 감상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문학의 교수나 연구가 모두 정답의 탐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문학작품을 읽고 삶의 한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신비평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문학 교육 자체는 충분한 반성의 대상이 된다. 시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명하는 일은 신비평이 아닌 다른 이론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비평 방법이든 어떤 문학 연구 방법이든 한 가지 방법만이 유용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
이런 신비평을 비판 만할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중시하는 지금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작품을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비평의 기초지식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세히 읽기를 문학교육에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자세히 읽기에서 지나치게 세밀한 분석은 삼가야 하며 시의 분석은 반드시 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 수업의 토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신비평의 개념이나 분석 방법을 기초 지식으로 익힌 후, 실제의 수업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하는 토론식 수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비평 이론을 수용하고 풍부한 교과서, 열린 교과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준, 『문학이론과 시교육』, 박이정, 1997.
주영중,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1호』, 「1095~60년대 신비평의 수용과 새로운 비평의 모색」, 한국근대문학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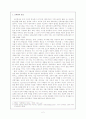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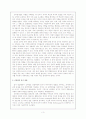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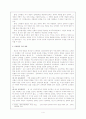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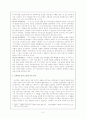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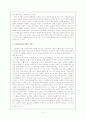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