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의 관계와 충격을 통해 자라고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반성적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데 있다.
5. 박용철 시론의 의의.
『기교주의설의 허망』에서 박용철은 프로레타리아 문학론과 모더니즘 시론을 거부하고 예술파 순수시론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박용철에게 있어서 반이성 반기교적 성격을 갖는 순수시의 방향성은 창작방법으로 변용시론을 주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용철 시론은 시어로서의 언어가 지닌 마술성을 이 땅에서 최초로 논리화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당대의 많은 시인들이 제대로 된 한국어의 훈련 내지는 기술의 습득을 지니지 않고 조야한 논리나 구호만으로 시를 구성하려 했던 잘못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한다. 또, 박용철 논리의 많은 부분은 독특한 시론이 아니라 시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환기하며 시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시적 완성에의 경로를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1930년대에 이 시문학파 시론은 우리 근대문학이 빠져있던 오류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란 문학이며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의 하나라는 사실을 널리 인지케 함으로써 우리 근대 문학을 발전시켰다.
5. 박용철 시론의 의의.
『기교주의설의 허망』에서 박용철은 프로레타리아 문학론과 모더니즘 시론을 거부하고 예술파 순수시론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박용철에게 있어서 반이성 반기교적 성격을 갖는 순수시의 방향성은 창작방법으로 변용시론을 주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용철 시론은 시어로서의 언어가 지닌 마술성을 이 땅에서 최초로 논리화했다는 것에 있다. 이는 당대의 많은 시인들이 제대로 된 한국어의 훈련 내지는 기술의 습득을 지니지 않고 조야한 논리나 구호만으로 시를 구성하려 했던 잘못에 대한 엄숙한 경고의 의미도 내포한다. 또, 박용철 논리의 많은 부분은 독특한 시론이 아니라 시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환기하며 시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시적 완성에의 경로를 강조하였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1930년대에 이 시문학파 시론은 우리 근대문학이 빠져있던 오류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란 문학이며 언어를 매개로 하는 예술의 하나라는 사실을 널리 인지케 함으로써 우리 근대 문학을 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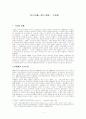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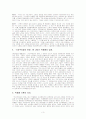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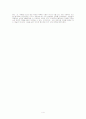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