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생명파의 등장 배경과 특성
2. 생명파의 대표적 시인과 작품
1) 서정주
2) 오장환
3) 유치환
Ⅲ. 나오며
※ 참고 문헌
Ⅱ. 본론
1. 생명파의 등장 배경과 특성
2. 생명파의 대표적 시인과 작품
1) 서정주
2) 오장환
3) 유치환
Ⅲ. 나오며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있다. 특히 3연에서는 생명에 열애는 하지만 열애에 빠지는 것은 치욕이기 때문에 애련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4연에서도 원수와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를 증오한다는 의지적 표현이 나타나며 마지막 6연에서는 시인의 삶의 자세가 드러난다. 회한 없는 삶이 그의 염원이다. 신용협,「유치환의 시정신 연구」, 우리 어문학회, 1988, p.233.
그는 강렬한 시어의 구사를 통해 시 전체의 분위기를 남성적, 대결적, 의지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강인하게 노래하였다.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바위> 전문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불감부동한 의지의 응결체인 바위에 투영하여 나타냈다. 그는 단호하고 강렬한 어조로 애련에 물들고 희로에 움직이는, 그런 감정에 움직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영원한 함묵을 통해 이러한 감정과 같은 것을 초극하는 바위가 되겠다고 하며 강인하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는 수사적 표현이 단조롭다. 설명적이요, 직관적인 표현이다. 은유법이나 역설, 또는 아이러니 또는 상징 등의 수법이 거의 없다. 김동리가 밝힌 청마의 “무기교의 기교”에 의해서 기교적 표현보다도 더한 감동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 감동은 진실의 표현에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시정신은 시인의 내면적 진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렁차고 단호한 결의와 의지의 목소리는 그의 전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논문, p.240.
Ⅲ. 나오며
지금까지 생명파의 대표적 시인인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을 통해 1930년대 후반의 조선문단을 주도한 생명파 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명파 시인들은 생명의 본질은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과 삶의 고뇌를 노래하였다. 이것을 투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서 기교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상을 거두었다. 이는 이전의 조선 문단을 주도했던 모더니즘시파와 시문학파의 시와는 다른 생명파 시의 특성이다. 비록 이들의 시가 남성적, 대결적,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은 아니기에 시대 현실에 무관심 했던 점에서는 이전의 1930년대 시파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강호정,「오장환 시 연구-표현기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003.
김진희,『생명파 시의 모더니티』, 새미, 2003.
방인태,「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생명 존중」, 배달말학회, 1990.
송외숙,「생명파 시인 연구1」,『사림어문학집』제13집, 창원대 사림어문학회, 2000.
송하선,『서정주 예술언어』, 국학자료원, 2000.
신용협,「유치환의 시정신 연구」, 우리 어문학회, 1988.
그는 강렬한 시어의 구사를 통해 시 전체의 분위기를 남성적, 대결적, 의지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강인하게 노래하였다.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億年) 비정(非情)의 함묵(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바위> 전문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불감부동한 의지의 응결체인 바위에 투영하여 나타냈다. 그는 단호하고 강렬한 어조로 애련에 물들고 희로에 움직이는, 그런 감정에 움직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영원한 함묵을 통해 이러한 감정과 같은 것을 초극하는 바위가 되겠다고 하며 강인하고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는 수사적 표현이 단조롭다. 설명적이요, 직관적인 표현이다. 은유법이나 역설, 또는 아이러니 또는 상징 등의 수법이 거의 없다. 김동리가 밝힌 청마의 “무기교의 기교”에 의해서 기교적 표현보다도 더한 감동을 준다. 다시 말하면 그 감동은 진실의 표현에 있다. 이 시에 나타난 시정신은 시인의 내면적 진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렁차고 단호한 결의와 의지의 목소리는 그의 전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논문, p.240.
Ⅲ. 나오며
지금까지 생명파의 대표적 시인인 서정주, 오장환, 유치환을 통해 1930년대 후반의 조선문단을 주도한 생명파 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생명파 시인들은 생명의 본질은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과 삶의 고뇌를 노래하였다. 이것을 투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함으로서 기교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상을 거두었다. 이는 이전의 조선 문단을 주도했던 모더니즘시파와 시문학파의 시와는 다른 생명파 시의 특성이다. 비록 이들의 시가 남성적, 대결적,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의 표현은 아니기에 시대 현실에 무관심 했던 점에서는 이전의 1930년대 시파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강호정,「오장환 시 연구-표현기법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2003.
김진희,『생명파 시의 모더니티』, 새미, 2003.
방인태,「유치환의 시에 나타난 생명 존중」, 배달말학회, 1990.
송외숙,「생명파 시인 연구1」,『사림어문학집』제13집, 창원대 사림어문학회, 2000.
송하선,『서정주 예술언어』, 국학자료원, 2000.
신용협,「유치환의 시정신 연구」, 우리 어문학회,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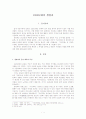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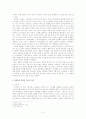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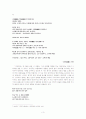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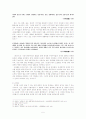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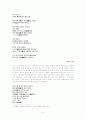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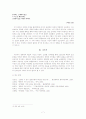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