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떡과 관련된 단어의 어원
2.1. 개피떡
2.2. 빈대떡
2.3. 호떡
2.4. 가래떡
2.5. 개떡
Ⅲ. 김치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3.1. 총각무
3.2. 김치
3.3. 나박김치
3.4. 날김치
3.5. 단무지
3.6. 동치미
Ⅳ. 탕 및 찌개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4.1. 청국장
4.2. 설렁탕
4.3. 곰국
4.4. 부대찌개
Ⅵ. 결론
Ⅱ. 떡과 관련된 단어의 어원
2.1. 개피떡
2.2. 빈대떡
2.3. 호떡
2.4. 가래떡
2.5. 개떡
Ⅲ. 김치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3.1. 총각무
3.2. 김치
3.3. 나박김치
3.4. 날김치
3.5. 단무지
3.6. 동치미
Ⅳ. 탕 및 찌개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4.1. 청국장
4.2. 설렁탕
4.3. 곰국
4.4. 부대찌개
Ⅵ. 결론
본문내용
되었을 것이다. 그런대 ‘가래떡’은 <큰사전>에서 처음 보인다. 이 사전에는 ‘가래’도 실려 있는데, 이를 ‘떡이나 엿 같은 것을 둥글고 길게 늘이어 놓은 토막’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래’를 ‘갈래’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다. 아마도 ‘가래머리, 가래삽’등에 유추되어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2.5. 개떡
19세기 말에 ‘개’로 처음 보인다. ‘개떡’은 보릿겨나 밀기울, 메밀겨 등을 반죽해서 아무렇게나 밥 뜸들일 때 올려서 찐 떡이다. 색깔은 잿빛이나 회색빛이어서 우중충하고, 모양은 손으로 대충 만져 울퉁불퉁하다. ‘개떡’은 이렇게 색깔이나 외양이 형편없을뿐더러 그 맛도 별 것이 아니다. ‘개떡’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첫째, ‘개’를 동사 어간 ‘개-’로 보고 ‘물에 개서 만든 떡’으로 이해하는 설이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 둘째, 한자 ‘가떡’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한다. 셋째, ‘겨로 만든 떡’이라는 ‘겨떡’에서 온 말로 보는 것인데, ‘겨떡’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고 ‘겨떡’이 쉽게 ‘개떡’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힘을 잃는다. 넷째, ‘개떡’을 접두사 ‘개-’와 명사 ‘떡’이 결합된 파생 명사로 보는 것이다. ‘개떡’이 별 맛도 없고 모양새나 볼품도 없는 떡이기에 부정적 의미를 띠는 접두사 ‘개-’가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떡’은 ‘변변치 못한 떡’이 된다. 이들 네가지 어원설 가운데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설과 네 번째 설이다.
Ⅲ. 김치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3.1. 총각무
총각무는 무의 일종으로, 총각무 보다는 알타리무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달랑무, 알무’라고도 한다.
‘총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머리를 땋아 묶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머리를 땋아서 묶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 전의 성인 남자’라는 좀더 일반적인 의미로 변했으며 이러한 의미가 19세기 말 이후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로 보면 ‘총각’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총각무’의 ‘총각’은 ‘혼인 전의 성인 남자’라는 변화된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총각무’의 ‘총각’은 ‘머리처럼 땋아 묶을 수 있는 것’, 여기서는 ‘무청’을 가리킨다. 사람의 머리와 무의 무청은 땋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면 ‘총각무’는 ‘무청이 있는 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총각무’의 반대가 ‘처녀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녀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2. 김치
선조들은 김치를 상고 시대부터 먹어왔으며 그것을 ‘디히’라 불렀다. 고추를 양념으로 하는 빨간 김치가 나타난 것은 고추가 국내에 들어온 16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다. ‘디히’는 김치에 대한 순수 우리말이다. 옛 문헌에 보이는 ‘겨디히’나 ‘장앳디히’의 ‘디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디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옛말 ‘
2.5. 개떡
19세기 말에 ‘개’로 처음 보인다. ‘개떡’은 보릿겨나 밀기울, 메밀겨 등을 반죽해서 아무렇게나 밥 뜸들일 때 올려서 찐 떡이다. 색깔은 잿빛이나 회색빛이어서 우중충하고, 모양은 손으로 대충 만져 울퉁불퉁하다. ‘개떡’은 이렇게 색깔이나 외양이 형편없을뿐더러 그 맛도 별 것이 아니다. ‘개떡’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전한다. 첫째, ‘개’를 동사 어간 ‘개-’로 보고 ‘물에 개서 만든 떡’으로 이해하는 설이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없다. 둘째, 한자 ‘가떡’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한다. 셋째, ‘겨로 만든 떡’이라는 ‘겨떡’에서 온 말로 보는 것인데, ‘겨떡’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고 ‘겨떡’이 쉽게 ‘개떡’으로 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힘을 잃는다. 넷째, ‘개떡’을 접두사 ‘개-’와 명사 ‘떡’이 결합된 파생 명사로 보는 것이다. ‘개떡’이 별 맛도 없고 모양새나 볼품도 없는 떡이기에 부정적 의미를 띠는 접두사 ‘개-’가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개떡’은 ‘변변치 못한 떡’이 된다. 이들 네가지 어원설 가운데 그런대로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설과 네 번째 설이다.
Ⅲ. 김치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
3.1. 총각무
총각무는 무의 일종으로, 총각무 보다는 알타리무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달랑무, 알무’라고도 한다.
‘총각’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머리를 땋아 묶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머리를 땋아서 묶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했다. 그리고 이어서 ‘혼인 전의 성인 남자’라는 좀더 일반적인 의미로 변했으며 이러한 의미가 19세기 말 이후의 문헌에서 확인된다. 이로 보면 ‘총각’이 지금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총각무’의 ‘총각’은 ‘혼인 전의 성인 남자’라는 변화된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총각무’의 ‘총각’은 ‘머리처럼 땋아 묶을 수 있는 것’, 여기서는 ‘무청’을 가리킨다. 사람의 머리와 무의 무청은 땋아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면 ‘총각무’는 ‘무청이 있는 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총각무’의 반대가 ‘처녀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녀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2. 김치
선조들은 김치를 상고 시대부터 먹어왔으며 그것을 ‘디히’라 불렀다. 고추를 양념으로 하는 빨간 김치가 나타난 것은 고추가 국내에 들어온 16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다. ‘디히’는 김치에 대한 순수 우리말이다. 옛 문헌에 보이는 ‘겨디히’나 ‘장앳디히’의 ‘디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디히’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 옛말 ‘
추천자료
 일본의 음식문화와 식생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본의 음식문화와 식생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말][우리글][우리말순화][우리말바로쓰기][국어][국어순화]우리말 특징 및 훼손과 우리...
[우리말][우리글][우리말순화][우리말바로쓰기][국어][국어순화]우리말 특징 및 훼손과 우리... 국어문법론
국어문법론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
한국음식의 관광상품화 [표준어][표준어의 정의][표준어의 체계][표준어의 내용][표준어의 문제점][표준어 관련 제언...
[표준어][표준어의 정의][표준어의 체계][표준어의 내용][표준어의 문제점][표준어 관련 제언... [어원][수저][베짱이][관광][아리랑][인절미][장사][설렁탕][화냥]수저의 어원, 베짱이의 어...
[어원][수저][베짱이][관광][아리랑][인절미][장사][설렁탕][화냥]수저의 어원, 베짱이의 어... 케이크(Cake)의 역사 (케이크의 정의, 어원, 기원, 발전과정, 종류, 풍습)
케이크(Cake)의 역사 (케이크의 정의, 어원, 기원, 발전과정, 종류, 풍습) [국어과교육] 어휘 지도 전략 (어휘 지도의 중요성, 어휘 및 어휘력의 개념, 어휘 지도의 원...
[국어과교육] 어휘 지도 전략 (어휘 지도의 중요성, 어휘 및 어휘력의 개념, 어휘 지도의 원... 중국음식 문화 레포트
중국음식 문화 레포트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국어 교과서와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국어 교과서와 한국어 교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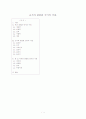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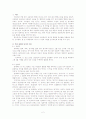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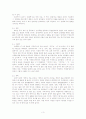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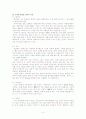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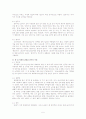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