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 연구
1.풍자
2.부정어법
Ⅲ.결론
Ⅳ.참고자료
Ⅱ.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 연구
1.풍자
2.부정어법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만 화자의 상황을 보면 건넌방엔 캐비닛도 있고 광, 지하실에 심지어 식모까지 있다. 화자에게 ‘철사’는 꼭 있어야 하는 거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광에 못을 쳐놓을 만큼 그 소유에 집착함으로서 ‘더 나쁘다’는 자책감과 ‘양심의 가책’등의 내적 갈등을 겪으며 칠백 원짜리 철사를 위해 담의 보수공사를 하는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된다. 이것 역시 자신의 긍정적인 상황과 달리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화자를 엿볼 수 있다. 상황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점점 확대시킴으로써 기득권층의 이기성과 그 삶의 이율배반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의 시들이 긍정적인 상황과 대비된 부정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서 주제를 강조했다면, 아래의 시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된 긍정적인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는 시이다.
<전략>
파자마 바람으로 닭모이를 주러 나가서
문지방 안에 석간이 떨어져 뒹굴고 있는데도
심부름하는 놈더러
「저것 좀 집어와라!」호령 하나 못하니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 바람으로 체면도 차리고 돈도 벌자고
하다하다못해 번역업을 했더니
권말에 붙어나오는 역자 약력에는
한사코 XX대학 중퇴가 XX대학 졸업으로 오식(誤植)이 돼 나오니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 차림으로 주스를 마시면서
프레이저의 현대시론을 사전을 찾아가며 읽고 있으려니
여편네가 일본에서 온 새 잡지 안의
김소운(金素雲)의 수필을 보라고 내던져준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읽어보시오
나의 프레이저의 책 속의 낱말이
송충이처럼 꾸불텅거리면서 어찌나 지겨워 보이던지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바람으로>
위의 시를 보면, 각 연들 첫 행의 ‘파자마바람으로’라는 구절과 마지막 두 행의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라는 두 절이 연결되어 있다. 화자의 삶은 ‘파자마바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를 당황스럽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파자마바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는 ‘체면을 차려볼 궁리’만 하는 것이다.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파자마’라는 말은 ‘주스’, ‘프레이저’, ‘일본에서 온 새 잡지’, ‘번역업’등과 연결되어 단순한 파자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문화의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상복을 입어야 체면을 차릴 수 있지만 화자는 파자마를 벗지 않는다. 문화정체성의 혼란은 계속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의 근본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의지만 내보이는 존재다.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약하게 상황탈피만 모색하던 화자를 통해 주제를 더욱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앞서 소개한 시 <도취의 피안>처럼 부정어미를 사용해 상황을 부정한 시다.
<전략>
가정을 알려면 돈을 떼어보면 돼
숲을 알려면 땅벌에 물려보면 돼
잔소리 날 때는 슬쩍 피하면 돼
-채귀(債鬼)가 올 때도-
버스를 피해서 길을 건너서는 어린 놈처럼
선뜻 큰 길을 건너서면 돼
장시(長時)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중략>
깨꽃이나 샐비어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일의 채귀를
죽은 뒤의 채귀를 걱정하는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샐비어 씨는 빨갛지 않으니까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영워만 영원만 고민하지 않으면 돼
오징어에 말라붙은 새처럼 5월이 와도
9월이 와도 꼬리만 치지 않으면 돼
<후략>
-<장시1>
이 시에서는 본래의 뜻을 숨기고 정반대로 진술하기 위해 부정어법이 쓰였다. 이 시의 서술어를 보면, 긍정어법인 ‘돼’와 부정어법인 ‘안 돼’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 모두 본 뜻과는 반대를 의미한다. 즉 ‘돼’는 ‘안 돼’를, ‘안 돼’는 ‘돼’를 의미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의 부정어법을 정반대의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는 ‘장시’라는 제목과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장시’는 보통 전통적인 시적 관습을 거부하는 체제 저항적인 의미를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간의 향락을 추구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근원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책을 등한시하는 기존 사회의 모순을 비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적 자아는 장시를 쓰고 영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어엿한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즉, 화자는 성인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돈이 우선시되고 장시처럼 정신적인 가치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대 사회의 흐름까지 비판하는 것이다.
Ⅲ. 결 론
김수영은 사회의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해방 이후 모더니즘 문학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인이었다. 아이러니는 김수영 시의 수사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법이며, 나아가 김수영의 세계를 보는 태도, 즉 세계에 대한 한 사고방식이다.
김수영 시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의 시의 의미는 아이러니 분석에 의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다. 그는 아이러니를 통해 기존의 의미를 파괴하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김수영의 아이러니는 ‘밖을 내다보는’, 즉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자신을 반성하며 그 반성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것은 시인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향해 밖을 바라보고 있는 김수영의 아이러니는 해방 이후 사회의식과 현실감각을 지닌 모더니즘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통 아이러니한 일 뿐이다. 김수영 시에 대한 연구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Ⅳ. 참고자료
<김수영 시 전집>, 김수영, 민음사
<김수영 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심은희
<김수영 시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황혜경
<김수영 시의 풍자연구>, 경기대 대학원, 정현덕
<김수영 문학의 전위적 성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김삼숙
위의 시들이 긍정적인 상황과 대비된 부정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서 주제를 강조했다면, 아래의 시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비된 긍정적인 화자의 행동이 나타나는 시이다.
<전략>
파자마 바람으로 닭모이를 주러 나가서
문지방 안에 석간이 떨어져 뒹굴고 있는데도
심부름하는 놈더러
「저것 좀 집어와라!」호령 하나 못하니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 바람으로 체면도 차리고 돈도 벌자고
하다하다못해 번역업을 했더니
권말에 붙어나오는 역자 약력에는
한사코 XX대학 중퇴가 XX대학 졸업으로 오식(誤植)이 돼 나오니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 차림으로 주스를 마시면서
프레이저의 현대시론을 사전을 찾아가며 읽고 있으려니
여편네가 일본에서 온 새 잡지 안의
김소운(金素雲)의 수필을 보라고 내던져준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읽어보시오
나의 프레이저의 책 속의 낱말이
송충이처럼 꾸불텅거리면서 어찌나 지겨워 보이던지
이렇게 돼서야 그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바람으로>
위의 시를 보면, 각 연들 첫 행의 ‘파자마바람으로’라는 구절과 마지막 두 행의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라는 두 절이 연결되어 있다. 화자의 삶은 ‘파자마바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를 당황스럽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파자마바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그는 ‘체면을 차려볼 궁리’만 하는 것이다.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는 ‘파자마’라는 말은 ‘주스’, ‘프레이저’, ‘일본에서 온 새 잡지’, ‘번역업’등과 연결되어 단순한 파자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문화의 정체성이 혼란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평상복을 입어야 체면을 차릴 수 있지만 화자는 파자마를 벗지 않는다. 문화정체성의 혼란은 계속되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을 억압하는 현실의 근본은 인식하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의지만 내보이는 존재다. 부정적인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약하게 상황탈피만 모색하던 화자를 통해 주제를 더욱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앞서 소개한 시 <도취의 피안>처럼 부정어미를 사용해 상황을 부정한 시다.
<전략>
가정을 알려면 돈을 떼어보면 돼
숲을 알려면 땅벌에 물려보면 돼
잔소리 날 때는 슬쩍 피하면 돼
-채귀(債鬼)가 올 때도-
버스를 피해서 길을 건너서는 어린 놈처럼
선뜻 큰 길을 건너서면 돼
장시(長時)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중략>
깨꽃이나 샐비어나 마찬가지 아니냐
내일의 채귀를
죽은 뒤의 채귀를 걱정하는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샐비어 씨는 빨갛지 않으니까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
영워만 영원만 고민하지 않으면 돼
오징어에 말라붙은 새처럼 5월이 와도
9월이 와도 꼬리만 치지 않으면 돼
<후략>
-<장시1>
이 시에서는 본래의 뜻을 숨기고 정반대로 진술하기 위해 부정어법이 쓰였다. 이 시의 서술어를 보면, 긍정어법인 ‘돼’와 부정어법인 ‘안 돼’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이 모두 본 뜻과는 반대를 의미한다. 즉 ‘돼’는 ‘안 돼’를, ‘안 돼’는 ‘돼’를 의미함으로써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의 부정어법을 정반대의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는 ‘장시’라는 제목과 ‘장시만 장시만 안 쓰려면 돼’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장시’는 보통 전통적인 시적 관습을 거부하는 체제 저항적인 의미를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원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간의 향락을 추구하고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근원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책을 등한시하는 기존 사회의 모순을 비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적 자아는 장시를 쓰고 영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어엿한 성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즉, 화자는 성인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성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설정은 돈이 우선시되고 장시처럼 정신적인 가치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현대 사회의 흐름까지 비판하는 것이다.
Ⅲ. 결 론
김수영은 사회의식과 현실감각을 가지고 해방 이후 모더니즘 문학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인이었다. 아이러니는 김수영 시의 수사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기법이며, 나아가 김수영의 세계를 보는 태도, 즉 세계에 대한 한 사고방식이다.
김수영 시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의 시의 의미는 아이러니 분석에 의해 새롭게 조명될 수 있었다. 그는 아이러니를 통해 기존의 의미를 파괴하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김수영의 아이러니는 ‘밖을 내다보는’, 즉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그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자신을 반성하며 그 반성을 통해 자신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것은 시인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에 대한 비판과 고발까지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향해 밖을 바라보고 있는 김수영의 아이러니는 해방 이후 사회의식과 현실감각을 지닌 모더니즘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통 아이러니한 일 뿐이다. 김수영 시에 대한 연구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Ⅳ. 참고자료
<김수영 시 전집>, 김수영, 민음사
<김수영 시 연구>, 경희대 대학원, 심은희
<김수영 시의 아이러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황혜경
<김수영 시의 풍자연구>, 경기대 대학원, 정현덕
<김수영 문학의 전위적 성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김삼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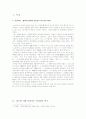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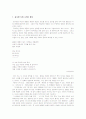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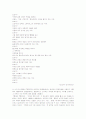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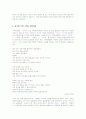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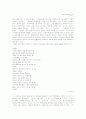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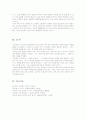









소개글